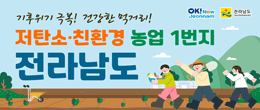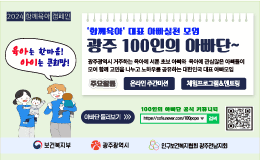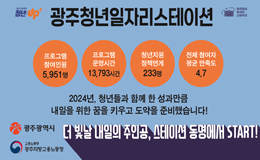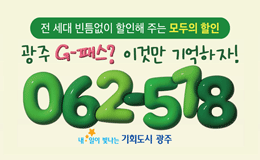[에필로그] 과거·현재·미래가 공존하는 ‘배움의 공간’
조선시대 사설 교육기관 ‘서원’…선현들 삶·학문 배우는 곳
성리학적 사상·지역의 독특한 문화 결합…콘텐츠화 ‘눈길’
김인후 배향 ‘장성 필암서원’…최초 서원 ‘영주 소수서원’
풍광 뛰어난 ‘안동 도산서원’…소나무 숲 ‘함양 남계서원’
통일신라시대 최치원 모신 ‘정읍 무성서원’ 마을 내 자리
성리학적 사상·지역의 독특한 문화 결합…콘텐츠화 ‘눈길’
김인후 배향 ‘장성 필암서원’…최초 서원 ‘영주 소수서원’
풍광 뛰어난 ‘안동 도산서원’…소나무 숲 ‘함양 남계서원’
통일신라시대 최치원 모신 ‘정읍 무성서원’ 마을 내 자리
 장성 필암서원 확연루 |
조선시대 사설 교육기관인 서원(書院)은 제향자의 정신이 구현된 공간이다. 이곳에선 선현들의 삶과 학문을 배우는 것은 물론 이를 실천의 장으로 모색했다. 또한 풍광이 뛰어난 곳에 자리해 심신을 풀고 편하게 쉬는 유식(遊息)의 활동이 이루어졌다.
한국의 서원은 지난 2019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만큼 세계가 인정한 보편적 가치가 보존 계승돼왔다. 장성 필암서원, 정읍 무성서원, 영주 소수서원, 안동 도산서원, 경주 옥산서원, 달성 도동서원, 안동 병산서원, 함양 남계서원, 논산 돈암서원 등 모두 9곳이다.
사실 전국 600여 개 서원 가운데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곳은 지역에서도 당대 성리학적 사상이 응집된 공간뿐 아니라 지역의 독특한 문화가 투영돼 있다는 점에서 세계유산으로 손색이 없다.
가장 먼저 소개한 곳은 장성 필암서원이었다. 하서 김인후(1510~1560)를 배향한 필암서원에서 문불여장성(文不如長城)이 유래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도학, 학문, 절의가 뛰어났던 김인후는 공자를 모신 사당인 문묘에 종사된 해동 18현 가운데 한 명이다.
서원은 당초 1590년 장성읍 기산리에 세워졌지만 정유재란 때 화재로 소실돼 1624년 다시 지어졌다. 이후 1662년 현종이 어필로 ‘필암서원’을 사액했으며 1672년 지금의 위치로 이전했다. 서원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물이 확연루(廓然樓)다. 군자가 임하는 학문의 태도를 일컫는 말로, 현판은 우암 송시열(1607~89)의 글씨다.
정읍 무성서원은 자리한 곳이 산도 아니고 들도 아닌 마을을 둘러싼 곳에 있다. 세계문화유산에 선정된 9곳 중 유일하게 마을 가운데 자리 잡은 데다, 배향 인물이 조선의 선비가 아닌 통일신라시대 인물에 닿아 있다는 점에서 이색적이다.
이곳은 고운(孤雲) 최치원(857~?)을 모신 서원으로 당시 선정을 베푼 고운 선생의 치적과 학덕을 기리기 위해 건립됐다. 기록에 따르면 무성서원은 최치원이 태산 태수로 있을 때 지은 생사당이 시초다. 이후 1483년 정극인이 중심이 돼 건립한 향학당의 자리로 옮긴 후 옛 지명을 따라 태산사라 명명했다. 그러다 조선시대 지역 유림들이 태산사와 생사당, 향학당을 합쳐 태산서원으로 명했으며 숙종 22년(1696년) 왕이 무성서원이라는 현판을 내려 사액서원이 됐다
경북 영주 소수서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이다. 풍기군수 주세붕이 1542년(중종37) 이곳 출신 유학자인 안향을 배향하기 위해 사묘를 건립했고, 이듬해 유생 교육을 담당하기 위해 백운동서원을 설립한 것이 토대가 됐다.
이후 1547년(명종2) 경상감사 안현이 서원관리침인 ‘사문입의’(斯文立議)를 작성하고 관둔전 30결과 서적을 비치해 비로소 서원의 형태가 갖추어졌다. 본격적인 발전의 토대를 닦은 것은 1549년(명종4) 이황이 풍기군수로 부임하면서다. 당시 이황은 백운동서원을 국가의 교육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한 방책을 마련했다.
도산서원은 서원 가운데 풍광이 뛰어난 곳이다. 퇴계 이황이 생전에 지은 도산서당이 모태가 됐다. 1574년 착공해 1년 만에 완공됐는데 당시 선조로부터 ‘도산’이라는 사액을 받았다. 또한 사당은 1576년 완공돼 퇴계의 위패를 봉안, 배향하면서 사실상 서원의 형태가 마련됐다.
<>소나무와 조경수가 에워싸듯 풍광이 단정한 도산서당. 마치 퇴계의 학덕을 보여주듯 올곧으면서도 담박한 분위기가 서지향과 어울린다.
도동서원은 대구시 달성군에 있다. 김굉필을 배향한 이곳 도동서원은 경관이 수려하다. 앞으로 흐르는 고요한 낙동강은 김굉필의 천품을 닮은 것도 같다. 이곳은 김
굉필의 외증손자 정구가 김굉필 선생의 도와 덕을 기리기 위해 지었다고 한다. 비슬산 언덕에 쌍계서원으로 건립했지만 정유재란 당시 소실돼 지금의 자리에 지었다.
남계서원은 소나무 숲이 장관이다. 우리의 산천 어느 곳인들 소나무가 없으련만 이곳의 숲은 그림 같다. 조선전기 정여창(1450~1504)을 배향하기 위해 건립됐는데 그는 학문과 덕행과 지조가 남달랐다. 인근 들녘에 남계(濫溪)라는 내가 흐르고 있어 서원의 이름도 그와 같이 따르게 됐다 전해온다.
정여창은 유학이 상정하는 이상사회의 전제는 통치자가 바로서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의 올곧은 행실은 집권세력에게는 눈엣가시였을 터. 중앙에 강학공간인 명성당(明誠堂)은 이치를 밝히고 행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충남 논산의 돈암서원은 예학의 대가인 김장생과 아들이면서 제자인 김집 그리고 송준길, 송시열의 위패를 모신 곳이다.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9개의 서원 가운데 유일하게 3대가 공존하는 서원이다. 사화와 반정으로 긴장의 연속이었던 조선 중기에 김장생은 예학으로 근본을 주창했다.
명칭이 말해주듯 돈암(遯巖)의 ‘돈’(遯)은 원래 ‘피한다’ ‘물러나다’ 라는 뜻의 ‘둔’이고 암은 바위 암(巖)이다. ‘돈암’은 낙향해 자연 속에서 학문과 강학에 힘쓰던 김장생의 철학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옥산서원은 회재(晦齋) 이언적이 배향된 곳이다. 그의 연대기에서 보듯 이언적은 조선 서화의 광풍이 불던 시기를 살았다. 사람들은 옥산서원을 명당이라 해석하는데 ‘봉황이 알을 품은 곳’으로 보는 것은 그런 연유다. 1574년 선조가 현판을 내려주고 사액서원이 됐다. 강학공간인 구인당에는 옥산서원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다. 옥산서원에는 유림들의 도서관이 있는데 경각이 그것이다.
<>안동의 병산서원은 수려하면서도 웅장하다. 조선시대 대표적인 유교 건축물로, 류성룡과 그의 제자이자 셋째 아들인 수암 류진(1582~1635)이 배향돼 있다. 류성룡이 젊은 시절 풍산 상리에 있던 풍악서당을 이곳으로 옮겨와 후학을 양성했다. 이후 1607년 선생이 타계하자 묘우를 건립하고 위패를 모셨으며 철종 14년(1863)에 병산서원으로 사액을 받았다. 이곳엔 ‘지난 일을 뉘우치고 앞으로의 교훈을 잊지 말자.’는 서애의 징비 정신이 투영돼 있다. <끝>
/글·사진=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서원은 지난 2019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만큼 세계가 인정한 보편적 가치가 보존 계승돼왔다. 장성 필암서원, 정읍 무성서원, 영주 소수서원, 안동 도산서원, 경주 옥산서원, 달성 도동서원, 안동 병산서원, 함양 남계서원, 논산 돈암서원 등 모두 9곳이다.
 정읍 무성서원 명륜당 |
정읍 무성서원은 자리한 곳이 산도 아니고 들도 아닌 마을을 둘러싼 곳에 있다. 세계문화유산에 선정된 9곳 중 유일하게 마을 가운데 자리 잡은 데다, 배향 인물이 조선의 선비가 아닌 통일신라시대 인물에 닿아 있다는 점에서 이색적이다.
 영주 소수서원 앞 취한대 |
경북 영주 소수서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이다. 풍기군수 주세붕이 1542년(중종37) 이곳 출신 유학자인 안향을 배향하기 위해 사묘를 건립했고, 이듬해 유생 교육을 담당하기 위해 백운동서원을 설립한 것이 토대가 됐다.
 안동 도산서원 앞 시사대 |
도산서원은 서원 가운데 풍광이 뛰어난 곳이다. 퇴계 이황이 생전에 지은 도산서당이 모태가 됐다. 1574년 착공해 1년 만에 완공됐는데 당시 선조로부터 ‘도산’이라는 사액을 받았다. 또한 사당은 1576년 완공돼 퇴계의 위패를 봉안, 배향하면서 사실상 서원의 형태가 마련됐다.
<>소나무와 조경수가 에워싸듯 풍광이 단정한 도산서당. 마치 퇴계의 학덕을 보여주듯 올곧으면서도 담박한 분위기가 서지향과 어울린다.
도동서원은 대구시 달성군에 있다. 김굉필을 배향한 이곳 도동서원은 경관이 수려하다. 앞으로 흐르는 고요한 낙동강은 김굉필의 천품을 닮은 것도 같다. 이곳은 김
 안동 병산서원 만대루 |
남계서원은 소나무 숲이 장관이다. 우리의 산천 어느 곳인들 소나무가 없으련만 이곳의 숲은 그림 같다. 조선전기 정여창(1450~1504)을 배향하기 위해 건립됐는데 그는 학문과 덕행과 지조가 남달랐다. 인근 들녘에 남계(濫溪)라는 내가 흐르고 있어 서원의 이름도 그와 같이 따르게 됐다 전해온다.
정여창은 유학이 상정하는 이상사회의 전제는 통치자가 바로서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의 올곧은 행실은 집권세력에게는 눈엣가시였을 터. 중앙에 강학공간인 명성당(明誠堂)은 이치를 밝히고 행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대구 도동서원 앞을 흐르는 낙동강 |
명칭이 말해주듯 돈암(遯巖)의 ‘돈’(遯)은 원래 ‘피한다’ ‘물러나다’ 라는 뜻의 ‘둔’이고 암은 바위 암(巖)이다. ‘돈암’은 낙향해 자연 속에서 학문과 강학에 힘쓰던 김장생의 철학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경주 옥산서원 |
<>안동의 병산서원은 수려하면서도 웅장하다. 조선시대 대표적인 유교 건축물로, 류성룡과 그의 제자이자 셋째 아들인 수암 류진(1582~1635)이 배향돼 있다. 류성룡이 젊은 시절 풍산 상리에 있던 풍악서당을 이곳으로 옮겨와 후학을 양성했다. 이후 1607년 선생이 타계하자 묘우를 건립하고 위패를 모셨으며 철종 14년(1863)에 병산서원으로 사액을 받았다. 이곳엔 ‘지난 일을 뉘우치고 앞으로의 교훈을 잊지 말자.’는 서애의 징비 정신이 투영돼 있다. <끝>
/글·사진=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