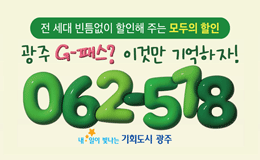[대구 도동서원] 한훤당 김굉필 선생의 도와 덕을 기리고 계승하다
비슬산 언덕에 쌍계서원으로 건립
정유재란때 소실, 지금 자리에 건립
이후 ‘도동 서원’으로 사액 받아
서원 입구 400년 넘은 은행나무
웅장한 품과 담대한 기상 보여줘
정유재란때 소실, 지금 자리에 건립
이후 ‘도동 서원’으로 사액 받아
서원 입구 400년 넘은 은행나무
웅장한 품과 담대한 기상 보여줘
 세계문화유산인 대구 도동서원은 조선 중기 유학자 김굉필 선생의 도와 덕을 기리기 위해 건립됐다. |
장마철이라 비가 오락가락한다. 장마기간 비가 내렸다 그쳤다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길’을 떠나는 이에게는 여간 신경이 쓰인다. 더욱이 올 장마는 예년과 다르게 폭염을 동반해 습하고 무덥다. 이상기온, 기후역습, 환경재앙이라는 말이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인간의 오만과 무지가 불러온 결과다. 모두 정해진 길을 버린 탓이다. 인간이 자연의 길을 인위의 길로 막아선 과오다. 인간에게는 인간의 길이 있고, 자연에게는 자연의 길이 있을 터인데, 인간은 너무도 오랫동안 그 길을 침범했다. 당연시한데다 무모했다. 자연의 도를 무너뜨린 과오는 인간에게 상상 이상의 대가를 지불하게 할 것 같다.
길을 떠나며 그 선비의 길, 그 선비의 도(道)를 생각한다. 그는 도를 저버리지 않았다. 올곧은 성정과 절의는 그를 대변하는 수사다. 도(道)란 무엇인가. “마땅히 지켜야 할 이치”나 “만물을 만드는 원리나 법칙”을 말한다. 거창한 그 무엇이 아니다. 마땅히 지켜야 할 이치나 법칙을 버리지 않으면 되는 것이니.
그 선비를 생각할 때면 마음이 삼상해진다. 곡학아세(曲學阿世)와 교언영색(巧言令色)이 출세의 지렛대가 돼버린 세태에서 그 선비의 지조는 빛이 난다. 한훤당(寒暄堂) 김굉필(1454~ 1504). 글월만을 읽고 학문을 논하는 것이 아닌 그는 위기지학(爲己之學)을 견지했다. 김종직의 문하에 들어가 ‘소학’을 배웠고 스스로를 ‘소학동자’라 칭할 만큼 소학에 심취했다고 전해온다.
잠시 한원당의 생을 톺아본다. 1480년 생원시 합격으로 성균관에 입교하고 1496년 군자감주부에 제수된다. 이후 사헌부감찰을 거쳐 1497년 형조좌랑이 된다. 학문이 깊고 근기가 있어 뭇사람들로부터 흠모를 받았다.
그러나 시대의 격랑을 피할 수 없었다. 그의 나이 45세에 무오사화가 일어난다. 당시 그는 김종직의 문도였다는 이유 등으로 국문을 당한다. 곤장 80대와 원방부처(遠方付處)의 형을 받고 평안북도 희천으로 유배된다. 특히 김굉필은 이곳에서 청년이었던 조광조를 만나게 된다. 조광조의 부친 조원강이 평안북도 희천 찰방(역참 관리)으로 부임했던 것이다. 이 만남으로 조광조는 사림파의 영향을 받게 되고 학문의 학통을 이어받는 계기가 된다.
2년 후 김굉필은 순천으로 이배된다. 잊혀진 사람으로 초야에 묻힌 선비로 살아가던 김굉필에게 또 한번의 시련이 닥쳐온다. 1504년 갑자사화가 발발한 것. 결국 김굉필은 무오 당인이라는 죄목으로 죽음을 면치 못한다.
선조실록(권4, 3년 5월 병자(9일)에는 김굉필 선생에 대한 기록이 나온다. 한원당이 지향했던 삶과 학문의 세계가 지극히 진리와 도를 추구했음을 보여준다.
“우리 동방이 신라로부터 고려에 이르기까지 문장 있는 선비들이 찬란하게 배출되었지만 의리와 학문은 실로 김굉필로부터 열렸던 것입니다. 김굉필이 우리 조선조의 초기의 학문이 끊어진 뒤에 태어나 처음으로 선현의 학문을 흠모하여 구습을 모두 버리고 소학에 마음을 다하여 명성과 이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학문에 힘쓴 지 10여 년 만에 동정(動靜·진리)이 모두 예법을 따랐고 지경(持敬·항상 깨어 있음) 공부를 오로지 한 지 30여 년에 정력이 쌓이고 도와 덕이 이루어져 말과 행동이 법도가 되었습니다.”(김희곤, 『정신 위에 지은 공간, 한국의 서원』, 미술문화, 2019)
퇴계 이황은 김굉필을 일컬어 ‘근세도학지종’(近世道學之宗)이라 했다. 조선의 성리학을 계승했을 뿐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이를 실천으로 구현했다는 평가다. 절개와 의리와 같은 도가 범사에 구현되고 나아가 학문을 지지하는 토대로 작동했다는 얘기다.
도동서원은 대구시 달성군에 있다. 7월에 찾는 대구는 말 그대로 ‘대프리카’였다. 한훤당의 삶을 생각하며 가는 길은 이치나 도리를 강구하며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지를 생각하게 한다. 절의와 의리는 말처럼 쉽지 않다. 왕조시대에는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추구할 수 없는 지향이었다. 오늘날에는 입에 올리기에도 민망한 옥조(玉條)가 돼 버렸다. 여반장 하듯 입장을 바꾸고 출세를 위해 내달리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들에게 김굉필이 죽음으로써 보여준 도의 추구는 한낱 물정모른 선비의 결기쯤으로 보일지 모르겠다.
김굉필을 배향한 이곳 도동서원은 경관이 수려하다. 앞으로 낙동강이 흐른다. 고요한 강은 한훤당의 천품을 닮은 것도 같다. 깊은 강은 멀리 흐르듯 심지가 굳은 강은 여일하다. 도동서원은 김굉필의 외증손자 정구가 설계했다. 그는 ‘도동서원춘추향사문’에서 김굉필 선생의 도와 덕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해 지었다고 한다. 비슬산 언덕에 쌍계서원으로 건립했지만 정유재란 당시 소실돼 지금의 자리에 지었다. 이후 도동서원으로 사액을 받아 오늘에 이른다.
서원 입구에는 400년 넘은 은행나무가 서 있다. 웅장한 품과 담대한 기상은 한훤당의 기개를 보여주는 것 같다. 오랜 시간의 무게를 견디며 강가를 굽어보는 자태가 예사롭지 않다. 그저 시간이 흘러 400 수령에 이른 것이 아닌 한 해 한 해 모진 삭풍을 이겨 오늘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은행나무를 알현하고 발걸음을 내딛으면 수월루(水月樓)를 마주한다. 현판이 발하는 시적인 풍취가 이곳과 절묘하게 맞아떨어진다. 서원을 처음 지었을 때는 수월루가 없었다고 한다. 바로 낙동강의 풍광을 감상하기 위해 어떤 건물도 들이지 않았다고 전해온다. 그러나 1849년에 지을 당시 상량문에는 ‘밝은 달과 선비의 심상, 차가운 강물을 아우르려 했다’는 표현이 들어 있다고 한다.
수월루를 거쳐 환주문을 지나면 중정당이 보인다, 바로 위에는 도동서원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다. 서원의 강당인 중정당은 한원당의 학문과 도의가 깃들어 있는 공간이다. 곳곳에는 30세가 넘어서까지 ‘소학’을 놓지 않고 중요시했던 선생의 정신이 드리워져 있다. 일상에서 유교적 실천덕목을 가르쳤던 소학은 바로 김굉필 학문의 본이었다.
/글·사진=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인간의 오만과 무지가 불러온 결과다. 모두 정해진 길을 버린 탓이다. 인간이 자연의 길을 인위의 길로 막아선 과오다. 인간에게는 인간의 길이 있고, 자연에게는 자연의 길이 있을 터인데, 인간은 너무도 오랫동안 그 길을 침범했다. 당연시한데다 무모했다. 자연의 도를 무너뜨린 과오는 인간에게 상상 이상의 대가를 지불하게 할 것 같다.
 도동서원’과 ‘중정당’ 현판. |
그러나 시대의 격랑을 피할 수 없었다. 그의 나이 45세에 무오사화가 일어난다. 당시 그는 김종직의 문도였다는 이유 등으로 국문을 당한다. 곤장 80대와 원방부처(遠方付處)의 형을 받고 평안북도 희천으로 유배된다. 특히 김굉필은 이곳에서 청년이었던 조광조를 만나게 된다. 조광조의 부친 조원강이 평안북도 희천 찰방(역참 관리)으로 부임했던 것이다. 이 만남으로 조광조는 사림파의 영향을 받게 되고 학문의 학통을 이어받는 계기가 된다.
2년 후 김굉필은 순천으로 이배된다. 잊혀진 사람으로 초야에 묻힌 선비로 살아가던 김굉필에게 또 한번의 시련이 닥쳐온다. 1504년 갑자사화가 발발한 것. 결국 김굉필은 무오 당인이라는 죄목으로 죽음을 면치 못한다.
 도동서원 앞 정원에는 400년 넘은 은행나무와 아름다운 정원수들이 늘어서 있다. |
“우리 동방이 신라로부터 고려에 이르기까지 문장 있는 선비들이 찬란하게 배출되었지만 의리와 학문은 실로 김굉필로부터 열렸던 것입니다. 김굉필이 우리 조선조의 초기의 학문이 끊어진 뒤에 태어나 처음으로 선현의 학문을 흠모하여 구습을 모두 버리고 소학에 마음을 다하여 명성과 이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학문에 힘쓴 지 10여 년 만에 동정(動靜·진리)이 모두 예법을 따랐고 지경(持敬·항상 깨어 있음) 공부를 오로지 한 지 30여 년에 정력이 쌓이고 도와 덕이 이루어져 말과 행동이 법도가 되었습니다.”(김희곤, 『정신 위에 지은 공간, 한국의 서원』, 미술문화, 2019)
퇴계 이황은 김굉필을 일컬어 ‘근세도학지종’(近世道學之宗)이라 했다. 조선의 성리학을 계승했을 뿐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이를 실천으로 구현했다는 평가다. 절개와 의리와 같은 도가 범사에 구현되고 나아가 학문을 지지하는 토대로 작동했다는 얘기다.
도동서원은 대구시 달성군에 있다. 7월에 찾는 대구는 말 그대로 ‘대프리카’였다. 한훤당의 삶을 생각하며 가는 길은 이치나 도리를 강구하며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지를 생각하게 한다. 절의와 의리는 말처럼 쉽지 않다. 왕조시대에는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추구할 수 없는 지향이었다. 오늘날에는 입에 올리기에도 민망한 옥조(玉條)가 돼 버렸다. 여반장 하듯 입장을 바꾸고 출세를 위해 내달리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들에게 김굉필이 죽음으로써 보여준 도의 추구는 한낱 물정모른 선비의 결기쯤으로 보일지 모르겠다.
 서원 앞을 유유히 흐르는 낙동강은 특유의 정취를 발한다 |
서원 입구에는 400년 넘은 은행나무가 서 있다. 웅장한 품과 담대한 기상은 한훤당의 기개를 보여주는 것 같다. 오랜 시간의 무게를 견디며 강가를 굽어보는 자태가 예사롭지 않다. 그저 시간이 흘러 400 수령에 이른 것이 아닌 한 해 한 해 모진 삭풍을 이겨 오늘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은행나무를 알현하고 발걸음을 내딛으면 수월루(水月樓)를 마주한다. 현판이 발하는 시적인 풍취가 이곳과 절묘하게 맞아떨어진다. 서원을 처음 지었을 때는 수월루가 없었다고 한다. 바로 낙동강의 풍광을 감상하기 위해 어떤 건물도 들이지 않았다고 전해온다. 그러나 1849년에 지을 당시 상량문에는 ‘밝은 달과 선비의 심상, 차가운 강물을 아우르려 했다’는 표현이 들어 있다고 한다.
수월루를 거쳐 환주문을 지나면 중정당이 보인다, 바로 위에는 도동서원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다. 서원의 강당인 중정당은 한원당의 학문과 도의가 깃들어 있는 공간이다. 곳곳에는 30세가 넘어서까지 ‘소학’을 놓지 않고 중요시했던 선생의 정신이 드리워져 있다. 일상에서 유교적 실천덕목을 가르쳤던 소학은 바로 김굉필 학문의 본이었다.
/글·사진=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