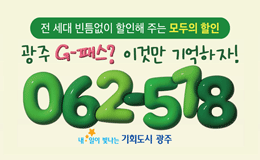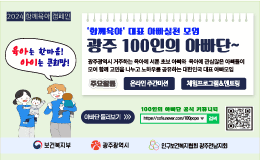[논산 돈암서원] ‘예학의 대가’ 김장생의 사상과 학문 면면히
1634년 건립, 연산면으로 이전
현종 현판내려 사액서원으로
지역 공론·학문·예법 주도
2019년 세계문화유산 등재
교류공간 ‘산앙루’ 후학양성 ‘양성당’
서원중 가장 큰 강당 ‘응도당’ 등
현종 현판내려 사액서원으로
지역 공론·학문·예법 주도
2019년 세계문화유산 등재
교류공간 ‘산앙루’ 후학양성 ‘양성당’
서원중 가장 큰 강당 ‘응도당’ 등
 돈암서원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9개의 서원 가운데 유일하게 3대가 공존하는 서원으로 알려져 있다. 이곳은 예학의 대가 김장생과 그의 부친 김계휘, 아들 김집 등이 배향돼 있다. |
그 도시에 가면 청춘의 한 때가 떠올려진다. 우렁찬 함성과 폴폴 흩날리던 먼지 그리고 황토빛의 넓은 연병장. 가뭇없이 흘러가버린 그 시간이었다. 푸른 대나무 같은 청춘의 시절이었다.
대략 스무 살부터 스무 서너 살까지 이십대 청춘들이 거쳐 갔던 곳. 바로 논산 육군훈련소다. 느티나무와 포플러 나무 사이로 이어진 연병장과 부대 막사 그리고 훈련장, 논산을 생각하면 어김없이 그 풍경들이 펼쳐진다.
그 시절 그 도시에서 나라의 부름을 받고 30여 개월의 시간을 보냈다. 신체 건강한 대한민국 젊은이라면 피할 수 없는 병역의 의무. 필자 또한 군 복무를 하기 위해 그곳으로 입대를 했다. 한 세대가 훌쩍 흘러가버린 그때의 기억은 아련하지만 여전히 생생하게 남아 있다.
눈을 감으면 가을 하늘 노란 연병장을 물들이던 청춘들의 구령 소리도 들린다. 먼지 속을 뒹굴며 까까머리 신병들은 푸른 젊음을 아낌없이 녹여냈다. 까만 된장국과 하얀 깍두기, 성근 쌀이 뒤섞인 보리밥은 배를 채워주는 ‘든든한’ 식사였다.
그때는 잘 몰랐다. 논산이라는 지역이 사실은 문(文)의 도시이고 예(禮)의 도시라는 것을. 그러나 논산(論山)은 학문의 고장이었다. 일찍이 한문화를 기반으로 한 성리학이 발달했다. 논산을 일컬어 ‘예학의 본산’이자 ‘기호학파의 근원’이라 부르는 것은 그만큼 한문화가 융성했음을 보여준다.
그 때문일까. 논산하면, 상반된 이미지가 겹쳐진다. 먼저 무와 호국의 정신이 환기된다. 옛백제인의 혈맥과 기상이 면면히 흐르는 곳이다. 멸망 직전의 나라를 구하기 위해 처자를 죽이고 황산벌 전투에 나가야만 했던 계백의 충혼이 서려 있는 고장이다. 계백의 그 무참함과 뼈저린 심회를 달리 표현할 말이 없다. 계백의 얼은 오늘의 육군 훈련소의 근간을 지지하는 정신으로 이어졌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논산에는 학문과 예법, 선비의 마음으로 대변되는 정신이 드리워져 있다. 김장생과 그 아들 김집을 중심으로 한 유학자들의 학문은 충청도 일대에 새로운 학풍을 진작시켰다.
돈암서원은 그 중심에 자리한다. 예학의 대가인 김장생과 아들이면서 제자인 김집 그리고 송준길, 송시열의 위패를 모신 곳이다. 사화와 반정으로 긴장의 연속이었던 조선 중기에 김장생은 예학으로 나라의 근본을 바로세우고자 했다.
톨게이트를 빠져나와 논산에 들어서자 시간의 경계가 무너지는 느낌이다. 아니 1500년 전 백척간두에 선 백제의 시간도 스쳐가는 느낌이다. 어디선가 훈련소 신병들의 고함 소리와 오래 전 황산벌전투에서 장렬하게 죽어간 계백의 마지막 숨소리도 들리는 것 같다. 논산이 지닌 힘을 다붓이 느껴가며 서원을 찾아간다.
돈암서원(遯巖書院)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9개의 서원 가운데 유일하게 3대가 공존하는 서원이다. 김장생의 부친은 대사헌을 지낸 황강 김계휘다. 서원 내부에는 김계휘가 지은 정회당이 있다. 명칭이 말해주듯 돈암(遯巖)의 ‘돈’(遯)은 원래 ‘피한다’ ‘물러나다’ 라는 뜻의 ‘둔’이고 암은 바위 암(巖)이다. 그러므로 ‘돈암’은 낙향해 자연 속에서 학문과 강학, 저술에 힘쓰던 김장생의 천품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원래 서원이 있던 인근에 돈암이라는 바위가 있어 지금의 이름으로 이어졌다고 한다.
돈암서원은 김장생 사후 그의 학덕을 기리는 제자들이 건립을 추진해 1634년(인조12년) 완공했다. 언급한대로 이곳을 근거로 김장생의 아들 김집, 송준길, 송시열, 유계 등 이름있는 유학자가 배출됐다. 현재 서원(연산면 임리)은 1880년에 이전한 것으로, 당초에는 약 오리 정도의 거리에 떨어진 하림리 숲말이라는 곳에 있었다. 저지대였던 탓에 침수 우려가 있어 지금의 자리로 옮겼다고 전해진다.
서원은 고정산에서 내리뻗은 줄기에 맞춤하듯 들어앉아 있다. 앞으로는 넓은 연산 평야가 보이는데 그 너머로 계룡산이 자리한다. 전체적으로 평지에 위치한 터라 안온한 기운이 배어나온다. 예법과 한문에 조예가 깊었던 김장생의 고매한 인품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곳은 1660년 현종(1년)이 ‘돈암서원’이라는 현판을 내려 사액서원이 됐다. 흥선대원권이 서원 철폐령을 비껴날 만큼 위상과 역할 등에서 인정을 받았다.
김장생의 강학은 부친 김계휘로부터 이어졌다. 김계휘는 인연이 있던 이이에게 아들의 교육을 부탁하기도 했다. 특히 송익필로부터는 사서 등을 배우며 예학에 눈을 떴다.
김장생이 활동할 무렵은 정여립의 사건과 기축옥사로 동인과 서인의 갈등이 깊었다. 더욱이 정유재란과 임진왜란은 당대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김장생은 정유재란이 발발하자 군량을 모으라는 선조의 명을 수행했을 뿐 아니라 저술에도 관심을 기울여 ‘근사록석의’, ‘가례집람’ 등을 완료했다.
이에서 보듯 김장생은 저술과 강학 외에도 국난의 시기에는 충의 임무를 완수했다. 정묘호란이 발발했을 때는 의병과 식량을 결집하는 양호소사의 책무를 수행하기도 했다. 여든이 넘은 노구를 이끌고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학문과 인품, 신망이 모두 두터웠기에 가능했다.
서원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물은 교류와 유식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됐던 산앙루(山仰樓)다. 기둥 사이로 바라보이는 들판의 정경은 활달하면서도 정취가 넘친다. 한국의 서원 가운데 가장 큰 강당인 응도당은 웅장하면서도 넓은 품이 인상적이다. 김장생이 강학활동을 펼쳤던 양성당, 문집과 목판 보관소인 경판각, 부친 김계휘가 후학을 양성했던 양회당도 돈암서원의 핵심건물이다.
/글·사진=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대략 스무 살부터 스무 서너 살까지 이십대 청춘들이 거쳐 갔던 곳. 바로 논산 육군훈련소다. 느티나무와 포플러 나무 사이로 이어진 연병장과 부대 막사 그리고 훈련장, 논산을 생각하면 어김없이 그 풍경들이 펼쳐진다.
 서원 내부에 있는 사당 |
눈을 감으면 가을 하늘 노란 연병장을 물들이던 청춘들의 구령 소리도 들린다. 먼지 속을 뒹굴며 까까머리 신병들은 푸른 젊음을 아낌없이 녹여냈다. 까만 된장국과 하얀 깍두기, 성근 쌀이 뒤섞인 보리밥은 배를 채워주는 ‘든든한’ 식사였다.
그 때문일까. 논산하면, 상반된 이미지가 겹쳐진다. 먼저 무와 호국의 정신이 환기된다. 옛백제인의 혈맥과 기상이 면면히 흐르는 곳이다. 멸망 직전의 나라를 구하기 위해 처자를 죽이고 황산벌 전투에 나가야만 했던 계백의 충혼이 서려 있는 고장이다. 계백의 그 무참함과 뼈저린 심회를 달리 표현할 말이 없다. 계백의 얼은 오늘의 육군 훈련소의 근간을 지지하는 정신으로 이어졌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논산에는 학문과 예법, 선비의 마음으로 대변되는 정신이 드리워져 있다. 김장생과 그 아들 김집을 중심으로 한 유학자들의 학문은 충청도 일대에 새로운 학풍을 진작시켰다.
 김장생이 강학활동을 펼쳤던 양성당(가운데). |
톨게이트를 빠져나와 논산에 들어서자 시간의 경계가 무너지는 느낌이다. 아니 1500년 전 백척간두에 선 백제의 시간도 스쳐가는 느낌이다. 어디선가 훈련소 신병들의 고함 소리와 오래 전 황산벌전투에서 장렬하게 죽어간 계백의 마지막 숨소리도 들리는 것 같다. 논산이 지닌 힘을 다붓이 느껴가며 서원을 찾아간다.
돈암서원(遯巖書院)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9개의 서원 가운데 유일하게 3대가 공존하는 서원이다. 김장생의 부친은 대사헌을 지낸 황강 김계휘다. 서원 내부에는 김계휘가 지은 정회당이 있다. 명칭이 말해주듯 돈암(遯巖)의 ‘돈’(遯)은 원래 ‘피한다’ ‘물러나다’ 라는 뜻의 ‘둔’이고 암은 바위 암(巖)이다. 그러므로 ‘돈암’은 낙향해 자연 속에서 학문과 강학, 저술에 힘쓰던 김장생의 천품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원래 서원이 있던 인근에 돈암이라는 바위가 있어 지금의 이름으로 이어졌다고 한다.
돈암서원은 김장생 사후 그의 학덕을 기리는 제자들이 건립을 추진해 1634년(인조12년) 완공했다. 언급한대로 이곳을 근거로 김장생의 아들 김집, 송준길, 송시열, 유계 등 이름있는 유학자가 배출됐다. 현재 서원(연산면 임리)은 1880년에 이전한 것으로, 당초에는 약 오리 정도의 거리에 떨어진 하림리 숲말이라는 곳에 있었다. 저지대였던 탓에 침수 우려가 있어 지금의 자리로 옮겼다고 전해진다.
 응도당은 한국의 서원 가운데 가장 큰 강당으로 유명하다. |
이곳은 1660년 현종(1년)이 ‘돈암서원’이라는 현판을 내려 사액서원이 됐다. 흥선대원권이 서원 철폐령을 비껴날 만큼 위상과 역할 등에서 인정을 받았다.
김장생의 강학은 부친 김계휘로부터 이어졌다. 김계휘는 인연이 있던 이이에게 아들의 교육을 부탁하기도 했다. 특히 송익필로부터는 사서 등을 배우며 예학에 눈을 떴다.
김장생이 활동할 무렵은 정여립의 사건과 기축옥사로 동인과 서인의 갈등이 깊었다. 더욱이 정유재란과 임진왜란은 당대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김장생은 정유재란이 발발하자 군량을 모으라는 선조의 명을 수행했을 뿐 아니라 저술에도 관심을 기울여 ‘근사록석의’, ‘가례집람’ 등을 완료했다.
이에서 보듯 김장생은 저술과 강학 외에도 국난의 시기에는 충의 임무를 완수했다. 정묘호란이 발발했을 때는 의병과 식량을 결집하는 양호소사의 책무를 수행하기도 했다. 여든이 넘은 노구를 이끌고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학문과 인품, 신망이 모두 두터웠기에 가능했다.
서원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물은 교류와 유식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됐던 산앙루(山仰樓)다. 기둥 사이로 바라보이는 들판의 정경은 활달하면서도 정취가 넘친다. 한국의 서원 가운데 가장 큰 강당인 응도당은 웅장하면서도 넓은 품이 인상적이다. 김장생이 강학활동을 펼쳤던 양성당, 문집과 목판 보관소인 경판각, 부친 김계휘가 후학을 양성했던 양회당도 돈암서원의 핵심건물이다.
/글·사진=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