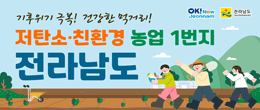[안동 병산서원] ‘징비의 정신’ 살아 숨쉬는 휴식과 강학의 공간
임란 극복한 명재상 류성룡과
제자이자 셋째아들 류진 배향
병풍같은 병산과 낙동강 ‘아늑’
학문도량 넘어 인과 예 가르침
‘서애집’·‘징비록’ 등 저서도
제자이자 셋째아들 류진 배향
병풍같은 병산과 낙동강 ‘아늑’
학문도량 넘어 인과 예 가르침
‘서애집’·‘징비록’ 등 저서도
 안동 병산서원은 서애 류성룡의 국난 극복의 정신이 깃든 서원이다. 사진은 웅장한 규모를 자랑하는 누각 만대루. |
 만대루에서 바라본 병산서원 내부 모습. |
 유생들의 강학활동이 이루어졌던 입교당. |
 병산서원 앞에 병풍처럼 서 있는 병산. |
늦여름을 지나 가을로 접어든 지가 한참이 지났다. 이제 달력은 두 장밖에 남지 않고 어느새 사르르 시간 속으로 사라졌다. 봄꽃이 만발하던 때 길을 재촉했는데 이제는 한낮의 햇귀가 떨어져버리는 가을 한복판에 접어들고 말았다. 화르르 타오르던 여름의 열기가 차라리 그리운 것은 비누 녹듯 사라져버리는 시간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일 것이다.
대체로 서원하면 여전히 옛날 학교라는 이미지가 강하다. 사실 학창시절에는 학교와 연관되거나 환기되는 것들에 대해 품을 열어 수용을 하는 편이 아니었다. 지나친 입시와 시험, 서열 위주의 결과에만 잣대를 들이대는 사회 풍토에 대한 일종의 반발심 때문이었을 것이다.
안동의 병산서원은 수려하면서도 웅장하다. 담대하면서도 섬세하고 오밀조밀하면서도 큼직큼직하다. 그리고 만대루에 올라 저편 병풍처럼 둘러싸인 병산을 바라보라. 푸른 낙동강과 아늑한 병산이 오랜 벗처럼 다정하게 서로를 그러안은 모습에 미소를 짓게 된다. 막혔던 가슴이 뻥 뚫리며 눈이 밝아지는 느낌이다. 옛 사람들의 학문이 입신과 출사를 넘어 인(仁)과 의(義)의 장이기도 했다는 생각이 흔연스레 흘러든다.
 만대루에서 바라본 병산서원 내부 모습. |
서애 류성룡(1542~1607)은 조선의 문신이자 학자였다.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했으며 도승지, 우의정 등을 거쳤다. 무엇보다 퇴계 이황의 제자로 알려져 있는데 그만큼 그의 학문의 뿌리가 탄탄했음을 보여준다. 서애를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임진왜란 때 군무를 총괄하고 군비 확충에 심혈을 기울였다는 점이다. 임란을 극복한 재상의 심중에는 늘 징비의 정신이 아로새겨져 있었다. “미리 잘못을 뉘우치고 경계해서 다시 환란을 대비한다”는 뜻이 바로 ‘징비’다. 원래 중국 고전인 서경에 나온다고 하는데, 만반의 대비를 언급할 때 곧잘 인용되는 어휘다.
그러나 서애는 선조 31년(1598) 탄핵으로 관직을 삭탈당하고 고향으로 든다. 전란을 겪으면서 국정의 난맥은 실타래처럼 꼬였을 것이다. 당파에 따라 역사적 사실과 관점에 따라 그리고 승자와 패자에 따라 한 인물을 바라보는 관점은 상이하다. 서애의 경우도 예외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를 거론할 때 도학, 문장, 글씨 등 다방면에서 뛰어났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학문은 학문대로 문장은 문장대로 경세는 경세대로 병법은 병법대로 밝았다고 전해오는 걸 보면 그렇다. 또한 ‘서애집’을 비롯해 ‘징비록’, ‘난후잡록’, ‘상례고증’ 등 다양한 저서를 남긴 것을 보면 짐작이 간다.
 유생들의 강학활동이 이루어졌던 입교당. |
서원의 관문 복례문(復禮門)을 통과하기 위해선 옷깃을 여며야 한다. “자신을 낮추고 예로 들어가는 것이 인(仁)이다”라는 말에서 ‘복례’는 연유한다. 학문의 첫걸음, 모든 공부의 시작을 이름하는 말이다. 복례문을 통과해 들어가면 만대루가 나온다. 막힌 가슴을 확 트이게 하는 웅장함이 예사롭지 않다. 조화와 절제 그러면서 호연의 기상이 밴 누각은 한국인의 심상을 닮은 것도 같다. 만대루를 통과하면 유생들이 학문을 익혔던 강당인 입교당이 나온다. 무엇에 비할 수 없는 품위와 지고함! ‘소학’ 입교 편에 나오는 ‘하늘이 준 본성에 따라 가르침을 바르게 세우는 전당’이라는 뜻을 벅벅이 되새기게 된다. 자연과 건축의 조화 그리고 인의 윤리가 충분히 세계문화유산에 값하고도 남는다.
 병산서원 앞에 병풍처럼 서 있는 병산. |
하회마을에는 서애의 정신이 응결된 충효당이 있다. 충효당은 서애 류성룡의 종택 당호로 류성룡 사후에 선생의 학덕과 청렴을 기리기 위해 지어졌다. 관직에서 파직을 당하고 낙향했을 때 당시의 집은 단촐했다고 전해진다. 더욱이 장례를 치를 수 없을 만큼 서애의 삶이 검박한 했던 탓에 선비들이 장례를 치르기 위해 추렴을 했다는 말도 있다.
‘지난 일을 뉘우치고 앞으로의 교훈을 잊지 말자.’ “잘못을 뉘우치고 경계해서 다시 환란을 대비한다”는 뜻은 가슴판에 새겨도 부족하지 않다. 서애의 징비 정신이 새삼 느껍게 다가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처한 현실이 그만큼 어지럽고 혼란스럽기 때문일 터다. 나라와 국민은 안중에 없고 오로지 당파와 정파 싸움에만 몰두하는 정치권의 행태는 500년 전 국난의 때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자신들의 출세와 명예가 나라의 존망과 안위보다 귀한 이들에게 과연 징비의 정신이 통용될 수 있을지, 안타까울 뿐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