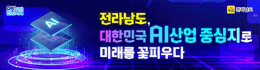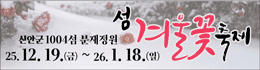[수필의 향기] 기억해야 합니다 - 이중섭 소설가
 |
겨울이 시작되자 벌써 작가들은 자신만의 글터에 몸을 웅크렸다. 몇몇은 남쪽 따뜻한 곳으로, 더러는 글발 좋은 산속으로 스며들었다. 긴 겨울 동안 한 세계를 형상화하려 노트북과 씨름해야 한다. 적당한 자리를 틀지 못한 나는 집 근처 스터디카페를 찾았다. 긴 글을 시작하려 했다. 그때쯤에 가게 주인의 통고를 받았다. 새 건물을 지으려 하니 내년 일월까지 가게를 비워주라고 했다.
처음에는 그냥 무덤덤했다. 아직 시간도 여유 있게 느껴졌다. 삼십여 년을 버텨온 일터가 사라진다는 사실이 실감이 나지 않았다. 막상 십이월이 되자 마음이 바빠지기 시작했다. 먼저 내년부터 새로운 삶이 펼쳐진다는 사실이 머리를 때렸다. 그다음 아무런 대책 없이 이렇게 가만히 있어야 하는지 걱정이 들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머릿속에서는 올해도 장편소설을 완성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제일 크게 느껴졌다.
따지고 보면 올 한 해 그렇게 성과가 나쁜 편은 아니었다. 새해 설 연휴에 청탁이 온 단편소설 한 편을 완성했다. 큰 수술 후 회복할 시간도 없이 사월부터는 두 군데 신문사에 글을 연재하게 되었다. 시련 후에 주어진 꽃다발 같은 선물이었다. 또 하나는 지난해 말에 보낸 단편소설 원고가 늦게나마 ‘소설 문학’ 칠월 호에 실렸다.
마지막 하나는 시월 추석 연휴에 쓴 단편소설이었다. 이마저 지면을 타게 되었다. 이삼 년 동안에 한 번도 없던 기회가 올해 세 번이나 몰려왔다. 호사다마였는지 마지막 달인 십이월에 가게를 정리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말았다.
처음 주인의 통고를 받았을 때 아내는 심하게 조바심을 나타냈다. 나는 속으로 은근히 반기고 있었다. 지긋지긋한 이곳을 벗어나 얼른 글의 세계로 뛰어들고 싶었다.
“사실 가게를 계속한다고 해도 실이익이 없잖아. 이걸 기회로 깨끗이 정리하면 더 좋을 거 같은데?”
아내도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게에 쌓인 물건을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오는 모양이었다. 삼십 년 동안 쌓인 물건들, 각종 독서대, 펜 진열장에 꽂혀있는 각종 필기구와 문구회사에 반품하는 문제 등이 머리를 짓눌렀을 터였다. 결국 가게의 물건을 정리할 수밖에 없었다.
문구 가게의 가장 문제는 펜이다. 종류가 너무 많았다. 재고를 정리한다고 했지만, 진열장에 풀어놓은 낱개 펜과 안쪽에 쌓인 갑 속 펜은 정확히 가늠하기 힘들었다. 일주일 동안 밤늦게까지 물건을 정리했다. 아뿔싸, 일요일 아침에 일어났더니 몸이 무거웠다. 한 주의 피로가, 아니 수술 후 약해진 체력이 온몸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아침도 먹지 않고 다시 정신없이 잤다.
다음날, 할인행사를 시작했다. 먼저 4절 형광 색상 지에 매직으로 ‘폐업 정리, 대폭 할인’이라 써 붙였다. 주문한 현수막은 가게 앞 유리창에 걸었다. 물건을 정리하면서 손님을 맞았다. 노트가 생각보다 많았다. 요즘 수험생은 읽고 쓰는 모든 것을 노트북으로 해결했다. 포스트잇 제품도 비중이 상당했다. 문제는 결국 펜이었다. 펜촉의 볼 크기, 색상에 따라 종류가 너무 다양했다.
일주일 동안 할인행사를 하니 조금씩 가게 안의 민낯이 보이기 시작했다. 잘 팔리는 펜부터 하나둘 재고가 바닥이 났다. 계속 물건을 정리하고 개수를 파악했다. 이달 말까지는 아직 한참 남았다. 가게의 공간이 넓어질수록 몸은 무겁지만, 머리는 가벼워졌다. 밤늦게 가게를 마치고 하천 산책길을 걸었다.
개울물 때문인지 공기가 차가웠다. 한 시간 정도 걸으면 외려 피곤이 풀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산책길 옆 물줄기 위로 하나둘 물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예보한 눈은 내리지 않고 겨울비가 추적거렸다. 멀리 흐릿한 하늘을 쳐다보며 겨울 산속 깊은 곳에 동면하듯 글을 쓰는 작가들을 떠올렸다. 집에 들어와 씻고 침대에 누웠다. 불을 켜놓은 채 음악을 틀었다. ‘비와 당신의 이야기’가 가슴속으로 깊숙이 파고들었다.
“당신은 나를 기억해야 하네.”
그 거리에 한 초라한 사내와 그의 아내가 앉아 있던 조그맣고 노란 문구 가게가 크리스마스카드 속 그림처럼 펼쳐졌다. 겨울 눈이 내리고 여름 비바람이 치던 날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다. 갑자기 요의를 느껴 일어났다. 잠이 들었던 모양이다. 멍한 채 거실 시계를 보았다. 새벽 두 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화장실을 다녀와 다시 침대에 누워 불을 껐다. 서서히 잠에 빠져들면서 가만히 웅얼거렸다.
당신은 나를 기억하고 있나요?
따지고 보면 올 한 해 그렇게 성과가 나쁜 편은 아니었다. 새해 설 연휴에 청탁이 온 단편소설 한 편을 완성했다. 큰 수술 후 회복할 시간도 없이 사월부터는 두 군데 신문사에 글을 연재하게 되었다. 시련 후에 주어진 꽃다발 같은 선물이었다. 또 하나는 지난해 말에 보낸 단편소설 원고가 늦게나마 ‘소설 문학’ 칠월 호에 실렸다.
처음 주인의 통고를 받았을 때 아내는 심하게 조바심을 나타냈다. 나는 속으로 은근히 반기고 있었다. 지긋지긋한 이곳을 벗어나 얼른 글의 세계로 뛰어들고 싶었다.
“사실 가게를 계속한다고 해도 실이익이 없잖아. 이걸 기회로 깨끗이 정리하면 더 좋을 거 같은데?”
아내도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게에 쌓인 물건을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오는 모양이었다. 삼십 년 동안 쌓인 물건들, 각종 독서대, 펜 진열장에 꽂혀있는 각종 필기구와 문구회사에 반품하는 문제 등이 머리를 짓눌렀을 터였다. 결국 가게의 물건을 정리할 수밖에 없었다.
문구 가게의 가장 문제는 펜이다. 종류가 너무 많았다. 재고를 정리한다고 했지만, 진열장에 풀어놓은 낱개 펜과 안쪽에 쌓인 갑 속 펜은 정확히 가늠하기 힘들었다. 일주일 동안 밤늦게까지 물건을 정리했다. 아뿔싸, 일요일 아침에 일어났더니 몸이 무거웠다. 한 주의 피로가, 아니 수술 후 약해진 체력이 온몸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아침도 먹지 않고 다시 정신없이 잤다.
다음날, 할인행사를 시작했다. 먼저 4절 형광 색상 지에 매직으로 ‘폐업 정리, 대폭 할인’이라 써 붙였다. 주문한 현수막은 가게 앞 유리창에 걸었다. 물건을 정리하면서 손님을 맞았다. 노트가 생각보다 많았다. 요즘 수험생은 읽고 쓰는 모든 것을 노트북으로 해결했다. 포스트잇 제품도 비중이 상당했다. 문제는 결국 펜이었다. 펜촉의 볼 크기, 색상에 따라 종류가 너무 다양했다.
일주일 동안 할인행사를 하니 조금씩 가게 안의 민낯이 보이기 시작했다. 잘 팔리는 펜부터 하나둘 재고가 바닥이 났다. 계속 물건을 정리하고 개수를 파악했다. 이달 말까지는 아직 한참 남았다. 가게의 공간이 넓어질수록 몸은 무겁지만, 머리는 가벼워졌다. 밤늦게 가게를 마치고 하천 산책길을 걸었다.
개울물 때문인지 공기가 차가웠다. 한 시간 정도 걸으면 외려 피곤이 풀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산책길 옆 물줄기 위로 하나둘 물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예보한 눈은 내리지 않고 겨울비가 추적거렸다. 멀리 흐릿한 하늘을 쳐다보며 겨울 산속 깊은 곳에 동면하듯 글을 쓰는 작가들을 떠올렸다. 집에 들어와 씻고 침대에 누웠다. 불을 켜놓은 채 음악을 틀었다. ‘비와 당신의 이야기’가 가슴속으로 깊숙이 파고들었다.
“당신은 나를 기억해야 하네.”
그 거리에 한 초라한 사내와 그의 아내가 앉아 있던 조그맣고 노란 문구 가게가 크리스마스카드 속 그림처럼 펼쳐졌다. 겨울 눈이 내리고 여름 비바람이 치던 날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다. 갑자기 요의를 느껴 일어났다. 잠이 들었던 모양이다. 멍한 채 거실 시계를 보았다. 새벽 두 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화장실을 다녀와 다시 침대에 누워 불을 껐다. 서서히 잠에 빠져들면서 가만히 웅얼거렸다.
당신은 나를 기억하고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