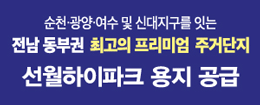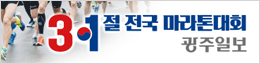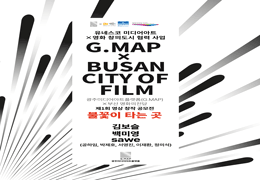[수필의 향기] 단풍 너머 낙엽의 시간- 정선 시인
 |
바야흐로 나무의 화양연화(花樣年華)다. 설악산 대청봉에서부터 앞서거니 뒤서거니 단풍들이 바람을 타고 산자락을 내려온다. 어떤 나무는 고사하고 어떤 나무는 부러지고 어떤 나무는 뿌리째 뽑히고……. 우리의 삶만큼이나 다난했던 고비를 넘고 이겨 낸 나무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다. 나무들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의식을 경건하게 치르는 중이다.
단풍 드는 시간은 나를 드러내는 시간이다. 나무들은 온 힘을 다해 숨어 있던 제 기량을 마음껏 발휘한다. 안토시아닌이 많은 잎은 붉게, 카로틴이 많은 잎은 노랗게, 탄닌이 많은 잎은 갈빛으로. 단풍 든다는 것은 무르익어 철든다는 것이다. 단풍 든다는 것은 소임을 다했다는 성실의 징표다.
나는 단풍의 붉은빛보다는 노란빛에 끌린다. 이 가을에 눈여겨보는 은행나무는 팔백 살이 넘은 문막읍 반계리의 은행나무다. 천백 살이 넘은 용문사 은행나무보다 키는 작지만 몸피가 크고 잎이 풍성하다. 압도적이다. 나무는 잔디밭 한가운데 되똑 하나의 성채를 이루고 있다. 둘레를 한 바퀴 돌아보니 둥치는 한 몸이었다가 여러 갈래였다가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다. 오랜 세월 마을의 내력을 일일이 꿰고, 언제나 제자리에서 풍파를 견뎌 온 고마운 지킴이다. 그를 변심하지 않는, 보고 또 보아도 질리지 않는 애인으로 삼아 볼까. 황금빛으로 찬란할 때나 커다란 둥치만 남을 때도 가슴이 벅차 그만 황홀히 눈멀 것만 같다. 이 가을이 목마르지 않고 풍만해진다.
은행잎이 안간힘으로 제빛을 다 발하면 떨켜는 한순간에 우수수 잎을 단호하게 떨군다. 집착도 없이 미련도 없이. 그 모습은 마치 생을 마감하며 자신의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는 통 큰 자산가 같다. 득도의 경지에 이른 도인의 자세가 그러할까. 수북이 떨어진 잎들은 제 색깔과 모양을 한동안 간직하여 볼품이 있다. 뒷모습이 아름답다. 아름드리 나무 아래 서면 ‘내려놓아라, 비우라, 그리고 기다려라.’ 고요한 죽비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바람도 가르침을 암송하며 힁허케 지나가겠지.
단풍 너머 낙엽의 시간으로 간다.
낙엽 진다는 것은 다시 돌아오겠다는 메시지이자 약속이다. 잎들의 스러짐은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또 다른 탄생을 기약한다. 낙엽은 새로운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한 해 동안의 수고로운 몸을 대지에 누인다. 달콤한 쉼이자 충전의 시간이다. 나무에게도 그치지 않는 욕망이 있어 안간힘으로 달린다면, 내 안에 집착과 욕망을 끊어 내는 떨켜가 없다면……. 떨켜는 낙엽수에게는 필수불가결한 고마운 기관이다.
나에게는 낙엽의 시간이 화양연화다. 단풍잎들이 하나둘 높은 곳에서 내려와 바닥을 차지할 때 비로소 단풍은 온전히 내 것이 된다. 내게 주어진 만추의 시간들을 낙엽으로 노랗게 때로는 은은한 갈빛으로 물들이고 싶다. 학창 시절 가까운 대학 운동장에는 아름드리 플라타너스 나무가 빙 둘러서 위용을 뽐냈다. ‘꿈을 아느냐 네게 물으면, 플라타너스, /……/ 호올로 되어 외로울 제/ 너는 그 길을 나와 같이 걸었다.’ 친구와 김현승 시인의 시 ‘플라타너스’의 시구를 읊조리면서 그 길 걷는 것을 좋아했다. 내 얼굴보다 큰 잎은 밟으면 소리가 아주 요란했다. 낙엽의 바스락거림은 존재의 몰락이 아니라 새 생명의 원동력임을 자랑스레 보여 주듯이.
낙엽은 들뜸을 가라앉히는 힘을 지녔다. 낙엽의 시간은 되새김질하는 시간이자 제 안을 조용히 들여다보는 시간이다. 낙엽 속에 나를 홀로 던져놓아도 쓸쓸하지 않다. 나무의 한살이를 교향곡에 견주어 볼 때 낙엽은 선율 속에 뛰노는 하나하나의 음표들이며 한 해를 매듭짓고 난 흔적이다. 바람에 뒤척일 때는 나 잘 살았으니 알아 달라는 응석으로 들리기도 한다. 내가 낙엽의 마음을 알아주듯 낙엽도 고단한 내 마음을 받아주지 않을까.
낙엽 속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뒹굴고 바람의 전갈이 새겨 있다. 세상을 등진 이의 눈동자가 살아 있고 그 눈동자를 사랑하는 이의 그리움이 반짝인다. 낙엽 속에는 응어리진 한숨들이 녹아 있고 무릎에 고개를 파묻고 훌쩍이는 사춘기의 내가 있다. 그리고 먼 나라의 시몽이 곁에 앉아 구부정한 내 등을 토닥이고 있다.
낙엽은 ‘울컥의 노래’이다.
단풍 너머 낙엽의 기차에 훌쩍 올라탄다. 세상의 모든 가을이 내게로 오는 날, 다정한 우울을 데불고 낙엽 진 숲에서 ‘울컥’을 노래하리. 가슴 설레고 두근거렸던 소녀 시절의 오래된 벗, 시몽, 너도 좋으냐?
나는 단풍의 붉은빛보다는 노란빛에 끌린다. 이 가을에 눈여겨보는 은행나무는 팔백 살이 넘은 문막읍 반계리의 은행나무다. 천백 살이 넘은 용문사 은행나무보다 키는 작지만 몸피가 크고 잎이 풍성하다. 압도적이다. 나무는 잔디밭 한가운데 되똑 하나의 성채를 이루고 있다. 둘레를 한 바퀴 돌아보니 둥치는 한 몸이었다가 여러 갈래였다가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다. 오랜 세월 마을의 내력을 일일이 꿰고, 언제나 제자리에서 풍파를 견뎌 온 고마운 지킴이다. 그를 변심하지 않는, 보고 또 보아도 질리지 않는 애인으로 삼아 볼까. 황금빛으로 찬란할 때나 커다란 둥치만 남을 때도 가슴이 벅차 그만 황홀히 눈멀 것만 같다. 이 가을이 목마르지 않고 풍만해진다.
단풍 너머 낙엽의 시간으로 간다.
낙엽 진다는 것은 다시 돌아오겠다는 메시지이자 약속이다. 잎들의 스러짐은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또 다른 탄생을 기약한다. 낙엽은 새로운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한 해 동안의 수고로운 몸을 대지에 누인다. 달콤한 쉼이자 충전의 시간이다. 나무에게도 그치지 않는 욕망이 있어 안간힘으로 달린다면, 내 안에 집착과 욕망을 끊어 내는 떨켜가 없다면……. 떨켜는 낙엽수에게는 필수불가결한 고마운 기관이다.
나에게는 낙엽의 시간이 화양연화다. 단풍잎들이 하나둘 높은 곳에서 내려와 바닥을 차지할 때 비로소 단풍은 온전히 내 것이 된다. 내게 주어진 만추의 시간들을 낙엽으로 노랗게 때로는 은은한 갈빛으로 물들이고 싶다. 학창 시절 가까운 대학 운동장에는 아름드리 플라타너스 나무가 빙 둘러서 위용을 뽐냈다. ‘꿈을 아느냐 네게 물으면, 플라타너스, /……/ 호올로 되어 외로울 제/ 너는 그 길을 나와 같이 걸었다.’ 친구와 김현승 시인의 시 ‘플라타너스’의 시구를 읊조리면서 그 길 걷는 것을 좋아했다. 내 얼굴보다 큰 잎은 밟으면 소리가 아주 요란했다. 낙엽의 바스락거림은 존재의 몰락이 아니라 새 생명의 원동력임을 자랑스레 보여 주듯이.
낙엽은 들뜸을 가라앉히는 힘을 지녔다. 낙엽의 시간은 되새김질하는 시간이자 제 안을 조용히 들여다보는 시간이다. 낙엽 속에 나를 홀로 던져놓아도 쓸쓸하지 않다. 나무의 한살이를 교향곡에 견주어 볼 때 낙엽은 선율 속에 뛰노는 하나하나의 음표들이며 한 해를 매듭짓고 난 흔적이다. 바람에 뒤척일 때는 나 잘 살았으니 알아 달라는 응석으로 들리기도 한다. 내가 낙엽의 마음을 알아주듯 낙엽도 고단한 내 마음을 받아주지 않을까.
낙엽 속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뒹굴고 바람의 전갈이 새겨 있다. 세상을 등진 이의 눈동자가 살아 있고 그 눈동자를 사랑하는 이의 그리움이 반짝인다. 낙엽 속에는 응어리진 한숨들이 녹아 있고 무릎에 고개를 파묻고 훌쩍이는 사춘기의 내가 있다. 그리고 먼 나라의 시몽이 곁에 앉아 구부정한 내 등을 토닥이고 있다.
낙엽은 ‘울컥의 노래’이다.
단풍 너머 낙엽의 기차에 훌쩍 올라탄다. 세상의 모든 가을이 내게로 오는 날, 다정한 우울을 데불고 낙엽 진 숲에서 ‘울컥’을 노래하리. 가슴 설레고 두근거렸던 소녀 시절의 오래된 벗, 시몽, 너도 좋으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