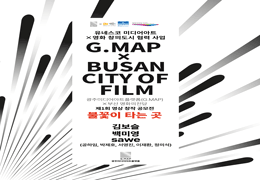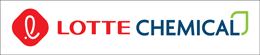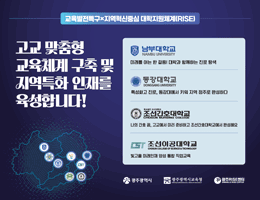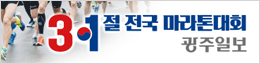[수필의 향기] 유자 축제에 감 따는 사내- 이중섭 소설가
 |
어쩔 수 없었다. 감을 밭에서 직접 팔기로 마음먹었다. 일할 시간과 사람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더구나 고흥유자축제 기간이라 차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었다. 그렇다고 서울에서 시간을 내 다시 내려올 수도 없었다. 대봉감을 길가 밭에 펼쳐놓았다. 나흘간 축제의 마지막 날인 일요일 오후였다.
전망대 올라가는 길옆이라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많았다. 굵은 대봉감을 비닐봉지에 넣었다. 한두 명 관심을 보이더니 아뿔싸 감이 부족했다. 구원요청을 했다. 시골 앞집 동생이 한 사람을 데리고 나타났다. 전날에도 감 작업에 한나절을 도와주었다. 두 사람은 감을 따고 난 달력 뒷면에 매직으로 ‘대봉감 판매, 한 봉지에 열다섯 개’를 써 붙였다. 계좌번호와 감 사진을 동창 카톡에도 올렸다. 다행히 감이 굵고 싱싱해서인지 여자 관광객들이 모여들었다. 택배 주문도 있었다.
서울에서 출발할 때부터 갈등이 시작되었다. 수술 후 회복이 덜 된 탓도 있지만 갈수록 장거리 운전이 부담되었다. 시골 일은 자가용이 없으면 불편했다. 렌터카도 알아보았지만 결국 금요일 아침 첫 고속버스를 예매했다. 차 안에서 베트남 작가 킴 투이의 ‘루’를 읽었다. 작가는 10세 때 베트남 난민이 되어 캐나다에 정착했다. 짧은 소설인데 이야기를 서술하는 시각과 문장이 좋았다. 특히 다음 이야기로 이어지는 장면이 부드러웠다.
해마다 어머니는 감 때문에 골치 아파했다. 나는 감 판매에 형과 여동생과 달리 모른척했다. 상품성도 문제지만 그보다 경제성이 떨어졌다. 택배비에 감 값을 합하면 도시 마트에 비해 비용 차이가 너무 났다. 하지만 이제 세상에 어머니는 없다. 이제 내가 짐을 져야 했다. 딱 축제 기간과 겹쳐 축제도 즐기고 노동도 맛보자는 심사였다. 하지만 혼자서 할 일이 아니었다. 최소한 두 명이 함께 작업을 해야 했다.
감을 딸 때 쓰는 모든 도구도 부족했다. 고지 가위는 어느새 녹이 슬고, 핸드 카트는 찌그러져 사용할 수 없었다. 사다리도 빌렸다. 감나무 위에서 바라보는 세상은 평화 그 자체였다. 마을 앞 축제장에서는 노랫소리가 끊임없었다. 주위 밭에는 노란 유자가 꼬마전구처럼 휘황찬란했다. 귀도 풍년 눈도 풍년이었다. 호강스러운 노동이었다.
감 따는 것을 도와주는 앞집 동생의 작업은 눈부셨다. 충전용 전지가위로 가지째 싹둑싹둑 잘랐다. 일 년만 지나도 감나무 가지가 어른 키보다 더 크게 자랐다. 감을 따면서 전지를 함께했다. 대봉감만 따는 걸로도 일이 많아 단감을 딸 시간이 없었다. 까치밥으로 남겨둘 수밖에 없었다. 감꼭지를 자르고 좋은 감을 선별하는 일은 내 몫으로 남았다. 대형 유자 모형의 애드벌룬이 바람에 날리며 힘겨워하는 나를 내려다보았다.
전날, 혼자 감을 따니 문제가 많았다. 사다리에 올라가 감을 따서 다시 내려와 땅에 놓고 다시 올라가 감을 따는 일이 반복되었다. 사다리 아래로 바로 감을 던질 수는 없었다. 감은 쉽게 쪼개지거나 상처가 났다. 하루만 지나면 상처 난 부분이 시커멓게 변했다. 혼자서는 일의 능률이 떨어졌다. 그때마다 앞집 동생이 나타났다.
감나무 위에서 고개를 돌리면 멀리 송내와 바다가 만나는 곳의 물길이 하얗게 빛났다. 마치 청포도 시인인 이육사가 하얀 돛단배에서 손을 흔드는 듯 가까웠다. 청청한 유자나무에 열린 노란 유자를 배에 가득 실어주고 싶었다. 유자는 해풍을 먹고 자란다. 주위에 유자가 노랗게 빛나고, 나는 감나무밭에서 멀리 풍경 속 사람을 그리워한다. 풍경은 사람이 있을 때 가장 아름답다.
낮에는 축제 속에 감을 따고 밤에는 음악에 흥겨워 친구들을 만났다. 사흘간의 낮과 이틀의 밤이 금방 지났다. 축제가 끝난 월요일 오전이었다. 모든 택배를 다 보내고 서울행 고속버스를 예매했다. 세시 오 분 버스였다. 터미널 앞 온화한 카페에서 시골 친구들과 만났다. 네 명의 친구들과 한 시간 반 동안 얘기를 나누었다. 모두 느긋한 얼굴이었다. 며칠 동안 도와주었던 그들이 고마웠다. 무언가 강박감에 사는 도회 생활에 비해 너무나 편안한 얼굴들이었다.
아쉬운 시간을 뒤로 하고 버스에 올랐다. 차가 움직이자 문득, 고향에 내려올 때마다 먹었던 서대회무침이 생각났다. 친구들의 배웅을 뒤로 하고 읽다 만 킴 투이의 ‘루’를 꺼냈다. 달리는 차 뒤로 멀리 고향 겨울 바닷속에서 서대가 헤엄치는 모습이 책 속에서 아른거렸다.
서울에서 출발할 때부터 갈등이 시작되었다. 수술 후 회복이 덜 된 탓도 있지만 갈수록 장거리 운전이 부담되었다. 시골 일은 자가용이 없으면 불편했다. 렌터카도 알아보았지만 결국 금요일 아침 첫 고속버스를 예매했다. 차 안에서 베트남 작가 킴 투이의 ‘루’를 읽었다. 작가는 10세 때 베트남 난민이 되어 캐나다에 정착했다. 짧은 소설인데 이야기를 서술하는 시각과 문장이 좋았다. 특히 다음 이야기로 이어지는 장면이 부드러웠다.
감을 딸 때 쓰는 모든 도구도 부족했다. 고지 가위는 어느새 녹이 슬고, 핸드 카트는 찌그러져 사용할 수 없었다. 사다리도 빌렸다. 감나무 위에서 바라보는 세상은 평화 그 자체였다. 마을 앞 축제장에서는 노랫소리가 끊임없었다. 주위 밭에는 노란 유자가 꼬마전구처럼 휘황찬란했다. 귀도 풍년 눈도 풍년이었다. 호강스러운 노동이었다.
감 따는 것을 도와주는 앞집 동생의 작업은 눈부셨다. 충전용 전지가위로 가지째 싹둑싹둑 잘랐다. 일 년만 지나도 감나무 가지가 어른 키보다 더 크게 자랐다. 감을 따면서 전지를 함께했다. 대봉감만 따는 걸로도 일이 많아 단감을 딸 시간이 없었다. 까치밥으로 남겨둘 수밖에 없었다. 감꼭지를 자르고 좋은 감을 선별하는 일은 내 몫으로 남았다. 대형 유자 모형의 애드벌룬이 바람에 날리며 힘겨워하는 나를 내려다보았다.
전날, 혼자 감을 따니 문제가 많았다. 사다리에 올라가 감을 따서 다시 내려와 땅에 놓고 다시 올라가 감을 따는 일이 반복되었다. 사다리 아래로 바로 감을 던질 수는 없었다. 감은 쉽게 쪼개지거나 상처가 났다. 하루만 지나면 상처 난 부분이 시커멓게 변했다. 혼자서는 일의 능률이 떨어졌다. 그때마다 앞집 동생이 나타났다.
감나무 위에서 고개를 돌리면 멀리 송내와 바다가 만나는 곳의 물길이 하얗게 빛났다. 마치 청포도 시인인 이육사가 하얀 돛단배에서 손을 흔드는 듯 가까웠다. 청청한 유자나무에 열린 노란 유자를 배에 가득 실어주고 싶었다. 유자는 해풍을 먹고 자란다. 주위에 유자가 노랗게 빛나고, 나는 감나무밭에서 멀리 풍경 속 사람을 그리워한다. 풍경은 사람이 있을 때 가장 아름답다.
낮에는 축제 속에 감을 따고 밤에는 음악에 흥겨워 친구들을 만났다. 사흘간의 낮과 이틀의 밤이 금방 지났다. 축제가 끝난 월요일 오전이었다. 모든 택배를 다 보내고 서울행 고속버스를 예매했다. 세시 오 분 버스였다. 터미널 앞 온화한 카페에서 시골 친구들과 만났다. 네 명의 친구들과 한 시간 반 동안 얘기를 나누었다. 모두 느긋한 얼굴이었다. 며칠 동안 도와주었던 그들이 고마웠다. 무언가 강박감에 사는 도회 생활에 비해 너무나 편안한 얼굴들이었다.
아쉬운 시간을 뒤로 하고 버스에 올랐다. 차가 움직이자 문득, 고향에 내려올 때마다 먹었던 서대회무침이 생각났다. 친구들의 배웅을 뒤로 하고 읽다 만 킴 투이의 ‘루’를 꺼냈다. 달리는 차 뒤로 멀리 고향 겨울 바닷속에서 서대가 헤엄치는 모습이 책 속에서 아른거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