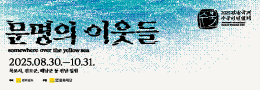냉면에 역사와 문화라는 ‘고명’을 올리다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냉면의 역사, 강명관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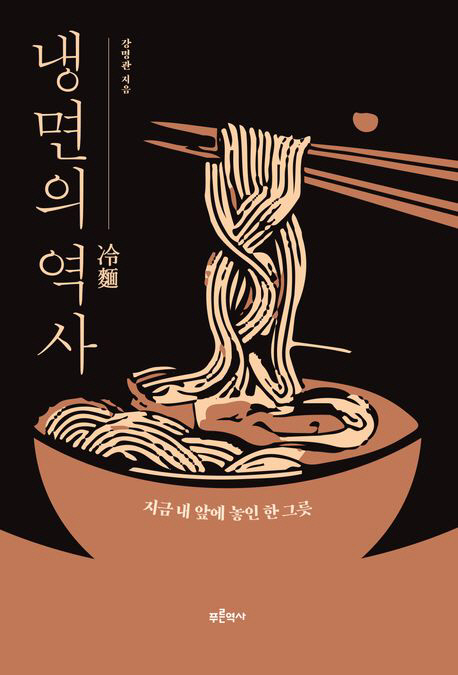 |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음식 가운데 하나가 냉면이다. 그다지 호불호가 심하지 않은 음식이다. 오히려 최애하는 음식 중 냉면을 꼽는 이들도 적지 않다.
한여름 얼음 둥둥 떠 있는 물냉면을 먹은 기억들이 있을 것이다. 답답한 가슴까지도 시원하게 씻어주는 감칠맛 나는 육수를 들이마시고 나면 더위는 저만치 밀려간다.
달짝지근하면서도 매콤한 양념과 잘 찢긴 소고기, 반쪽의 달걀 등이 정갈하게 조화를 이룬 비빔냉면은 어떤가. 더위에 달아났던 입맛을 돋우는 데 비빔냉면만한 음식도 없다.
시나브로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고 소리 없이 가을이 무르익어가고 있다. 냉면이 생각나는 계절은 아니지만 뭔가 새로운 맛을 느끼고 싶다면 냉면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다양한 학문을 고명으로 얹어 냉면을 조명한 ‘냉면 역사’는 냉면에 관한 모든 것을 담고 있다. 강명관 부산대 한문학과 교수가 저자로, 그는 냉면을 모티브로 맛깔스럽게 면의 이모저모를 분석해낸다.
요즘 사람들만 냉면을 좋아했던 것은 아니다. 우리 옛 문헌에는 선조들이 국수를 좋아했던 기록이 있다. 냉면은 국수의 한 종류로, 국수의 역사를 알아야 냉면의 기원과 종류 등도 알 수 있다.
이용기는 ‘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1924년)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국수는 온갖 잔치에, 조반이나 점심에 아니 쓰는 데가 없나니, 어찌 경(輕)하다 하리오? 누구를 대접하던지 국수 대접은 밥 대접보다 낫게 알고, 국수 대접에는 편육 한 접시라도 놓나니, 그런 고로 대접 중에 나으니라” 이 말은 조선 사람들도 편육이 들어간 국수를 좋아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한 사발의 냉면, 다시 말해 국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다. 여기에는 역사와 사회, 경제, 문화 무엇보다 사람살이의 ‘오미’(五味)가 담겨 있다.
냉면이라는 음식 이름이 최초로 등장한 것은 언제일까. 1558년 4월 20일 ‘묵재일기’에는 “낮잠을 자다 깨어 곧 ‘냉면’을 먹었더니 발바닥이 차가워졌다”는 내용이 나온다. 말인즉슨 차가운 냉면을 먹었더니 발바닥에 찬기운이 돌았다는 의미다.
강 교수에 따르면 ‘냉면’이라는 어휘가 한국음식사에서 최초로 나오는 부분이다. 물론 이 구절에서 냉면을 밀가루로 만들었는지 혹은 메밀가루가 재료인지는 명확히 단정할 수는 없다.
이와 달리 차갑게 해서 먹는 국수에 대한 내용은 ‘산가요록’에 기술돼 있다. 수라화, 만이창면 등의 공통점은 면을 찬물에 여러 차례 헹궈 차게 한 상태로 초장 등에 말아먹는 국수를 일컬었다.
국수를 먹기 시작한 것은 삼국시대로 추정된다. 전설과 유사한 이야기가 전해온다. 여름 날 진흥왕이 순찰을 나갔는데 가지고 갔던 궁중음식이 상했던 모양이다. 신하들이 메밀국수에 얼음을 띄워 진상한 것이 냉면의 시초였을 거라는 얘기다.
고려인들도 국수를 즐겨 먹은 것으로 보인다. 고려에 사신으로 온 송나라 서긍이 10여 가지의 음식을 접대받았는데 국수가 제일 맛있었다는 기록이 ‘고려도경’에 나와 있다. 또한 서긍은 고려의 밀 생산량이 적은 탓에 송나라에서 들여온다고 기술했다.
고려 문인 이색은 ‘하일즉사’라는 시에서 냉국수를 찬탄했다. 특히 중국의 냉국수 일종인 ‘괴엽냉도’를 맛있게 먹은 경험을 글로 표현했다. 강 교수는 “괴엽냉도는 찬 국수다”며 “괴엽냉도를 냉면과 연결 지을 구체적 근거는 없다”고 언급한다.
책에는 냉면의 역사뿐 아니라 ‘과학’의 에피소드도 기술돼 있다. 찰기 없는 메밀로 보다 맛있는 국수를 만들기 위해 ‘세판’을 도입하거나 국수틀의 모양을 복원하는 대목 등도 나온다. 1939년을 전후해 박병천, 최응도라는 인물이 국수기계를 개발했다는 기사도 소개돼 있다. 아울러 냉면에 올린 돼지고기 부패로 식중독이 급증하자 1946년에는 냉면 제조, 판매가 금지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저자는 말한다. 주문을 받아 자전거로 배달하는 방식이 통용되면서 냉면은 도시화와 근대화의 선두에 섰다고. 맛있는 ‘냉면 경제학’의 단면이다. <푸른역사·2만8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한여름 얼음 둥둥 떠 있는 물냉면을 먹은 기억들이 있을 것이다. 답답한 가슴까지도 시원하게 씻어주는 감칠맛 나는 육수를 들이마시고 나면 더위는 저만치 밀려간다.
시나브로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고 소리 없이 가을이 무르익어가고 있다. 냉면이 생각나는 계절은 아니지만 뭔가 새로운 맛을 느끼고 싶다면 냉면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다양한 학문을 고명으로 얹어 냉면을 조명한 ‘냉면 역사’는 냉면에 관한 모든 것을 담고 있다. 강명관 부산대 한문학과 교수가 저자로, 그는 냉면을 모티브로 맛깔스럽게 면의 이모저모를 분석해낸다.
이용기는 ‘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1924년)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국수는 온갖 잔치에, 조반이나 점심에 아니 쓰는 데가 없나니, 어찌 경(輕)하다 하리오? 누구를 대접하던지 국수 대접은 밥 대접보다 낫게 알고, 국수 대접에는 편육 한 접시라도 놓나니, 그런 고로 대접 중에 나으니라” 이 말은 조선 사람들도 편육이 들어간 국수를 좋아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한 사발의 냉면, 다시 말해 국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다. 여기에는 역사와 사회, 경제, 문화 무엇보다 사람살이의 ‘오미’(五味)가 담겨 있다.
냉면이라는 음식 이름이 최초로 등장한 것은 언제일까. 1558년 4월 20일 ‘묵재일기’에는 “낮잠을 자다 깨어 곧 ‘냉면’을 먹었더니 발바닥이 차가워졌다”는 내용이 나온다. 말인즉슨 차가운 냉면을 먹었더니 발바닥에 찬기운이 돌았다는 의미다.
강 교수에 따르면 ‘냉면’이라는 어휘가 한국음식사에서 최초로 나오는 부분이다. 물론 이 구절에서 냉면을 밀가루로 만들었는지 혹은 메밀가루가 재료인지는 명확히 단정할 수는 없다.
이와 달리 차갑게 해서 먹는 국수에 대한 내용은 ‘산가요록’에 기술돼 있다. 수라화, 만이창면 등의 공통점은 면을 찬물에 여러 차례 헹궈 차게 한 상태로 초장 등에 말아먹는 국수를 일컬었다.
국수를 먹기 시작한 것은 삼국시대로 추정된다. 전설과 유사한 이야기가 전해온다. 여름 날 진흥왕이 순찰을 나갔는데 가지고 갔던 궁중음식이 상했던 모양이다. 신하들이 메밀국수에 얼음을 띄워 진상한 것이 냉면의 시초였을 거라는 얘기다.
고려인들도 국수를 즐겨 먹은 것으로 보인다. 고려에 사신으로 온 송나라 서긍이 10여 가지의 음식을 접대받았는데 국수가 제일 맛있었다는 기록이 ‘고려도경’에 나와 있다. 또한 서긍은 고려의 밀 생산량이 적은 탓에 송나라에서 들여온다고 기술했다.
고려 문인 이색은 ‘하일즉사’라는 시에서 냉국수를 찬탄했다. 특히 중국의 냉국수 일종인 ‘괴엽냉도’를 맛있게 먹은 경험을 글로 표현했다. 강 교수는 “괴엽냉도는 찬 국수다”며 “괴엽냉도를 냉면과 연결 지을 구체적 근거는 없다”고 언급한다.
책에는 냉면의 역사뿐 아니라 ‘과학’의 에피소드도 기술돼 있다. 찰기 없는 메밀로 보다 맛있는 국수를 만들기 위해 ‘세판’을 도입하거나 국수틀의 모양을 복원하는 대목 등도 나온다. 1939년을 전후해 박병천, 최응도라는 인물이 국수기계를 개발했다는 기사도 소개돼 있다. 아울러 냉면에 올린 돼지고기 부패로 식중독이 급증하자 1946년에는 냉면 제조, 판매가 금지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저자는 말한다. 주문을 받아 자전거로 배달하는 방식이 통용되면서 냉면은 도시화와 근대화의 선두에 섰다고. 맛있는 ‘냉면 경제학’의 단면이다. <푸른역사·2만8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