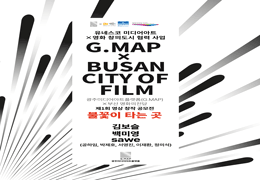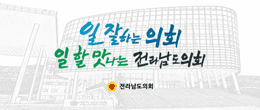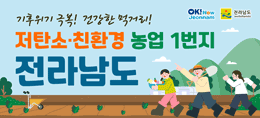예술인이 행복해야 ‘문화 도시’다-박진현 제작국장·문화선임기자
끼니 걱정 없이 창작 전념할 수 없나
카를교엔 바이올린 선율이 흐르고
카를교엔 바이올린 선율이 흐르고
 |
이달 초, 다시 찾은 체코 프라하의 카를교는 예전의 모습이 아니었다. 전 세계에서 몰려온 관광객들로 발 디딜 틈 없었던 이곳은 코로나19 탓인지 한산하기만 했다. 프라하 시민들로 보이는 몇몇이 마스크를 벗은 채 다리를 배경으로 ‘여유롭게’ 인증샷을 찍는 모습이 왠지 낯설게 느껴졌다. 3년 전만 해도 인파에 치여 후다닥 기념사진을 찍고 자리를 떠야 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다. 새삼 코로나가 남긴 일상의 변화를 실감했다.
그 순간, 어디선가 귀에 익숙한 바이올린 선율이 들려왔다. 소리가 나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겨 보니, 머리가 희끗희끗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스메타나의 ‘나의 조국’을 연주하고 있었다. 오케스트라의 웅장함과는 거리가 있었지만 블타바강으로 잔잔하게 퍼지는 애절한 선율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예술의 도시’ 빈도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다. 노마스크로 거리를 활보하거나 노천카페에서 커피를 즐기는 시민들이 눈에 많이 띄었다. 벨베데레궁전, 레오폴트 미술관, 알베르티나 미술관 등은 백신 접종을 마친 관람객에 한해 전시장을 개방하고 있었다. 빈 관광의 꽃으로 불리는 콘서트는 매일 밤 수십 여 개의 공연장에서 펼쳐졌다. 오랫동안 움츠렸던 예술 현장이 기지개를 켜며 활기를 되찾고 있었다.
취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 광주에서 청년작가 A가 안부 전화를 걸어왔다. 오는 28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막하는 아트페어에 참가한다고 했다. 그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다. 작품 판매가 유일한 생계 수단인 그에게 아트페어가 ‘정상적으로’ 열린다는 것만큼 반가운 뉴스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어디 그뿐이겠는가. 전대미문의 코로나19로 모든 이들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예술인만큼 직격탄을 맞은 이들도 많지 않을 터. 실제로 광주 지역 예술인들의 수입은 월 평균 197만 원으로 전국 평균 월 390만 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지난 2018년 광주문화재단이 주최한 ‘예술인복지 지원토론회’에서 발표된 자료) 특히 전업 예술인의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가입률은 46.2%에 그치는 등 사회적 안전망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여기에 ‘코로나19’라는 악재가 겹치면서 근근이 버텨 왔던 무대마저 사라졌으니, 예술인들이 겪고 있는 고충이 어느 정도일지 짐작이 간다.
지난해 5월 광주문화재단이 예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예산으로 진행한 ‘300, 소리 없는 아우성’ 공모 사업은 예술인들의 절박한 처지를 극명하게 보여 준 사례다. 당시 재단은 코로나19와 관련된 응원 메시지를 선정해 금남로 일대에 배너로 설치하기로 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300명(1인당 30만 원)을 뽑는다는 공고를 냈다. 워낙 갑작스럽게 편성한 사업이다 보니 내부에선 홍보가 부족해 신청자가 적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다. 하지만 웬걸, 반나절 만에 400명의 지원자가 쇄도하는 바람에 서둘러 공고문을 내리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고작 30만 원의 지원금이지만 한 푼이라도 아쉬운 예술인들이 앞다투어 몰려든 것이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 지역 예술인들의 생활환경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예술인 긴급 재난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유사한 사업들이 이어졌지만 유감스럽게도 ‘언 발에 오줌 누기’에 그쳤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대부분의 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난 데다 소액이어서 생계가 막막한 예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물론 광주시의 넉넉지 않은 재정 형편을 감안하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올 초부터 서울·부산·충남 등 일부 지자체들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해 예술인들의 창작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이와는 달리 광주시는 지난 8월말에서야 뒤늦게 ‘지역예술인 활동환경 실태조사’에 들어가 ‘문화 광주’의 체면을 구겼다. 게다가 지난해 8월 광주시립극단의 갑질·성희롱 그리고 불공정 계약 행태까지 제기된 이후 1년이 지난 올 9월에서야 창·제작 지원 강화 및 문화예술인 권리 증진 등을 골자로 한 문화예술 분야 13개 지원 과제를 발표해 ‘뒷북 행정’이라는 빈축을 사기도 했다.
모름지기 ‘문화 도시’라 하면 예술이 융성하고 시민들이 문화생활을 마음껏 향유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예술가들이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삶과 예술 속에서 마치 ‘전쟁을 치르듯’ 사는 예술인의 현실은 더 이상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공적 영역의 의제인 것이다. 문화 광주의 타이틀이 부끄럽지 않은 ‘광주다운’ 예술인 복지가 필요한 이유다. 예술인들이 불행한 도시는 더 이상 문화 도시가 아니다.
‘예술의 도시’ 빈도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다. 노마스크로 거리를 활보하거나 노천카페에서 커피를 즐기는 시민들이 눈에 많이 띄었다. 벨베데레궁전, 레오폴트 미술관, 알베르티나 미술관 등은 백신 접종을 마친 관람객에 한해 전시장을 개방하고 있었다. 빈 관광의 꽃으로 불리는 콘서트는 매일 밤 수십 여 개의 공연장에서 펼쳐졌다. 오랫동안 움츠렸던 예술 현장이 기지개를 켜며 활기를 되찾고 있었다.
사실, 어디 그뿐이겠는가. 전대미문의 코로나19로 모든 이들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예술인만큼 직격탄을 맞은 이들도 많지 않을 터. 실제로 광주 지역 예술인들의 수입은 월 평균 197만 원으로 전국 평균 월 390만 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지난 2018년 광주문화재단이 주최한 ‘예술인복지 지원토론회’에서 발표된 자료) 특히 전업 예술인의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가입률은 46.2%에 그치는 등 사회적 안전망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여기에 ‘코로나19’라는 악재가 겹치면서 근근이 버텨 왔던 무대마저 사라졌으니, 예술인들이 겪고 있는 고충이 어느 정도일지 짐작이 간다.
지난해 5월 광주문화재단이 예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예산으로 진행한 ‘300, 소리 없는 아우성’ 공모 사업은 예술인들의 절박한 처지를 극명하게 보여 준 사례다. 당시 재단은 코로나19와 관련된 응원 메시지를 선정해 금남로 일대에 배너로 설치하기로 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300명(1인당 30만 원)을 뽑는다는 공고를 냈다. 워낙 갑작스럽게 편성한 사업이다 보니 내부에선 홍보가 부족해 신청자가 적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다. 하지만 웬걸, 반나절 만에 400명의 지원자가 쇄도하는 바람에 서둘러 공고문을 내리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고작 30만 원의 지원금이지만 한 푼이라도 아쉬운 예술인들이 앞다투어 몰려든 것이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 지역 예술인들의 생활환경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예술인 긴급 재난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유사한 사업들이 이어졌지만 유감스럽게도 ‘언 발에 오줌 누기’에 그쳤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대부분의 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난 데다 소액이어서 생계가 막막한 예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물론 광주시의 넉넉지 않은 재정 형편을 감안하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올 초부터 서울·부산·충남 등 일부 지자체들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해 예술인들의 창작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이와는 달리 광주시는 지난 8월말에서야 뒤늦게 ‘지역예술인 활동환경 실태조사’에 들어가 ‘문화 광주’의 체면을 구겼다. 게다가 지난해 8월 광주시립극단의 갑질·성희롱 그리고 불공정 계약 행태까지 제기된 이후 1년이 지난 올 9월에서야 창·제작 지원 강화 및 문화예술인 권리 증진 등을 골자로 한 문화예술 분야 13개 지원 과제를 발표해 ‘뒷북 행정’이라는 빈축을 사기도 했다.
모름지기 ‘문화 도시’라 하면 예술이 융성하고 시민들이 문화생활을 마음껏 향유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예술가들이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삶과 예술 속에서 마치 ‘전쟁을 치르듯’ 사는 예술인의 현실은 더 이상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공적 영역의 의제인 것이다. 문화 광주의 타이틀이 부끄럽지 않은 ‘광주다운’ 예술인 복지가 필요한 이유다. 예술인들이 불행한 도시는 더 이상 문화 도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