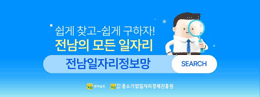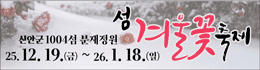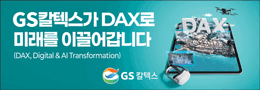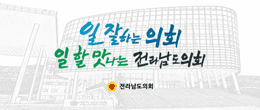[이홍재의 세상만사] 대박 그리고 대통령의 거친 목소리
 |
‘대박’이란 말을 처음 들은 것은 90년대 후반쯤이었던 것 같다. “우와, 대박 났네.” 일부 젊은이들 사이에서 오가는 이 말. 당시엔 무슨 뜻인지 몰랐다. 사전에도 없는 말이었다.
지금은 너도나도 쓴다. 표준국어대사전에도 올랐다. 어떤 일이 크게 이루어짐을 뜻한다. 요즘엔 의미가 더욱 확장됐다. 감탄사로서의 ‘대∼박!’이다. 놀랍거나 대단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쓴다. 너무 어이가 없을 때 ‘헐∼’이라 하는 것처럼.
대박의 어원은 불확실하다. 그런 만큼 여러 가지 설이 있다. 누구는 흥부가 큰 박을 터뜨려 횡재하는 장면을 떠올린다. 판소리 ‘흥부가’(興夫歌)에 나오는 박은 ‘집채’만 하니 그럴 만하다. 영화계에서는 오래전부터 흥행에 성공했을 때 이 표현을 사용해 왔다고 한다.
노름 용어인 ‘박’(博)에서 따왔다는 주장도 있다. ‘십인계’라는 도박에서 판돈을 ‘박’이라고 한단다. 그리고 크게 한 판을 따게 되면 “한박 잡았다.”라고 한다는 것이니. 큰 박이라는 뜻의 한박이나 대박이나 같은 말이라는 거다.
대박의 유래로 큰 배를 뜻하는 ‘대박(大舶) 설’도 있다. 천주교 신자들이 박해받던 조선조 말. 이들은 고통 속에서도 서양의 큰 배(大舶)가 자신들을 구원해 줄 구세주라 여겼다. 80년 5월 항쟁 당시에도 그랬다. 시민군들은 미국의 큰 배가 한반도 해역에 나타났다는 소식에 반짝 희망을 가졌다.(그러나 이 항공모함은 오히려 북한의 오판을 막기 위해 신군부를 지원하러 온 것임이 나중에 밝혀졌다)
60년대로 기억되는데 허장강의 “우리 심심한데 뽀뽀나 한번 할까?” 와 함께 이런 말이 크게 유행한 적이 있다. “홍콩에서 라이터돌 실은 배만 들어오면 내 크게 호강시켜 줄게.” 라이터돌 한 가마니만 팔면 엄청난 이문(利文)을 남길 수 있다 했다. 물론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어서는 안 됐다. 아무리 기다려도 배는 끝내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그래도 언제 어느 때나 외국에서 들어오는 큰 배(대박)는 ‘없는 사람’과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늘 한 줄기 빛과도 같은 ‘희망’이었다.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그해 연말 새누리당에서 유행했던 술자리 건배 구호도 대박이었다. ‘연말’이라고 한 명이 외치면 여러 명이 ‘대박’이라고 화답하는 식이었다. 여기에서의 대박은 ‘대통령 박근혜’의 준말이다.
그리고 선거가 끝난 후 그녀는 그 구호에서 외친 대로 대통령에 당선돼 대박을 터뜨렸다. 그러니 대박이란 표현을 어찌 좋아하지 않을쏜가. 박 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며 또다시 이 말을 언급한 것은 바로 그 때문일지도 모른다.
물론 일부 누리꾼들은 즉각 “어휘력 수준이 통탄스러울 지경이다.”라거나 “용어 선택이 천박하다.”는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다. 대박의 어원이 아무리 불확실하다 해도 청와대 비서관도 듣고 깜짝 놀랐을 만큼, 그게 결코 점잖은 표현이 아닌 것만은 분명했기 때문이다.
그래 그랬다. 평소 품위 있는 언어를 구사해 온 박 대통령 아니었던가. 극도로 절제된 표현만을 선호해 왔던 그녀 아니었던가. 한데 요사이 달라졌다. 달라도 너무 달라졌다.
대박이란 말까지는 이해해 줄 수 있겠다. 하지만 최근 부쩍 전투적인 표현이 많아졌다. ‘쳐부숴야 할 원수’ ‘한 번 물면 살점이 뜯어져 나갈 때까지’ ‘사생결단’ 같은 격정의 말들이 그것이다. 이런 거친 언사는 그동안 박 대통령의 입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았었다.
왜 이렇게 거칠어졌을까. 아마도 각료(閣僚)나 당료(黨僚)들이 모든 일에 수수방관(袖手傍觀)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아무리 말해도 모두들 하나같이 받아 적고만 있기 때문일 것이다. ‘수첩 각료’ ‘수첩 당료’ 들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팔 걷어붙이고 나서는 이보다는 팔짱 낀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니 ‘오죽했으면 그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었을까’ 백번 이해한다. 그렇다고 대통령의 말이 품위를 잃고 그처럼 거칠어서야 되겠는가. 세상사도 마찬가지여서 목소리만 높다고 해서 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용장(勇將)이라도 덕장(德將)을 넘어서기 어려운 법이다.
부드러움이 강한 것을 이긴다고(柔之勝剛) 했다. 천하에 이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 하지만 이를 행하는 자는 드물다.(天下莫不知 莫能行) 노자(老子)의 도덕경에 나오는 말이다.
중국에서 가장 태평성대였다고 전해지는 요순시대를 생각해 보자. 백성들이 손으로 배를 두드리고, 발로 땅을 구르며, 장단을 맞춰 노래를 부른다. 해가 뜨면 일하고, 해가 지면 쉬나니, 임금의 힘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냐면서. 요왕(堯王)은 그렇게 임금이 ‘있는 듯 없는 듯’ 나라를 다스렸다. 무릇 지도자의 ‘쎈’ 목소리는 아랫것들을 더욱 복지부동(伏地不動)으로 몰아갈 뿐이다.
지금은 너도나도 쓴다. 표준국어대사전에도 올랐다. 어떤 일이 크게 이루어짐을 뜻한다. 요즘엔 의미가 더욱 확장됐다. 감탄사로서의 ‘대∼박!’이다. 놀랍거나 대단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쓴다. 너무 어이가 없을 때 ‘헐∼’이라 하는 것처럼.
노름 용어인 ‘박’(博)에서 따왔다는 주장도 있다. ‘십인계’라는 도박에서 판돈을 ‘박’이라고 한단다. 그리고 크게 한 판을 따게 되면 “한박 잡았다.”라고 한다는 것이니. 큰 박이라는 뜻의 한박이나 대박이나 같은 말이라는 거다.
60년대로 기억되는데 허장강의 “우리 심심한데 뽀뽀나 한번 할까?” 와 함께 이런 말이 크게 유행한 적이 있다. “홍콩에서 라이터돌 실은 배만 들어오면 내 크게 호강시켜 줄게.” 라이터돌 한 가마니만 팔면 엄청난 이문(利文)을 남길 수 있다 했다. 물론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어서는 안 됐다. 아무리 기다려도 배는 끝내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그래도 언제 어느 때나 외국에서 들어오는 큰 배(대박)는 ‘없는 사람’과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늘 한 줄기 빛과도 같은 ‘희망’이었다.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그해 연말 새누리당에서 유행했던 술자리 건배 구호도 대박이었다. ‘연말’이라고 한 명이 외치면 여러 명이 ‘대박’이라고 화답하는 식이었다. 여기에서의 대박은 ‘대통령 박근혜’의 준말이다.
그리고 선거가 끝난 후 그녀는 그 구호에서 외친 대로 대통령에 당선돼 대박을 터뜨렸다. 그러니 대박이란 표현을 어찌 좋아하지 않을쏜가. 박 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며 또다시 이 말을 언급한 것은 바로 그 때문일지도 모른다.
물론 일부 누리꾼들은 즉각 “어휘력 수준이 통탄스러울 지경이다.”라거나 “용어 선택이 천박하다.”는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다. 대박의 어원이 아무리 불확실하다 해도 청와대 비서관도 듣고 깜짝 놀랐을 만큼, 그게 결코 점잖은 표현이 아닌 것만은 분명했기 때문이다.
그래 그랬다. 평소 품위 있는 언어를 구사해 온 박 대통령 아니었던가. 극도로 절제된 표현만을 선호해 왔던 그녀 아니었던가. 한데 요사이 달라졌다. 달라도 너무 달라졌다.
대박이란 말까지는 이해해 줄 수 있겠다. 하지만 최근 부쩍 전투적인 표현이 많아졌다. ‘쳐부숴야 할 원수’ ‘한 번 물면 살점이 뜯어져 나갈 때까지’ ‘사생결단’ 같은 격정의 말들이 그것이다. 이런 거친 언사는 그동안 박 대통령의 입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았었다.
왜 이렇게 거칠어졌을까. 아마도 각료(閣僚)나 당료(黨僚)들이 모든 일에 수수방관(袖手傍觀)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아무리 말해도 모두들 하나같이 받아 적고만 있기 때문일 것이다. ‘수첩 각료’ ‘수첩 당료’ 들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팔 걷어붙이고 나서는 이보다는 팔짱 낀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니 ‘오죽했으면 그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었을까’ 백번 이해한다. 그렇다고 대통령의 말이 품위를 잃고 그처럼 거칠어서야 되겠는가. 세상사도 마찬가지여서 목소리만 높다고 해서 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용장(勇將)이라도 덕장(德將)을 넘어서기 어려운 법이다.
부드러움이 강한 것을 이긴다고(柔之勝剛) 했다. 천하에 이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 하지만 이를 행하는 자는 드물다.(天下莫不知 莫能行) 노자(老子)의 도덕경에 나오는 말이다.
중국에서 가장 태평성대였다고 전해지는 요순시대를 생각해 보자. 백성들이 손으로 배를 두드리고, 발로 땅을 구르며, 장단을 맞춰 노래를 부른다. 해가 뜨면 일하고, 해가 지면 쉬나니, 임금의 힘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냐면서. 요왕(堯王)은 그렇게 임금이 ‘있는 듯 없는 듯’ 나라를 다스렸다. 무릇 지도자의 ‘쎈’ 목소리는 아랫것들을 더욱 복지부동(伏地不動)으로 몰아갈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