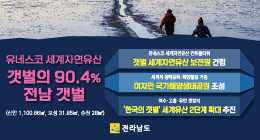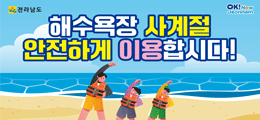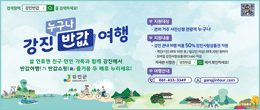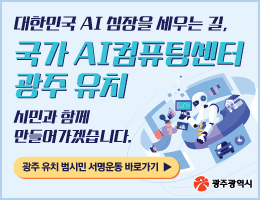[이정모의 ‘자연이 건네는 말’] 기름장어와 거북의 나라
 |
장어는 손에 쥐자마자 미끈거려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려 한다. 얇고 매끄러운 점액층 때문이다. 점액은 몸을 보호하고 마찰 저항을 줄여 매끄럽게 헤엄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해서 피부를 통한 산소 교환이 원활하게 일어나도록 한다. 장어는 그 미끈함 덕분에 살아남는다. 하지만 우리는 장어를 잡아야 한다. 잿가루나 모래를 손에 묻혀서라도 장어를 잡는다.
장어는 흥미로운 동물이다. 길고 유연한 체형 덕분에 작은 틈새도 미끄러지듯 통과한다. 비늘이 거의 드러나지 않고 피부가 점액으로 덮여 있어 손으로 잡기가 어렵다. 밤이 되면 은밀하게 활동하며 먹이를 낚아채는데, 그 몸놀림이 마치 뱀이 물속을 헤엄치는 것 같다고 해서 뱀장어라는 이름이 붙었다. 바다뱀은 파충류이지만 뱀장어는 어류다. 잘 보면 지느러미도 붙어 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바다로 회유해 산란을 하는 집요함까지 더해지니 회피와 생존술은 실로 놀랍다.
한국 정치계에도 장어를 닮은 인물이 있다. 전직 국무총리, 별명은 기름장어. 어떤 위기에서도 미끈하게 빠져나가는 솜씨가 혀를 내두를 지경이다. 정치 자금, 권력형 비리, 온갖 의혹이 덮쳐도 끝내 법망을 빠져나갔다. 포식자 대신 검찰과 여론이 덮쳤을 뿐인데, 그 앞에서 그는 장어처럼 몸을 비틀며 “나는 아니다”라며 도망쳤다. 그 생존술에 감탄해야 할까, 아니면 부끄러워해야 할까.
장어가 미끈하게 빠져나갈 때 잡는 이는 답답하다. 그런데 더 답답한 건 잡는 손이 느슨할 때다. 최근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여기서 또 다른 동물이 떠오른다. 바로 거북이다.
거북은 방어의 달인이다. 위협이 오면 머리를 껍질 안으로 쏙 집어넣는다. 거북이 2억 6천만 년 전에 처음 등장했지만 배딱지와 등딱지가 완성될 때까지는 6천만 년이 더 걸렸다. 거북은 단단한 껍데기를 갖추는 대신 이빨을 잃어버리고 부리만 남았다. 이때부터 단단한 등껍질은 거북이 살아남은 비결이 되었다. 백악기 공룡들이 멸종하는 와중에도 거북은 껍질 하나로 살아남았다. 거북 껍질은 단순한 방패가 아니라 골격의 변형이다. 갈비뼈와 척추가 옆으로 벌어져 판 모양으로 융합해 만들어졌다. 사실상 뼈 바깥에 뼈를 한 겹 더 두른 셈이다. 자연계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진화적 발명품이다.
전직 총리에 대한 구속 영장이 청구되었지만 판사는 법리라는 단단한 껍질 속으로 숨어 사회적 책임을 외면했다. 시민들은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고 배웠다. 그러나 판사는 껍질 속에 들어가 “구속사유가 불충분하다”는 말만 남겼다. 시민들이 거북의 등껍질을 두드리며 “밖으로 나와 정의를 보라”고 외쳐도 판사는 껍질 속에서 법률 조항 몇 마디만 흘려보낼 뿐이다. 사회적 상식과 법적 판단이 어긋나는 순간, 정의는 등껍질 속에 갇히고 말았다.
그러고보니 장어와 거북은 묘한 대칭을 이룬다. 장어는 능동적으로 빠져나가며 “나는 잡히지 않는다”고 히죽댄다. 거북은 수동적으로 숨으며 “나는 보지 못한다”고 말한다. 한쪽은 법망을 비집고 빠져나가고, 다른 한쪽은 법망을 스스로 좁혀버린다. 시민은 허탈감 속에 남겨진다.
뱀장어의 미끈한 몸과 거북의 등껍질은 진화의 걸작이다. 수억 년의 세월 동안 살아남게 해준 훌륭한 장치다. 그러나 인간 사회에서 장어 같은 정치인과 거북 같은 판사가 보여주는 모습은 도덕적 파산이다. 동물에게는 합리적이고 아름다운 전략이 인간에게는 추악한 회피로 둔갑한다.
더 큰 문제는 이 두 존재가 서로를 살려낸다는 점이다. 장어 같은 정치인은 거북 같은 판사를 만나야 비로소 살아남을 수 있다. 장어 혼자만으로는 물 밖에서 오래 버티기 힘들다. 그러나 거북이 껍질 속에 자신의 머리를 집어넣는 순간, 장어는 다시 물속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해서 생존의 동맹이 형성된다.
동물의 생존 전략에서 배워야 할 것은 창의성과 적응력이지 회피와 도피가 아니다. 장어가 미끈하게 빠져나가는 법이나 거북이 숨어버리는 법을 흉내 낸다면, 우리는 이미 도태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인간 사회는 자연이 아니다. 인간은 책임과 도덕, 정의라는 껍질로 보호받아야 한다.
정의는 장어처럼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다. 정의는 거북처럼 숨어버리는 것도 아니다. 정의는 직시하는 것이고 드러내는 것이고 잡아내는 것이다. 판사의 머리를 껍질 밖으로 끄집어 내야 하고, 죄를 지은 정치인의 점액질을 벗겨내야 한다. 시민이 거북의 껍질을 두드리고 장어를 잡는 손이 되어야 한다. 장어와 거북의 나라에서 벗어나는 일, 그것이 지금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이다. <전 국립과천과학관장>
장어가 미끈하게 빠져나갈 때 잡는 이는 답답하다. 그런데 더 답답한 건 잡는 손이 느슨할 때다. 최근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여기서 또 다른 동물이 떠오른다. 바로 거북이다.
거북은 방어의 달인이다. 위협이 오면 머리를 껍질 안으로 쏙 집어넣는다. 거북이 2억 6천만 년 전에 처음 등장했지만 배딱지와 등딱지가 완성될 때까지는 6천만 년이 더 걸렸다. 거북은 단단한 껍데기를 갖추는 대신 이빨을 잃어버리고 부리만 남았다. 이때부터 단단한 등껍질은 거북이 살아남은 비결이 되었다. 백악기 공룡들이 멸종하는 와중에도 거북은 껍질 하나로 살아남았다. 거북 껍질은 단순한 방패가 아니라 골격의 변형이다. 갈비뼈와 척추가 옆으로 벌어져 판 모양으로 융합해 만들어졌다. 사실상 뼈 바깥에 뼈를 한 겹 더 두른 셈이다. 자연계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진화적 발명품이다.
전직 총리에 대한 구속 영장이 청구되었지만 판사는 법리라는 단단한 껍질 속으로 숨어 사회적 책임을 외면했다. 시민들은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고 배웠다. 그러나 판사는 껍질 속에 들어가 “구속사유가 불충분하다”는 말만 남겼다. 시민들이 거북의 등껍질을 두드리며 “밖으로 나와 정의를 보라”고 외쳐도 판사는 껍질 속에서 법률 조항 몇 마디만 흘려보낼 뿐이다. 사회적 상식과 법적 판단이 어긋나는 순간, 정의는 등껍질 속에 갇히고 말았다.
그러고보니 장어와 거북은 묘한 대칭을 이룬다. 장어는 능동적으로 빠져나가며 “나는 잡히지 않는다”고 히죽댄다. 거북은 수동적으로 숨으며 “나는 보지 못한다”고 말한다. 한쪽은 법망을 비집고 빠져나가고, 다른 한쪽은 법망을 스스로 좁혀버린다. 시민은 허탈감 속에 남겨진다.
뱀장어의 미끈한 몸과 거북의 등껍질은 진화의 걸작이다. 수억 년의 세월 동안 살아남게 해준 훌륭한 장치다. 그러나 인간 사회에서 장어 같은 정치인과 거북 같은 판사가 보여주는 모습은 도덕적 파산이다. 동물에게는 합리적이고 아름다운 전략이 인간에게는 추악한 회피로 둔갑한다.
더 큰 문제는 이 두 존재가 서로를 살려낸다는 점이다. 장어 같은 정치인은 거북 같은 판사를 만나야 비로소 살아남을 수 있다. 장어 혼자만으로는 물 밖에서 오래 버티기 힘들다. 그러나 거북이 껍질 속에 자신의 머리를 집어넣는 순간, 장어는 다시 물속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해서 생존의 동맹이 형성된다.
동물의 생존 전략에서 배워야 할 것은 창의성과 적응력이지 회피와 도피가 아니다. 장어가 미끈하게 빠져나가는 법이나 거북이 숨어버리는 법을 흉내 낸다면, 우리는 이미 도태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인간 사회는 자연이 아니다. 인간은 책임과 도덕, 정의라는 껍질로 보호받아야 한다.
정의는 장어처럼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다. 정의는 거북처럼 숨어버리는 것도 아니다. 정의는 직시하는 것이고 드러내는 것이고 잡아내는 것이다. 판사의 머리를 껍질 밖으로 끄집어 내야 하고, 죄를 지은 정치인의 점액질을 벗겨내야 한다. 시민이 거북의 껍질을 두드리고 장어를 잡는 손이 되어야 한다. 장어와 거북의 나라에서 벗어나는 일, 그것이 지금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이다. <전 국립과천과학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