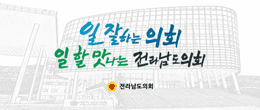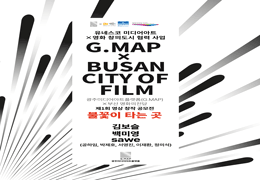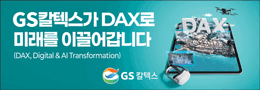서로를 오역하지 않는 법 - 김창균 광주시교육청 중등특수교육과장
 |
연못가에는 매년 오리 새끼들이 태어났다. 노란 솜털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어미를 쫓는 물장구 소리가 평화로웠다. 그런데 어느 해, 털빛이 다르고 걸음걸이도 다른 하나가 태어났다. 어미와 형제들은 그를 어색하게 바라보았고 이웃 오리들은 뒤에서 수군거렸다. 안데르센의 ‘미운 오리 새끼’는 이렇게 시작한다.
사실 그는 오리가 아니라 백조였다. 혹독한 겨울을 지나 백조의 일원으로 재탄생할 때까지는 그 진실을 누구도 알아보지 못했다. 존재의 의미를 잘못 읽은 것이다. 그러고 보면 미운 오리 새끼가 겪은 아픔은 다름의 문제 이전에 해석의 문제였다. 그래서 이 우화는 자기 성장의 이야기이면서 한편으로는 해석의 오류, 즉 오역(誤譯)에 대해 돌아보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오역이란 본래 다른 언어를 잘못 옮기는 일을 뜻하지만 사실 우리의 일상과 사회 안에도 수많은 오역이 존재한다. 말보다 먼저 판단하고 다름을 틀림으로 해석하며, 타인의 의도를 내 기준으로 번역하는 것 말이다.
이청준의 ‘당신들의 천국’은 이 오역의 단면을 절실하게 보여준다.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 헌신하는 원장은 자신이 그들을 구원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는 섬사람들에게 또 다른 억압이었다. 원장이 원한 천국은 사실 그들에 의한, 그들을 위한 천국이 아니라 자신이 해석한 천국이었다. 타인의 고통과 욕망을 자신의 관점으로 번역해 버린 순간 선의는 폭력이 되고 만다. 결국 닫힌사회는 언제나 상대를 잘못 번역하는 데서 시작한다.
‘미운 오리 새끼’의 연못과 ‘당신들의 천국’의 섬은 닫힌사회의 두 풍경이다. 한쪽은 다름이 낯설어 맞대하기를 물설어하고 다른 한쪽은 다름을 제 방식대로 고쳐서 감싸려 한다. 전자는 차별의 오역이고 후자는 선의의 오독이다. 어느 경우든 상대의 진짜 언어를 듣고 보려 하지 않는 데서 문제가 시작한다.
오늘의 우리 사회 역시 오역의 파문 속에서 흔들린다. 환경 문제 앞에서는 산업과 생태의 언어가 충돌한다. 다문화 사회에서 이주민 지원 정책을 특혜로 읽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언어와 문화 장벽 속에서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여전하다. 교육 현장에서는 같은 말을 두고도 교사와 학부모, 학생이 다른 뜻으로 이해한다.
우리가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도 오역에서 비롯한다. 상대의 말을 자기 언어로 번역하면서 뜻을 호도하고 다름을 틀림으로 읽어버린다. 이해 체계나 세계관의 충돌도 각자의 익숙한 문법으로 상대를 해석하는 데서 생겨난다. 서로의 경험과 인식을 고집할 때 소통의 문은 서서히 닫혀간다.
이렇듯 오역을 되풀이하는 공동체는 타인의 언어를 들을 귀를 잃은 사회다. 이를 바로잡는 길은 상대의 세계를 이해하려는 태도에서 비롯한다. 뜻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맥락을 함께 읽는 태도, 그것이 열린사회의 언어다. 포퍼가 말한 열린사회는 바로 이런 태도를 개인의 미덕에 그치지 않고 제도적, 이성적 차원으로 확장한 사회다. 그는 비판과 토론을 통해 오류를 수정하고 스스로를 갱신할 수 있는 구조를 강조했다. 결국 열린사회는 서로의 문법을 배우되, 그것을 끊임없이 검증하고 조정하는 세상이다.
철학자 김용석은 ‘미운 오리 새끼’를 닫힌사회의 우화로 읽었다. 백조의 무리 또한 같은 깃털만을 허락하는 또 다른 닫힘의 세계일 뿐이라는 것이다. 반면에 ‘당신들의 천국’의 원장은 해석의 오류를 인정하고 이해와 공존으로 옮겨간다. 진정한 천국이 그곳 사람들의 삶과 의지 속에 있음을 깨닫고 그들과 함께 불완전한 현실을 살아가는 한 인간으로서의 길을 택한다.
바람이 차가워지는 요즘, 사람들의 마음도 함께 닫기 쉬운 계절이다. 찬바람이 불면 문틈을 막아야겠지만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면 집 안의 공기부터 탁해진다. 비판이 문을 두드린다면 열어젖히는 것은 이해와 대화다. 뜻이 완전히 같지 않아도 서로의 세계를 존중하는 순간, 비로소 공기가 통한다.
닫힌 문을 여는 일은 거창하지 않다. 상대를 고치려 하기보다 먼저 이해하려는 마음이 사회의 문을 연다. 다른 의견을 끝까지 들어주는 일, 말 사이의 미묘한 차이를 헤아리며 수긍하려는 작은 공감의 움직임이 결국 닫힌 문을 여는 첫걸음이 된다.
오역이란 본래 다른 언어를 잘못 옮기는 일을 뜻하지만 사실 우리의 일상과 사회 안에도 수많은 오역이 존재한다. 말보다 먼저 판단하고 다름을 틀림으로 해석하며, 타인의 의도를 내 기준으로 번역하는 것 말이다.
‘미운 오리 새끼’의 연못과 ‘당신들의 천국’의 섬은 닫힌사회의 두 풍경이다. 한쪽은 다름이 낯설어 맞대하기를 물설어하고 다른 한쪽은 다름을 제 방식대로 고쳐서 감싸려 한다. 전자는 차별의 오역이고 후자는 선의의 오독이다. 어느 경우든 상대의 진짜 언어를 듣고 보려 하지 않는 데서 문제가 시작한다.
오늘의 우리 사회 역시 오역의 파문 속에서 흔들린다. 환경 문제 앞에서는 산업과 생태의 언어가 충돌한다. 다문화 사회에서 이주민 지원 정책을 특혜로 읽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언어와 문화 장벽 속에서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여전하다. 교육 현장에서는 같은 말을 두고도 교사와 학부모, 학생이 다른 뜻으로 이해한다.
우리가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도 오역에서 비롯한다. 상대의 말을 자기 언어로 번역하면서 뜻을 호도하고 다름을 틀림으로 읽어버린다. 이해 체계나 세계관의 충돌도 각자의 익숙한 문법으로 상대를 해석하는 데서 생겨난다. 서로의 경험과 인식을 고집할 때 소통의 문은 서서히 닫혀간다.
이렇듯 오역을 되풀이하는 공동체는 타인의 언어를 들을 귀를 잃은 사회다. 이를 바로잡는 길은 상대의 세계를 이해하려는 태도에서 비롯한다. 뜻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맥락을 함께 읽는 태도, 그것이 열린사회의 언어다. 포퍼가 말한 열린사회는 바로 이런 태도를 개인의 미덕에 그치지 않고 제도적, 이성적 차원으로 확장한 사회다. 그는 비판과 토론을 통해 오류를 수정하고 스스로를 갱신할 수 있는 구조를 강조했다. 결국 열린사회는 서로의 문법을 배우되, 그것을 끊임없이 검증하고 조정하는 세상이다.
철학자 김용석은 ‘미운 오리 새끼’를 닫힌사회의 우화로 읽었다. 백조의 무리 또한 같은 깃털만을 허락하는 또 다른 닫힘의 세계일 뿐이라는 것이다. 반면에 ‘당신들의 천국’의 원장은 해석의 오류를 인정하고 이해와 공존으로 옮겨간다. 진정한 천국이 그곳 사람들의 삶과 의지 속에 있음을 깨닫고 그들과 함께 불완전한 현실을 살아가는 한 인간으로서의 길을 택한다.
바람이 차가워지는 요즘, 사람들의 마음도 함께 닫기 쉬운 계절이다. 찬바람이 불면 문틈을 막아야겠지만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면 집 안의 공기부터 탁해진다. 비판이 문을 두드린다면 열어젖히는 것은 이해와 대화다. 뜻이 완전히 같지 않아도 서로의 세계를 존중하는 순간, 비로소 공기가 통한다.
닫힌 문을 여는 일은 거창하지 않다. 상대를 고치려 하기보다 먼저 이해하려는 마음이 사회의 문을 연다. 다른 의견을 끝까지 들어주는 일, 말 사이의 미묘한 차이를 헤아리며 수긍하려는 작은 공감의 움직임이 결국 닫힌 문을 여는 첫걸음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