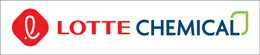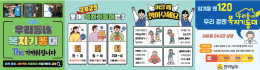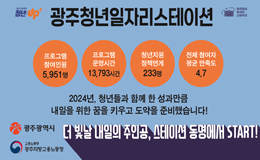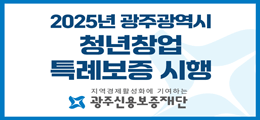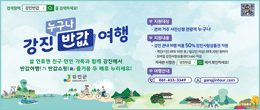도굴과 훼손 - 윤영기 체육부 부국장
조선시대에 도굴은 중대 범죄였다. 성종 대인 1480년 임은(林垠)은 흥덕 현감 시절 고분 때문에 곤욕을 치렀다. 고총(古塚)을 파헤쳐 인골을 방치하고 은기(銀器)와 유기(鍮器)를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성종은 그의 직첩을 거두고 관리 재임용을 막았다. 세종(1446년)은 국사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예전에 국군(國君)의 장사에 금·은을 쓰지 않았던 것은 후세에 도굴당하는 근심이 있을까 염려한 것”이라고 일깨운다. 이어 “중궁(中宮) 상사에는 금·은으로 그려 만든 그릇 또한 쓰지 않으려 하니, 국장 도감(國葬都監) 제조(提調)에게 의논해 아뢰게 하라”고 교시한다.
일제 강점기에는 일본인들이 ‘묘에서 금닭이 운다’는 전설의 고분을 찾기 위해 전국을 누벼 성한 무덤이 없을 정도였다. 조선통감으로 부임한 이토 히로부미는 1000여 점에 달하는 고려자기를 싹쓸이한 장물아비였다. 그의 광적인 수집이 도굴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는다. 조선총독부 박물관장을 지낸 아리미츠 교이치는 회고록 격인 ‘조선 고고학 75년’에서 경주 민간인들이 담장을 쌓아 고분을 은폐하고 도굴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증언했다. 담장 재료는 무덤을 헐고 반출한 흙과 돌이었다.
도굴이 거의 자취를 감춘 요즘에는 공식 발굴과 복원 과정에서 문화재 훼손이 논란이 된다. 지난해 경남 김해시에서 구산동 지석묘 국가사적 지정을 위한 정비 사업을 추진하다가 문화재 훼손 사실이 드러나 공무원 11명이 무더기 징계 조치를 받았다. 최근 경찰과 문화재청 현장 조사에서는 박석(얇고 넓적한 돌) 1000여 개를 분실했다는 새로운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구산동 지석묘 사례는 마한 문화유산을 관리하는 광주·전남 지역에도 시사점이 없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행정 조직의 비전문성이다. 사건 발생 당시 김해시 문화유산과 과장과 팀장이 모두 토목 직렬이었다고 한다. 광주·전남 지역 자치단체에 근무하는 학예직 공무원은 한두 명 뿐이어서 현장 업무는커녕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데도 역부족이다. 마한사 복원에 맞춰 학계와 자치단체가 전문 인력 양성과 확충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
/윤영기 체육부 부국장 penfoot@kwangju.co.kr
구산동 지석묘 사례는 마한 문화유산을 관리하는 광주·전남 지역에도 시사점이 없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행정 조직의 비전문성이다. 사건 발생 당시 김해시 문화유산과 과장과 팀장이 모두 토목 직렬이었다고 한다. 광주·전남 지역 자치단체에 근무하는 학예직 공무원은 한두 명 뿐이어서 현장 업무는커녕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데도 역부족이다. 마한사 복원에 맞춰 학계와 자치단체가 전문 인력 양성과 확충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
/윤영기 체육부 부국장 penfoot@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