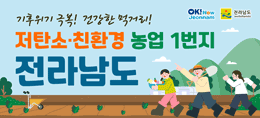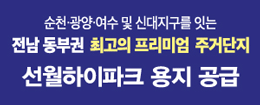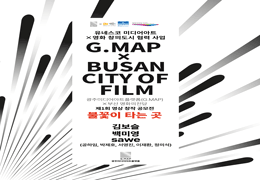[서울 공공조형물] 35초마다 망치질 ‘해머링맨’ 노동의 숭고함을 느끼다
포스코센터 앞 ‘꽃이 피는 구조물-아마벨’
인간 관계 확장 형상화 여의도 ‘조용한 증식’
높이20m·지름6m 알루미늄 다슬기 ‘스프링’
인간 관계 확장 형상화 여의도 ‘조용한 증식’
높이20m·지름6m 알루미늄 다슬기 ‘스프링’
 서울 삼성동 포스코센터 앞에 설치된 세계적인 작가 프랭크 스텔라의 ‘꽃이 피는 구조물-아마벨’. <사진=포스코 제공> |
매일 아침 출근길, 서울 광화문 흥국빌딩 앞을 지나는 직장인들은 ‘반가운’ 얼굴과 마주하게 된다. 미국 출신 조각가 조나단 브롭스키(Jonathan Borofsky)의 ‘해머링맨’(Hammering man)이다. 삭막한 도심에 홀로 서있는 이 작품은 압도적인 스케일로 부근을 지나가는 이들의 시선을 사로 잡는다. 그도 그럴것이 22m의 키에 무게가 50t에 달하는 ‘키다리 아저씨’다. 지난 2002년 부터 비가 오거나 눈이 내리는 날씨에도 꿋꿋하게 서울 도심 한복판을 지켜오고 있다.
무엇보다 인상적인 것은 ‘살아 있는’ 조형물이라는 점이다. 검정색의 스틸로 제작된 작품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저녁 7시(하절기 기준)까지 35초 마다 한차례씩 망치질을 한다. 국내 건축물 장식미술품 가운데 ‘움직이는’ 조각으로는 거의 유일하다. 특히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망치질을 하는 모습은 현대인들에게 노동의 숭고함을 느끼게 한다.
#광화문의 ‘해머링맨’
그래서일까. 올해로 탄생 20주년을 맞은 ‘해머링맨’은 광화문을 상징하는 랜드마크로 자리잡고 있다. 지나온 시간이 말해주듯 한번쯤 이 곳을 지나간 사람이라면 언제부터 그 자리에 서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친숙한 존재다.
‘해머링맨’이 이곳에 첫선을 보이게 된 건 지난 2002년부터. 흥국생명은 2000년 당시 24층 사옥을 신축하기로 하면서 웅장한 건축물 규모와 직장인들이 많은 주변의 특성을 고려해 대형작품을 주로 작업하는 브롭스키에게 제작을 의뢰했다. 조나단 브롭스키는 1976년 튀니지의 구두 수선공이 망치질 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보고 스케치로 옮겼다. 여기에 어린 시절, 자신의 부친으로 부터 친절한 거인 이야기를 들은 기억을 살려 스케치와 거인의 이미지를 조합해 1979년 뉴욕에서 3.4m 높이의 ‘해머링맨’을 세상에 내놓았다. 해머링맨’을 운영·관리하고 있는 곳은 태광그룹계열의 세화미술관으로, 서울을 대표하는 공공조형물 답게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통해 브랜딩 작업을 하고 있다.
#테헤란로의 ‘아마벨’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는 고철덩어리가 거리의 랜드마크가 된 공공조형물도 있다. 서울 삼성동 테헤란로 포스코센터 앞에 설치된 미국 추상화가 프랭크 스텔라(Frank Stella)의 ‘꽃이 피는 구조물-아마벨(Amabel)’이다. 얼핏 최첨단 사옥의 모던한 건축물과의 이질적인 조합처럼 보이지만 철강회사의 정체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는 점에서 근래 재평가 되고 있는 작품이기도 하다.
1996년 포스코는 포항 본사에 이어 서울 강남에 신축한 사옥 이미지에 걸맞은 야외 조각작품을 건립하기로 하고 사물의 형상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미니멀 아트의 대가 프랭크 스텔라에게 제작을 의뢰했다.
스텔라는 생명 존중과 물질문명의 위험성을 경고하기 위해 현대산업사회의 상징적인 소재이자 녹이 슬지 않는 스테인레스 스틸을 미국에서 들여와 1년 6개월간 포스코 사옥 인근에서 정교하게 용접하는 작업을 거쳐 이 구조물을 탄생시켰다.
마침내 1997년 일반에 베일을 벗은 철제 구조물은 한때 도시의 이미지는 물론 예술성과 거리가 멀다며 일각에서 철거를 요구하는 수모를 겪었다. 하지만 포스코는 일부 미술전문가들로 부터 ‘상투적이지 않고 미학적으로 깊이가 있다’는 의견을 수렴해 지난 2012년부터 붉은빛의 야간 조명을 설치, 독특한 조형미를 지닌 랜드마크로 키워냈다. 포스코의 발상 덕분에 ‘아마벨’은 낮에는 ‘평범한’ 쇠붙이지만 밤에는 환상적인 아우라를 풍기는 테헤란로의 명물로 떠오르고 있다.
#여의도의 ‘조용한 증식’
서울의 도심을 걷다 보면 공공장소, 오피스 빌딩, 백화점 등 곳곳에 빼어난 조형미를 자랑하는 ‘명작’들로 거대한 야외 미술관을 보는 듯 하다. 최첨단 건축물들로 우거진 여의도의 IFC서울도 그중의 하나다. 지난 2012년 화려한 디자인의 건물 앞에 김용호 작가의 ‘조용한 증식’이 둥지를 튼 이후 ‘도심 속 문화쉼터’라는 근사한 타이틀을 얻었다.
초고층 건물 앞에 서면 가장 먼저 강렬한 노란색의 길다란 조형물이 방문객의 시선을 빼앗는다. 높이 3m에 길이 6m의 스테인레스 스틸로 된 25개의 원형 파이프를 우레탄으로 도장 처리한 작품이다. 트럼펫의 나팔 모양을 연상시키는 이 조형물은 가까이 다가가면 꽃의 암술과 수술을 떠올리게 한다. 작품의 나팔 모양은 사회 구조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인간 관계의 확장을 형상화 한 것으로 직선 같은 곡선을 통해 인간 사회의 관습 등 손에 잡히지 않는 조용한 변화의 궤적을 담아냈다. ‘조용한 증식’을 작품의 명제로 삼은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조용한 증식’의 매력은사람과 작품이 빚어낸 ‘일상의 여유’다. 조형물 주변에는 패브릭으로 만든 수 십여 개의 방석이 곳곳에 설치돼 점심 시간을 짬낸 직장인들이 담소를 나누거나 이 곳을 지나는 시민들이 잠시 걸음을 멈추고 휴식을 취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단순히 조형물 하나를 설치했을 뿐인데 주변 풍경은 물론 시민들의 일상을 ‘문화적으로’ 바꾼 마법을 이뤄냈다.
#청계광장의 ‘스프링’
서울의 공공조형물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청계천 인근에 설치된 팝아트의 거장 클래스 올덴버그의 ‘스프링’이다. 영어로 ‘봄’, ‘용수철’을 뜻하는 중의적 의미인 스프링은 다슬기를 알루미늄으로 형상화 것으로 높이 20m, 지름 6m 크기의 초대형 설치작품이다. 지난 2005년 서울시가 청계천 복원 1주년을 기념해 서울 시청 인근 청계천이 시작되는 광장에 서울을 상징하는 조형물 제작을 추진했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물건을 거대하게 확대하거나 풍자하는 작품으로 잘 알려진 올덴버그는 당시 서울시의 제안을 받고 미술은 모든 사람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오브제여야 한다는 철학을 담아 청계천의 다슬기를 주제로 삼았다. 하지만 그의 작품이 청계광장과 어울리지 않는다 등의 이유로 시민예술단체들로 부터 비난을 받기도 했다.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지금, ‘스프링’은 일각의 곱지 않은 시각에도 불구하고 수평과 수직으로 가득찬 고층 빌딩군 사이에 나선형으로 미끄러지듯한 형상이 주변 풍광과 어우러지며 청계광장의 명물로 변신중이다.
지난 4월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열린 ‘2022 미술아카데미’에서 ‘거리의 미술관’을 주제로 강연한 손영옥씨(‘거리로 나온 미술관’저자)는 “1972년 1만㎡ 이상 신·증축 건축물에 대해 건축비의 1%(현재는 0.7%)를 미술품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 하는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도입 이후 수많은 조형물이 거리에 등장하기 시작했다”면서 “장소성과 예술성이 뛰어난 조형물은 굳이 시민들이 미술관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일상에서 예술의 향기를 만끽할 수 있는 공공재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글·사진 박진현 문화선임기자 jhpark@kwangju.co.kr
 노동의 숭고함을 표현한 조나단 브롭스키의 ‘해머링맨’ |
그래서일까. 올해로 탄생 20주년을 맞은 ‘해머링맨’은 광화문을 상징하는 랜드마크로 자리잡고 있다. 지나온 시간이 말해주듯 한번쯤 이 곳을 지나간 사람이라면 언제부터 그 자리에 서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친숙한 존재다.
#테헤란로의 ‘아마벨’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는 고철덩어리가 거리의 랜드마크가 된 공공조형물도 있다. 서울 삼성동 테헤란로 포스코센터 앞에 설치된 미국 추상화가 프랭크 스텔라(Frank Stella)의 ‘꽃이 피는 구조물-아마벨(Amabel)’이다. 얼핏 최첨단 사옥의 모던한 건축물과의 이질적인 조합처럼 보이지만 철강회사의 정체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는 점에서 근래 재평가 되고 있는 작품이기도 하다.
1996년 포스코는 포항 본사에 이어 서울 강남에 신축한 사옥 이미지에 걸맞은 야외 조각작품을 건립하기로 하고 사물의 형상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미니멀 아트의 대가 프랭크 스텔라에게 제작을 의뢰했다.
스텔라는 생명 존중과 물질문명의 위험성을 경고하기 위해 현대산업사회의 상징적인 소재이자 녹이 슬지 않는 스테인레스 스틸을 미국에서 들여와 1년 6개월간 포스코 사옥 인근에서 정교하게 용접하는 작업을 거쳐 이 구조물을 탄생시켰다.
마침내 1997년 일반에 베일을 벗은 철제 구조물은 한때 도시의 이미지는 물론 예술성과 거리가 멀다며 일각에서 철거를 요구하는 수모를 겪었다. 하지만 포스코는 일부 미술전문가들로 부터 ‘상투적이지 않고 미학적으로 깊이가 있다’는 의견을 수렴해 지난 2012년부터 붉은빛의 야간 조명을 설치, 독특한 조형미를 지닌 랜드마크로 키워냈다. 포스코의 발상 덕분에 ‘아마벨’은 낮에는 ‘평범한’ 쇠붙이지만 밤에는 환상적인 아우라를 풍기는 테헤란로의 명물로 떠오르고 있다.
 주변의 공간과 어우러져 도심 속 쉼터가 된 김용호 작가의 ‘조용한 증식’ |
서울의 도심을 걷다 보면 공공장소, 오피스 빌딩, 백화점 등 곳곳에 빼어난 조형미를 자랑하는 ‘명작’들로 거대한 야외 미술관을 보는 듯 하다. 최첨단 건축물들로 우거진 여의도의 IFC서울도 그중의 하나다. 지난 2012년 화려한 디자인의 건물 앞에 김용호 작가의 ‘조용한 증식’이 둥지를 튼 이후 ‘도심 속 문화쉼터’라는 근사한 타이틀을 얻었다.
초고층 건물 앞에 서면 가장 먼저 강렬한 노란색의 길다란 조형물이 방문객의 시선을 빼앗는다. 높이 3m에 길이 6m의 스테인레스 스틸로 된 25개의 원형 파이프를 우레탄으로 도장 처리한 작품이다. 트럼펫의 나팔 모양을 연상시키는 이 조형물은 가까이 다가가면 꽃의 암술과 수술을 떠올리게 한다. 작품의 나팔 모양은 사회 구조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인간 관계의 확장을 형상화 한 것으로 직선 같은 곡선을 통해 인간 사회의 관습 등 손에 잡히지 않는 조용한 변화의 궤적을 담아냈다. ‘조용한 증식’을 작품의 명제로 삼은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조용한 증식’의 매력은사람과 작품이 빚어낸 ‘일상의 여유’다. 조형물 주변에는 패브릭으로 만든 수 십여 개의 방석이 곳곳에 설치돼 점심 시간을 짬낸 직장인들이 담소를 나누거나 이 곳을 지나는 시민들이 잠시 걸음을 멈추고 휴식을 취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단순히 조형물 하나를 설치했을 뿐인데 주변 풍경은 물론 시민들의 일상을 ‘문화적으로’ 바꾼 마법을 이뤄냈다.
 청계광장의 명물로 자리잡은 클래스 올덴버그의 ‘스프링’ |
서울의 공공조형물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청계천 인근에 설치된 팝아트의 거장 클래스 올덴버그의 ‘스프링’이다. 영어로 ‘봄’, ‘용수철’을 뜻하는 중의적 의미인 스프링은 다슬기를 알루미늄으로 형상화 것으로 높이 20m, 지름 6m 크기의 초대형 설치작품이다. 지난 2005년 서울시가 청계천 복원 1주년을 기념해 서울 시청 인근 청계천이 시작되는 광장에 서울을 상징하는 조형물 제작을 추진했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물건을 거대하게 확대하거나 풍자하는 작품으로 잘 알려진 올덴버그는 당시 서울시의 제안을 받고 미술은 모든 사람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오브제여야 한다는 철학을 담아 청계천의 다슬기를 주제로 삼았다. 하지만 그의 작품이 청계광장과 어울리지 않는다 등의 이유로 시민예술단체들로 부터 비난을 받기도 했다.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지금, ‘스프링’은 일각의 곱지 않은 시각에도 불구하고 수평과 수직으로 가득찬 고층 빌딩군 사이에 나선형으로 미끄러지듯한 형상이 주변 풍광과 어우러지며 청계광장의 명물로 변신중이다.
지난 4월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열린 ‘2022 미술아카데미’에서 ‘거리의 미술관’을 주제로 강연한 손영옥씨(‘거리로 나온 미술관’저자)는 “1972년 1만㎡ 이상 신·증축 건축물에 대해 건축비의 1%(현재는 0.7%)를 미술품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 하는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도입 이후 수많은 조형물이 거리에 등장하기 시작했다”면서 “장소성과 예술성이 뛰어난 조형물은 굳이 시민들이 미술관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일상에서 예술의 향기를 만끽할 수 있는 공공재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글·사진 박진현 문화선임기자 jhpark@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