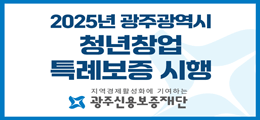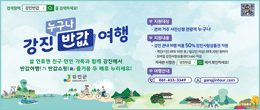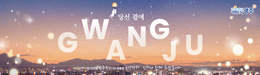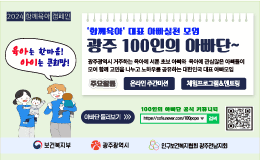우리가 ‘오월 광주’를 대하는 자세-김미은 편집부국장·문화부장
 |
지난해 가장 소중한 인연 중 하나는 충남 아산 거산초등학교 6학년생들이었다. 아이들은 ‘5·18’을 공부하기 위해 광주를 방문했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에서 오월 연극 ‘시간을 칠하는 사람들’을 관람했다. 공연장에서 우연히 아이들을 만난 나는 후배들 선물로 ‘5·18 교과서’를 1년 동안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사를 썼었다.
올 초 교과서를 전달 받았을 때, 책 뒤편에 실린 짧은 추천사들을 보고 새삼 ‘광주 사람들’ 마음은 다 같구나 싶었다. 오월 동화 ‘기찻길 옆 동네’를 쓴 김남중 작가의 마지막 문장은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나의 마지막 문장은 “고맙고 또 감사합니다”였다. 아이들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하곤 했는데, 감동한 이들의 반응도 마찬가지였다. “기특하고, 고마운 일”이라는.
문화전당 ‘미디어 월’ 존폐 공론화를
회사로 출퇴근할 때 요즘은 디지털 테마공원 ‘금남나비 정원’으로 이름이 바뀐 옛 금남공원을 지나온다. 나비폭포, 별빛 정원 등이 펼쳐지는 공원에서 휴식을 즐기고, 멋진 모습을 사진에 담는 이들을 본다. 옛 전남도청 외벽에서도 오월 이야기 등을 담은 미디어아트를 만날 수 있다. 전당 안내센터에는 유쾌한 콘셉트의 작품을 송출 중이고, 6월이면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GMAP) 외벽에 대형 파사드 작품도 들어선다. 유네스코 지정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관련 사업들로 2025년까지 180억 원이 투입되는 광주시의 대형 프로젝트다. 5·18 광장 분수대 역시 조만간 미디어아트로 새롭게 탄생한다.
문화전당 주변 등 광주 곳곳이 미디어아트와 함께 변해가는 모습을 보며 옛 전남도청 복원과 함께 철거 예정인 전당의 ‘미디어 월’(Media Wall)을 떠올렸다.
미디어 월은 옛 전남경찰청 건물에서 아시아문화광장으로 이어지는 벽에 설치된 가로 75.2m, 세로 16m의 대형 철골 구조물로 와이드 스크린 두 개를 갖추고 있다.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지정 후인 지난 2017년 26억 원을 들여 설치한 미디어 월은 문화전당이 창·제작한 콘텐츠를 소개하는 등 랜드마크 역할을 해왔다. 4월 현재 송출된 작품은 2400여 건에 달하며 현재도 신규 콘텐츠를 공모 중이다. 문화전당은 지금까지 240여 건의 5월 관련 콘텐츠도 송출했다.
미디어 월은 복원될 옛 전남도청을 가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올해 안에 사라질 운명이다. 하지만 미디어 월과 관련해서는 제대로 된 논의가 진행된 적이 없고, 철거 반대 의견을 내놓는 사람들도 많다. 경찰청 뒤쪽 벽면에 자리하고 있어 도청 원형 복원의 의미를 해치지 않으면서 오히려 예술로 승화된 작품들을 통해 ‘5월 광주’의 미래 가치를 담아낼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이다. 또 시의 발전 동력 중 하나로 문화·관광 사업의 핵심인 미디어아트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존치에 동의하는 사람도 많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실내 밀집 행사를 꺼려하는 상황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하드웨어라는 점도 장점이다.
5·18이 광주 정체성의 핵심이고 우리가 영원히 추구해야 할 가치라는 사실은 자명하다. 하지만 5·18 자체가 많은 사람들의 건전한 의견 개진과 순수한 비판마저도 머뭇거리게 만든다면 그건 분명 문제다. 오월과 관련해 ‘다른’ 이야기를 할 때면 어느 정도 각오를 해야 한다. 이런 저런 이유로 모두가 침묵해 버린다면 5월은 특정인의 이야기에 머물고 만다. 박제화된 오월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
사실, ‘40주년’이라는 큰 산을 넘으며 5월은 광주 사람들에겐 무덤덤한 일상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5월 단체에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이들도 눈에 띈다. 1980년 광주가 경험했듯, 가장 무서운 건 ‘고립’이다. 그래서 미얀마 민주화 운동 때 가장 먼저 손을 내민 것도 광주였다.
‘5월 광주’ 성역이 돼선 안 된다
고(故)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의 말은 인상적이다. “광주가 광주를 너무 내세우면 문화중심도시가 못 돼. 나를 비워야 밖에서 나를 채워. 광주에서 일본을 보고, 중국을 봐야 해.” 광주가 광주를 아시아에 강요하지 않고, 아시아 문화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될 때 진정한 문화 중심 도시가 된다는 설명이다.
이 말은 그대로 ‘5월 광주’에도 적용할 수 있을 듯하다. 광주시민들이 광주 이외의 외부인들에게, 오월 관련 사람들은 다른 광주 시민들에게 너무 자신만을 내세우지는 않았는지, 강요하지는 않았는지, 중심은 비워 두었는지 이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때다.
도시가 역사를 기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정해진 답은 없다. 하지만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토론하고, 의견을 나누는 과정은 필수다. 미디어 월 논의가 ‘5월 광주’라는 거대한 담론을 둘러싼 활발한 논의의 출발점이 되면 좋겠다.
참, ‘시간을 칠하는 사람들’(5월 18~22일 문화전당)은 올해도 상연된다. 놓치기 아까운 작품이다.
/mekim@kwangju.co.kr
문화전당 ‘미디어 월’ 존폐 공론화를
회사로 출퇴근할 때 요즘은 디지털 테마공원 ‘금남나비 정원’으로 이름이 바뀐 옛 금남공원을 지나온다. 나비폭포, 별빛 정원 등이 펼쳐지는 공원에서 휴식을 즐기고, 멋진 모습을 사진에 담는 이들을 본다. 옛 전남도청 외벽에서도 오월 이야기 등을 담은 미디어아트를 만날 수 있다. 전당 안내센터에는 유쾌한 콘셉트의 작품을 송출 중이고, 6월이면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GMAP) 외벽에 대형 파사드 작품도 들어선다. 유네스코 지정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관련 사업들로 2025년까지 180억 원이 투입되는 광주시의 대형 프로젝트다. 5·18 광장 분수대 역시 조만간 미디어아트로 새롭게 탄생한다.
미디어 월은 옛 전남경찰청 건물에서 아시아문화광장으로 이어지는 벽에 설치된 가로 75.2m, 세로 16m의 대형 철골 구조물로 와이드 스크린 두 개를 갖추고 있다.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지정 후인 지난 2017년 26억 원을 들여 설치한 미디어 월은 문화전당이 창·제작한 콘텐츠를 소개하는 등 랜드마크 역할을 해왔다. 4월 현재 송출된 작품은 2400여 건에 달하며 현재도 신규 콘텐츠를 공모 중이다. 문화전당은 지금까지 240여 건의 5월 관련 콘텐츠도 송출했다.
미디어 월은 복원될 옛 전남도청을 가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올해 안에 사라질 운명이다. 하지만 미디어 월과 관련해서는 제대로 된 논의가 진행된 적이 없고, 철거 반대 의견을 내놓는 사람들도 많다. 경찰청 뒤쪽 벽면에 자리하고 있어 도청 원형 복원의 의미를 해치지 않으면서 오히려 예술로 승화된 작품들을 통해 ‘5월 광주’의 미래 가치를 담아낼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이다. 또 시의 발전 동력 중 하나로 문화·관광 사업의 핵심인 미디어아트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존치에 동의하는 사람도 많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실내 밀집 행사를 꺼려하는 상황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하드웨어라는 점도 장점이다.
5·18이 광주 정체성의 핵심이고 우리가 영원히 추구해야 할 가치라는 사실은 자명하다. 하지만 5·18 자체가 많은 사람들의 건전한 의견 개진과 순수한 비판마저도 머뭇거리게 만든다면 그건 분명 문제다. 오월과 관련해 ‘다른’ 이야기를 할 때면 어느 정도 각오를 해야 한다. 이런 저런 이유로 모두가 침묵해 버린다면 5월은 특정인의 이야기에 머물고 만다. 박제화된 오월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
사실, ‘40주년’이라는 큰 산을 넘으며 5월은 광주 사람들에겐 무덤덤한 일상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5월 단체에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이들도 눈에 띈다. 1980년 광주가 경험했듯, 가장 무서운 건 ‘고립’이다. 그래서 미얀마 민주화 운동 때 가장 먼저 손을 내민 것도 광주였다.
‘5월 광주’ 성역이 돼선 안 된다
고(故)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의 말은 인상적이다. “광주가 광주를 너무 내세우면 문화중심도시가 못 돼. 나를 비워야 밖에서 나를 채워. 광주에서 일본을 보고, 중국을 봐야 해.” 광주가 광주를 아시아에 강요하지 않고, 아시아 문화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될 때 진정한 문화 중심 도시가 된다는 설명이다.
이 말은 그대로 ‘5월 광주’에도 적용할 수 있을 듯하다. 광주시민들이 광주 이외의 외부인들에게, 오월 관련 사람들은 다른 광주 시민들에게 너무 자신만을 내세우지는 않았는지, 강요하지는 않았는지, 중심은 비워 두었는지 이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때다.
도시가 역사를 기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정해진 답은 없다. 하지만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토론하고, 의견을 나누는 과정은 필수다. 미디어 월 논의가 ‘5월 광주’라는 거대한 담론을 둘러싼 활발한 논의의 출발점이 되면 좋겠다.
참, ‘시간을 칠하는 사람들’(5월 18~22일 문화전당)은 올해도 상연된다. 놓치기 아까운 작품이다.
/me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