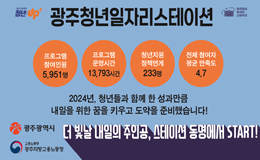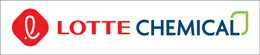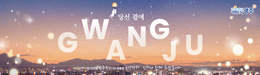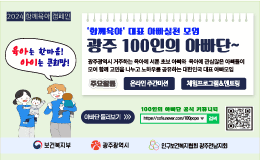백남준이 울산으로 간 까닭은-박진현 제작국장·문화선임기자
 |
최근 울산의 12경(景) 중 하나인 대왕암 공원에 색다른 볼거리가 들어섰다. 지난 1월 옛 방어진중학교에 둥지를 튼 울산시립미술관 분관이다. 추억 속으로 사라진 시골 폐교이기에 그 남루한 외관에서는 세월의 흔적이 묻어난다. 하지만 미술관 안으로 들어서면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 우선 전시장에서 바라보는 대왕암 공원의 앞바다가 빼어난 풍광을 뽐낸다. 하늘 높이 솟은 빼곡한 소나무와 본관 건물에서 바라본 푸른 바다 역시 말 그대로 한 폭의 풍경화다.
그렇다고 그림 같은 ‘오션뷰’만이 미술관의 자랑거리는 아니다. 이곳에서 가장 인상적인 건 ‘소장품전: 찬란한 날들’에 출품된 세계적인 비디오아티스트 백남준의 작품 ‘거북’(Turtle, 150×600×1000㎝)이다. 텔레비전 모니터 166대를 거북 모양으로 설치한 이 영상 작품은 백남준이 1993년 동양 정신과 서양 기술의 결합을 예술 미학으로 담아낸 걸작이다.
도시 브랜드가 된 미술관 컬렉션
‘거북’이 대왕암 앞바다에 둥지를 틀게 된 건 울산시의 끈질긴 ‘구애’ 덕분이다. 거북이 형상의 울산 반구대 암각화와 작품 ‘거북’이 울산의 문화 정체성을 상징한다고 판단한 울산시가 수년 전부터 소장가인 재미 사업가에게 러브콜을 보낸 것이다. 그렇게 해서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입한 것인데 지난 1월 6일 개관한 울산시립미술관의 소장품 1호가 됐다. 자연과 기술, 산업과 예술의 조화를 내건 울산시립미술관의 비전이 소장가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전언이다.
지난해 구입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은 언론을 통해 미술관 소장품과 전시 일정을 직접 브리핑하기도 했다. 시장으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는데 소장품을 일반에 공개한 데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울산시립미술관은 지난 10여 년간 지역사회와 시민들의 열망이 이뤄 낸 결실이기 때문이다. 사실 울산은 대표적인 공업도시이자 2018년 기준 1인당 평균소득이 가장 높은 광역시이지만, 공립미술관은커녕 변변한 사립미술관 하나 없었다. 이 때문에 울산 시민들은 전시를 보기 위해 부산이나 대구 등으로 원정 관람을 떠나야 했다. 그래 울산은 주머니는 부자여도 마음은 삭막한 ‘문화 불모지’라는 불명예까지 안아야 했다.
하지만 지난 2011년 미술관 건립이 공론화된 이후 원도심에 시립미술관 본관(울산 중구 도서관길 72)과 분관이 개관하면서 지역민들은 가슴 한편에 묻어 둔 문화 향유에 대한 갈증을 말끔히 씻어 낼 수 있게 됐다. 개관과 동시에 평일 1000여 명, 주말 3000여 명이 다녀가며 폭발적인 호응을 보인 것이 이를 증명한다.
울산시립미술관이 개관 두 달 만에 5만 7000여 명의 관람객을 끌어 모은 데에는 차별화된 컬렉션이 있었다. 공업도시의 정체성에 맞게 ‘미디어아트 중심의 미래형 미술관’을 표방한 울산시는 전국 최초로 ‘소장품 기금제’를 도입했다. 그리하여 개관 이전인 2017년부터 지금까지 5년간 140억 원을 적립했다. 대부분의 국공립미술관이 한해 5~10억 원의 예산을 책정에 1년 단위 회계연도에 따라 소장품을 구입하는 것과 달리, 적립된 재원 내에서 작품을 구입하고 남은 기금은 다음 해로 이월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이런 유연한 방식 덕분에 울산시는 수십억 원에 달하는 백남준의 ‘거북’을 비롯해 ‘시스틴 채플’, ‘케이지의 숲, 숲의 계시’ 등 3점을 소장할 수 있었다. 또한 미디어아트의 거장 페터 바이벨, 중국 작가 쑹동, 한국의 이불·문경원·전준호 등 내로라하는 아티스트들의 작품 29점도 손에 넣었다. 여기에 ‘아시아 최고의 컬렉션’을 지향하는 미술관의 로드맵에 맞춰 매년 지속적으로 ‘문제작’들을 구입할 계획이다.
30주년 맞은 GMA의 미래는
올해는 광주시립미술관(GMA: Gwangju Museum of Art)이 개관한 지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다. 지난 1992년 서울을 제외하고는 전국 최초의 공립미술관으로 탄생한 GMA는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모델이자 문화광주의 브랜드로 자리매김해 왔다는 평가다. 그럼에도 전국의 미술애호가들을 광주로 ‘불러들이는’ 파급력 있는 컬렉션을 보유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물론 재일교포 하정웅 씨가 기증한 2500여 점의 작품과 지난해 고 이건희 삼성회장의 유족으로부터 기증받은 ‘이건희 컬렉션’으로 외연이 풍성해지긴 했다.
하지만 광주에서만 볼 수 있는, 그야말로 GMA를 상징하는 걸작들은 그리 많지 않다. ‘민주·평화·인권’을 내걸고 매년 작품들을 구입하고 있지만 한 해 평균 7억 원에 불과한 빠듯한 예산으로는 한 점에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명작은 ‘그림의 떡’일 뿐이다. 게다가 주어진 예산을 쪼개 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나눠주기식’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더욱 쪼들릴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울산시립미술관이 처음 시행한 ‘소장품 기금제’는 문화수도를 자부하는 광주시가 눈여겨봐야 하지 않나 싶다. 미술관의 컬렉션은 도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바로미터이기 때문이다.
이제 21세기 미술관은 단순히 작품을 전시하는 물리적 공간이 아니다. 새로운 30년을 준비해야 하는 GMA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 ‘광주만의’ 컬렉션을 가꿔 가야 하는 이유다. 광주시의 과감한 지원과 열린 마인드가 전제돼야 함은 물론이다. 경쟁력 있는 컬렉션은 도시의 관광 자산이자 브랜드이다.
도시 브랜드가 된 미술관 컬렉션
지난해 구입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은 언론을 통해 미술관 소장품과 전시 일정을 직접 브리핑하기도 했다. 시장으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는데 소장품을 일반에 공개한 데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울산시립미술관은 지난 10여 년간 지역사회와 시민들의 열망이 이뤄 낸 결실이기 때문이다. 사실 울산은 대표적인 공업도시이자 2018년 기준 1인당 평균소득이 가장 높은 광역시이지만, 공립미술관은커녕 변변한 사립미술관 하나 없었다. 이 때문에 울산 시민들은 전시를 보기 위해 부산이나 대구 등으로 원정 관람을 떠나야 했다. 그래 울산은 주머니는 부자여도 마음은 삭막한 ‘문화 불모지’라는 불명예까지 안아야 했다.
하지만 지난 2011년 미술관 건립이 공론화된 이후 원도심에 시립미술관 본관(울산 중구 도서관길 72)과 분관이 개관하면서 지역민들은 가슴 한편에 묻어 둔 문화 향유에 대한 갈증을 말끔히 씻어 낼 수 있게 됐다. 개관과 동시에 평일 1000여 명, 주말 3000여 명이 다녀가며 폭발적인 호응을 보인 것이 이를 증명한다.
울산시립미술관이 개관 두 달 만에 5만 7000여 명의 관람객을 끌어 모은 데에는 차별화된 컬렉션이 있었다. 공업도시의 정체성에 맞게 ‘미디어아트 중심의 미래형 미술관’을 표방한 울산시는 전국 최초로 ‘소장품 기금제’를 도입했다. 그리하여 개관 이전인 2017년부터 지금까지 5년간 140억 원을 적립했다. 대부분의 국공립미술관이 한해 5~10억 원의 예산을 책정에 1년 단위 회계연도에 따라 소장품을 구입하는 것과 달리, 적립된 재원 내에서 작품을 구입하고 남은 기금은 다음 해로 이월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이런 유연한 방식 덕분에 울산시는 수십억 원에 달하는 백남준의 ‘거북’을 비롯해 ‘시스틴 채플’, ‘케이지의 숲, 숲의 계시’ 등 3점을 소장할 수 있었다. 또한 미디어아트의 거장 페터 바이벨, 중국 작가 쑹동, 한국의 이불·문경원·전준호 등 내로라하는 아티스트들의 작품 29점도 손에 넣었다. 여기에 ‘아시아 최고의 컬렉션’을 지향하는 미술관의 로드맵에 맞춰 매년 지속적으로 ‘문제작’들을 구입할 계획이다.
30주년 맞은 GMA의 미래는
올해는 광주시립미술관(GMA: Gwangju Museum of Art)이 개관한 지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다. 지난 1992년 서울을 제외하고는 전국 최초의 공립미술관으로 탄생한 GMA는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모델이자 문화광주의 브랜드로 자리매김해 왔다는 평가다. 그럼에도 전국의 미술애호가들을 광주로 ‘불러들이는’ 파급력 있는 컬렉션을 보유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물론 재일교포 하정웅 씨가 기증한 2500여 점의 작품과 지난해 고 이건희 삼성회장의 유족으로부터 기증받은 ‘이건희 컬렉션’으로 외연이 풍성해지긴 했다.
하지만 광주에서만 볼 수 있는, 그야말로 GMA를 상징하는 걸작들은 그리 많지 않다. ‘민주·평화·인권’을 내걸고 매년 작품들을 구입하고 있지만 한 해 평균 7억 원에 불과한 빠듯한 예산으로는 한 점에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명작은 ‘그림의 떡’일 뿐이다. 게다가 주어진 예산을 쪼개 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나눠주기식’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더욱 쪼들릴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울산시립미술관이 처음 시행한 ‘소장품 기금제’는 문화수도를 자부하는 광주시가 눈여겨봐야 하지 않나 싶다. 미술관의 컬렉션은 도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바로미터이기 때문이다.
이제 21세기 미술관은 단순히 작품을 전시하는 물리적 공간이 아니다. 새로운 30년을 준비해야 하는 GMA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 ‘광주만의’ 컬렉션을 가꿔 가야 하는 이유다. 광주시의 과감한 지원과 열린 마인드가 전제돼야 함은 물론이다. 경쟁력 있는 컬렉션은 도시의 관광 자산이자 브랜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