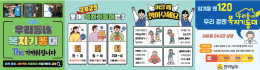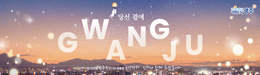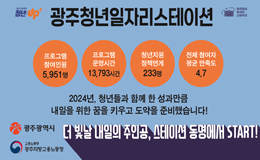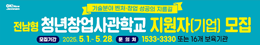2022년, ‘호랭이 물어갈 놈들’-채희종 사회부장 겸 편집부국장
 |
새해 첫날이면 늘 해맞이를 했던 무등산을 못 오른 지 이태가 됐다. 악귀 같은 ‘코로나19’ 탓이다. 신년 아침에 마땅히 할 일을 찾지 못하던 참에, 불현듯 호랑이를 보러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올해가 바로 ‘호랑이해’ 아닌가. 가족과 함께 동물원으로 향했다. 마침 우치동물원은 집에서 3~4분 거리밖에 되지 않는다. 영물의 영험한 기를 받을 요량이었지만, 호랑이는 누워서 좀체 움직이지 않더니 얼마 안 있어 우리로 들어가 버렸다. 비록 호랑이 얼굴을 ‘영접’한 시간은 짧았지만, 올 한 해는 지난해보다 웃는 날이 많은 1년이 되게 해 달라고 기원했다.
옛사람들의 관념 속에 호랑이는 산의 주인인 산군(山君)이자 산신령이었다. 때론 부처나 신의 사자로 여겨졌다. 호랑이는 한민족에게 오랜 세월 신수(神獸)로 받들여졌다. 이런 까닭에 우리나라 영토의 모형을 호랑이로 그리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현대에 와서 호랑이는 88올림픽 마스코트를 거쳐 육군의 마스코트로도 사랑받고 있다.
호환, 하늘의 징벌로 여겼다
하지만 현실에서 호랑이는 가축은 물론 사람까지 닥치는 대로 잡아먹는 맹수의 왕이었다. 그래서 과거 호랑이에게 물려가는 호환(虎患)은 흔히 일어나는 재난이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호환을 불효하거나 조상 모시기를 소홀히 한 사람에 대한 하늘의 징벌로 여기기도 했으니, 양반 집안에서 이를 최고의 치욕으로 생각한 것도 이 때문이다.
조선시대 호환은 지역을 불문하고 나타나는데, 진도 등 섬 지역에서도 횡행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래서 호랑이는 신령스러운 동물임에도 백성들이 살기 위해서 제거해야 하는 대상이기도 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가을과 겨울 두 계절에 걸쳐 호환(虎患)으로 죽은 자가 100명이 넘는다는 기록이 여러 차례 나온다. 호환이 자주 발생한 지역의 관리는 파직되거나 곤장을 맞았다는 내용도 많이 보인다. 오죽했으면 세종 임금이 호랑이 사냥만을 전담하는 착호갑사(捉虎甲士)라는 부대까지 만들었겠는가.
용에 비견될 만큼 신격화된 호랑이는 옛 소설에서도 볼 수 있다. 연암 박지원의 한문 단편소설 ‘호질’(虎叱)이 대표적이다. 물론 소설의 주제는 조선 후기 양반 사회의 부조리를 꿰뚫고 있지만 말이다. ‘호질’이란 말은 ‘범의 호통’ ‘범의 꾸짖음’ 정도로 풀이할 수 있겠다. 소설 속에서 호랑이는 창귀라고 부르는 귀신 수하들을 대동하고 다니는, 절대적인 존재이다. 범에게 잡아 먹힌 뒤 사람에서 귀신이 된 세 창귀는 각기 역할이 다르다. 심부름하는 귀신, 덫이나 함정 등 호랑이에게 위험이 되는 요소를 미리 제거해 주는 귀신, 먹잇감을 불러들이는 귀신이 있다.
온갖 몹쓸 것들 잡아갔으면
어느 날 창귀로부터 선비를 먹잇감으로 추천받은 범이 마을로 내려온다. “대저 제 것 아닌 물건에 손을 대는 놈을 일러 도적놈이라 하고, 살아 있는 것을 잔인하게 대하고 사물에 해를 끼치는 놈을 화적놈이라고 하느니라. 네놈들은 밤낮을 쏘다니며 분주하게 팔뚝을 걷어붙이고 눈을 부릅뜨고 남의 것을 훔치고 낚아채려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 심한 놈은 돈을 형님이라고 부르고, 출세를 위해 마누라까지 파는 세상이니 삼강오륜을 더 이야기할 나위가 있겠느냐?” 범이 위선에 가득한 선비를 코앞에서 호통치는 장면이다. 240년 전 ‘범의 꾸짖음’ 이 지금까지도 유효함이 신기할 따름이다.
소설 속 호랑이의 호통처럼 21세기에 범이 내려온다면 누구부터 잡아먹을까? 그 대상이 어찌 한둘일까마는, 오직 돈밖에 몰라 이윤을 챙기느라 발생한 ‘안전사고’라는 놈만큼은 반드시 물어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69명-71명-68명-72명-68명, 최근 5년 동안 광주·전남의 산업현장에서 안전사고로 숨진 사망자의 수이다. 매년 70명이 산업 현장에서 추락하거나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특히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 건물 붕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대형 재난이 발생했으니, 오로지 돈만을 좇아 안전을 도외시한 그들 공사 관계자들도 호랑이 앞에 세우고 싶다. 아울러 여전히 온라인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을 북한군의 사주로 여기는 꼴통들도 물어 갔으면 좋겠다. 세상의 온갖 몹쓸 것들, 그중에 오미크론만큼은 꼭 물어 가기를. 그래서 하루빨리 심간 편한 세상이 오기를.
하지만 현실에서 호랑이는 가축은 물론 사람까지 닥치는 대로 잡아먹는 맹수의 왕이었다. 그래서 과거 호랑이에게 물려가는 호환(虎患)은 흔히 일어나는 재난이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호환을 불효하거나 조상 모시기를 소홀히 한 사람에 대한 하늘의 징벌로 여기기도 했으니, 양반 집안에서 이를 최고의 치욕으로 생각한 것도 이 때문이다.
조선시대 호환은 지역을 불문하고 나타나는데, 진도 등 섬 지역에서도 횡행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래서 호랑이는 신령스러운 동물임에도 백성들이 살기 위해서 제거해야 하는 대상이기도 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가을과 겨울 두 계절에 걸쳐 호환(虎患)으로 죽은 자가 100명이 넘는다는 기록이 여러 차례 나온다. 호환이 자주 발생한 지역의 관리는 파직되거나 곤장을 맞았다는 내용도 많이 보인다. 오죽했으면 세종 임금이 호랑이 사냥만을 전담하는 착호갑사(捉虎甲士)라는 부대까지 만들었겠는가.
용에 비견될 만큼 신격화된 호랑이는 옛 소설에서도 볼 수 있다. 연암 박지원의 한문 단편소설 ‘호질’(虎叱)이 대표적이다. 물론 소설의 주제는 조선 후기 양반 사회의 부조리를 꿰뚫고 있지만 말이다. ‘호질’이란 말은 ‘범의 호통’ ‘범의 꾸짖음’ 정도로 풀이할 수 있겠다. 소설 속에서 호랑이는 창귀라고 부르는 귀신 수하들을 대동하고 다니는, 절대적인 존재이다. 범에게 잡아 먹힌 뒤 사람에서 귀신이 된 세 창귀는 각기 역할이 다르다. 심부름하는 귀신, 덫이나 함정 등 호랑이에게 위험이 되는 요소를 미리 제거해 주는 귀신, 먹잇감을 불러들이는 귀신이 있다.
온갖 몹쓸 것들 잡아갔으면
어느 날 창귀로부터 선비를 먹잇감으로 추천받은 범이 마을로 내려온다. “대저 제 것 아닌 물건에 손을 대는 놈을 일러 도적놈이라 하고, 살아 있는 것을 잔인하게 대하고 사물에 해를 끼치는 놈을 화적놈이라고 하느니라. 네놈들은 밤낮을 쏘다니며 분주하게 팔뚝을 걷어붙이고 눈을 부릅뜨고 남의 것을 훔치고 낚아채려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 심한 놈은 돈을 형님이라고 부르고, 출세를 위해 마누라까지 파는 세상이니 삼강오륜을 더 이야기할 나위가 있겠느냐?” 범이 위선에 가득한 선비를 코앞에서 호통치는 장면이다. 240년 전 ‘범의 꾸짖음’ 이 지금까지도 유효함이 신기할 따름이다.
소설 속 호랑이의 호통처럼 21세기에 범이 내려온다면 누구부터 잡아먹을까? 그 대상이 어찌 한둘일까마는, 오직 돈밖에 몰라 이윤을 챙기느라 발생한 ‘안전사고’라는 놈만큼은 반드시 물어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69명-71명-68명-72명-68명, 최근 5년 동안 광주·전남의 산업현장에서 안전사고로 숨진 사망자의 수이다. 매년 70명이 산업 현장에서 추락하거나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특히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 건물 붕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대형 재난이 발생했으니, 오로지 돈만을 좇아 안전을 도외시한 그들 공사 관계자들도 호랑이 앞에 세우고 싶다. 아울러 여전히 온라인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을 북한군의 사주로 여기는 꼴통들도 물어 갔으면 좋겠다. 세상의 온갖 몹쓸 것들, 그중에 오미크론만큼은 꼭 물어 가기를. 그래서 하루빨리 심간 편한 세상이 오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