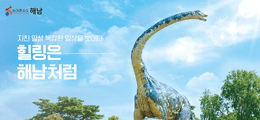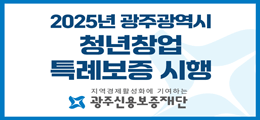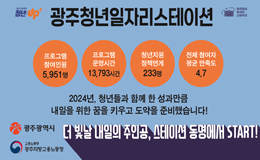도시를 바꾸는 사소한 것들-박진현 제작국장·문화선임기자
 박진현 제작국장·문화선임기자 |
두어 달 전, 독일 베를린에 들렀다. 중앙역 앞 횡단보도에 서자 독특한 모양의 신호등이 눈에 띄었다. ‘암펠만’(Ampelmann·신호등과 남자의 합성어)이라 불리는 신호등 속에는 중절모자를 쓴 땅딸막한 남자가 서 있었다. 파란불에 굵고 짧은 다리로 걸어가던 이 남자는 빨간불이 되면 허수아비처럼 두 팔을 벌리고 선다. 참 신기하다 느꼈는데, 이 남자는 비단 이곳에만 있는 게 아니었다. 베를린의 주요 횡단보도는 물론 핫플레이스에서도 ‘모자 쓴 남자’를 쉽게 볼 수 있었다. 유명 백화점의 기념품 매장과 관광명소에서 암펠만이 선명하게 새겨진 T셔츠, 가방, 노트, 텀블러, 장난감, 접시를 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암펠만이 베를린에 등장하게 된 건 독일 분단시절인 1961년부터다. 당시 동독에서는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어린이와 노인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크게 늘어났다. 전체 인구의 10%가 신호등 색깔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는 게 한 원인이었다. 급기야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자 교통 심리학자 칼 페글라우는 ‘사람들은 호감을 주는 캐릭터나 상징에 더 빨리 반응을 한다’고 주장하며 ‘사람 신호등’을 제안했다. 이렇게 탄생한 암펠만은 동베를린의 교통사고율을 40%까지 감소시키며 공공디자인의 힘을 보여 준 모범 사례가 됐다.
‘암펠만’과 ‘코펜하겐 벤치’
암펠만이 베를린의 상징이라면 ‘초록색 벤치’는 코펜하겐의 아이콘이다. 덴마크의 코펜하겐을 여행하다 보면 하루에도 여러 차례 ‘클래식한 의자’에 시선을 빼앗기게 된다. 초록색 나무와 철제로 디자인된 벤치는 공원에서부터 공항이나 미술관까지 도시 곳곳에 2000여 개가 설치돼 강렬한 존재감을 뽐낸다. 100여 년 전, 시민들의 쉼터로 처음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벤치는 이제 디자인 강국의 면모를 보여 주는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국내에도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삭막한 도시의 이미지를 바꾸는 곳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다. 지난 2018년 서울 서초구가 첫선을 보인 박스형 가로수 프로젝트가 대표적인 예다. 당시 서초구는 무성하게 자란 가로수가 신호등과 교통표지판을 가려 보행자 안전과 도심 경관에 장애물이 되자 사각형의 가로수 정비 사업을 진행했다. 무분별한 가지치기로 흉물이 된 가로수를 네모 형태로 깔끔하게 손질해 파리의 명물로 바꾼 프랑스 상젤리제 거리에서 영감을 얻었다. 실제로 서초구 반포대로와 서초대로, 방배로 등 주요 도로변에 있는 가로수 1176주를 ‘사각 가지치기’로 정리해 도심의 미관을 개선하면서 부산·대구·인천·수원 등 전국 지자체들의 벤치마킹이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도시의 거리는 크고 작은 공공디자인으로 저마다의 풍경을 연출한다. 그리고 이제는 평소 눈여겨보지 않았던 벤치나 가로수, 광고 간판, 공사장 가림막 등이 우리의 일상 속으로 깊게 들어오고 있다.
차별화된 공공디자인 절실
하지만 아시아의 문화수도를 꿈꾸는 광주는 화려한 청사진에 올인한 탓인지 소시민들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사소한 것들’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다. 아파트 숲으로 둘러싸인 삭막한 도심은 말할 것도 없고, 공원·벤치·교통표지판·광고간판 등에서 광주만의 정체성을 보여 주는 차별화된 공공디자인을 찾아보기 힘들다. 지난 2005년 창설된 이후 9회째 이어지고 있는 ‘디자인비엔날레’ 개최지라는 사실이 무색하게 말이다.
그런 점에서 누적 다운로드 5억 건을 기록한 인기 팟캐스트 ‘보이지 않는 99%’의 프로듀서 커트가 강조한 ‘도시를 움직이는 디테일’은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도시를 기능하게 하고, 도시민의 삶이 반영되는 것들 대부분은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고 지나치는 것들이나 발에 차이는 것들이다.”
사실, 도시의 품격과 시민의 삶을 결정하는 척도는 화려한 인프라가 아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문화도시인 빈·파리·뉴욕의 공통점은 숲·공원·벤치 등 삶의 질을 높이는 공공 구조물이 잘 갖춰져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 도시의 경쟁력을 끌어올린 건 공공디자인이었다. 작은 시설물 하나라도 사람 중심으로 설계해 명품 도시로 가꾼 것이다.
어느덧 한 해의 끄트머리에 섰다. 오는 2022년에는 아시아예술공원, 광주비엔날레재단 전시관, 아시아디지털아트 아카이빙플랫폼 등 초대형 문화 건축 프로젝트에서부터 일신방직과 전방 부지 개발 사업, 중앙근린공원 특례 사업 등 광주의 미래를 바꿀 대역사들이 줄줄이 이어진다. 하지만 자칫 거대한 ‘랜드마크’에 매몰돼 일상의 소소한 것들을 놓치게 된다면 허울뿐인 문화도시가 될 수 있다.
다행인 것은, 최근 광주혁신추진위원회가 ‘광주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미래혁신’의 중점 과제로 사람·자연·문화적 감성이 어우러진 걷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고 나섰다는 점이다. 코로나19로 사람 중심의 가치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좋은 일이긴 하지만 이번 광주혁신추진위원회의 제안이 구두선에 그치지 않으려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디자인 전략’이 전제돼야 할 터다. 살기 좋은 도시는 ‘보이지 않는 99%’, 그 디테일에서 결정되는 법이니까.
암펠만이 베를린의 상징이라면 ‘초록색 벤치’는 코펜하겐의 아이콘이다. 덴마크의 코펜하겐을 여행하다 보면 하루에도 여러 차례 ‘클래식한 의자’에 시선을 빼앗기게 된다. 초록색 나무와 철제로 디자인된 벤치는 공원에서부터 공항이나 미술관까지 도시 곳곳에 2000여 개가 설치돼 강렬한 존재감을 뽐낸다. 100여 년 전, 시민들의 쉼터로 처음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벤치는 이제 디자인 강국의 면모를 보여 주는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국내에도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삭막한 도시의 이미지를 바꾸는 곳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다. 지난 2018년 서울 서초구가 첫선을 보인 박스형 가로수 프로젝트가 대표적인 예다. 당시 서초구는 무성하게 자란 가로수가 신호등과 교통표지판을 가려 보행자 안전과 도심 경관에 장애물이 되자 사각형의 가로수 정비 사업을 진행했다. 무분별한 가지치기로 흉물이 된 가로수를 네모 형태로 깔끔하게 손질해 파리의 명물로 바꾼 프랑스 상젤리제 거리에서 영감을 얻었다. 실제로 서초구 반포대로와 서초대로, 방배로 등 주요 도로변에 있는 가로수 1176주를 ‘사각 가지치기’로 정리해 도심의 미관을 개선하면서 부산·대구·인천·수원 등 전국 지자체들의 벤치마킹이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도시의 거리는 크고 작은 공공디자인으로 저마다의 풍경을 연출한다. 그리고 이제는 평소 눈여겨보지 않았던 벤치나 가로수, 광고 간판, 공사장 가림막 등이 우리의 일상 속으로 깊게 들어오고 있다.
차별화된 공공디자인 절실
하지만 아시아의 문화수도를 꿈꾸는 광주는 화려한 청사진에 올인한 탓인지 소시민들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사소한 것들’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다. 아파트 숲으로 둘러싸인 삭막한 도심은 말할 것도 없고, 공원·벤치·교통표지판·광고간판 등에서 광주만의 정체성을 보여 주는 차별화된 공공디자인을 찾아보기 힘들다. 지난 2005년 창설된 이후 9회째 이어지고 있는 ‘디자인비엔날레’ 개최지라는 사실이 무색하게 말이다.
그런 점에서 누적 다운로드 5억 건을 기록한 인기 팟캐스트 ‘보이지 않는 99%’의 프로듀서 커트가 강조한 ‘도시를 움직이는 디테일’은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도시를 기능하게 하고, 도시민의 삶이 반영되는 것들 대부분은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고 지나치는 것들이나 발에 차이는 것들이다.”
사실, 도시의 품격과 시민의 삶을 결정하는 척도는 화려한 인프라가 아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문화도시인 빈·파리·뉴욕의 공통점은 숲·공원·벤치 등 삶의 질을 높이는 공공 구조물이 잘 갖춰져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 도시의 경쟁력을 끌어올린 건 공공디자인이었다. 작은 시설물 하나라도 사람 중심으로 설계해 명품 도시로 가꾼 것이다.
어느덧 한 해의 끄트머리에 섰다. 오는 2022년에는 아시아예술공원, 광주비엔날레재단 전시관, 아시아디지털아트 아카이빙플랫폼 등 초대형 문화 건축 프로젝트에서부터 일신방직과 전방 부지 개발 사업, 중앙근린공원 특례 사업 등 광주의 미래를 바꿀 대역사들이 줄줄이 이어진다. 하지만 자칫 거대한 ‘랜드마크’에 매몰돼 일상의 소소한 것들을 놓치게 된다면 허울뿐인 문화도시가 될 수 있다.
다행인 것은, 최근 광주혁신추진위원회가 ‘광주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미래혁신’의 중점 과제로 사람·자연·문화적 감성이 어우러진 걷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고 나섰다는 점이다. 코로나19로 사람 중심의 가치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좋은 일이긴 하지만 이번 광주혁신추진위원회의 제안이 구두선에 그치지 않으려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디자인 전략’이 전제돼야 할 터다. 살기 좋은 도시는 ‘보이지 않는 99%’, 그 디테일에서 결정되는 법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