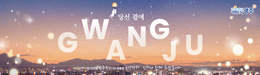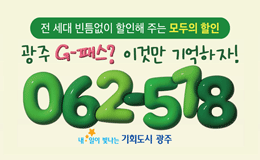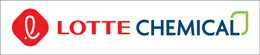[윤영기 체육부장] ‘끝났지만 끝나지 않은’ 부끄러운 선거
 |
“끝났지만 끝난 게 아니다.” 지난달 13일 치러진 광주시체육회장 보궐선거 결과를 지켜보며 문득 이런 문구가 떠올랐다. 체육인들은 이상동 후보를 회장으로 선택했다. 이제 광주 체육계는 그와 짐을 나눠 져야 할 처지가 됐지만 그는 현재 형사사건 피고인이다. 변호사법 위반, 업무상 횡령,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번 송사는 체육회 업무와 무관하지만 그가 체육회장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공공의 문제가 됐다. 광주체육을 ‘걱정해’ 출마했던 그를 이젠 체육계가 ‘염려해야’ 할 처지다. 체육계는 이 상황을 감내해야만 한다. 그를 뽑은 당사자들이 바로 체육계이기 때문이다.
어쩌다 개혁 주체 아닌 대상이 됐나
얼마 전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했던 낙선자 두 명은 법원에 선거무효소송과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무자격 유권자 46명이 투표해 참가해 표결함으로써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내용이 골자다. 체육인들은 당분간 법정에서 눈을 뗄 수 없게 됐다. 법원 판단에 따라 광주체육회는 물론 체육회장 선관위와 낙선자들의 시비가 가려질 것이다.
하지만 정작 주목해야 할 것은 법원의 심판이 아니라 가처분 신청의 피고가 광주시체육회라는 사실이다. 시체육회가 소송 당사자라는 의미는 선거를 주재한 광주체육회의 공정성이 심판대에 올랐다는 얘기다. 선거 후유증이 법정으로 번졌다는 사실보다 더 무겁고 두려운 일이다.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체육회가 자초한 불공정 프레임은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더 뼈아픈 사실은 민선 들어 전국 시도 체육회 가운데 처음으로 보궐선거를 치른 광주가 타 시도에게는 답습하지 않아야할 전철로 남았다는 점이다. ‘선거가 끝난 마당에 깨끗이 승복하지 않는 옹졸한 행위’라고 낙선자들을 비난해선 안 된다. 선거는 ‘오심도 경기의 일부’로 간주하고 넘어가는 운동 경기가 아니다. 광주체육의 미래 지도자를 뽑는 일이다. 여기에 불공정과 부당의 소지가 있다면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 할 대상이다. 이런 기초적인 분별마저 없다면 광주체육에는 희망이 없다.
사실 송사와 논란을 초래한 원죄는 선거를 설계한 광주시체육회에 있다. 애초 불공정 시비는 체육회가 마련한 유권자 가이드라인에서부터 불거졌다. 유권자 선정에서 종목 단체 60개 가운데 절반가량을 배제했기 때문이다. 체육회는 ‘참정권 제한’이라는 체육계의 이의 제기와 거센 항의에도 어물쩍 넘어가려 했다.
이 문제를 거듭 지적했던 한 선관위원은 “선거인수 배정 기준 등에 불공정 소지가 있는 선거 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항의하며 사퇴했다. 이후 체육회에서 유권자 가이드라인을 수정하면서 논란이 일단락됐지만, 중견 언론인인 그가 직을 던지면서까지 각성을 촉구하지 않았더라면 진즉 판이 깨졌을 것이다.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무자격 유권자 가처분신청에 앞서 선거 중지 가처분신청이 먼저 제기돼 선거가 장기간 표류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공정성 심판대에 오른 광주체육회
광주시체육회가 중립과 공정을 의심받는 대목은 또 있다. 선거 업무를 담당하는 한 간부가 업무에서 배제된 데 이어 또 다른 간부와 함께 선거 중립 의무 위반 혐의로 구설수에 오른 것이다. 이들은 ‘생활체육계를 지원한다는 의심’을 샀으나 선관위에서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그렇다고 이들의 사려 깊지 못한 행동까지 면죄부를 받기는 어렵다.
체육계에는 이미 올 초부터 “체육회장이 일신상 사유로 사임할 것이고 그에 맞춰 특정 진영에서 후보자를 옹립하기 위해 인사들을 접촉하고 있다. 체육회 일부 직원도 움직이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들이 진즉 체육회를 둘러싼 소문에 귀를 기울이고 경계했더라면 선거 업무를 맡는 사람으로서 선관위 심판대에 오르는 치욕은 없었을 것이다. 또한 ‘체육회가 특정 진영과 후보를 밀고 있다’는 등의 이야기(기획설)를 듣지 않아도 됐을 것이다.
광주 체육계를 절망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지점은 선거에서 드러난 부패다. 물론 이번 선거는 대의원 284명이 투표하는 간접선거 방식이어서 이전부터 금품을 돌릴 수 있다는 얘기가 나돌긴 했다. 그래도, 아무리 맘만 먹으면 가능한 일이라 해도, 지금은 21세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다. 한데 한 후보로부터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하며 선거운동을 자청하거나 표를 팔겠다고 나서는 이가 한둘이 아니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심지어 상대편의 약점을 들고 와서 그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제안도 받았다고 한다.
이러한 선거 브로커들의 행위가 표심에 영향을 미쳤다면 체육회장 선거는 참담한 실패이며 이를 근절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연거푸 실패할 것이 자명하다. 광주체육회는 여러 곡절 끝에 회장을 뽑았지만 잃은 게 적지 않다. 그중 공정과 신뢰 상실은 치명적이다. 이번 선거에서 얻은 게 있다면 단 하나, 광주 체육계는 여전히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이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한 점이다.
/penfoot@kwangju.co.kr
어쩌다 개혁 주체 아닌 대상이 됐나
얼마 전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했던 낙선자 두 명은 법원에 선거무효소송과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무자격 유권자 46명이 투표해 참가해 표결함으로써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내용이 골자다. 체육인들은 당분간 법정에서 눈을 뗄 수 없게 됐다. 법원 판단에 따라 광주체육회는 물론 체육회장 선관위와 낙선자들의 시비가 가려질 것이다.
더 뼈아픈 사실은 민선 들어 전국 시도 체육회 가운데 처음으로 보궐선거를 치른 광주가 타 시도에게는 답습하지 않아야할 전철로 남았다는 점이다. ‘선거가 끝난 마당에 깨끗이 승복하지 않는 옹졸한 행위’라고 낙선자들을 비난해선 안 된다. 선거는 ‘오심도 경기의 일부’로 간주하고 넘어가는 운동 경기가 아니다. 광주체육의 미래 지도자를 뽑는 일이다. 여기에 불공정과 부당의 소지가 있다면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 할 대상이다. 이런 기초적인 분별마저 없다면 광주체육에는 희망이 없다.
사실 송사와 논란을 초래한 원죄는 선거를 설계한 광주시체육회에 있다. 애초 불공정 시비는 체육회가 마련한 유권자 가이드라인에서부터 불거졌다. 유권자 선정에서 종목 단체 60개 가운데 절반가량을 배제했기 때문이다. 체육회는 ‘참정권 제한’이라는 체육계의 이의 제기와 거센 항의에도 어물쩍 넘어가려 했다.
이 문제를 거듭 지적했던 한 선관위원은 “선거인수 배정 기준 등에 불공정 소지가 있는 선거 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항의하며 사퇴했다. 이후 체육회에서 유권자 가이드라인을 수정하면서 논란이 일단락됐지만, 중견 언론인인 그가 직을 던지면서까지 각성을 촉구하지 않았더라면 진즉 판이 깨졌을 것이다.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무자격 유권자 가처분신청에 앞서 선거 중지 가처분신청이 먼저 제기돼 선거가 장기간 표류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공정성 심판대에 오른 광주체육회
광주시체육회가 중립과 공정을 의심받는 대목은 또 있다. 선거 업무를 담당하는 한 간부가 업무에서 배제된 데 이어 또 다른 간부와 함께 선거 중립 의무 위반 혐의로 구설수에 오른 것이다. 이들은 ‘생활체육계를 지원한다는 의심’을 샀으나 선관위에서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그렇다고 이들의 사려 깊지 못한 행동까지 면죄부를 받기는 어렵다.
체육계에는 이미 올 초부터 “체육회장이 일신상 사유로 사임할 것이고 그에 맞춰 특정 진영에서 후보자를 옹립하기 위해 인사들을 접촉하고 있다. 체육회 일부 직원도 움직이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들이 진즉 체육회를 둘러싼 소문에 귀를 기울이고 경계했더라면 선거 업무를 맡는 사람으로서 선관위 심판대에 오르는 치욕은 없었을 것이다. 또한 ‘체육회가 특정 진영과 후보를 밀고 있다’는 등의 이야기(기획설)를 듣지 않아도 됐을 것이다.
광주 체육계를 절망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지점은 선거에서 드러난 부패다. 물론 이번 선거는 대의원 284명이 투표하는 간접선거 방식이어서 이전부터 금품을 돌릴 수 있다는 얘기가 나돌긴 했다. 그래도, 아무리 맘만 먹으면 가능한 일이라 해도, 지금은 21세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다. 한데 한 후보로부터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하며 선거운동을 자청하거나 표를 팔겠다고 나서는 이가 한둘이 아니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심지어 상대편의 약점을 들고 와서 그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제안도 받았다고 한다.
이러한 선거 브로커들의 행위가 표심에 영향을 미쳤다면 체육회장 선거는 참담한 실패이며 이를 근절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연거푸 실패할 것이 자명하다. 광주체육회는 여러 곡절 끝에 회장을 뽑았지만 잃은 게 적지 않다. 그중 공정과 신뢰 상실은 치명적이다. 이번 선거에서 얻은 게 있다면 단 하나, 광주 체육계는 여전히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이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한 점이다.
/penfoot@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