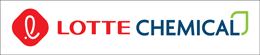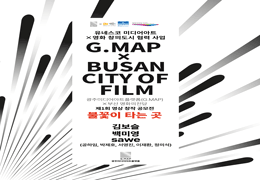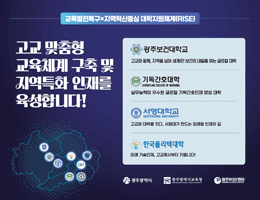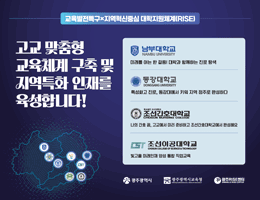누가 외눈박이들의 소란을 두려워하랴!
 심옥숙 인문지행 대표 |
있을 수 없는 일이 현실이 될 때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부터가 하나의 실천’이라는 말은 백번 맞다. 여기서 이해한다는 것은 무조건 지지나 반대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태의 전말과 이면을 파악한 후 판단한다는 의미다. 요 며칠 사이에 법과 윤리를 초월하는 선민의식으로 충만한 특정 집단들이 자기 우상화(집단이기주의)에 빠져 독점적 기득권을 사수하려 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 방식과 이로 인한 결과적 상황이다.
키클롭스는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에 나오는 이마 한가운데에 눈이 하나만 있는 외눈박이 거인이자 식인 괴물이다. 그래서 좌우를 못 보고 정면만 볼 수 있는 이 괴물은 거대한 몸집과 목소리부터 공포감을 준다. 물론 성격도 좋을 리 없다. 무례하고 오만불손하며 난폭해서, 올림포스산에 사는 신들은 물론이고 신들의 왕이라는 제우스조차도 무시하는 무법자다.
이런 키클롭스에게도 형제와 가족이 있지만, 호메로스에 의하면 공동체 의식과 회의장이나 법 같은 것이 애당초 없으니, 뭐든 마음대로 하면 그것이 곧 법이다. 당연히 키클롭스들은 ‘제 손으로’ 노동하는 일도 없다. 동굴 속에 모여 살면서 제멋대로 무고한 사람들을 잡아먹을 뿐이다. 키클롭스가 의기양양해서 하는 말이 있다. “이봐, 나그네, 우리는 하늘에 있는 어떤 신도 신경 쓰지 않아. 우리가 훨씬 더 강하기 때문이지. 제우스의 분노가 두려워 내가 그대나 그대의 전우들을 아껴 두는 일은 없어. 내 마음이 그러고 싶다면 모를까.”
키클롭스는 자신이 법이며 절대권력자라고 호통을 친다. 그런데 키클롭스에게서 보는 것은 정작 어리석고 어리석은 외눈박이의 야만성과 파괴적 폭력성이다. 키클롭스의 행태는 오디세이가 고향으로 돌아가기까지 꼬박 10년을 바다 위에서 떠돌게 하는 발단이 되지만, 그러나 오디세이는 포기하지 않고 끝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에 성공한다.
여기서 눈에 들어오는 것은 키클롭스의 특징이다. 이들에게는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치들이 무의미하다. 공동체적 윤리와 법, 서로의 의견을 듣는 공론의 장소도 없이 동굴 생활을 하면서 제멋대로 타인을 잡아먹는 야만적인 모습뿐이다. 더구나 애써 몸을 써서 노동하지 않으면서도 과도한 풍요를 누린다.
이 키클롭스의 신화가 우리 시대에 대한 의미심장한 비유로 읽히는 것은 현실 상황과 중첩되는 지점들이 확연하기 때문이다. 키클롭스에게는 자신들에게 이로운 것 이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키클롭스는 괴물일 수밖에 없다. 공동체의 윤리도, 법도 없이 자신의 어두운 동굴 깊숙이 갇혀 살면서, 타인에게 한계를 넘어서는 희생을 강요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유명한 명제는 인간이 ‘인간’이 되는 절대 조건을 말한다. 사람은 홀로 살아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만 서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타인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비로소 ‘인간’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반면, 공동체와 비슷해 보이지만 이해관계를 도모하는 사람들끼리 숫자의 힘과 권위를 통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는 것은 집단주의에 지나지 않는다.
바로 이 지점에서 공동체 의식과 집단주의가 서로 다른 지향점을 보여 주는데, 집단주의의 본질은 ‘키클롭스 콤플렉스’에 의한 시각의 표출이다. 다시 말하면, 오직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보는 외눈의 편향된 시각과 판단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외눈박이 키클롭스에게 두눈박이의 공동체는 불신과 부정의 대상이다.
모두가 예외 없이 두눈박이로 사는 ‘완전한 세상’에서 사는 것은 어렵지만, 불행한 외눈박이가 되지 않기 위한 스스로의 노력은 언제 어디서나 가능하다. 이 노력만이 서로를 맹목적으로 외눈박이라고 비난하는 ‘키클롭스 콤플렉스’를 멈출 수 있다. 이웃도 미래도 없는 어두운 동굴에 사는 외눈박이의 시야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외눈박이의 폭주는 불안감 대신 외눈박이 괴물이 되지 않기 위한 성찰의 중요성을 깨우치게 한다. 이러한 성찰의 시간이 지금보다 더 절실한 때가 있겠는가.
키클롭스는 자신이 법이며 절대권력자라고 호통을 친다. 그런데 키클롭스에게서 보는 것은 정작 어리석고 어리석은 외눈박이의 야만성과 파괴적 폭력성이다. 키클롭스의 행태는 오디세이가 고향으로 돌아가기까지 꼬박 10년을 바다 위에서 떠돌게 하는 발단이 되지만, 그러나 오디세이는 포기하지 않고 끝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에 성공한다.
여기서 눈에 들어오는 것은 키클롭스의 특징이다. 이들에게는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치들이 무의미하다. 공동체적 윤리와 법, 서로의 의견을 듣는 공론의 장소도 없이 동굴 생활을 하면서 제멋대로 타인을 잡아먹는 야만적인 모습뿐이다. 더구나 애써 몸을 써서 노동하지 않으면서도 과도한 풍요를 누린다.
이 키클롭스의 신화가 우리 시대에 대한 의미심장한 비유로 읽히는 것은 현실 상황과 중첩되는 지점들이 확연하기 때문이다. 키클롭스에게는 자신들에게 이로운 것 이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키클롭스는 괴물일 수밖에 없다. 공동체의 윤리도, 법도 없이 자신의 어두운 동굴 깊숙이 갇혀 살면서, 타인에게 한계를 넘어서는 희생을 강요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유명한 명제는 인간이 ‘인간’이 되는 절대 조건을 말한다. 사람은 홀로 살아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만 서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타인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비로소 ‘인간’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반면, 공동체와 비슷해 보이지만 이해관계를 도모하는 사람들끼리 숫자의 힘과 권위를 통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는 것은 집단주의에 지나지 않는다.
바로 이 지점에서 공동체 의식과 집단주의가 서로 다른 지향점을 보여 주는데, 집단주의의 본질은 ‘키클롭스 콤플렉스’에 의한 시각의 표출이다. 다시 말하면, 오직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보는 외눈의 편향된 시각과 판단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외눈박이 키클롭스에게 두눈박이의 공동체는 불신과 부정의 대상이다.
모두가 예외 없이 두눈박이로 사는 ‘완전한 세상’에서 사는 것은 어렵지만, 불행한 외눈박이가 되지 않기 위한 스스로의 노력은 언제 어디서나 가능하다. 이 노력만이 서로를 맹목적으로 외눈박이라고 비난하는 ‘키클롭스 콤플렉스’를 멈출 수 있다. 이웃도 미래도 없는 어두운 동굴에 사는 외눈박이의 시야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외눈박이의 폭주는 불안감 대신 외눈박이 괴물이 되지 않기 위한 성찰의 중요성을 깨우치게 한다. 이러한 성찰의 시간이 지금보다 더 절실한 때가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