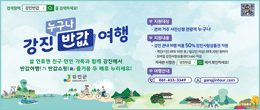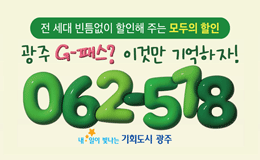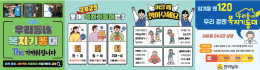‘나비효과’로 번진 나주 SRF 발전소
 |
광주·전남이 공동으로 조성한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의 현안은 한전공대 설립과 공동발전기금 조성 등이다. 하지만 요즘 가장 ‘핫한’ 문제는 SRF 열병합발전소 가동을 둘러싼 논란일 것이다. SRF 열병합발전소는 빛가람혁신도시 내 주거지와 상업 및 공공시설에 난방을 공급하는 시설이다. LNG(액화천연가스)와 SRF(고형 폐기물 연료)를 연료로 사용하는데, 문제는 플라스틱 등 가연성 쓰레기로 만든 SRF의 인체 유해 논란으로 발전소 가동이 2년째 중단되고 있다는 점이다.
급기야 불똥이 광주시 쓰레기 대란 우려로 튀었다. 나주 SRF발전소에서 광주 양과동에 생산한 SRF를 가져다 사용하기로 했는데 발전소가 가동을 못하면서 양과동 제조 공장도 멈춰 섰기 때문이다.
가연성 쓰레기를 SRF로 만들지 못하면서 양과동 광역매립장 반입량이 급증하자 매립장 측이 가연성 쓰레기 반입 중단 조치를 내렸고 이런 조치가 연쇄적으로 가연성 쓰레기 처리량 증가와 처리 비용 폭증을 불렀다. 경영난에 처한 수거 업체들이 가연성 쓰레기 수거를 거부할 경우 광주는 하반기에 쓰레기 대란이 현실화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나주 SRF발전소 가동 중단 장기화가 나비효과로 작용해 SRF는 이제 나주와 전남(SRF 생산시설이 목포·순천에도 있다)만의 문제가 아니라 광주까지 포함한 광역 쓰레기 문제가 된 것이다.
그렇다면 해법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우선은 나주 SRF 문제를 조율하고 있는 민관협력 거버넌스에 맡기는 것이 순서다. 민간협력 거버넌스는 이해 당사자인 한국난방공사(발전소 사업자)와 혁신도시 주민들로 구성된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 산업자원부, 전남도, 나주시 등 5자로 구성됐다. 지난 1월 활동에 들어가 지금까지 9차례 회의를 갖고 합의점 도출에 힘을 쏟고 있지만 해법을 마련하지는 못했다. 그나마 지난 17일 열린 9차 회의에서 핵심 쟁점인 환경영향조사와 주민수용성조사에서 입장 차를 좁힌 것은 다행이다. SRF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기간과 방법은 물론 가동 여부에 대한 주민 의견을 묻는 범위를 놓고 줄다리기만 해 온 한국난방공사와 범대위가 다소 의견 접근을 본 것만 해도 해결에 대한 실낱같은 희망을 갖게 한다.
그 희망의 불씨를 살려나가기 위해서는 거버넌스 참여자 가운데서도 범대위와 한국난방공사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합리적인 접점을 찾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산업자원부나 전남도 및 나주시는 이들의 주장에 충분히 귀를 기울이고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갈등 조율자 역할을 해야 할 이들의 대처는 그동안 소극적이고 안이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나주시의 일관성 없는 행정과 지역 정치인들의 어정쩡한 자세가 사태 장기화를 불렀다는 비판도 있다.
나주 시민들은 똑같이 SRF 문제로 갈등을 빚은 충남 내포 신도시와 전주시의 해결 사례를 들면서 지역 정치인들의 무책임하고 무능함을 질타하고 있다. 내포 신도시는 시장과 지사가 적극적으로 정부를 설득해 SRF로 설계된 발전시설을 100% 친환경 LNG로 바꿨다. 전주시는 정동영 의원이 SRF를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킴으로써 전주시에 SRF가 들어서는 논리를 차단했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자치단체와 정부가 적극적인 자세로 해법 모색에 나서야 한다. 이해당사자 간 의견 조율을 유도해 거버넌스 내에서 해법을 찾는 것이 우선이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한발씩 양보를 이끌어 내 가동 여부를 결정짓는 결단이 필요하다. 단,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주민의 불안감을 불식시킨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한다.
‘발암물질을 마시며 살수는 없다’는 주민들의 주장을 이기적인 ‘님비’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빛가람혁신도시는 쓰레기소각장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광주 상무지구와는 다르다. 상무지구는 아파트 분양을 받아 자발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대다수였지만 빛가람혁신도시는 정부 정책에 따라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이주한 공공기관 직원과 가족들이 많다. 광주 시민들이 쓰레기 대란을 우려해 나주 SRF발전소를 가동하라고 말해선 안 되는 이유다.
만약에 가동 중단으로 결론을 낸다면 발전소 해체에 따른 매몰비용(3500억원+α) 보전 문제를 지원해 한국난방공사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내야 하는 것도 정부와 자치단체의 몫이다. 주민들 역시 SRF 대신 청정에너지 난방을 원한다면 난방비 상승분을 기꺼이 수용해야 한다. 한발씩 양보하지 않는다면 해법은 없다.
/bungy@kwangju.co.kr
가연성 쓰레기를 SRF로 만들지 못하면서 양과동 광역매립장 반입량이 급증하자 매립장 측이 가연성 쓰레기 반입 중단 조치를 내렸고 이런 조치가 연쇄적으로 가연성 쓰레기 처리량 증가와 처리 비용 폭증을 불렀다. 경영난에 처한 수거 업체들이 가연성 쓰레기 수거를 거부할 경우 광주는 하반기에 쓰레기 대란이 현실화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나주 SRF발전소 가동 중단 장기화가 나비효과로 작용해 SRF는 이제 나주와 전남(SRF 생산시설이 목포·순천에도 있다)만의 문제가 아니라 광주까지 포함한 광역 쓰레기 문제가 된 것이다.
그 희망의 불씨를 살려나가기 위해서는 거버넌스 참여자 가운데서도 범대위와 한국난방공사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합리적인 접점을 찾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산업자원부나 전남도 및 나주시는 이들의 주장에 충분히 귀를 기울이고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갈등 조율자 역할을 해야 할 이들의 대처는 그동안 소극적이고 안이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나주시의 일관성 없는 행정과 지역 정치인들의 어정쩡한 자세가 사태 장기화를 불렀다는 비판도 있다.
나주 시민들은 똑같이 SRF 문제로 갈등을 빚은 충남 내포 신도시와 전주시의 해결 사례를 들면서 지역 정치인들의 무책임하고 무능함을 질타하고 있다. 내포 신도시는 시장과 지사가 적극적으로 정부를 설득해 SRF로 설계된 발전시설을 100% 친환경 LNG로 바꿨다. 전주시는 정동영 의원이 SRF를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킴으로써 전주시에 SRF가 들어서는 논리를 차단했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자치단체와 정부가 적극적인 자세로 해법 모색에 나서야 한다. 이해당사자 간 의견 조율을 유도해 거버넌스 내에서 해법을 찾는 것이 우선이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한발씩 양보를 이끌어 내 가동 여부를 결정짓는 결단이 필요하다. 단,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주민의 불안감을 불식시킨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한다.
‘발암물질을 마시며 살수는 없다’는 주민들의 주장을 이기적인 ‘님비’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빛가람혁신도시는 쓰레기소각장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광주 상무지구와는 다르다. 상무지구는 아파트 분양을 받아 자발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대다수였지만 빛가람혁신도시는 정부 정책에 따라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이주한 공공기관 직원과 가족들이 많다. 광주 시민들이 쓰레기 대란을 우려해 나주 SRF발전소를 가동하라고 말해선 안 되는 이유다.
만약에 가동 중단으로 결론을 낸다면 발전소 해체에 따른 매몰비용(3500억원+α) 보전 문제를 지원해 한국난방공사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내야 하는 것도 정부와 자치단체의 몫이다. 주민들 역시 SRF 대신 청정에너지 난방을 원한다면 난방비 상승분을 기꺼이 수용해야 한다. 한발씩 양보하지 않는다면 해법은 없다.
/bungy@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