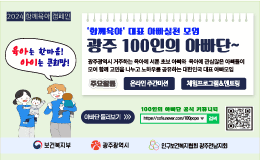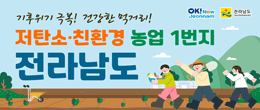전라도 정명(定名) 천년과 의향(義鄕)
송기동 문화2부장·편집국부국장
 |
“우리는 (일본과 싸우다) 죽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겠지요. 하지만 일본의 노예가 되어 사느니 차라리 자유인으로 죽는 편이 훨씬 낫소.”
1907년, 영국 ‘데일리 메일’ 특파원 프레데릭 아서 맥켄지(1869~1931)가 대한제국을 방문해 직접 의병을 찾아 나섰다. 어렵사리 조우한 한 의병이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의병들은 화승총을 들고 결연한 모습으로 기자의 사진 촬영에 응했다. 최근 막을 내린 드라마 ‘미스터션샤인’도 ‘오마주’로 같은 장면을 보여 주었다. 이름 모를 ‘아무개 의병’이 남긴 말 한마디는 당시 총을 들고 일어선 모든 의병들의 심정을 대변했다.
‘전라도 정명(定名) 천년’을 맞아 광주일보는 지난 1년간 역사적인 전라도 출신 인물들의 발자취를 살펴봤다. 고려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시대별로 다양했다. 대부분 일반인들에게 알려진 인물들이었지만 구한말 활동한 의병장들은 다소 생소했을 터. 영광 출신 후은 김용구(1861~1918)와 대극 이순식(1875~1909) 의병장이 대표적이다.
영국 기자는 왜 1907년에 ‘은둔의 나라’ 조선을 찾았을까? 그해 7월에 일제는 헤이그 밀사사건을 핑계로 고종을 강제 퇴위시켰다. 그리고 8월에 대한제국 군대를 강제로 해산시켰다. 이에 대한 반발로 전국적으로 의병들이 일어났다. 당연히 언론의 시각에서 격동의 취재 현장이었을 것이다.
1907년은 호남 의병들에게도 각별한 해였다. 그해 10월 30일에 호남 의병들은 장성 수연산 석수암에서 연합 부대를 결성했다. 바로 ‘호남창의회맹소’(湖南倡義會盟所)이다. 성재(省齋) 기삼연을 대장으로 추대하고 도통령(道統領)과 참모, 종사(從事) 등 의병 지도부를 꾸렸다. 이때 영광 출신 유학자 후은 김용구 선생이 실질적 전투 지휘관인 도통령을 맡았다. 의병 부대는 독립적으로 활동하다가 필요 시 협력하는 등 게릴라전을 벌였다.
앞서 같은 해 10월 16일, 일본 군대는 녹천 고광순 의병 부대의 아지트인 구례 연곡사를 기습했다. 10여 년간 풍찬노숙(風餐露宿)하며 항일 활동을 펼쳤던 녹천 등 의병 13명이 이날 순절했다. 며칠 후 매천 황현이 연곡사를 찾아 녹천의 가묘 앞에서 곡을 하고 칠언시를 지었다. “우리처럼 글만 하는 선비들은 무엇에 쓸 것인가(我曺文字終安用)/ 명조(明祖·의병장 고경명과 인후 부자를 뜻함)의 가풍을 이은 풍성(風聲)을 따를 길 없네(明祖家聲不可當)···.” 매천 역시 3년 뒤인 1910년 경술국치 직후 음독 자결한다. 초야에 묻혀 책만 읽은 선비나 총칼을 든 유학자나 나라를 향한 단심(丹心)은 모두 한결같았다.
영광문화원에서 지난 2016년 펴낸 ‘영광군 인물사 1집-영광의 인물’에서는 당시 호남 의병들의 활동을 이렇게 평가한다. “…1907년에서 1909년까지 의병과 일본군과의 알려진 전투 횟수만 해도 약 2700회나 되었고, 참가 의병들이 약 14만여 명에 이르렀다. 이들 항일 의병 투쟁은 전국적으로 활발했는데, 특히 전라도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항일 의병들 수가 월등히 많아 전체의 60%가 넘었고, 전투 횟수도 압도적으로 많았고 격렬했다.”
크게 전라도를 규정하는 3대 키워드로 흔히 ‘예향’(藝鄕)과 ‘문향’(文鄕), ‘의향’(義鄕)을 꼽는다. 그러나 후은 김용구와 대극 이순식 의병장이 생소했던 이유는 교과서나 대중적 역사서에서 접해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초·중·고에서 각 지역의 의병, 또는 호남 의병의 역사와 정신에 대해 깊이 있게 학습할 수 있는 현장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 최근 영광군과 광주일보, ㈔지역미래연구원이 함께 마련한 ‘영광 의병장 청소년 캠프’가 좋은 사례이다. 임진왜란과 구한말에 활동한 호남 의병장과 무명 의병들의 스토리는 ‘미스터 션샤인’같은 드라마나 영화 등 문화 상품을 만들 수 있는 좋은 콘텐츠이기도 하다.
‘전라도 정명 천년’의 해인 올해는 김용구 의병장이 순절한 지 꼭 100년이 되는 해였다. 또한 새해는 3·1만세운동이 일어난 지 100년,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100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전라도 정명 천년’ 이후에도 전라도의 역사는 계속 쓰여진다. / song@kwangju.co.kr
1907년, 영국 ‘데일리 메일’ 특파원 프레데릭 아서 맥켄지(1869~1931)가 대한제국을 방문해 직접 의병을 찾아 나섰다. 어렵사리 조우한 한 의병이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의병들은 화승총을 들고 결연한 모습으로 기자의 사진 촬영에 응했다. 최근 막을 내린 드라마 ‘미스터션샤인’도 ‘오마주’로 같은 장면을 보여 주었다. 이름 모를 ‘아무개 의병’이 남긴 말 한마디는 당시 총을 들고 일어선 모든 의병들의 심정을 대변했다.
1907년은 호남 의병들에게도 각별한 해였다. 그해 10월 30일에 호남 의병들은 장성 수연산 석수암에서 연합 부대를 결성했다. 바로 ‘호남창의회맹소’(湖南倡義會盟所)이다. 성재(省齋) 기삼연을 대장으로 추대하고 도통령(道統領)과 참모, 종사(從事) 등 의병 지도부를 꾸렸다. 이때 영광 출신 유학자 후은 김용구 선생이 실질적 전투 지휘관인 도통령을 맡았다. 의병 부대는 독립적으로 활동하다가 필요 시 협력하는 등 게릴라전을 벌였다.
앞서 같은 해 10월 16일, 일본 군대는 녹천 고광순 의병 부대의 아지트인 구례 연곡사를 기습했다. 10여 년간 풍찬노숙(風餐露宿)하며 항일 활동을 펼쳤던 녹천 등 의병 13명이 이날 순절했다. 며칠 후 매천 황현이 연곡사를 찾아 녹천의 가묘 앞에서 곡을 하고 칠언시를 지었다. “우리처럼 글만 하는 선비들은 무엇에 쓸 것인가(我曺文字終安用)/ 명조(明祖·의병장 고경명과 인후 부자를 뜻함)의 가풍을 이은 풍성(風聲)을 따를 길 없네(明祖家聲不可當)···.” 매천 역시 3년 뒤인 1910년 경술국치 직후 음독 자결한다. 초야에 묻혀 책만 읽은 선비나 총칼을 든 유학자나 나라를 향한 단심(丹心)은 모두 한결같았다.
영광문화원에서 지난 2016년 펴낸 ‘영광군 인물사 1집-영광의 인물’에서는 당시 호남 의병들의 활동을 이렇게 평가한다. “…1907년에서 1909년까지 의병과 일본군과의 알려진 전투 횟수만 해도 약 2700회나 되었고, 참가 의병들이 약 14만여 명에 이르렀다. 이들 항일 의병 투쟁은 전국적으로 활발했는데, 특히 전라도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항일 의병들 수가 월등히 많아 전체의 60%가 넘었고, 전투 횟수도 압도적으로 많았고 격렬했다.”
크게 전라도를 규정하는 3대 키워드로 흔히 ‘예향’(藝鄕)과 ‘문향’(文鄕), ‘의향’(義鄕)을 꼽는다. 그러나 후은 김용구와 대극 이순식 의병장이 생소했던 이유는 교과서나 대중적 역사서에서 접해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초·중·고에서 각 지역의 의병, 또는 호남 의병의 역사와 정신에 대해 깊이 있게 학습할 수 있는 현장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 최근 영광군과 광주일보, ㈔지역미래연구원이 함께 마련한 ‘영광 의병장 청소년 캠프’가 좋은 사례이다. 임진왜란과 구한말에 활동한 호남 의병장과 무명 의병들의 스토리는 ‘미스터 션샤인’같은 드라마나 영화 등 문화 상품을 만들 수 있는 좋은 콘텐츠이기도 하다.
‘전라도 정명 천년’의 해인 올해는 김용구 의병장이 순절한 지 꼭 100년이 되는 해였다. 또한 새해는 3·1만세운동이 일어난 지 100년,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100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전라도 정명 천년’ 이후에도 전라도의 역사는 계속 쓰여진다. / song@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