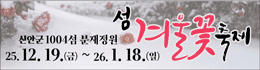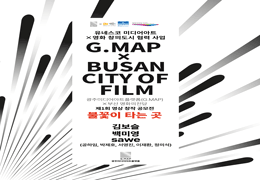대통령의 ‘응급실 뺑뺑이’ 대책은 무엇인가 - 이철갑 조선대 의과대학 교수
 |
12월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는 현 대한민국 의료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대통령은 “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찾아 헤매다 길 위에서 국민이 죽어가고 있다. 대책이 무엇인가?”라고 묻는데, 장관은 “광역 상황실을 만들어 이송을 조정하겠다”, “순환 당직제를 도입하겠다”라는 공허한 답변만 되풀이했다.
대통령이 “과거에는 병원이 거부를 못했는데 지금은 ‘역량이 안 된다’며 거부한다”라고 묻는데, 이미 실패가 증명된 ‘컨트롤타워’ 타령이라니. 응급실 뺑뺑이는 전화 연결이 안돼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다. 환자를 받아줄 ‘공간’과 ‘의사’가 전멸했기 때문이다. 관료들이 애써 외면하는, 그러나 모두가 알고 있는 ‘불편한 진실’을 국민에게 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왜 말하지 못할까?
대통령이, 국민이 진정으로 듣고 싶어 했던, 아니 반드시 들었어야만 했던 얘기를 끝내 입에 올리지 못하는 걸 보며 참 답답했다.
대통령은 “왜 환자를 안 받아주느냐”라고 사태의 원인을 묻는데, 장관은 원인에 대한 답변 없이 그냥 환자를 잘 배분하겠다는 엉뚱한 답변을 한 것이다. 응급실 뺑뺑이는 ‘환자 배분’의 문제가 아니라 ‘총량’의 붕괴에서 기인한다. 받아줄 곳이 없는데 아무리 정교한 배분 시스템을 도입한들 무슨 소용일까?
그 ‘불편한 진실’은 무엇인가? 바로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의사들의 손발을 묶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배후 진료 인프라가 붕괴했다는 사실이다. 응급실과 배후 진료과에 의사가 없는 것은 환자를 받았다가 발생할 법적 책임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은 의사에게 신의 능력을 요구한다. 만약 실패하면 ‘죄인’으로 만든다. 과거 필자가 수련받을 때는 의료진들은 “일단 환자를 받아서 최선을 다해보자”라는 야전병원식의 암묵적 합의가 있었다. 환자나 보호자도 의사의 ‘선한 의지’를 믿었다. 그러나 지금 의사들은 “살릴 확률이 100%가 아니면 받지 않는다”라는 생존 본능으로 무장했다. 무엇이 그들을 변하게 했을까? 사법 리스크다.
한국에서 의사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기소될 확률은 일본의 265배, 영국의 895배에 달한다. 1%의 사망 확률이 있는 위급 환자를 수술하다 결과가 나쁘면 검찰과 법원은 “왜 그 1%를 막지 못했느냐”라며 의사를 형사 법정에 세운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때 의료진이 포승줄에 묶이는 장면은 ‘필수의료’를 선택하려는 젊은 의사들에게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다. 환자를 받았다가 소송을 당하는 것보다 안 받고 차라리 ‘과태료’를 내겠다는 것이 현실이다. 복지부 관료들이 이걸 모를까? 다 안다. 그런데 ‘광역 상황실’이 무슨 소용인가? 상황실 직원이 전화하면 없던 수술방도 생기고 퇴근한 의사가 돌아오나?
응급실은 병원에 들어가는 문일 뿐이다. 국민은 응급실에 의사만 있으면 되는 줄 안다. 착각이다. 응급의학과 의사는 급한 불을 끄는 소방수일 뿐, 터진 뇌혈관을 잇고 막힌 심장을 뚫는 건 배후 진료를 맡은 흉부외과, 신경외과, 심장내과 의사이다. 지금의 뺑뺑이는 실상 응급실 의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수술할 배후 진료 의사가 없어서 발생한다. 지방은 사정이 더욱 심하다.
정원을 늘리거나 지방에 공공의대를 만들면 해결될까? ‘생명값’ 보다 ‘미용값’을 더 쳐주는 기형적인 수가 구조를 방치한 상황에서는 젊은 세대들은 위험을 피해 미용·성형 시장으로 흘러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것이다.
일각에서 응급실 수용 의무화를 강제하자고 하는데 수술할 의사가 없는데 강제한다고 해결될까? 이제 미국 텍사스주처럼 ‘고의나 중대한 과실(술 취한 상태 등)’이 아니면 응급 의료진에게 형사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법을 제정해야 한다.
“사람이 죽었는데 면책이냐”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의사에게 면죄부를 주자는 게 아니다. 응급실에서 최선을 다했는데도 환자가 사망한 경우, 고의나 중대한 잘못이 없으면 책임을 묻지 않거나 국가가 보상하는(응급의료를 개인의 희생에 맡기지 않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
의료는 신의 영역이 아님을 인정해야 한다. 최선을 다해도 환자는 사망할 수 있다. 그 결과에 소송으로 대응한다면 결국 환자 곁에서 위험을 감수할 의사는 한 명도 없을 것이다.
응급실 뺑뺑이는 시스템 오류가 아니다. 대통령의 답답함은 이해하지만 해법은 올바른 정책을 시행할 의지와 결단이다. 이제 미봉책은 걷어치우고 해법이 무엇인지 모든 이해관계자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
대통령이, 국민이 진정으로 듣고 싶어 했던, 아니 반드시 들었어야만 했던 얘기를 끝내 입에 올리지 못하는 걸 보며 참 답답했다.
그 ‘불편한 진실’은 무엇인가? 바로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의사들의 손발을 묶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배후 진료 인프라가 붕괴했다는 사실이다. 응급실과 배후 진료과에 의사가 없는 것은 환자를 받았다가 발생할 법적 책임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은 의사에게 신의 능력을 요구한다. 만약 실패하면 ‘죄인’으로 만든다. 과거 필자가 수련받을 때는 의료진들은 “일단 환자를 받아서 최선을 다해보자”라는 야전병원식의 암묵적 합의가 있었다. 환자나 보호자도 의사의 ‘선한 의지’를 믿었다. 그러나 지금 의사들은 “살릴 확률이 100%가 아니면 받지 않는다”라는 생존 본능으로 무장했다. 무엇이 그들을 변하게 했을까? 사법 리스크다.
한국에서 의사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기소될 확률은 일본의 265배, 영국의 895배에 달한다. 1%의 사망 확률이 있는 위급 환자를 수술하다 결과가 나쁘면 검찰과 법원은 “왜 그 1%를 막지 못했느냐”라며 의사를 형사 법정에 세운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때 의료진이 포승줄에 묶이는 장면은 ‘필수의료’를 선택하려는 젊은 의사들에게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다. 환자를 받았다가 소송을 당하는 것보다 안 받고 차라리 ‘과태료’를 내겠다는 것이 현실이다. 복지부 관료들이 이걸 모를까? 다 안다. 그런데 ‘광역 상황실’이 무슨 소용인가? 상황실 직원이 전화하면 없던 수술방도 생기고 퇴근한 의사가 돌아오나?
응급실은 병원에 들어가는 문일 뿐이다. 국민은 응급실에 의사만 있으면 되는 줄 안다. 착각이다. 응급의학과 의사는 급한 불을 끄는 소방수일 뿐, 터진 뇌혈관을 잇고 막힌 심장을 뚫는 건 배후 진료를 맡은 흉부외과, 신경외과, 심장내과 의사이다. 지금의 뺑뺑이는 실상 응급실 의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수술할 배후 진료 의사가 없어서 발생한다. 지방은 사정이 더욱 심하다.
정원을 늘리거나 지방에 공공의대를 만들면 해결될까? ‘생명값’ 보다 ‘미용값’을 더 쳐주는 기형적인 수가 구조를 방치한 상황에서는 젊은 세대들은 위험을 피해 미용·성형 시장으로 흘러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것이다.
일각에서 응급실 수용 의무화를 강제하자고 하는데 수술할 의사가 없는데 강제한다고 해결될까? 이제 미국 텍사스주처럼 ‘고의나 중대한 과실(술 취한 상태 등)’이 아니면 응급 의료진에게 형사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법을 제정해야 한다.
“사람이 죽었는데 면책이냐”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의사에게 면죄부를 주자는 게 아니다. 응급실에서 최선을 다했는데도 환자가 사망한 경우, 고의나 중대한 잘못이 없으면 책임을 묻지 않거나 국가가 보상하는(응급의료를 개인의 희생에 맡기지 않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
의료는 신의 영역이 아님을 인정해야 한다. 최선을 다해도 환자는 사망할 수 있다. 그 결과에 소송으로 대응한다면 결국 환자 곁에서 위험을 감수할 의사는 한 명도 없을 것이다.
응급실 뺑뺑이는 시스템 오류가 아니다. 대통령의 답답함은 이해하지만 해법은 올바른 정책을 시행할 의지와 결단이다. 이제 미봉책은 걷어치우고 해법이 무엇인지 모든 이해관계자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