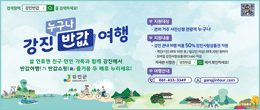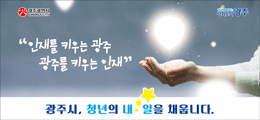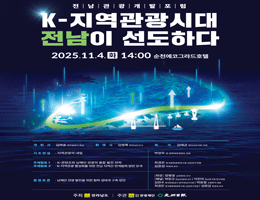이방인의 기록에서 향수까지 ‘후각의 인문학’
찰나의 기억, 냄새-김성연 지음
 보고, 듣고, 말하지 못했던 헬렌켈러는 후각과 촉각으로 세계를 인식했다. 1937년 조선 방문 당시 한복을 입은 헬렌켈러(왼쪽)와 폴리 여사. <서해문집 제공> |
 |
헬렌켈러(1880~1968)는 일본을 거쳐 1937년 7월 11일 오후 3시 부산항에 상륙했다. 대구, 경성, 평양으로 이어진 국내 강연은 연일 만원이었고 언론에 대서특필됐다. 보고, 듣고, 말하지 못했던 그는 대신 후각과 촉각으로 세계를 인식했다. 그는 조선의 냄새는 어떠냐는 질문에 “공기가 매우 깨끗하여 향취가 난다”고 답했다. 또 “나무가 없는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울창한 산에서 불어는 바람은 감촉이 다르다”고도 했다.
김성연 연세대 미래캠퍼스 국어국문학과 교수가 펴낸 ‘찰나의 기억, 냄새’는 소설·시·수필 등 근대문학, 일간지 기사와 광고 등 언론매체, 이방인의 기록에 숨어 있는 냄새의 흔적을 살펴본 ‘후각의 문화사’다.
저자는 “어떤 냄새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사물의 이면을, 현상과는 다른 사태의 본질을 드러내 주기도 한다”고 말하고 “냄새의 배경에는 일상과 과학과 종교와 예술과 정치가 가로놓여 있다”고 이야기한다.
향수는 손편지, 손수건과 어우러지며 순정과 사랑의 징표로 사용되기도 했지만 정비석 소설 ‘자유부인’에서는 타락과 방종의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다양한 문학작품에서 ‘냄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저자가 ‘향기 수집가’라 부른 소설가 이효석은 ‘메밀꽃 필 무렵’에서 “그윽한 밤의 향기”를 잡아내고 소설 ‘분녀’에서는 짙은 여름을 깻잎 냄새로, 수필 ‘낙엽을 태우며’서는 가을의 이미지를 사철나무와 낙엽송의 냄새로 묘사한다.
‘고향 냄새’를 채집한 시인 백석에게 음식의 맛과 냄새는 공동체가 함께한 풍요로운 기억을 환기하는 감각이다. 1930년대 중반까지 남긴 시 100여편에는 110가지 요리가 기록돼 있고, 그의 시는 “100년 전 이북 지역 부엌에 관한 기억의 아카이브” 역할을 한다. ‘추야일경(秋夜一景)에 묘사된 어느 가을 깊은 밤, “시래기를 삶는 훈훈한 방안에는 양염 내음새가 싱싱도 하”고, 온 집안은 풍요로운 음식 냄새로 가득하다.
소설 속 냄새는 누군가를 기억하는 장치이기도 하다. 박완서의 소설 ‘나의 가장 나종 지니인 것’에서 민주화 운동으로 아들을 잃은 어머니는 ‘행운목꽃 향기’와 ‘태운 꼬릿국’ 냄새를 통해 아들을 기억한다. “그에게서는 언제나 비누 냄새가 난다.”로 시작되는 강신재 소설 ‘젊은 느티나무’ 속 주인공 여고생 숙희에게 짝사랑하는 대학생 의붓오빠를 상기시키는 건 ‘비누’다.
또 문순태의 ‘늙으신 어머니의 향기’ 중 시골에서 올라온 노모에게서 나는 냄새를 아내는 “어머니라는 한 개인에게서 나는 욕심과 집착의 냄새”로 여기지만 아들은 “전후 아버지의 빈자리를 메우며 억척같이 식구들을 먹여 살린 어머니의 고단했던 삶 자체”로 인식한다.
저자는 2540년이 배경인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에서 소리가 아니라 향기를 연주하는 ‘방향 오르간(scent-organ)’의 존재나 냄새가 부재하는 세계를 통해 냄새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김초엽의 SF ‘숨그림자’ 등 SF문학에서도 미래의 냄새를 읽어낸다.
<서해문집·2만6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