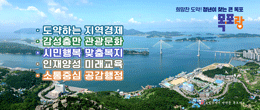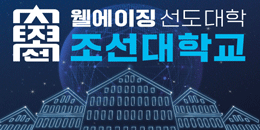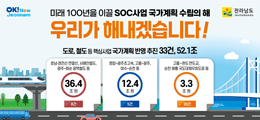[광복 80년 되짚어 본 광주·전남 아·태전쟁 유적] 10대까지 동원해 무임금 강제 노동… 폭약으로 채굴 작업 중 다리 잃기도
 수압궤도를 이용해 광물을 이용하고, 아슬아슬하게 설치된 레일 위에서 일하는 조선인 강제동원자들. |
“아버지께서는 옥매광산에서 강제 노동을 하다 다쳤던 다리가 점차 악화돼, 결국 두 다리를 끌며 움직일 정도로 후유증이 심각했습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 지원위원회가 보고한 ‘해남 옥매광산 노무자들의 강제동원 및 피해실태 조사’에 따르면 옥매광산 강제동원 피해자로 공식 결정된 피해 인원수는 총 94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89건은 제주도 해상 조난 피해와 관련된 사례이며 나머지 5건은 옥매광산에서 강제 동원돼 발파 작업을 하던 중 크게 다쳐 장애를 입은 경우다.
동원된 노동자들의 연령 구성도 주목된다. 제적부상 1933년생과 1932년생 각 1명이 포함돼 있어 10세~15세 청소년들도 강제 노동에 동원됐던 것으로 파악된다.
15세~20세와 21세~25세 구간도 각각 14명, 26세~30세는 8명이 포함되는 등 전체적으로 청년층의 비율이 높았다. 고령층인 51세 이상은 총 6명이 포함돼 있었다.
동원 이후 생존한 이는 5명에 불과하고 후유장애를 입은 사례가 1건, 국외 강제동원 후 귀국해 1938년~1945년 사이 국내에서 사망한 이도 43명에 달한다. ‘동원 중 사망’으로 분류된 인원은 45명인데 이들은 모두 해방 직후 귀환 도중 일어난 해상 조난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문제가 된 해상 조난 사고는 옥매광산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에게 “제주도로 가지 않으면 배급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협박에 따라 강제로 이동시킨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 가운데 일부 인원은 구조됐지만 폐 손상 등으로 귀환 후 2년 만에 사망했고, 많은 이들이 호흡기 질환 등 만성 질병에 시달렸다. 연령대별 피해 심각성은 51세~55세 구간에서 가장 컸다. 해당 연령층으로 동원된 6명 전원이 사망했으며 46세~50세 구간에서도 14명 중 12명이 목숨을 잃었다. 다른 연령대 역시 사망률이 50%를 넘는 등, 전체적으로 극심한 희생이 확인된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노동의 대가조차 지급되지 않았다.
피해자 강모 씨의 아들은 “아버지께 들은 바로는 광산 아래 바닷가에 선박이 드나들 수 있는 부두가 있었고, 그곳을 통해 광산에서 캐낸 광물을 일본으로 실어 날랐다고 했다”며, “월급은 전혀 받지 못했고, 지급받기로 했던 통장이나 관련 증서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 지원위원회가 보고한 ‘해남 옥매광산 노무자들의 강제동원 및 피해실태 조사’에 따르면 옥매광산 강제동원 피해자로 공식 결정된 피해 인원수는 총 94명에 달한다.
동원된 노동자들의 연령 구성도 주목된다. 제적부상 1933년생과 1932년생 각 1명이 포함돼 있어 10세~15세 청소년들도 강제 노동에 동원됐던 것으로 파악된다.
15세~20세와 21세~25세 구간도 각각 14명, 26세~30세는 8명이 포함되는 등 전체적으로 청년층의 비율이 높았다. 고령층인 51세 이상은 총 6명이 포함돼 있었다.
동원 이후 생존한 이는 5명에 불과하고 후유장애를 입은 사례가 1건, 국외 강제동원 후 귀국해 1938년~1945년 사이 국내에서 사망한 이도 43명에 달한다. ‘동원 중 사망’으로 분류된 인원은 45명인데 이들은 모두 해방 직후 귀환 도중 일어난 해상 조난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노동의 대가조차 지급되지 않았다.
피해자 강모 씨의 아들은 “아버지께 들은 바로는 광산 아래 바닷가에 선박이 드나들 수 있는 부두가 있었고, 그곳을 통해 광산에서 캐낸 광물을 일본으로 실어 날랐다고 했다”며, “월급은 전혀 받지 못했고, 지급받기로 했던 통장이나 관련 증서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