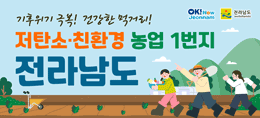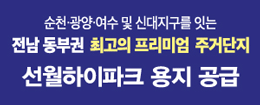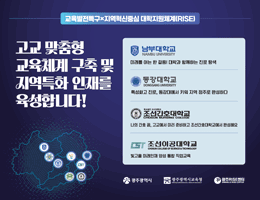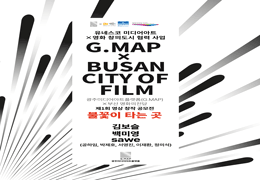경험을 위한 씀씀이 - 정유진 코리아컨설트 대표
 |
송글송글 이마에 맺히는 땀을 닦으며 북아프리카 산맥 아틀라스 협곡의 엄청난 장관을 마주하고 있다. 불과 얼마 전까지 만해도 여행을 목전에 두고 망설였다. 이번 여름만큼은 보양식을 챙겨 먹으며 집에서 쉬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은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앞으로 또 언제란 생각에 단호히 집을 나섰다. 실제 47도를 웃도는 이곳 기후를 경험하고 보니 역시 만류하던 지인들의 얘기처럼 여행길은 생각보다 더 고됐다.
편한 걸 마다하고 큰돈을 써가며 사서 하는 이 고생은 아들의 호기심에서 비롯되었다. 북아프리카의 자연, 그 곳에서 사는 사람과 이슬람 문화가 궁금하다고 했다. 교육열이 남다르거나 유행하는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살려는 것은 아니지만 물건의 소유보단 돈을 써 가며 경험을 소유하고자 했으니 굳이 따지자면 요즘의 경험 소비자를 자처한 셈이다.
이 같은 소유 불가능한 것에 돈을 쓰기로 마음먹는 것이 쉽진 않았다. 사실 경험 소비를 망설일 때마다 소환하는 기억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어린 시절 여름 방학에 떠난 가족과의 피서다. 서울을 벗어나 바다로 향해 가는 길에는 과수원이 있었고 원두막에 걸터앉아 두 다리를 흔들며 맛본 큼지막한 수박의 맛이 아직까지 생생하다. 기막힌 여름 맛은 이어 출렁거리는 파도 위에서 튜브를 탄 기억이며 시원한 저녁 바닷가를 따라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걸으며 발바닥에 닿은 모래 촉감도 떠올리게 한다.
낭만적인 추억 회상이 이쯤에 이르면 부모님께서 당시 이 여행을 얼마나 어렵게 계획하셨을까란 생각을 하게 되고 더 이상 망설이던 씀씀이를 고민하지 않는다. 비단 돈만이 아닌 마음을 쓰는 것을 포함한 씀씀이란 의미가 와 닿기 때문이다.
경험을 원하는 소비자가 더욱 많아지는 세상이다. 이를 증명하듯 명품백보다 에코백을 들며 여행이나 미식에 돈을 쓰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젊은 세대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소비 문화의 변화는 생각의 전환이 왔음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물질을 직접 소유하는 데서 오는 관심과 즐거움을 넘어 본래 가치나 경험을 하는데 큰 소비 욕구를 느끼게 되는 것은 그만큼 한국의 삶의 질이 향상됨을 보여 주는 현상일 수도 있다.
이제 백화점 상품을 통해 실내가 아닌 실외에서 자신의 취향에 맞는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한국의 명소를 찾아가는 여행을 하거나 평상시 관심을 가져온 분야의 활동을 휴가 기간에 배울 수도 있다. 특별한 장소에서 영화를 보거나 본래 입장이 불가능한 시간에 미술관이나 갤러리를 방문해 특화된 예술 콘텐츠를 경험할 수도 있게 되었다.
에리히 프롬은 그의 저서 ‘소유냐 존재냐’에서 나는 내가 가진 것과 같고 내가 가진 것은 내가 소비하는 것이라는 등식을 세웠다. 내가 가진 것을 보여 주려는 태도는 인간이 가진 너무도 본능적인 욕구이자 행위이며 이에 대한 질문은 약 반세기가 지난 지금에 와서도 유효하다.
여전히 넘쳐나는 광고는 소유하는 것에 따라 나의 격도 높아지는 것처럼 소비자를 자극하고 있다. 마치 유한한 소유물을 통해 무한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의식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본주의 시장은 시대의 흐름에 따른 의식의 변화를 반영해 소유 소비를 넘어 가치 소비에 이은 경험 소비에 걸맞은 다양한 선택의 폭을 제시하고 있다. 그야말로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윤택한 삶을 위해 돈을 쓰는 것을 넘어 새로운 소비 시대로 전환을 맞은 셈이다.
근래 한 지인으로부터 물건을 사는 소유 소비의 지출을 줄이고 도서나 전시 및 공연 등 문화 생활비에 돈을 더 지출하게 되면서 전에 보다 더 큰 만족감을 느끼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아울러 헤프다고 생각되었던 우리 가족의 여행 씀씀이에 대해서도 이해하게 되었다고 했다.
미처 그 지인에게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가족의 여행은 소비 활동으로만 보기보다는 개인과 가족 모두에게 중요한 여가 활동이자 자기 계발과 서로를 이해하는 의미 있는 행위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는 어떤 일정에서도 감행하는 의식이자 정기적인 연례 행사로까지 자리 잡았다는 것이다. 그래서일까? 이번 무모한 여행을 ‘가족 여행 씀씀이’로 정의하고 가계부 지출 목록에 올리고 나니 큰돈을 한꺼번에 쓰고도 면죄부를 얻은 듯하다.
이 같은 소유 불가능한 것에 돈을 쓰기로 마음먹는 것이 쉽진 않았다. 사실 경험 소비를 망설일 때마다 소환하는 기억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어린 시절 여름 방학에 떠난 가족과의 피서다. 서울을 벗어나 바다로 향해 가는 길에는 과수원이 있었고 원두막에 걸터앉아 두 다리를 흔들며 맛본 큼지막한 수박의 맛이 아직까지 생생하다. 기막힌 여름 맛은 이어 출렁거리는 파도 위에서 튜브를 탄 기억이며 시원한 저녁 바닷가를 따라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걸으며 발바닥에 닿은 모래 촉감도 떠올리게 한다.
경험을 원하는 소비자가 더욱 많아지는 세상이다. 이를 증명하듯 명품백보다 에코백을 들며 여행이나 미식에 돈을 쓰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젊은 세대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소비 문화의 변화는 생각의 전환이 왔음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물질을 직접 소유하는 데서 오는 관심과 즐거움을 넘어 본래 가치나 경험을 하는데 큰 소비 욕구를 느끼게 되는 것은 그만큼 한국의 삶의 질이 향상됨을 보여 주는 현상일 수도 있다.
이제 백화점 상품을 통해 실내가 아닌 실외에서 자신의 취향에 맞는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한국의 명소를 찾아가는 여행을 하거나 평상시 관심을 가져온 분야의 활동을 휴가 기간에 배울 수도 있다. 특별한 장소에서 영화를 보거나 본래 입장이 불가능한 시간에 미술관이나 갤러리를 방문해 특화된 예술 콘텐츠를 경험할 수도 있게 되었다.
에리히 프롬은 그의 저서 ‘소유냐 존재냐’에서 나는 내가 가진 것과 같고 내가 가진 것은 내가 소비하는 것이라는 등식을 세웠다. 내가 가진 것을 보여 주려는 태도는 인간이 가진 너무도 본능적인 욕구이자 행위이며 이에 대한 질문은 약 반세기가 지난 지금에 와서도 유효하다.
여전히 넘쳐나는 광고는 소유하는 것에 따라 나의 격도 높아지는 것처럼 소비자를 자극하고 있다. 마치 유한한 소유물을 통해 무한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의식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본주의 시장은 시대의 흐름에 따른 의식의 변화를 반영해 소유 소비를 넘어 가치 소비에 이은 경험 소비에 걸맞은 다양한 선택의 폭을 제시하고 있다. 그야말로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윤택한 삶을 위해 돈을 쓰는 것을 넘어 새로운 소비 시대로 전환을 맞은 셈이다.
근래 한 지인으로부터 물건을 사는 소유 소비의 지출을 줄이고 도서나 전시 및 공연 등 문화 생활비에 돈을 더 지출하게 되면서 전에 보다 더 큰 만족감을 느끼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아울러 헤프다고 생각되었던 우리 가족의 여행 씀씀이에 대해서도 이해하게 되었다고 했다.
미처 그 지인에게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가족의 여행은 소비 활동으로만 보기보다는 개인과 가족 모두에게 중요한 여가 활동이자 자기 계발과 서로를 이해하는 의미 있는 행위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는 어떤 일정에서도 감행하는 의식이자 정기적인 연례 행사로까지 자리 잡았다는 것이다. 그래서일까? 이번 무모한 여행을 ‘가족 여행 씀씀이’로 정의하고 가계부 지출 목록에 올리고 나니 큰돈을 한꺼번에 쓰고도 면죄부를 얻은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