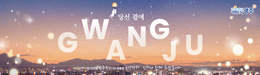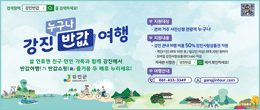신냉전 - 최권일 정치부 부국장
지구촌이 신(新)냉전 체제에 접어든 모양새다.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이 ‘한국·미국·일본’ 대 ‘중국·러시아·북한’ 간 진영 대결로 확대되면서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유럽 대륙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유럽연합(EU)과 러시아 간 대립각이 커지고 있다.
‘냉전’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 간의 동맹국들 사이에 정치·외교·이념상의 제한적 갈등·대결 상태를 일컫는다. 냉전이라는 용어는 미국의 평론가 월터 리프먼이 저술한 ‘냉전’(The Cold War, 1947)이라는 논문에서 최초로 사용하면서 등장했다. 미국과 소련의 패권 경쟁이 만들어 낸 냉전 체제는 1991년 소련 연방 해체와 함께 사회주의 블록 붕괴로 양극화됐던 국제 질서가 다극 체제로 전환되면서 사실상 종식됐다.
하지만 2008년 이후 중국의 경제력·군사력 확대에 따라 미국이 이를 강하게 견제하면서 미·중 패권 경쟁이 시작됐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꿈꾸는 ‘옛 소련 연방 부활’로 인해 유럽의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또다시 지구촌이 냉전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국은 북한의 핵 위협 등에 맞서 한미 간 ‘핵 협의 그룹’을 창설하는 등 대북 확장 억제 강화를 위한 ‘워싱턴 선언’에 합의하며 한·미·일 간 동맹 강화에 외교적 노력을 쏟고 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 북한과는 연일 각을 세우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다자주의가 본질인 현 외교 상황에서 미국·일본 중심으로 가게 되면 장기적으로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 외교가 동맹국 미국과 흐름을 같이하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겠지만, 분단 국가면서 통상 국가인 대한민국의 현실을 고려하면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불필요하게 악화시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은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로 태평양전쟁 패전국임에도 또다시 무장 가능한 국가로 전환을 꾀하고 있는 일본을 좌시해서도 안 될 것이다.
/cki@kwangju.co.kr
하지만 2008년 이후 중국의 경제력·군사력 확대에 따라 미국이 이를 강하게 견제하면서 미·중 패권 경쟁이 시작됐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꿈꾸는 ‘옛 소련 연방 부활’로 인해 유럽의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또다시 지구촌이 냉전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한국 외교가 동맹국 미국과 흐름을 같이하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겠지만, 분단 국가면서 통상 국가인 대한민국의 현실을 고려하면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불필요하게 악화시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은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로 태평양전쟁 패전국임에도 또다시 무장 가능한 국가로 전환을 꾀하고 있는 일본을 좌시해서도 안 될 것이다.
/cki@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