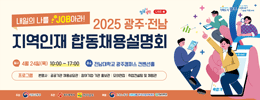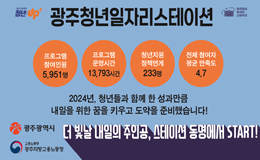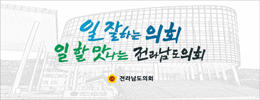‘피로 사회’ - 박성천 여론매체부 부국장
현대 사회의 특징을 규정하는 용어 가운데 ‘피로 사회’라는 말이 있다. 물질 만능 사회, 고령화 사회, 파편화된 사회 등 기존 현대 사회의 특징을 드러내는 용어와는 차원이 다른 개념이다. ‘피로 사회’(문학과지성사)는 베를린예술대 철학과 교수를 역임했던 재독 철학자 한병철이 지난 2012년에 발간했던 책의 제목이기도 했다.
한 교수는 현대 사회에서 금과옥조처럼 떠받드는 성과주의를 ‘피로 사회’와 연관 짓는다. 그는 “피로 사회는 자기 착취의 사회다. 피로 사회에서 현대인은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이다”라고 주장한다. 당시 출간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책은 주요 미디어 매체들에 소개되며 적잖은 반향을 일으켰다. 현대 사회의 문제를 시의 적절하게 그리고 예리하게 포착했다는 평이 잇따랐다.
“성과 주체는 성과의 극대화를 위해 강제하는 자유 또는 자유로운 강제에 몸을 맡긴다. 과다한 노동과 성과는 자기 착취로까지 치닫는다. 자기 착취는 자유롭다는 느낌을 동반하기 때문에 타자의 착취보다 더 효율적이다. 착취자는 동시에 피착취자이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더 이상 분리되지 않는다.”
한 교수의 주장은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여론조사 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20·30대를 대상으로 진행한 기업(인) 인식 조사 결과를 생각하게 한다. MZ세대들은 전체 응답자의 36.6%가 취업 최고 조건으로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을 선호했다. 다음으로 29.6%가 월급과 성과 보상체계가 잘 갖춰진 기업을 꼽았다. 전통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지던 월급과 정년 보장과 같은 조건은 퇴조한 대신 개인의 삶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인식이 바뀌었다.
성과를 중시하는 사회일수록 개인의 피로는 누적될 수밖에 없다. 번아웃 되거나 우울에 빠진 이들이 증가하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람이 늘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물론 성과만으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려는 이들의 자세도 문제는 있다. 그러나 과도한 성장과 실적 경쟁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공동체 피로로 전이된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있다. 피로 사회가 아닌 여유와 배려, 공감과 나눔의 사회를 기대하는 것은 무망한 일일까.
/박성천 여론매체부 부국장 skypark@kwangju.co.kr
“성과 주체는 성과의 극대화를 위해 강제하는 자유 또는 자유로운 강제에 몸을 맡긴다. 과다한 노동과 성과는 자기 착취로까지 치닫는다. 자기 착취는 자유롭다는 느낌을 동반하기 때문에 타자의 착취보다 더 효율적이다. 착취자는 동시에 피착취자이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더 이상 분리되지 않는다.”
성과를 중시하는 사회일수록 개인의 피로는 누적될 수밖에 없다. 번아웃 되거나 우울에 빠진 이들이 증가하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람이 늘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물론 성과만으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려는 이들의 자세도 문제는 있다. 그러나 과도한 성장과 실적 경쟁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공동체 피로로 전이된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있다. 피로 사회가 아닌 여유와 배려, 공감과 나눔의 사회를 기대하는 것은 무망한 일일까.
/박성천 여론매체부 부국장 skypark@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