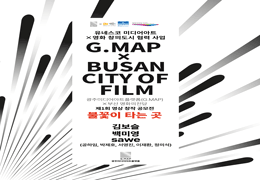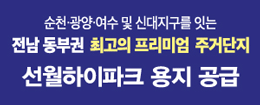사투리가 소멸된다면… -송기동 예향부장·편집국 부국장
 |
“있냐- 니는 시상 귄 있는 내야 강아지여”(있잖아 너는 엄청 매력적인 나만의 강아지야)
“나으 가슴이 요로코롬 뛰어 분디 어째 쓰까”(나의 가슴이 이렇게 뛰는데 어떻게 하지)
“겁나게 감사한 이 맴을 어찌고 다 말한 다요”(아주 많이 감사한 이 마음을 어떻게 전부 말할까요)
지난 8월 말 찾은 광주시 서구 쌍촌동 민아트갤러리. 김진아 역서사소 대표의 ‘사투리를 말하다’전에 선보인 작품들은 얼굴 가득 미소를 짓게 만들었다. 문구마다 표준어에서 느낄 수 없는 전라도 사투리 특유의 정감이 물씬 묻어나기 때문이었다. ‘여기서 사세요’라는 의미의 전라도 사투리를 문구 브랜드 명으로 삼은 김 대표는 사투리 문구류를 선보여 젊은 소비자들의 호평을 얻고 있다.
시·영화 다양한 문화 콘텐츠로 부활
최근 지역 토박이말인 사투리가 문학 작품을 비롯해 드라마, 영화, 가요,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다채롭게 활용되고 있다. 애플 tv+에서 방영된 ‘파친코’의 경우처럼 사투리는 시대상과 지역, 극중 인물의 캐릭터를 입체적으로 살려 내는 역할을 톡톡히 한다.
“목포 사투리로 ‘에말이요~’란 말이 있지. 그 뜻이 뭔고 허니 내 말 좀 들어 보라는 것이야. 처음에는 그 말뜻을 몰라서 어리둥절혔어. 왜 말을 싸가지 없게 그따위로 허느냐고 시비 거는 줄 알았어….”
최기종 시인의 시 ‘에말이요~’ 중 일부다. 전북 부안에서 태어나 1980년대 중반부터 목포에서 40년 가깝게 살고 있는 시인은 지난 2020년에 시집 ‘목포, 에말이요’를 펴냈다. 시인은 목포 사투리 ‘에말이요~’에 대해 처음에는 그 말뜻을 몰라 어리둥절하고, 혹 내가 뭘 잘못한 건 아닌지 가슴이 철렁했지만 목포 살이를 오래하며 살갑게 느꼈다고 한다.
영암 출신 조정 시인 또한 지난 6월 서남 전라도 서사시 ‘그라시재라’를 펴냈다. 일제 강점기와 한국 전쟁기를 힘겹게 관통해 온 우리네 할머니와 어머니의 인생사를 듣는 듯하다. 독자들은 ‘아무렴 그렇지요!’ ‘왜 그렇지 않겠어요’라는 뜻의 ‘그라시재라’로 호응하며 눈시울을 붉힌다.
“나는 꽃 중에 찔레꽃이 질로 좋아라/ 우리 친정 앞 또랑 너매 찔레 덤불이/ 오월이면 꽃이 만발해가꼬/ 거울 가튼 물에 흑하니 비친단 말이요/ 으치께 이삔가 물 흔들리깜시/ 빨래허든 손 놓고 앙거서/ 꽃기림자를 한정없이 보고 있었당께라….”
조정래 작가의 대하소설 ‘태백산맥’에서 청년단장 염상구는 토벌대장 임만수에게 전라도 말에 대해 한마디로 압축한다.
“전라도말맹키로 유식허고 찰지고 맛나고 한시럽고 헌 말이 팔도에 워디 있습디여.”
시대가 급변함에 따라 사투리 역시 소멸 위기를 맞고 있다. 원인은 서울말을 중심에 둔 정부의 표준어 정책과 산업화·도시화에 의해 고향을 떠나 대도시에서 거주하는 라이프 스타일 등 다양하다. 사투리는 고어가 살아 있는 우리말의 화석이자 문화 콘텐츠의 보물 창고이기도 하다. 토박이말에는 표준어로 대체할 수 없는 뉘앙스의 표현들이 많다. 전라도 말로 ‘귄 있다’가 그러한 경우이다. 귀엽다라는 표현을 넘어서는 어감을 담고 있다. 만약 지역의 사투리가 모두 소멸된다면? 우리의 소중한 문화 자산을 송두리째 잃는 것일 것이다.
사라지는 토박이말 보존 노력 절실
충북 진천에서 유년 시절을 보낸 유종호 문학평론가는 지난 5월 ‘사라지는 말들-말과 사회사’를 출간했다. ‘호습다’와 ‘설은살’ ‘오진살’ ‘그리마’ ‘보비위’ ‘입찬소리’ ‘구메구메’ 등 생소한 말들이 눈에 띈다. 그는 어릴 적의 낱말에 대해 ‘우리가 폐기해서 잊힌 혹은 잊히면서 사라져 가는 모어(母語) 중의 모어’라고 강조하며 이렇게 말한다.
“…사라지는 모든 것은 그 지음(知音)에게 소소한 대로 조금한 마음의 파문을 남긴다. 정답고 낯익은 것의 소멸은 바로 그대의 소멸을 알려 주는 예고 지표가 아닌가! 소멸을 수용하고 준비하라는 엄중한 전언이 아닌가!”
하루가 다르게 정신없이 질주하는 과학문명 속에서 지역 토박이들의 생활문화가 배어있는 사투리의 미래는 어떠할까? 사투리를 살리는 길은 당연히 언중(言衆)들이 일상에서 널리 사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투리가 시와 소설 등 문학 작품은 물론 영화, 드라마, 가요,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 활짝 꽃피우기를 기대한다.
/song@kwangju.co.kr
“나으 가슴이 요로코롬 뛰어 분디 어째 쓰까”(나의 가슴이 이렇게 뛰는데 어떻게 하지)
“겁나게 감사한 이 맴을 어찌고 다 말한 다요”(아주 많이 감사한 이 마음을 어떻게 전부 말할까요)
지난 8월 말 찾은 광주시 서구 쌍촌동 민아트갤러리. 김진아 역서사소 대표의 ‘사투리를 말하다’전에 선보인 작품들은 얼굴 가득 미소를 짓게 만들었다. 문구마다 표준어에서 느낄 수 없는 전라도 사투리 특유의 정감이 물씬 묻어나기 때문이었다. ‘여기서 사세요’라는 의미의 전라도 사투리를 문구 브랜드 명으로 삼은 김 대표는 사투리 문구류를 선보여 젊은 소비자들의 호평을 얻고 있다.
최근 지역 토박이말인 사투리가 문학 작품을 비롯해 드라마, 영화, 가요,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다채롭게 활용되고 있다. 애플 tv+에서 방영된 ‘파친코’의 경우처럼 사투리는 시대상과 지역, 극중 인물의 캐릭터를 입체적으로 살려 내는 역할을 톡톡히 한다.
최기종 시인의 시 ‘에말이요~’ 중 일부다. 전북 부안에서 태어나 1980년대 중반부터 목포에서 40년 가깝게 살고 있는 시인은 지난 2020년에 시집 ‘목포, 에말이요’를 펴냈다. 시인은 목포 사투리 ‘에말이요~’에 대해 처음에는 그 말뜻을 몰라 어리둥절하고, 혹 내가 뭘 잘못한 건 아닌지 가슴이 철렁했지만 목포 살이를 오래하며 살갑게 느꼈다고 한다.
영암 출신 조정 시인 또한 지난 6월 서남 전라도 서사시 ‘그라시재라’를 펴냈다. 일제 강점기와 한국 전쟁기를 힘겹게 관통해 온 우리네 할머니와 어머니의 인생사를 듣는 듯하다. 독자들은 ‘아무렴 그렇지요!’ ‘왜 그렇지 않겠어요’라는 뜻의 ‘그라시재라’로 호응하며 눈시울을 붉힌다.
“나는 꽃 중에 찔레꽃이 질로 좋아라/ 우리 친정 앞 또랑 너매 찔레 덤불이/ 오월이면 꽃이 만발해가꼬/ 거울 가튼 물에 흑하니 비친단 말이요/ 으치께 이삔가 물 흔들리깜시/ 빨래허든 손 놓고 앙거서/ 꽃기림자를 한정없이 보고 있었당께라….”
조정래 작가의 대하소설 ‘태백산맥’에서 청년단장 염상구는 토벌대장 임만수에게 전라도 말에 대해 한마디로 압축한다.
“전라도말맹키로 유식허고 찰지고 맛나고 한시럽고 헌 말이 팔도에 워디 있습디여.”
시대가 급변함에 따라 사투리 역시 소멸 위기를 맞고 있다. 원인은 서울말을 중심에 둔 정부의 표준어 정책과 산업화·도시화에 의해 고향을 떠나 대도시에서 거주하는 라이프 스타일 등 다양하다. 사투리는 고어가 살아 있는 우리말의 화석이자 문화 콘텐츠의 보물 창고이기도 하다. 토박이말에는 표준어로 대체할 수 없는 뉘앙스의 표현들이 많다. 전라도 말로 ‘귄 있다’가 그러한 경우이다. 귀엽다라는 표현을 넘어서는 어감을 담고 있다. 만약 지역의 사투리가 모두 소멸된다면? 우리의 소중한 문화 자산을 송두리째 잃는 것일 것이다.
사라지는 토박이말 보존 노력 절실
충북 진천에서 유년 시절을 보낸 유종호 문학평론가는 지난 5월 ‘사라지는 말들-말과 사회사’를 출간했다. ‘호습다’와 ‘설은살’ ‘오진살’ ‘그리마’ ‘보비위’ ‘입찬소리’ ‘구메구메’ 등 생소한 말들이 눈에 띈다. 그는 어릴 적의 낱말에 대해 ‘우리가 폐기해서 잊힌 혹은 잊히면서 사라져 가는 모어(母語) 중의 모어’라고 강조하며 이렇게 말한다.
“…사라지는 모든 것은 그 지음(知音)에게 소소한 대로 조금한 마음의 파문을 남긴다. 정답고 낯익은 것의 소멸은 바로 그대의 소멸을 알려 주는 예고 지표가 아닌가! 소멸을 수용하고 준비하라는 엄중한 전언이 아닌가!”
하루가 다르게 정신없이 질주하는 과학문명 속에서 지역 토박이들의 생활문화가 배어있는 사투리의 미래는 어떠할까? 사투리를 살리는 길은 당연히 언중(言衆)들이 일상에서 널리 사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투리가 시와 소설 등 문학 작품은 물론 영화, 드라마, 가요,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 활짝 꽃피우기를 기대한다.
/song@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