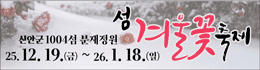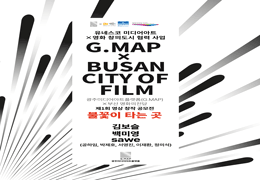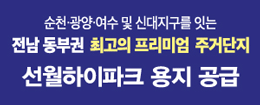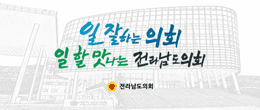‘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나라
 |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나면 제주도로 보내라’는 속담이 있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서울로 보내어 공부를 시켜야 입신출세할 수 있다는 의미다.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속언도 널리 쓰인다. 수단이나 방법이야 어찌 되었든 간에 목적만 이루면 된다는 뜻이다. 여기서 서울은 지명이면서 ‘수도’를 뜻하는 보통명사이기도 하다.
이들 표현은 한국인들의 의식과 우리 사회의 특징을 압축적으로 보여 준다. 서울 중심적, 중앙 지향적 사고다. 서울은 조선시대 도읍지로 정해진 이후 600년 이상 정치·경제·교육·문화의 중심지였다. 특히 광복 이후 경제 개발 시대에는 주요 산업의 본거지로 팽창을 거듭했다. 모든 분야가 서울로 과도하게 집중되는 현상을 비꼰 ‘서울 공화국’이라는 말이 국어사전에 오를 정도였다. 공룡이 된 서울은 급기야 그 영토를 경기와 인천까지 확장하며 거대 도시(megalopolis)로 성장했다. 사람은 물론 기업과 일자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 ‘수도권 공화국’의 탄생이다.
수도권 과밀화의 대표적인 지표는 인구다. 지난해 말 서울·경기·인천의 인구는 국내 전체의 절반을 넘어섰다.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주민 등록 기준 전체 인구 5184만 9861명 가운데 50.002%인 2592만 5799명이 수도권에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4개 광역 시도에 거주하는 지방 인구는 수도권보다 1737명 적었다.
수도권의 면적은 전체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하다. 전체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땅에 인구의 과반이 몰려 사는 것이다. 수도권 인구 비중은 60년 전인 1960년만 해도 20.8% 수준이었다. 그랬던 것이 1980년 35.5%, 2000년에는 46.3%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인구가 몰리다 보니 지역 내 총생산(GRDP) 쏠림도 심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전국 GRDP 1900조 원 가운데 수도권은 984조 원으로 전체의 51.8%를 차지했다. 비수도권 가운데 광주는 39조 원으로 2.1%, 전남은 76조 원으로 4.0%에 그쳤다.
일자리와 주요 인프라도 수도권에 편중돼 있다. 국내 1000대 기업 본사의 73.6%, 신규 취업자의 60.8%, 그리고 공공기관과 주요 대학, 요양기관, 문화시설 등도 40~50%가 수도권에 자리 잡고 있다. 수도권 일극(一極) 체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날로 비대해진 수도권은 ‘고도(高度) 비만’으로 각종 합병증과 기능 장애를 겪고 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드니 당연히 주택이 부족하게 되고, 이는 ‘평당 1억 원’에 육박하는 집값 폭등으로 이어졌다. 교통체증이나 환경오염이 가중되면서 삶의 질은 저하되고 사회적 비용은 급증하고 있다.
반면 지방은 영양실조로 쇠퇴를 거듭하며 활력을 잃어 가고 있다. 무엇보다 인구 감소로 인한 공동화(空洞化) 현상이 심각하다. 이는 호남권에서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다. 지난해 말 현재 광주의 주민등록 인구는 145만 6468명이며 전남은 186만 8745명, 전북은 181만 8917명으로 3개 시도를 합쳐 1년 새 3만 5000명이 줄었다. 호남의 인구 비중은 1970년만 해도 국내 전체의 20.4%에 달했지만 지금은 9.9% 수준이다. 50년 만에 반토막이 난 것이다. 이렇게 되다 보니 지방은 존립 자체를 걱정해야 할 형편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해 전남을 전국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지방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했다.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16곳이 30년 내 소멸 위기라는 진단을 받았다. 호남권 등 지방 인구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젊은 층인 10~30대가 교육과 취업을 이유로 수도권 등으로 빠져나가는 것이다. 이는 소비 위축과 생산력 저하, 경기침체를 불러오고 유권자 수까지 덩달아 줄어들면서 정치적 위상도 약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발전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 불균형은 서구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다. 과도한 수도권 편중과 국토의 양극화는 국가의 성장을 어렵게 만들고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들이 재앙 수준의 ‘파멸적 집적(集積)’이자 ‘국가 비상사태’라며 대책을 촉구하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수도권 공화국은 역대 정부의 편향적 국토 개발 정책에서 비롯됐다. 경제 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수십 년간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개발을 추진해 온 결과다. 수도권 집중은 참여정부 시절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정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 등 강력한 국토 균형 발전 정책에 따라 한때 주춤해지는 듯했다. 하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 이후 후속 대책이 실종되면서 되레 가속화하는 추세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을 약속했지만 진전이 없다. 외려 수도권 3기 신도시 건설 등으로 쏠림을 부채질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시대는 지났다. 지방을 희생양 삼아 수도권을 살찌우는 정책은 공멸을 부를 뿐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해소하려면 그 단초가 되는 일자리와 교육 여건부터 개선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정부가 약속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서두르고, 민간 기업의 지방 이전과 지역 거점 대학 육성을 위한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 광주형 일자리 등 지역 상생 일자리를 활성화해 지역에서 양성된 인재들이 지역에 정착해 일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해야 한다. 지역마다 특성화된 발전 전략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권한을 강화하는 지방 분권형 개헌은 필수적이다.
국가 균형 발전과 자치 분권은 고사 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릴 수 있는 두 기둥이다. 다가오는 총선은 이들 과제를 국가적 의제로 다시 세울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여야 정당과 후보자들이 이를 핵심 정책과 공약으로 적극 채택해, ‘지역이 강한 나라’를 앞당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
수도권의 면적은 전체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하다. 전체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땅에 인구의 과반이 몰려 사는 것이다. 수도권 인구 비중은 60년 전인 1960년만 해도 20.8% 수준이었다. 그랬던 것이 1980년 35.5%, 2000년에는 46.3%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인구가 몰리다 보니 지역 내 총생산(GRDP) 쏠림도 심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전국 GRDP 1900조 원 가운데 수도권은 984조 원으로 전체의 51.8%를 차지했다. 비수도권 가운데 광주는 39조 원으로 2.1%, 전남은 76조 원으로 4.0%에 그쳤다.
일자리와 주요 인프라도 수도권에 편중돼 있다. 국내 1000대 기업 본사의 73.6%, 신규 취업자의 60.8%, 그리고 공공기관과 주요 대학, 요양기관, 문화시설 등도 40~50%가 수도권에 자리 잡고 있다. 수도권 일극(一極) 체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날로 비대해진 수도권은 ‘고도(高度) 비만’으로 각종 합병증과 기능 장애를 겪고 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드니 당연히 주택이 부족하게 되고, 이는 ‘평당 1억 원’에 육박하는 집값 폭등으로 이어졌다. 교통체증이나 환경오염이 가중되면서 삶의 질은 저하되고 사회적 비용은 급증하고 있다.
반면 지방은 영양실조로 쇠퇴를 거듭하며 활력을 잃어 가고 있다. 무엇보다 인구 감소로 인한 공동화(空洞化) 현상이 심각하다. 이는 호남권에서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다. 지난해 말 현재 광주의 주민등록 인구는 145만 6468명이며 전남은 186만 8745명, 전북은 181만 8917명으로 3개 시도를 합쳐 1년 새 3만 5000명이 줄었다. 호남의 인구 비중은 1970년만 해도 국내 전체의 20.4%에 달했지만 지금은 9.9% 수준이다. 50년 만에 반토막이 난 것이다. 이렇게 되다 보니 지방은 존립 자체를 걱정해야 할 형편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해 전남을 전국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지방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했다.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16곳이 30년 내 소멸 위기라는 진단을 받았다. 호남권 등 지방 인구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젊은 층인 10~30대가 교육과 취업을 이유로 수도권 등으로 빠져나가는 것이다. 이는 소비 위축과 생산력 저하, 경기침체를 불러오고 유권자 수까지 덩달아 줄어들면서 정치적 위상도 약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발전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 불균형은 서구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다. 과도한 수도권 편중과 국토의 양극화는 국가의 성장을 어렵게 만들고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들이 재앙 수준의 ‘파멸적 집적(集積)’이자 ‘국가 비상사태’라며 대책을 촉구하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수도권 공화국은 역대 정부의 편향적 국토 개발 정책에서 비롯됐다. 경제 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수십 년간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개발을 추진해 온 결과다. 수도권 집중은 참여정부 시절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정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 등 강력한 국토 균형 발전 정책에 따라 한때 주춤해지는 듯했다. 하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 이후 후속 대책이 실종되면서 되레 가속화하는 추세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을 약속했지만 진전이 없다. 외려 수도권 3기 신도시 건설 등으로 쏠림을 부채질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시대는 지났다. 지방을 희생양 삼아 수도권을 살찌우는 정책은 공멸을 부를 뿐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해소하려면 그 단초가 되는 일자리와 교육 여건부터 개선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정부가 약속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서두르고, 민간 기업의 지방 이전과 지역 거점 대학 육성을 위한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 광주형 일자리 등 지역 상생 일자리를 활성화해 지역에서 양성된 인재들이 지역에 정착해 일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해야 한다. 지역마다 특성화된 발전 전략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권한을 강화하는 지방 분권형 개헌은 필수적이다.
국가 균형 발전과 자치 분권은 고사 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릴 수 있는 두 기둥이다. 다가오는 총선은 이들 과제를 국가적 의제로 다시 세울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여야 정당과 후보자들이 이를 핵심 정책과 공약으로 적극 채택해, ‘지역이 강한 나라’를 앞당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