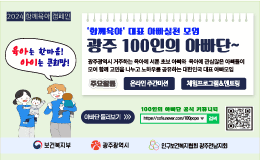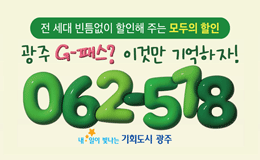한가위 둥근달에 묻는다
 |
# “밝은 저 달님은 언제부터 있었을까?(明月幾時有)/ 술잔 들고 저 푸른 하늘에게 물어본다(把酒問靑天)…” 북송시대 시인 동파(東坡) 소식(1036~1101)이 지은 노랫말(詞) ‘수조가두’(水調歌頭)의 첫 구다. 추석날 밤늦도록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동생을 그리며 지었다고 한다. 이보다 300여 년 앞서 당나라 ‘시선’(詩仙) 이백(701~762)은 ‘파주문월’(把酒問月)에서 “푸른 하늘에 저 달은 언제부터 있었나(靑天有月來幾時)/ 나 술잔을 멈추고 한번 물어보노라(我今停杯一問之)”라고 읊었다. 동파의 시는 바로 이에 대한 오마주(hommage)였다.
# 1965년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1932~2006)은 뉴욕 보니노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그중 TV 12대로 만든 작품이 눈길을 끌었다. 초승달부터 보름달까지 달의 위상 변화를 네모난 브라운관 속에 구현했다. 작품 제목은 ‘달은 가장 오래된 TV’(Moon is the oldest TV)였다. ‘달이 TV라니’ 하면서도 누구든 고개를 끄덕일 만한 이색적인 작품이었다. 동양적인 사유를 바탕으로 현대인들에게 철학적인 물음을 던지는 신개념 비디오아트의 탄생이었다.
달은 시뿐만 아니라 소설·그림·음악·미디어아트 등 다양한 예술 장르의 소재로 즐겨 활용됐다. 특히 우리 옛 그림에는 달을 주제로 한 작품들이 많다. 조선 중기 탄은 이정(1554~1626)의 ‘문월도’(問月圖)는 이태백이나 소동파의 시구를 떠올리게 하는 작품이다. 비스듬히 기운 나무 아래 앉은 한 처사가 오른손을 들어 하늘에 떠 있는 달을 가리키고 있다. 그가 달에게 묻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이정과 비슷한 시기 활동한 문인화가 이경윤(1545~1611)이 그렸다고 전해지는 ‘월하탄금도’(月下彈琴圖) 역시 달을 보며 줄 없는 거문고를 타고 있는 선비를 묘사했다. 손철주 미술평론가는 최근 인터뷰에서 우리 옛 그림에 달을 담은 작품이 많은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소설가 이병주 선생이 ‘햇빛에 바래면 역사가 되고, 달빛에 물들면 신화가 된다’고 했다. 명명백백한 태양 아래서는 ‘팩트’만 있는 것이다. 으스름한 달이 뜨는 순간, 그때부터 ‘신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추석은 햇빛이 아닌 달빛의 풍속이다. 음력 8월 보름은 봄부터 씨를 뿌리고 비지땀 흘리며 일궈 온 오곡백과가 익어 수확하는 때다. 농경문화 속에서 이보다 좋은 시기가 또 있을까? 추석의 기원은 20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신라 3대 왕인 유리왕은 6부를 정한 뒤 이를 둘로 나누어 두 명의 왕녀로 하여금 각각 부서 내의 여자들을 거느려 8월 보름까지 한 달간 베를 짜게 하는 경쟁을 벌이도록 했다. 그 결과 진 팀이 이긴 팀에게 음식과 술을 대접하고 놀이를 했다는 데서 한가위가 유래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시대가 변하며 전통적인 추석의 의미가 점점 퇴색하고 있다. 산업화 시대를 겪으며 지금은 농경문화 속의 추석과는 너무도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옛 그림 속에서 ‘신화’가 되는 은은한 달빛의 정서는 더 이상 보기 힘들어졌다. 함께 수확하며 공유하던 공동체의 화합 정신도 희미해졌다. 추석을 쇠는 문화도 달라졌다. 차례 음식은 직접 장만하기보다는 반찬 업체에서 만든 것을 소량 구입해 차리기도 한다. 성묘 또한 추석 당일보다는 번잡한 교통난을 피해 미리 해버린다. 추석 명절을 맞아 가족과 함께 해외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도 많아졌다.
추석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도 사람들은 설레는 맘으로 장사진을 이룬 거북이 귀성 행렬에 묻혀 고향을 찾을 것이다. 그리고 가족들과 둥글게 둘러앉아 TV를 보듯, 보름달을 바라보며 이야기꽃을 피울 것이다. 하지만 아날로그를 벗어나 디지털 기술 시대로 치닫는 현시대에 추석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앞으로도 음력 8월 보름이면 변함없이 떠오를 둥근달에게 묻고 싶다. 10년, 100년 뒤에 추석은 어떻게 변할까? 어쩌면 ‘민족 대이동’이라고 일컫는 귀성 행렬도 뚝 끊어지고, 이름뿐인 명절로 남아 있을지도 모르는데….
소동파의 시는 이렇게 끝난다. “다만 우리 모두 오래오래 살아서(但願人長久)/ 천리 끝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아름다운 저 달님 구경할 수 있기를(千里共嬋娟).”(유병례 지음, ‘송사(宋詞) 30수’ 중)
/song@kwangju.co.kr
이정과 비슷한 시기 활동한 문인화가 이경윤(1545~1611)이 그렸다고 전해지는 ‘월하탄금도’(月下彈琴圖) 역시 달을 보며 줄 없는 거문고를 타고 있는 선비를 묘사했다. 손철주 미술평론가는 최근 인터뷰에서 우리 옛 그림에 달을 담은 작품이 많은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소설가 이병주 선생이 ‘햇빛에 바래면 역사가 되고, 달빛에 물들면 신화가 된다’고 했다. 명명백백한 태양 아래서는 ‘팩트’만 있는 것이다. 으스름한 달이 뜨는 순간, 그때부터 ‘신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추석은 햇빛이 아닌 달빛의 풍속이다. 음력 8월 보름은 봄부터 씨를 뿌리고 비지땀 흘리며 일궈 온 오곡백과가 익어 수확하는 때다. 농경문화 속에서 이보다 좋은 시기가 또 있을까? 추석의 기원은 20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신라 3대 왕인 유리왕은 6부를 정한 뒤 이를 둘로 나누어 두 명의 왕녀로 하여금 각각 부서 내의 여자들을 거느려 8월 보름까지 한 달간 베를 짜게 하는 경쟁을 벌이도록 했다. 그 결과 진 팀이 이긴 팀에게 음식과 술을 대접하고 놀이를 했다는 데서 한가위가 유래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시대가 변하며 전통적인 추석의 의미가 점점 퇴색하고 있다. 산업화 시대를 겪으며 지금은 농경문화 속의 추석과는 너무도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옛 그림 속에서 ‘신화’가 되는 은은한 달빛의 정서는 더 이상 보기 힘들어졌다. 함께 수확하며 공유하던 공동체의 화합 정신도 희미해졌다. 추석을 쇠는 문화도 달라졌다. 차례 음식은 직접 장만하기보다는 반찬 업체에서 만든 것을 소량 구입해 차리기도 한다. 성묘 또한 추석 당일보다는 번잡한 교통난을 피해 미리 해버린다. 추석 명절을 맞아 가족과 함께 해외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도 많아졌다.
추석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도 사람들은 설레는 맘으로 장사진을 이룬 거북이 귀성 행렬에 묻혀 고향을 찾을 것이다. 그리고 가족들과 둥글게 둘러앉아 TV를 보듯, 보름달을 바라보며 이야기꽃을 피울 것이다. 하지만 아날로그를 벗어나 디지털 기술 시대로 치닫는 현시대에 추석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앞으로도 음력 8월 보름이면 변함없이 떠오를 둥근달에게 묻고 싶다. 10년, 100년 뒤에 추석은 어떻게 변할까? 어쩌면 ‘민족 대이동’이라고 일컫는 귀성 행렬도 뚝 끊어지고, 이름뿐인 명절로 남아 있을지도 모르는데….
소동파의 시는 이렇게 끝난다. “다만 우리 모두 오래오래 살아서(但願人長久)/ 천리 끝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아름다운 저 달님 구경할 수 있기를(千里共嬋娟).”(유병례 지음, ‘송사(宋詞) 30수’ 중)
/song@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