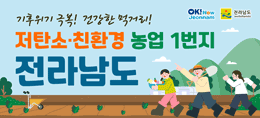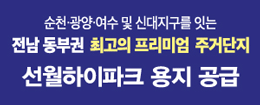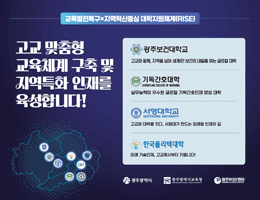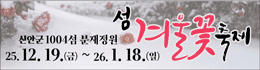월드컵 축구와 즐기는 삶
[채희종 여론매체부장]
 |
2018러시아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이미 탈락한 한국 축구를 놓고 아직도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 팀이 첫 경기였던 스웨덴전에서 제대로 슈팅 한번 해 보지 못하는 무기력한 게임으로 16강이 좌절됐다는 비난이 지금도 온라인에 줄을 잇는다. 반면 ‘꼴등이 1등을 이겼다’며, 독일을 상대로 거둔 2-0 승리를 기적으로 치켜세우는 국민도 많다.
한국의 월드컵 경기를 놓고 비난과 칭찬으로 갈린 데다 양측 주장이 모두 일리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더불어 두 게임을 지는 동안 국가대표 팀을 맹비난하다가 독일전에서 승리하자 영웅으로 치켜세운다며, 이런 국민의 태도를 ‘냄비 근성’으로 몰아붙이는 일부 언론이나 축구 팬들도 있어 논란은 여전하다. 이는 일반 스포츠와 달리 월드컵이나 올림픽 같은 메가 스포츠의 경우 국가 대항전 성격이 짙어 국민들도 응원으로 경기에 가세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풍경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온 국민이 열광하는 스포츠 경기가 열릴 때면 생각나는 얘기가 있다. 2500년 전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피타고라스가 인간의 삶(인생)을 ‘올림픽 경기장에 가는 사람’으로 비유했다는 바로 그 얘기다. 피타고라스의 비유는 흔히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으로 철학 입문서나 교양서에 나오기도 한다.
피타고라스는 올림픽 경기장에 가는 사람을 세 부류로 나눴다. 하나는 경기장에 온 사람들에게 물건을 팔려는 장사꾼이고, 또 하나는 경기에서 이기려고 뛰는 운동선수이며, 나머지 하나는 그냥 게임을 보러 온 관객이다. 장사꾼은 오로지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객석 사이를 부산히 움직인다. 누가 잘하는지, 어느 팀이 앞서는지는 관심 밖이다. 오랜 기간 기량을 갈고 닦아 출전한 운동선수는 승리를 위해 온몸을 던진다. 그에게 경기는 인생을 건 전쟁이나 마찬가지다. 하지만 관객은 그저 경기 보는 재미에 빠져 다른 곳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
피타고라스가 말한 경기장의 풍경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다르지 않아 보인다. 그렇다면 과연 이들 중 경기를 제대로 보고, 즐기는 사람은 누구일까. 이익을 남기려는 장사꾼과 이름을 떨치려는 운동선수는 자신들의 목표에 집착한 나머지 경기를 관조하기가 쉽지 않다. 구경하러 간 사람만이 이해관계의 얽매임 없이 온전히 경기에 몰입할 수 있다.
피타고라스의 이런 비유는 ‘정말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행복할까’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진다. 즉 관조하고 즐기는 삶이야말로 바람직한 인생의 자세라는 철학적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다. 피타고라스의 가르침이 철학적 진리라면 그 가르침이 현대에도 유효한 것일까? 하루라도 돈 없이는 못 살고, 권력을 얻거나 높은 지위에 올라가려고 안간힘을 쓰는 현대인들에게 돈과 권력을 멀리하라니, 별로 가진 것도 없는데 집착하지 말라니. 철학적 가르침이란 그저 책에서나 실현 가능한 것일지 모른다. 하지만 피타고라스의 비유를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그렇기에 역으로 그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재벌이나 프랜차이즈사의 하청 업체 또는 가맹점에 대한 ‘갑질’이 어디 돈이 없어서 일어난 일인가. 오히려 돈이 많은 탓에 더 많은 돈을 쉽게 벌기 위해 벌인 일 아닌가.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들의 국정 농단 역시 권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권력이 강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돈과 권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돈과 권력이 남아서 남을 해치고 결국에는 나까지 망하게 하는 것이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즐겨야 하고, 즐기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와 집착에서 약간이라도 벗어나야 한다.
100m 달리기 한국 대표가 우샤인 볼트에게 졌다거나 예선에 탈락했다는 이유로 흥분할 국민은 한 명도 없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심폐 기능과 근육량·지구력 등에서 서양인에 비해 떨어지는 신체 기능을 정신력만으로 극복하기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이다. 여기에 팀워크까지 갖춰야 하는 축구라면 더 말할 나위 없다. 매사에 좀 더 거리를 두고 즐기는 자세를 가져 보자. 생각보다 행복해지는 게 쉬울 수 있다.
/ chae@kwangju.co.kr
온 국민이 열광하는 스포츠 경기가 열릴 때면 생각나는 얘기가 있다. 2500년 전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피타고라스가 인간의 삶(인생)을 ‘올림픽 경기장에 가는 사람’으로 비유했다는 바로 그 얘기다. 피타고라스의 비유는 흔히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으로 철학 입문서나 교양서에 나오기도 한다.
피타고라스가 말한 경기장의 풍경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다르지 않아 보인다. 그렇다면 과연 이들 중 경기를 제대로 보고, 즐기는 사람은 누구일까. 이익을 남기려는 장사꾼과 이름을 떨치려는 운동선수는 자신들의 목표에 집착한 나머지 경기를 관조하기가 쉽지 않다. 구경하러 간 사람만이 이해관계의 얽매임 없이 온전히 경기에 몰입할 수 있다.
피타고라스의 이런 비유는 ‘정말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행복할까’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진다. 즉 관조하고 즐기는 삶이야말로 바람직한 인생의 자세라는 철학적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다. 피타고라스의 가르침이 철학적 진리라면 그 가르침이 현대에도 유효한 것일까? 하루라도 돈 없이는 못 살고, 권력을 얻거나 높은 지위에 올라가려고 안간힘을 쓰는 현대인들에게 돈과 권력을 멀리하라니, 별로 가진 것도 없는데 집착하지 말라니. 철학적 가르침이란 그저 책에서나 실현 가능한 것일지 모른다. 하지만 피타고라스의 비유를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그렇기에 역으로 그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재벌이나 프랜차이즈사의 하청 업체 또는 가맹점에 대한 ‘갑질’이 어디 돈이 없어서 일어난 일인가. 오히려 돈이 많은 탓에 더 많은 돈을 쉽게 벌기 위해 벌인 일 아닌가.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들의 국정 농단 역시 권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권력이 강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돈과 권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돈과 권력이 남아서 남을 해치고 결국에는 나까지 망하게 하는 것이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즐겨야 하고, 즐기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와 집착에서 약간이라도 벗어나야 한다.
100m 달리기 한국 대표가 우샤인 볼트에게 졌다거나 예선에 탈락했다는 이유로 흥분할 국민은 한 명도 없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심폐 기능과 근육량·지구력 등에서 서양인에 비해 떨어지는 신체 기능을 정신력만으로 극복하기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이다. 여기에 팀워크까지 갖춰야 하는 축구라면 더 말할 나위 없다. 매사에 좀 더 거리를 두고 즐기는 자세를 가져 보자. 생각보다 행복해지는 게 쉬울 수 있다.
/ chae@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