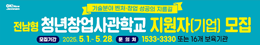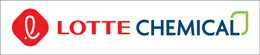기차역서 울리는 피아노 소리
 김 미 은 문화1부장 |
최근 다녀온 네덜란드 헤이그는 화가 몬드리안의 그림이 살아 숨 쉬는 곳이다. 네덜란드 출신인 몬드리안의 그 유명한 파랑·노랑·빨강·흰색 격자 무늬가 시청과 공공건물, 일반 상가 등을 장식하고 있었다. 그림이 도시 전체에 포인트를 준 게 신선했다.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는 헤이그역도 마찬가지였다. 가장 인상적인 건 몬드리안의 그림으로 단장한 ‘피아노’. 역을 찾은 누구나 마음껏 연주를 할 수 있는 악기다. 내가 기차역에 내렸을 땐, 안전복을 착용한 공사장 인부가 안전모를 피아노 위에 얹어 둔 채 연주하고 있었다. 잠시 쉬는 시간 짬을 내 연주하는 모습을 그의 동료들과 지나가는 이들이 지켜봤다. 연주가 끝나자 환호와 박수가 터졌다.
기차역에서 나와 역 앞 대형 공사장에서는 또 다른 ‘인부’를 볼 수 있었다. 이번엔 안전모를 받침대 삼아 책을 읽고 있는, 백발에 수염이 하얀 할아버지의 모습이었다.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몰입하는지 ‘독서 삼매경’에 빠져 있는 모습이 아름다워 보였다. 돌아오는 길, 다시 만난 할아버지는 굴착기가 돌아가는 공사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
이번 여행 중 들른 도시에서 자주 볼 수 있었던 건 누구나 자유롭게 연주할 수 있는 ‘피아노’였다. 암스테르담 기차역에서는 흥겨운 피아노 반주에 맞춰 많은 이들이 함께 노래하는 모습에 절로 기분이 좋아졌다. 뒤셀도르프의 유명한 서점 ‘마이어션 드로스테’ 3층에 놓인 피아노 앞에선 한 아시아인 청년이 아름다운 곡들을 연주하고 있었다. 암스테르담 국립도서관 1층에 자리한 피아노에서 연주하는 금발의 젊은이는 프로급 실력이었는데, 무엇보다 연주 내내 기둥에 기대어 황홀한 표정으로 음악을 감상하던 나이 지긋한 남성의 모습이 기억에 남는다. 엄마를 따라온 꼬마가 연주랍시고 뚱땅거리던 모습에선 웃음이 절로 나왔다.
행복한 풍경들을 보며 이들에겐 ‘음악과 독서’가 삶 속에 자연스레 스며 있는, 그게 바로 ‘평범한 일상’인 것 같아 많이 부러웠다.
얼마 전 시집 ‘나의 바다’를 펴내 화제가 된 무안 출신 ‘팔순 할매’ 김옥례 여사는 ‘누에 고치가 실 뽑아내듯’ 시를 쓰는 게 생활이었다. 평생 써 온 다리미, 밤마다 우는 귀뚜라미, ‘탐스럽고 복스러웠다가 지금은 힘줄만 울룩불룩 가엾어져 버린’ 고마운 손이 모두 시의 소재였고, ‘아들 못 둔 쓰린 마음’과 ‘나 몰래 떠난 청춘’, ‘새댁 시절’ 등 순탄치만은 않았던 80 인생을 토해 내는 데 시만 한 게 없었다.
자주 아픈데다 헌 박스를 줍는 힘든 삶 속에서도 ‘시인이 되겠다’는 꿈을 꾼 ‘할매’는 시 공부하러 도서관에 갔다 느낀 심정을 이렇게 써 내려가기도 했다. “깜짝 놀랐어요. 전부 아주 애송이 방실방실한 새댁들이고 팔순의 노파 저 혼자란 말씀이지요. 살다가 처음 주눅이 들었지요. 잠깐 생각하다 에라 모르겠다 용기를 내자.”(‘목포 공공 도서관’ 중에서)
먹고 살기 팍팍한 현대인의 삶 속에서 문화 예술은 나와는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사실, 일부러 공연장과 갤러리를 찾아가는 건 어느 정도 품이 드는 일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의식주처럼 자연스레 몸에 배는 ‘생활 속 예술’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개인 개인의 관심과 함께 ‘내가 직접 즐기는 예술’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고 지원하는 자치단체와 문화예술 기관들의 노력이 필요한 이유다.
참, 광주에도 누구나 연주할 수 있는 피아노가 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 앞에 놓인 ‘달려라 피아노 65호’다. 언젠가 전당에 놀러갔을 때 할머니 등 온 가족이 아이가 연주하는 ‘엘리제를 위하여’를 들으며 흐뭇하게 지켜보던 모습이 떠오른다. ‘달려라 피아노’ 프로젝트는 ‘즐거운 소통이 되어 희망과 변화를 만들며 함께 행복해지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이들의 염원이 담긴 기획이다.
또 한 곳, 매주 ‘어여쁘다 궁동’ 행사가 열리는 궁동 예술의 거리 무등갤러리 앞에도 꽃무늬 옷을 입은 초록색 피아노가 놓여 있다. 피아노를 칠 수 있다면, 쑥스러워하지 말고 한 번쯤 연주해 보는 건 어떨까. 고민에 쌓여 있던 누군가가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당신이 들려주는 그 아름다운 음악에 귀 기울이며 작은 위로를 얻을 수도 있을 테니 말이다.
/mekim@kwangju.co.kr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는 헤이그역도 마찬가지였다. 가장 인상적인 건 몬드리안의 그림으로 단장한 ‘피아노’. 역을 찾은 누구나 마음껏 연주를 할 수 있는 악기다. 내가 기차역에 내렸을 땐, 안전복을 착용한 공사장 인부가 안전모를 피아노 위에 얹어 둔 채 연주하고 있었다. 잠시 쉬는 시간 짬을 내 연주하는 모습을 그의 동료들과 지나가는 이들이 지켜봤다. 연주가 끝나자 환호와 박수가 터졌다.
행복한 풍경들을 보며 이들에겐 ‘음악과 독서’가 삶 속에 자연스레 스며 있는, 그게 바로 ‘평범한 일상’인 것 같아 많이 부러웠다.
얼마 전 시집 ‘나의 바다’를 펴내 화제가 된 무안 출신 ‘팔순 할매’ 김옥례 여사는 ‘누에 고치가 실 뽑아내듯’ 시를 쓰는 게 생활이었다. 평생 써 온 다리미, 밤마다 우는 귀뚜라미, ‘탐스럽고 복스러웠다가 지금은 힘줄만 울룩불룩 가엾어져 버린’ 고마운 손이 모두 시의 소재였고, ‘아들 못 둔 쓰린 마음’과 ‘나 몰래 떠난 청춘’, ‘새댁 시절’ 등 순탄치만은 않았던 80 인생을 토해 내는 데 시만 한 게 없었다.
자주 아픈데다 헌 박스를 줍는 힘든 삶 속에서도 ‘시인이 되겠다’는 꿈을 꾼 ‘할매’는 시 공부하러 도서관에 갔다 느낀 심정을 이렇게 써 내려가기도 했다. “깜짝 놀랐어요. 전부 아주 애송이 방실방실한 새댁들이고 팔순의 노파 저 혼자란 말씀이지요. 살다가 처음 주눅이 들었지요. 잠깐 생각하다 에라 모르겠다 용기를 내자.”(‘목포 공공 도서관’ 중에서)
먹고 살기 팍팍한 현대인의 삶 속에서 문화 예술은 나와는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사실, 일부러 공연장과 갤러리를 찾아가는 건 어느 정도 품이 드는 일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의식주처럼 자연스레 몸에 배는 ‘생활 속 예술’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개인 개인의 관심과 함께 ‘내가 직접 즐기는 예술’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고 지원하는 자치단체와 문화예술 기관들의 노력이 필요한 이유다.
참, 광주에도 누구나 연주할 수 있는 피아노가 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 앞에 놓인 ‘달려라 피아노 65호’다. 언젠가 전당에 놀러갔을 때 할머니 등 온 가족이 아이가 연주하는 ‘엘리제를 위하여’를 들으며 흐뭇하게 지켜보던 모습이 떠오른다. ‘달려라 피아노’ 프로젝트는 ‘즐거운 소통이 되어 희망과 변화를 만들며 함께 행복해지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이들의 염원이 담긴 기획이다.
또 한 곳, 매주 ‘어여쁘다 궁동’ 행사가 열리는 궁동 예술의 거리 무등갤러리 앞에도 꽃무늬 옷을 입은 초록색 피아노가 놓여 있다. 피아노를 칠 수 있다면, 쑥스러워하지 말고 한 번쯤 연주해 보는 건 어떨까. 고민에 쌓여 있던 누군가가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당신이 들려주는 그 아름다운 음악에 귀 기울이며 작은 위로를 얻을 수도 있을 테니 말이다.
/me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