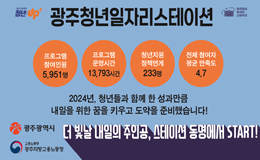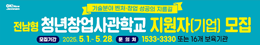김영란법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김 일 환
편집부국장
편집부국장
김영란법. 정확히 말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오늘 발효됐다. 지난여름 한국사회의 최대 화두였던 이 법은 공직사회와 교육계 그리고 언론계까지 학습의 열풍으로 몰아넣었다.
부정 청탁과 부패를 방지하자는 간단한 취지임에도 이 법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공직자 등 400만 명은 이 법이 간단하지만은 않은 모양이다. 각 공공기관은 물론 언론사들까지 나서 김영란법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내 교육을 강화하는 등 북새통이다. 미구에 닥칠지도 모르는 막연한 공포에 두려움 또한 팽배해 있다. 긴장의 강도가 점차 고조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한편으로는 볼멘소리도 터져 나온다. 3·5·10이란 족쇄에 세상을 가둔다느니,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치명타가 될 거라고도 한다. 인적 네트워크를 중시하는 한국사회의 정서와는 상당히 동떨어진 법이라는 부정적 견해도 쏟아진다. 또 법의 모호함 때문에 ‘귀에 걸면 귀고리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거라는 비판도 있다.
그럴 수 있다. 물론 대부분 공감할 수 있는 말들이다. 시행 초기에 혼란은 어느 정도 예상되는 일이다. 단언컨대 상당한 시행착오를 겪을 것이다.
그렇다 해서 제대로 해 보지도 않고 이 법을 당장 개정해야 한다거나 비토할 수는 없는 일이다. 김영란법은 투명한 대한민국을 실현하는 시대적 요청이다. 오늘 발효된 이 법으로 후세대에 청렴 한국의 시작은 오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역사가 쓰이고 있다.
시발점이라는 거창함과 법이 주는 무거움은 있지만 당장 이 법의 테두리에 속해 있다 해서 위축될 필요는 없다. 오히려 능동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 사회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이 법의 원조 격인 미국의 ‘25달러 리미트’(뇌물·부당 이득 및 이해 충돌 방지법이 정한 선물 상한선)에서 찾을 수 있다. 1962년 제정돼 로비스트법(1995년)에까지 25달러 제한을 두게 한 이 법은 현재 미국에서는 사실상 사문화된 법이다. 이 말은 현실적으로 법으로만 존재할 뿐 거의 화석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미국 사회의 근간이 되는 합리성과 포용성의 결과지만 애당초 그들은 법 발효 초기에 이것을 제재로 받아들이지 않고 규범으로 수용했기에 그 법은 사문화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와 관련 최근 미국에서 살다 온 이가 들려준 일화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 생활 초기에 자녀 학교에서 갑작스러운 면담 요청이 와 한국에서처럼 촌지나 고가의 선물을 준비해야 하나 하고 상당히 당황했다고 한다. 그는 고민 끝에 이웃에 사는 교포에게 물었더니 극구 말리더라는 것이다. 그리고 조언하기를, 25달러짜리 케이크와 감사 편지를 써서 가져가라고 했다는 것이다. 여타 선물의 기준도 그 정도 선에서 하면 될 거라고 했다.
그는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고민에서 해방될 수 있어서 좋았다고 했다. 넘치지 않고 치우침 없는 합리적인 사회의 단면을 봤다고도 했다. 그리고 한국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불합리와 부조리의 고리를 하루빨리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예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작금의 우리 사회에 절실히 필요한 것은 합리적이고 포용력 있는 마음가짐이다. 법 이전에 상식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요구된다. 우리 사회의 기본 프레임에 착근만 시킬 수 있다면 법은 상식을 배반하지 않는다. 사회적 공감대만 확산시킬 수 있다면 규범으로 자리 잡는 데 그리 오래 걸릴 일도 아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발효 전부터 팽배해 있는 김영란법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씻어 낼 필요가 있다.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시민사회가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야한다. 법 이전에 규범으로 받아들이자는 사회 협약을 추진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더불어 국회와 법률전문가들을 주축으로 사회적 합의를 가로막는 독소 규정은 없는지 또는 과하거나 경직된 조항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세심하게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
부정 청탁과 부패를 방지하자는 간단한 취지임에도 이 법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공직자 등 400만 명은 이 법이 간단하지만은 않은 모양이다. 각 공공기관은 물론 언론사들까지 나서 김영란법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내 교육을 강화하는 등 북새통이다. 미구에 닥칠지도 모르는 막연한 공포에 두려움 또한 팽배해 있다. 긴장의 강도가 점차 고조되고 있다.
그렇다 해서 제대로 해 보지도 않고 이 법을 당장 개정해야 한다거나 비토할 수는 없는 일이다. 김영란법은 투명한 대한민국을 실현하는 시대적 요청이다. 오늘 발효된 이 법으로 후세대에 청렴 한국의 시작은 오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역사가 쓰이고 있다.
시발점이라는 거창함과 법이 주는 무거움은 있지만 당장 이 법의 테두리에 속해 있다 해서 위축될 필요는 없다. 오히려 능동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 사회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이 법의 원조 격인 미국의 ‘25달러 리미트’(뇌물·부당 이득 및 이해 충돌 방지법이 정한 선물 상한선)에서 찾을 수 있다. 1962년 제정돼 로비스트법(1995년)에까지 25달러 제한을 두게 한 이 법은 현재 미국에서는 사실상 사문화된 법이다. 이 말은 현실적으로 법으로만 존재할 뿐 거의 화석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미국 사회의 근간이 되는 합리성과 포용성의 결과지만 애당초 그들은 법 발효 초기에 이것을 제재로 받아들이지 않고 규범으로 수용했기에 그 법은 사문화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와 관련 최근 미국에서 살다 온 이가 들려준 일화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 생활 초기에 자녀 학교에서 갑작스러운 면담 요청이 와 한국에서처럼 촌지나 고가의 선물을 준비해야 하나 하고 상당히 당황했다고 한다. 그는 고민 끝에 이웃에 사는 교포에게 물었더니 극구 말리더라는 것이다. 그리고 조언하기를, 25달러짜리 케이크와 감사 편지를 써서 가져가라고 했다는 것이다. 여타 선물의 기준도 그 정도 선에서 하면 될 거라고 했다.
그는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고민에서 해방될 수 있어서 좋았다고 했다. 넘치지 않고 치우침 없는 합리적인 사회의 단면을 봤다고도 했다. 그리고 한국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불합리와 부조리의 고리를 하루빨리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예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작금의 우리 사회에 절실히 필요한 것은 합리적이고 포용력 있는 마음가짐이다. 법 이전에 상식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요구된다. 우리 사회의 기본 프레임에 착근만 시킬 수 있다면 법은 상식을 배반하지 않는다. 사회적 공감대만 확산시킬 수 있다면 규범으로 자리 잡는 데 그리 오래 걸릴 일도 아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발효 전부터 팽배해 있는 김영란법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씻어 낼 필요가 있다.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시민사회가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야한다. 법 이전에 규범으로 받아들이자는 사회 협약을 추진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더불어 국회와 법률전문가들을 주축으로 사회적 합의를 가로막는 독소 규정은 없는지 또는 과하거나 경직된 조항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세심하게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