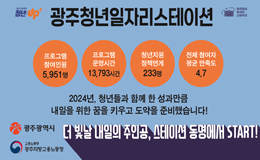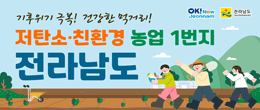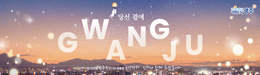‘조각의 거리’ 누가 찾아올까 두렵다
김 미 은
문화1부장
문화1부장
“누가 볼까 무섭다.” 오랜만에 광주 예술의 거리를 찾았다가 든 생각이다. 요즘 예술의 거리를 찾는 일이 잦았다. 4월초 주말엔 ‘나비야 궁동 가자’ 에 들렀다. 처음 구경 나온 일행과 함께 이곳저곳 둘러보며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2주 전쯤엔 아트타운 갤러리에 들러 최향 씨의 그림을 감상했다. 강남구 작가가 벽화를 그린 음식점 밀락원에선 모임을 가졌다.
최근엔 새롭게 문을 연 ‘예린 소극장’을 취재했다. 동부 경찰서 앞 깜찍한 0.3평 갤러리 앞을 지날 때면 절로 미소가 지어지곤 했다. 아직 갈 길이 멀기는 하지만 침체됐던 예술의 거리가 조금씩 활기를 찾는 듯했다.
하지만 중앙 초등학교 사거리를 넘어서면 이런 마음이 싹 달아난다. 20세기로 돌아간 느낌이 들어서다. 최근 조성된 ‘예술의 거리 조각 거리’는 절망감 만을 안겨 준다.
광주시와 동구는 문화전당권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금남로에 설치된 조각 작품 20점 중 18점을 예술의 거리로 옮기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사실, 처음 이전 계획이 알려지면서 이미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었다. 금남로 조각상 20점은 원래 1㎞ 구간에 분산 설치돼 있었다. 반면 예술의 거리로 들어오게 되면 140m 구간에 18점이 설치될 처지였다. 최고 3m가 넘는 조각상이 2∼5m 간격으로 놓이게 돼 감상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전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실제로 최근 조성된 조각의 거리 모습을 보면 그런 ‘우려’마저도 넘어섰다. 작가 의도나 작품이 갖는 의미 등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설치 등 ‘미적 사항’을 문제 삼는 건 오히려 사치스러운 일이었다. 2∼5m 간격으로 설치됐다면 그나마 다행이었다. 현실은 작품 간격이 1m가 넘는 곳이 거의 없다. 거리를 보는 순간, ‘금딱지를 덕지덕지 걸친 졸부의 얼굴’이 떠올랐다.
140m 거리에는 18개 조각품 뿐 아니라 대형 안내판을 비롯해 예술의 거리 ‘아트우물’ 프로젝트로 진행한 4개의 스트리트 아트도 함께 놓여 있다. 여기에 대형 배전함 5개와 벤치 10여 개도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정작 18개 작품이 들어서는 거리는 길게 잡아도 80m에 불과하다. 그러다 보니 말 그대로 작품을 ‘몰아넣은 꼴’이 됐다. 김성식, 박병희, 이용덕 작가 작품은 30cm 간격으로 설치돼 있다. 바글바글 흥부네 자식들이 따로 없다.
아쉬운 건 작가들의 태도다. 자신들의 작품이 이처럼 짐짝 취급당해도 괜찮다는 걸까. 초라할 대로 초라해져 버린 작품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편할 수 있을까.
백번 양보해 이런 상황이 예술의 거리가 아닌, 다른 곳에서 벌어졌다면 그나마 덜 아쉬울 것 같다. 국립아시아문화 전당을 품고 있는 문화특구, 문화 1번지를 주창하는 동구, 광주 문화예술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예술의 거리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게 서글프다.
광주시와 동구청은 추진 단계에서 예술의 거리 번영회 등의 동의를 얻었다고는 하지만 상인들도 ‘이런 모습’을 생각했던 건 아니라고 말한다. 담당 공무원들에게 문화적 마인드가 있었다면, 그리고 조각품 설치 시뮬레이션을 거쳐 봤다면 이런 상황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
1980∼90년대도 아니고, 핫한 문화 예술이 넘쳐나는 2016년에 이런 형식의 ‘조각의 거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게 신기할(?) 따름이다. 시가 의도했던 ‘명품 조각거리’는 아닐지라도 세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유례가 없는 조각 거리’인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다. 전국적인 조롱거리가 될 지도 모르겠다는 우려를 전한 한 작가의 말처럼 되레 문화도시 이미지를 손상시키지 않을까 걱정된다.
김성환 동구청장은 선거 당시 “조각상 이전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문화특구 동구 이미지에 걸맞게 작품 특징을 살리는 이전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전문가와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김 청장은 다른 구정 업무로 바쁘더라도 현장을 꼭 한번 들러보시라. 시 공무원도 마찬가지다.
예술의 거리에 꼭 조각상이 자리할 필요는 없다. 예술의 거리 특성에 맞는 작품을 선별하거나 거리 곳곳으로 작품을 분산하는 방법도 있다. ‘조각의 거리’가 오랜 세월 숱한 논란을 낳고 결국 철거됐던, 바로 예술의 거리에 있었던 ‘루미나리에’ 사태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문화전당에 들르는 사람들이 자연스레 유입되고, 구청이 진행 중인 도심 재생 프로젝트 사업이 현실화되면 예술의 거리를 찾는 이들은 더욱 늘어날 터다. 이대로 변화가 없다면 ‘문화도시 광주’의 부끄러운 민낯을 보여 주는 것일 터이니, “누가 찾아올까 정말 두렵다.”
/mekim@kwangju.co.kr
하지만 중앙 초등학교 사거리를 넘어서면 이런 마음이 싹 달아난다. 20세기로 돌아간 느낌이 들어서다. 최근 조성된 ‘예술의 거리 조각 거리’는 절망감 만을 안겨 준다.
광주시와 동구는 문화전당권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금남로에 설치된 조각 작품 20점 중 18점을 예술의 거리로 옮기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사실, 처음 이전 계획이 알려지면서 이미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었다. 금남로 조각상 20점은 원래 1㎞ 구간에 분산 설치돼 있었다. 반면 예술의 거리로 들어오게 되면 140m 구간에 18점이 설치될 처지였다. 최고 3m가 넘는 조각상이 2∼5m 간격으로 놓이게 돼 감상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전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140m 거리에는 18개 조각품 뿐 아니라 대형 안내판을 비롯해 예술의 거리 ‘아트우물’ 프로젝트로 진행한 4개의 스트리트 아트도 함께 놓여 있다. 여기에 대형 배전함 5개와 벤치 10여 개도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정작 18개 작품이 들어서는 거리는 길게 잡아도 80m에 불과하다. 그러다 보니 말 그대로 작품을 ‘몰아넣은 꼴’이 됐다. 김성식, 박병희, 이용덕 작가 작품은 30cm 간격으로 설치돼 있다. 바글바글 흥부네 자식들이 따로 없다.
아쉬운 건 작가들의 태도다. 자신들의 작품이 이처럼 짐짝 취급당해도 괜찮다는 걸까. 초라할 대로 초라해져 버린 작품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편할 수 있을까.
백번 양보해 이런 상황이 예술의 거리가 아닌, 다른 곳에서 벌어졌다면 그나마 덜 아쉬울 것 같다. 국립아시아문화 전당을 품고 있는 문화특구, 문화 1번지를 주창하는 동구, 광주 문화예술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예술의 거리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게 서글프다.
광주시와 동구청은 추진 단계에서 예술의 거리 번영회 등의 동의를 얻었다고는 하지만 상인들도 ‘이런 모습’을 생각했던 건 아니라고 말한다. 담당 공무원들에게 문화적 마인드가 있었다면, 그리고 조각품 설치 시뮬레이션을 거쳐 봤다면 이런 상황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
1980∼90년대도 아니고, 핫한 문화 예술이 넘쳐나는 2016년에 이런 형식의 ‘조각의 거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게 신기할(?) 따름이다. 시가 의도했던 ‘명품 조각거리’는 아닐지라도 세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유례가 없는 조각 거리’인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다. 전국적인 조롱거리가 될 지도 모르겠다는 우려를 전한 한 작가의 말처럼 되레 문화도시 이미지를 손상시키지 않을까 걱정된다.
김성환 동구청장은 선거 당시 “조각상 이전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문화특구 동구 이미지에 걸맞게 작품 특징을 살리는 이전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전문가와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김 청장은 다른 구정 업무로 바쁘더라도 현장을 꼭 한번 들러보시라. 시 공무원도 마찬가지다.
예술의 거리에 꼭 조각상이 자리할 필요는 없다. 예술의 거리 특성에 맞는 작품을 선별하거나 거리 곳곳으로 작품을 분산하는 방법도 있다. ‘조각의 거리’가 오랜 세월 숱한 논란을 낳고 결국 철거됐던, 바로 예술의 거리에 있었던 ‘루미나리에’ 사태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문화전당에 들르는 사람들이 자연스레 유입되고, 구청이 진행 중인 도심 재생 프로젝트 사업이 현실화되면 예술의 거리를 찾는 이들은 더욱 늘어날 터다. 이대로 변화가 없다면 ‘문화도시 광주’의 부끄러운 민낯을 보여 주는 것일 터이니, “누가 찾아올까 정말 두렵다.”
/me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