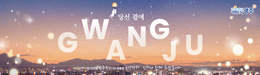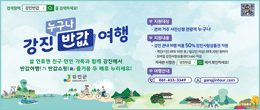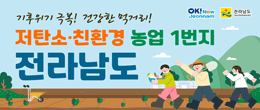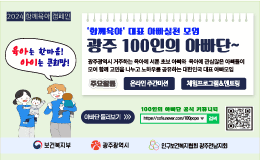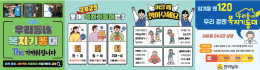인문학의 바다에 빠진 중년들
송 기 동
문화2부장
문화2부장
#연말에 공직에서 퇴직하게 되는 J씨는 틈틈이 인문학 ‘공부’를 하고 있다. 매주 한 차례 인문학 공동체에서 독일 철학자 니체의 철학책을 읽고 토론한다. 21권짜리 전집을 구입해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와 ‘즐거운 학문’, ‘아침놀’ 등 여러 권을 독파했다.
책 한 권을 공부하려면 두세 달이 소요된다. 또 일반 멀티플렉스(복합 상영관)에서 보기 힘든 예술영화를 광주극장에서 즐겨 보고 지인들에게도 꼭 볼 것을 권유한다. 좋은 전시회와 뮤지컬, 공연이 있으면 서울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간다. 철학 등 인문학과 영화는 자신을 뒤에서 밀어주는 든든한 바탕이자 삶의 ‘비타민’이다.
#매주 토요일 광주 시내 한 대학 강의실에 중년의 남녀가 모여든다. 대학원생들의 ‘노자(老子) 수업’을 청강하기 위해서다. 20∼30대 학생들과 함께 강의를 듣는 청강생 20여 명의 나이는 사회생활에 한창인 40대부터 퇴직한 60대까지 폭넓다. 직업도 교사·공무원·직장인·주부 등 다양하다.
이들은 교수의 문구 해석을 한마디라도 빠뜨릴세라 귀를 기울이며 메모한다. “물들이기 전 본바탕 그대로의 명주 천과 다듬어지지 않은 통나무 같은 소박함을 잊지 않고, 사사로움을 줄이며 욕심을 적게 하라.(見素抱樸 少私寡欲)” 연륜 있는 청강생들의 공부는 ‘학위’를 따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열의를 가지고 바쁜 시간을 쪼개 1000여 년 전 고전을 들춰 보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중년들이 인문학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이들의 관심은 취업이나 입시를 위한 것도, 스펙을 쌓기 위한 것도, 생계를 위한 것도 아니다. 10대와 20대 시절의 ‘공부’는 진학과 취업을 위한 암기였고, 30대의 ‘공부’는 스펙과 자기계발을 위한 것들뿐이었다. 반면 ‘불혹’(不惑)이라 일컫는 마흔 살을 지나 중년으로 접어들며 시작한 새로운 ‘공부’는 바로 ‘마음공부’이다. 오로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며, 삶에 긍정적 에너지를 불어넣고, 흔들림 없는 인생의 ‘북극성’, 말하자면 지표(指標)를 찾기 위함이다.
20∼30여 년간 직장 생활을 하며 숨 가쁘게 달려온 중년은 경기 불황과 성과주의, 고용 불안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해 몸과 정신이 피폐해졌다. 정신적으로 자신을 지탱해 줄 버팀목 역할을 하고,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그 무엇’이 절실한 시점이기도 하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들이 찾은 숨구멍이 바로 ‘인문학’이다. 가깝게는 100여 년에서 멀리 1000여 년 전에 쓰인 철학과 역사, 문학작품 등 ‘고전’들의 글귀 한 구절, 한 구절이 중년들의 마음에 울림을 주는 것이다.
요즘 지천명(知天命)을 훌쩍 넘어선 고교 동창들을 만나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우선 ‘건강 챙기기’다. 무엇보다 주말에 텃밭에서 흙 내음을 맡으며 작물을 키우거나, 개인적으로 고전을 읽고 인문학 강좌에 등록해 ‘공부’하는 친구들이 부쩍 눈에 띄는 것이다. 시를 쓰는 한 대학 친구는 ‘일리아스’, ‘오디세이’ 등 고전을 함께 읽는 모임을 만들자고 제안한다.
중년 또는 노년의 인문학 ‘공부’는 일상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까? J씨는 이렇게 말한다. “인문학은 ‘어떻게 제대로 살 것인가?’ 묻는 공부이다. 젊을 때 고전을 읽었을 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지금 다시 읽으니 너무 좋다. 옛날에 쓰인 책이어도 요즘 현실에 그대로 적용된다. 100년 전 고전이 지금도 읽히는 이유일 것이다. 젊은 사람들이 제대로 인문학을 공부한다면 바른 생각을 갖고, 사회 혼란도 줄어들지 않을까 싶다. 젊은이들을 위한 단발성이 아닌 장기적인 무료 인문학 강좌 개설도 필요하다.” 중년에 갈팡질팡하는 나를 위한 진정한 ‘공부’는 바로 지금부터다.
/song@kwangju.co.kr
책 한 권을 공부하려면 두세 달이 소요된다. 또 일반 멀티플렉스(복합 상영관)에서 보기 힘든 예술영화를 광주극장에서 즐겨 보고 지인들에게도 꼭 볼 것을 권유한다. 좋은 전시회와 뮤지컬, 공연이 있으면 서울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간다. 철학 등 인문학과 영화는 자신을 뒤에서 밀어주는 든든한 바탕이자 삶의 ‘비타민’이다.
중년들이 인문학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이들의 관심은 취업이나 입시를 위한 것도, 스펙을 쌓기 위한 것도, 생계를 위한 것도 아니다. 10대와 20대 시절의 ‘공부’는 진학과 취업을 위한 암기였고, 30대의 ‘공부’는 스펙과 자기계발을 위한 것들뿐이었다. 반면 ‘불혹’(不惑)이라 일컫는 마흔 살을 지나 중년으로 접어들며 시작한 새로운 ‘공부’는 바로 ‘마음공부’이다. 오로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며, 삶에 긍정적 에너지를 불어넣고, 흔들림 없는 인생의 ‘북극성’, 말하자면 지표(指標)를 찾기 위함이다.
20∼30여 년간 직장 생활을 하며 숨 가쁘게 달려온 중년은 경기 불황과 성과주의, 고용 불안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해 몸과 정신이 피폐해졌다. 정신적으로 자신을 지탱해 줄 버팀목 역할을 하고,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그 무엇’이 절실한 시점이기도 하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들이 찾은 숨구멍이 바로 ‘인문학’이다. 가깝게는 100여 년에서 멀리 1000여 년 전에 쓰인 철학과 역사, 문학작품 등 ‘고전’들의 글귀 한 구절, 한 구절이 중년들의 마음에 울림을 주는 것이다.
요즘 지천명(知天命)을 훌쩍 넘어선 고교 동창들을 만나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우선 ‘건강 챙기기’다. 무엇보다 주말에 텃밭에서 흙 내음을 맡으며 작물을 키우거나, 개인적으로 고전을 읽고 인문학 강좌에 등록해 ‘공부’하는 친구들이 부쩍 눈에 띄는 것이다. 시를 쓰는 한 대학 친구는 ‘일리아스’, ‘오디세이’ 등 고전을 함께 읽는 모임을 만들자고 제안한다.
중년 또는 노년의 인문학 ‘공부’는 일상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까? J씨는 이렇게 말한다. “인문학은 ‘어떻게 제대로 살 것인가?’ 묻는 공부이다. 젊을 때 고전을 읽었을 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지금 다시 읽으니 너무 좋다. 옛날에 쓰인 책이어도 요즘 현실에 그대로 적용된다. 100년 전 고전이 지금도 읽히는 이유일 것이다. 젊은 사람들이 제대로 인문학을 공부한다면 바른 생각을 갖고, 사회 혼란도 줄어들지 않을까 싶다. 젊은이들을 위한 단발성이 아닌 장기적인 무료 인문학 강좌 개설도 필요하다.” 중년에 갈팡질팡하는 나를 위한 진정한 ‘공부’는 바로 지금부터다.
/song@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