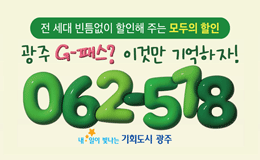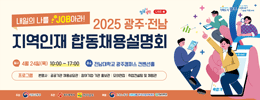SNS 메르스 괴담에 멍드는 지역사회
김일환 편집부국장
페이스북 창을 여니 ‘광주대병원에 메르스 환자가 격리됐다’는 메시지가 뜬다. 광주 사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금방 알아챌 거짓말이다. 왜냐하면 광주대에는 병원이 없기 때문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소위 메르스를 예방하기 위한 비책이라며 떠도는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글은 정말 황당하기까지 하다. 코에 바셀린을 발라야 한다는 둥 ‘방마다 양파를 5개씩 갖다 놓으라’는 둥 검증되지도 않았고 근거도 없는 이야기들이 마구 전파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종류의 글 대부분이 전문가발(發)로 위장한다는 것이다. 허위 정보에 정체불명의 출처를 달거나, 개인적인 의견을 전문가 글로 포장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큰 일 있을 때마다 정보에 목마른 이들은 괴담 수준의 글이라 할지라도 별 생각 없이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쏟아지는 괴담·유언비어들이 판단력을 흩트려 그것이 진실인 양 생각을 마취시켜 버리기 때문이다. 한때 TV를 바보상자라 칭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SNS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그럴듯하게 포장된 SNS 글들은 그만큼 파괴력이 크다. 전파력 또한 상상을 초월한다. 이 때문에 현재 계속되고 있는 메르스 사태 속에서 막연한 공포를 키우는 데 단단히 한 몫을 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정부나 지자체의 발표는 믿지 못하는 불신 현상이 증폭되고 있다. 최근 ‘광주에 메르스 환자 2명 발생’ 소동은 광주시가 보건복지부 주소지 분류에 따른 착각이라고 발표했음에도 SNS에서는 음모론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광주시가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를 치르기 위해 숨기고 있다.” “병원관계자가 친척인데 어디 어디 병원에 격리되어 있다더라” 등 괴담이 퍼져 나가고 있다. 도하 언론들이 광주 지역은 메르스 청정지역이라고 확인을 하고 있음에도 쉽게 믿으려 들지 않는다. 광주시도 괴담 확산을 막기 위해 메르스 방역과 관련 일일 브리핑을 하는 등 연일 적극적인 홍보와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그다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60대 확진 환자가 완치되어 퇴원한 보성 지역에서도 한때 막연한 불안감과 공포감에 시달려야 했다. 이 또한 상당 부분 SNS에 떠도는 유언비어 때문이었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막연한 공포가 지역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보성군이 나서서 캠페인 등을 통해 지역 경제를 살려보겠다고 애쓰고 있지만 역부족인 것 같다.
모임이나 단체로 연결된 카카오 톡, 밴드 등을 통해 키워진 공포는 다시 초기의 괴담에 살을 붙여 확대 재생산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사실 SNS 괴담·유언비어는 아무런 죄의식이 없이 그저 장난삼아 올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문제는 그런 사소한 장난이 끼치는 폐해가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는 데 있다.
더욱이 이 SNS를 운영하는 회사들은 그곳을 사적인 공간으로 치부, 필터링이나 계몽에는 비협조로 일관하기 일쑤다. 한마디로 돈벌이에 급급, 사태를 방치하면서 괴담의 확산을 막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다.
결국 괴담의 확산을 막는 일은 고스란히 지역사회의 몫이 되고 있다. 하지만 사이버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 또한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거짓말로 괴담을 퍼트린다고 해도 처벌하기가 쉽지가 않다. 명예훼손·업무 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순 있지만 피해 사실을 특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당장 지자체와 지역 시민단체가 나서 메르스 괴담 확산 방지 캠페인을 펼쳐야 한다는 생각이다. 또 지역 교육청은 SNS의 올바른 사용에 대한 교육을 강화했으면 한다. 학습자료를 만들어 배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괴담 차단에 적극 나서지 않을 경우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소위 메르스를 예방하기 위한 비책이라며 떠도는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글은 정말 황당하기까지 하다. 코에 바셀린을 발라야 한다는 둥 ‘방마다 양파를 5개씩 갖다 놓으라’는 둥 검증되지도 않았고 근거도 없는 이야기들이 마구 전파되고 있다.
큰 일 있을 때마다 정보에 목마른 이들은 괴담 수준의 글이라 할지라도 별 생각 없이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쏟아지는 괴담·유언비어들이 판단력을 흩트려 그것이 진실인 양 생각을 마취시켜 버리기 때문이다. 한때 TV를 바보상자라 칭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SNS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다 보니 정부나 지자체의 발표는 믿지 못하는 불신 현상이 증폭되고 있다. 최근 ‘광주에 메르스 환자 2명 발생’ 소동은 광주시가 보건복지부 주소지 분류에 따른 착각이라고 발표했음에도 SNS에서는 음모론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광주시가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를 치르기 위해 숨기고 있다.” “병원관계자가 친척인데 어디 어디 병원에 격리되어 있다더라” 등 괴담이 퍼져 나가고 있다. 도하 언론들이 광주 지역은 메르스 청정지역이라고 확인을 하고 있음에도 쉽게 믿으려 들지 않는다. 광주시도 괴담 확산을 막기 위해 메르스 방역과 관련 일일 브리핑을 하는 등 연일 적극적인 홍보와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그다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60대 확진 환자가 완치되어 퇴원한 보성 지역에서도 한때 막연한 불안감과 공포감에 시달려야 했다. 이 또한 상당 부분 SNS에 떠도는 유언비어 때문이었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막연한 공포가 지역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보성군이 나서서 캠페인 등을 통해 지역 경제를 살려보겠다고 애쓰고 있지만 역부족인 것 같다.
모임이나 단체로 연결된 카카오 톡, 밴드 등을 통해 키워진 공포는 다시 초기의 괴담에 살을 붙여 확대 재생산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사실 SNS 괴담·유언비어는 아무런 죄의식이 없이 그저 장난삼아 올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문제는 그런 사소한 장난이 끼치는 폐해가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는 데 있다.
더욱이 이 SNS를 운영하는 회사들은 그곳을 사적인 공간으로 치부, 필터링이나 계몽에는 비협조로 일관하기 일쑤다. 한마디로 돈벌이에 급급, 사태를 방치하면서 괴담의 확산을 막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다.
결국 괴담의 확산을 막는 일은 고스란히 지역사회의 몫이 되고 있다. 하지만 사이버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 또한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거짓말로 괴담을 퍼트린다고 해도 처벌하기가 쉽지가 않다. 명예훼손·업무 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순 있지만 피해 사실을 특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당장 지자체와 지역 시민단체가 나서 메르스 괴담 확산 방지 캠페인을 펼쳐야 한다는 생각이다. 또 지역 교육청은 SNS의 올바른 사용에 대한 교육을 강화했으면 한다. 학습자료를 만들어 배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괴담 차단에 적극 나서지 않을 경우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