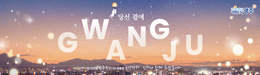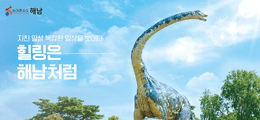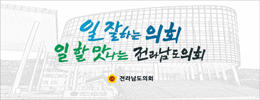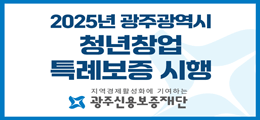어느 중견 배우의 눈물
김 미 은
문화1부장
문화1부장
마지막으로, 출연 배우중 가장 연장자인 그가 일어섰다. 50대 중반인 그는 자신을 ‘눈물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다. 울어 본 게 지금까지 딱 두 번. 한 번은 지난해였고, 또 한 번은 바로 며칠 전이었다고 했다.
5월 광주를 소재로 한 연극 ‘푸르른 날에’는 지난 6월 광주 공연을 가졌다. 2011년 서울 초연 멤버 그대로였다. 그는 주인공 여산의 스승으로 출연했다. 그가 울어버린 건 광주 첫 공연 후였다.
당시 배우들은 공연장에서 도보 이동이 가능한 시내 호텔에 투숙했다. 그는 첫 공연을 끝내고 숙소까지 걸어가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더라고 했다. 길에서 스쳐 지나가는 광주 사람 한 명 한 명이 다 달리 보이고 고맙고 감사하게 느껴졌다고 했다.
그는 이미 이 역할을 100번도 넘게 연기했다. 하지만, 이날 느꼈던 기분은 그동안 한 번도 느껴 보지 못한 감정이었다. 그 배우의 그 ‘진심’은 이후 관객들에게 그대로 전해졌을 거라 생각한다.
‘푸르른 날에’ 광주 공연 뒷풀이 자리는 화기애애했다. 출연배우들은 소감을 이야기하고 가장 인상 깊었던 대사들을 하나씩 던졌다. 그가 울림 있는 목소리로 외쳤다. “광주시민 여러분 우리를 잊지 말아주세요.” 1980년 메가폰을 든 여성이 외치던 대사였다.
굳이 뒷풀이에 참석한 건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였다. 내게 발언할 기회가 주어졌다. 이번 작품에 다양한 반응들이 쏟아졌다. 혹평하는 이도 있었고, 이런 작품을 만들어 줘서 감사하다는 이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 중에서 이 말만은 꼭 전해야 할 것 같아 이 자리에 왔다고 했다.
예술가의 진심, 관객의 진심
마지막 공연 전날, 작품을 보고 나오던 대학생 커플을 만났었다. 젊은 관객들 반응이 궁금했던 터라 질문을 던졌다가 가슴이 쿵 내려 앉았다. 청년의 한 마디 때문이었다. “연극 보면서 가슴이 다 없어져 버리는 줄 알았어요.” 연극의 마지막 장면. 결혼식에 불려 나온 영령 중 한 명이 무심한 듯 읊조리던 대사가 너무 아팠다는 말도 덧붙였다. “30년이 지났는디 우리를 기억이나 해 줄랑가 몰라.”
이야기를 전해들은 고선웅 연출자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배우들도 울컥했다. ‘누군가의 가슴을 다 없애버린’ 작품을 공연한 이들이 느끼는 감정의 깊이를 내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들의 작품을 보고 느꼈던 관객들의 ‘진심’은 배우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졌으리라.
예술의 힘, 예술가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는 요즘이다. 앞뒤 살필 겨를 없이 앞만 보고 달리는 시대, 위로와 위무가 필요한 시대를 건너고 있기 때문일 거다.
지난 5월 시내 작은 레스토랑에서 열린 ‘어머니를 위한 축제’는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다. 지인이 어머니 20주기를 맞아 친척과 가까운 이들을 불러 마련한 작은 클래식 음악회였다. 오페라 아리아, 가곡 등에 이은 마지막 노래는 지인이 신청한 곡이었다. 어머니가 좋아하던 이미자 노래 ‘동백 아가씨’. 한창 고왔던 어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이 걸린 공간에서 ‘동백 아가씨’를 들으며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어머니·아버지를 생각했다.
수년 전 본 공연이지만 지금도 생생하게 떠오르는 게 있다. 젊은 무용수 배강현과 김미선의 춤이다. 사람의 몸이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는지, 그 몸짓이 얼마나 큰 감동을 줄 수 있는지 제대로 느꼈었다.
지난해 광주시립미술관에 걸렸던 황재형의 작품 ‘아버지의 자리’가 준 감동을 두고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다. 은퇴 광부의 굵은 주름살과 물기 고인 눈망울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며칠 전 대인 야시장에서 기타 하나 둘러매고 노래하던 젊은 뮤지션의 수줍은 모습도 기억에 남는다.
예술가에 ‘판’을 허(許)하라
예술가들이 전하는 감동의 기억은 수없이 많다. 새삼스레 그 장면을 불러내는 건 ‘가슴이 없어져 버린 듯한’ 그 순간을 더 만끽하고 싶어서다.
민선 6기가 출범했다. 솔직히 새로운 시장이 취임했다 해서 예술계에 큰 변화가 오지는 않을 것이다. 예술가들에게 없던 아이디어들이 갑자기 쏟아지는 것도 아니다. 한데, 새로운 출발이 새로운 기대를 갖게 하고 새로운 꿈을 꾸게 하는 것도 사실이다. 예술가들이 마음껏 끼를 발산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판’을 허(許) 하라. 그게 광주시가 할 일이다.
세상의 모든 예술가들을 응원한다. 언제든 박수와 환호를 보낼 준비가 되어 있다. 진심과 진심이 통하는 ‘그 순간’을 항상 꿈꾼다.
/mekim@kwangju.co.kr
5월 광주를 소재로 한 연극 ‘푸르른 날에’는 지난 6월 광주 공연을 가졌다. 2011년 서울 초연 멤버 그대로였다. 그는 주인공 여산의 스승으로 출연했다. 그가 울어버린 건 광주 첫 공연 후였다.
그는 이미 이 역할을 100번도 넘게 연기했다. 하지만, 이날 느꼈던 기분은 그동안 한 번도 느껴 보지 못한 감정이었다. 그 배우의 그 ‘진심’은 이후 관객들에게 그대로 전해졌을 거라 생각한다.
굳이 뒷풀이에 참석한 건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였다. 내게 발언할 기회가 주어졌다. 이번 작품에 다양한 반응들이 쏟아졌다. 혹평하는 이도 있었고, 이런 작품을 만들어 줘서 감사하다는 이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 중에서 이 말만은 꼭 전해야 할 것 같아 이 자리에 왔다고 했다.
예술가의 진심, 관객의 진심
마지막 공연 전날, 작품을 보고 나오던 대학생 커플을 만났었다. 젊은 관객들 반응이 궁금했던 터라 질문을 던졌다가 가슴이 쿵 내려 앉았다. 청년의 한 마디 때문이었다. “연극 보면서 가슴이 다 없어져 버리는 줄 알았어요.” 연극의 마지막 장면. 결혼식에 불려 나온 영령 중 한 명이 무심한 듯 읊조리던 대사가 너무 아팠다는 말도 덧붙였다. “30년이 지났는디 우리를 기억이나 해 줄랑가 몰라.”
이야기를 전해들은 고선웅 연출자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배우들도 울컥했다. ‘누군가의 가슴을 다 없애버린’ 작품을 공연한 이들이 느끼는 감정의 깊이를 내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들의 작품을 보고 느꼈던 관객들의 ‘진심’은 배우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졌으리라.
예술의 힘, 예술가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는 요즘이다. 앞뒤 살필 겨를 없이 앞만 보고 달리는 시대, 위로와 위무가 필요한 시대를 건너고 있기 때문일 거다.
지난 5월 시내 작은 레스토랑에서 열린 ‘어머니를 위한 축제’는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다. 지인이 어머니 20주기를 맞아 친척과 가까운 이들을 불러 마련한 작은 클래식 음악회였다. 오페라 아리아, 가곡 등에 이은 마지막 노래는 지인이 신청한 곡이었다. 어머니가 좋아하던 이미자 노래 ‘동백 아가씨’. 한창 고왔던 어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이 걸린 공간에서 ‘동백 아가씨’를 들으며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어머니·아버지를 생각했다.
수년 전 본 공연이지만 지금도 생생하게 떠오르는 게 있다. 젊은 무용수 배강현과 김미선의 춤이다. 사람의 몸이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는지, 그 몸짓이 얼마나 큰 감동을 줄 수 있는지 제대로 느꼈었다.
지난해 광주시립미술관에 걸렸던 황재형의 작품 ‘아버지의 자리’가 준 감동을 두고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다. 은퇴 광부의 굵은 주름살과 물기 고인 눈망울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며칠 전 대인 야시장에서 기타 하나 둘러매고 노래하던 젊은 뮤지션의 수줍은 모습도 기억에 남는다.
예술가에 ‘판’을 허(許)하라
예술가들이 전하는 감동의 기억은 수없이 많다. 새삼스레 그 장면을 불러내는 건 ‘가슴이 없어져 버린 듯한’ 그 순간을 더 만끽하고 싶어서다.
민선 6기가 출범했다. 솔직히 새로운 시장이 취임했다 해서 예술계에 큰 변화가 오지는 않을 것이다. 예술가들에게 없던 아이디어들이 갑자기 쏟아지는 것도 아니다. 한데, 새로운 출발이 새로운 기대를 갖게 하고 새로운 꿈을 꾸게 하는 것도 사실이다. 예술가들이 마음껏 끼를 발산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판’을 허(許) 하라. 그게 광주시가 할 일이다.
세상의 모든 예술가들을 응원한다. 언제든 박수와 환호를 보낼 준비가 되어 있다. 진심과 진심이 통하는 ‘그 순간’을 항상 꿈꾼다.
/me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