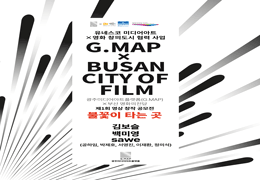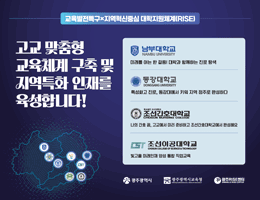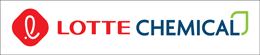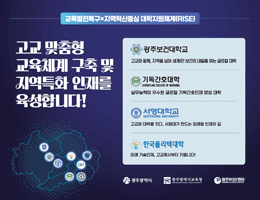예술가로 산다는 것은
지난 2011년 1월 세상을 떠난 소설가 박완서 선생은 특별한 유언을 남겼다. “돈 없는 문인들에게 부의금을 받지 말고 대신 잘 대접하라”고 간곡하게 당부했다. 유족들은 선생의 뜻을 받들어 빈소 앞에 “부의금을 정중히 사양하겠습니다”라는 안내문을 붙였다. 그 자신은 문학으로 성공한 인생을 살았지만, 평소 문인들의 경조사에도 ‘부담스러워하는’ 후배들을 많이 봤기 때문이다.
마지막 가는 길까지 가난한 문인들을 챙겼던 선생의 기사를 접하던 날, 문득 유난히 춥고 썰렁했던 한 작가의 빈소가 떠올랐다. 지난 2005년 극심한 생활고 끝에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중견화가 K의 빈소는 그 어느 곳보다 적막했다. 빈소의 분위기가 다 그렇지만 화가의 ‘그곳’은 쓸쓸하기 그지 없었다. 고인의 후배였던 30대 작가는 조의금을 넉넉하게 내놓지 못하는 처지를 자책하듯 술잔만 비웠다.
무엇보다 그를 슬프게 한 건 선배의 ‘생의 마지막 순간’이었다. 50평생을 지긋지긋한 가난과 싸우며 창작의 열정을 지킨 보람도 없이 지인의 컨테이너 박스에서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최근 예술인 복지법(지난해 11월18일 제정)이 시행 1주년을 맞았다. 예술인 복지법은 2년 전 생활고 끝에 월세방에서 숨을 거둔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32)씨의 죽음이 계기가 됐다. 하지만 오랜 논의 끝에 세상에 나온 예술인 복지법은 고용보험 적용 등의 핵심적인 장치가 빠져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노동력’으로 인정하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한 탓이다. 최근 울산, 대전 등 일부 지자체들이 예술인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그런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예향의 도시 광주에선 이렇다할 움직임이 전혀 없다.
문제는 광주 미술인들의 삶이 전국에서 가장 열악하다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12 문화예술인실태조사’결과 광주 미술인들이 전국에서 가장 가난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수입 100만 원 이하의 비율이 78.3%로 전국(평균 66.3%)에서 가장 높았다. 올 초 광주미술문화연구소가 내놓은 통계는 더 우울하다. 30∼40대 청년미술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청년작가의 56.6%가 월수입 50만 원 이하에 그쳤다.
모름지기 예술이 융성하고 시민들이 문화생활을 향유하려면 예술가들이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이 필요하다. 삶과 예술 속에서 ‘전쟁을 치르며’ 사는 예술인의 현실은 더 이상 그들 만의 문제가 아니다. 밥벌이를 찾아 작업실을 떠나는 예술가들이 늘어날수록 시민들의 ‘문화적 허기’도 커진다. 예술가들이 불행한 도시는 문화수도가 아니다.
<편집부국장·문화선임기자>
무엇보다 그를 슬프게 한 건 선배의 ‘생의 마지막 순간’이었다. 50평생을 지긋지긋한 가난과 싸우며 창작의 열정을 지킨 보람도 없이 지인의 컨테이너 박스에서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문제는 광주 미술인들의 삶이 전국에서 가장 열악하다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12 문화예술인실태조사’결과 광주 미술인들이 전국에서 가장 가난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수입 100만 원 이하의 비율이 78.3%로 전국(평균 66.3%)에서 가장 높았다. 올 초 광주미술문화연구소가 내놓은 통계는 더 우울하다. 30∼40대 청년미술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청년작가의 56.6%가 월수입 50만 원 이하에 그쳤다.
모름지기 예술이 융성하고 시민들이 문화생활을 향유하려면 예술가들이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이 필요하다. 삶과 예술 속에서 ‘전쟁을 치르며’ 사는 예술인의 현실은 더 이상 그들 만의 문제가 아니다. 밥벌이를 찾아 작업실을 떠나는 예술가들이 늘어날수록 시민들의 ‘문화적 허기’도 커진다. 예술가들이 불행한 도시는 문화수도가 아니다.
<편집부국장·문화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