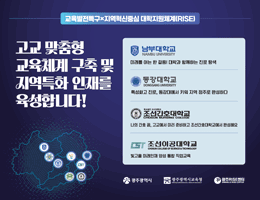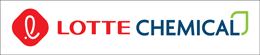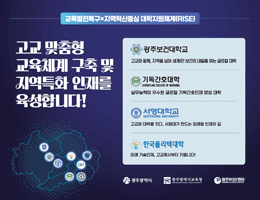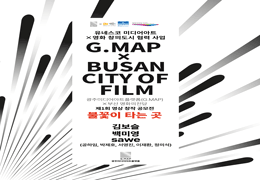우리들의 부끄러운 ‘광주필’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경기도 부천시는 ‘회색도시’나 다름없었다. 1973년 시 승격 이후 인구와 공장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교통난과 대기오염이 극심했기 때문이다. 유명 관광지는 물론이거니와 시민들의 자긍심을 살려줄 ‘문화’도 하나 없는, 삭막한 도시였다.
하지만 부천은 1987년 소설가 양귀자의 ‘원미동 사람들’로 일약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됐다. ‘멀고도 아름다운 동네’라는 뜻의 부천시 원미동을 배경으로 소시민들의 삶을 그린 소설이 베스트 셀러가 되면서 ‘부천’이란 이름이 전국에 알려지게 된 것이다.
‘원미동 효과’에 고무된 부천시는 이듬해인 1988년 부천시립교향악단(이하 부천필)을 창설했다. 그러나 의욕만 컸지 지원에는 인색했다. 단원이라고 해봐야 20명 안팎이었고 보수 역시 당시 다른 시향의 절반도 안 되는 20만∼30만 원에 불과했다. 게다가 지하에 마련된 연습실은 여름이면 시궁창 냄새가 코를 찔렀고 겨울이면 난방시설이 안 돼 단원들은 곱은 손을 불어가며 연주해야 했다.
일 년 넘게 ‘이름뿐인 시향’을 거느리던 부천시는 부천필의 비상을 위해서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부천시는 수소문 끝에 당시 서울대 음대 임헌정 교수를 찾아가 상임지휘자를 맡아줄 것을 제안했다. 임 교수는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말라’는 조건을 제시했다. 부천시는 (시 입장에서는 모험이나 다름없는)임 교수의 제안을 고심 끝에 받아들였다.
1989년 8월 부천필의 상임지휘자로 부임한 그는 단원 영입부터 챙겼다. 20명의 연주자 가지고는 평생(?) 모차르트나 슈베르트 작품밖에 공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실력만 있으면 유학을 마치고 갓 돌아온 젊은 연주자도 과감하게 수석자리에 앉혔다.
그로부터 19년이 흐른 지금 부천필은 부천시의 ‘제1 브랜드’가 됐다. 근 20여 년 동안 포디엄(지휘대)을 지킨 임 지휘자의 리더십 덕분에 정단원 74명, 연예산 30억 원이란 튼실한 오케스트라로 거듭났다. 국내 ‘빅2’인 서울시향과 KBS 교향악단도 해내지 못한 말러 교향곡 전곡 연주라는 위업을 달성해 화제를 모았다. 또 톱스타 부럽지 않은 전국구 팬클럽 ‘부사모(부천필을 사랑하는 모임)’까지 생겼다.
최근 광주시립교향악단(광주시향)의 부실 운영이 도마 위에 올랐다. 광주시의 지원 부족과 운영 미숙으로 단장이 수개월째 공석으로 방치되는 등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광주시향의 경우 지휘자 연봉이 6천200만 원으로 부산 10만 달러, 대구 2억 원, 인천 1억 원 등 6개 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고 단원 보수 역시 최하위권이다. 이렇다 보니 창작공연과 해외공연 실적도 저조하고 전국 교향악 축제에도 참가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쯤 되면 아시아의 문화중심도시를 자부하는 광주가 ‘열린 행정’으로 부천필을 국내 ‘빅3’에 올려놓은 중소도시 부천시에게 한 수 배워야 할 것 같다.
/박진현 문화생활부장·jhpark@kwangju.co.kr〉
하지만 부천은 1987년 소설가 양귀자의 ‘원미동 사람들’로 일약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됐다. ‘멀고도 아름다운 동네’라는 뜻의 부천시 원미동을 배경으로 소시민들의 삶을 그린 소설이 베스트 셀러가 되면서 ‘부천’이란 이름이 전국에 알려지게 된 것이다.
‘원미동 효과’에 고무된 부천시는 이듬해인 1988년 부천시립교향악단(이하 부천필)을 창설했다. 그러나 의욕만 컸지 지원에는 인색했다. 단원이라고 해봐야 20명 안팎이었고 보수 역시 당시 다른 시향의 절반도 안 되는 20만∼30만 원에 불과했다. 게다가 지하에 마련된 연습실은 여름이면 시궁창 냄새가 코를 찔렀고 겨울이면 난방시설이 안 돼 단원들은 곱은 손을 불어가며 연주해야 했다.
일 년 넘게 ‘이름뿐인 시향’을 거느리던 부천시는 부천필의 비상을 위해서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부천시는 수소문 끝에 당시 서울대 음대 임헌정 교수를 찾아가 상임지휘자를 맡아줄 것을 제안했다. 임 교수는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말라’는 조건을 제시했다. 부천시는 (시 입장에서는 모험이나 다름없는)임 교수의 제안을 고심 끝에 받아들였다.
1989년 8월 부천필의 상임지휘자로 부임한 그는 단원 영입부터 챙겼다. 20명의 연주자 가지고는 평생(?) 모차르트나 슈베르트 작품밖에 공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실력만 있으면 유학을 마치고 갓 돌아온 젊은 연주자도 과감하게 수석자리에 앉혔다.
그로부터 19년이 흐른 지금 부천필은 부천시의 ‘제1 브랜드’가 됐다. 근 20여 년 동안 포디엄(지휘대)을 지킨 임 지휘자의 리더십 덕분에 정단원 74명, 연예산 30억 원이란 튼실한 오케스트라로 거듭났다. 국내 ‘빅2’인 서울시향과 KBS 교향악단도 해내지 못한 말러 교향곡 전곡 연주라는 위업을 달성해 화제를 모았다. 또 톱스타 부럽지 않은 전국구 팬클럽 ‘부사모(부천필을 사랑하는 모임)’까지 생겼다.
최근 광주시립교향악단(광주시향)의 부실 운영이 도마 위에 올랐다. 광주시의 지원 부족과 운영 미숙으로 단장이 수개월째 공석으로 방치되는 등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광주시향의 경우 지휘자 연봉이 6천200만 원으로 부산 10만 달러, 대구 2억 원, 인천 1억 원 등 6개 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고 단원 보수 역시 최하위권이다. 이렇다 보니 창작공연과 해외공연 실적도 저조하고 전국 교향악 축제에도 참가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쯤 되면 아시아의 문화중심도시를 자부하는 광주가 ‘열린 행정’으로 부천필을 국내 ‘빅3’에 올려놓은 중소도시 부천시에게 한 수 배워야 할 것 같다.
/박진현 문화생활부장·jhpark@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