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효인의 ‘소설처럼’] 이것은 과학이 아닙니다만 -SF 앤솔러지 ‘태초에 외계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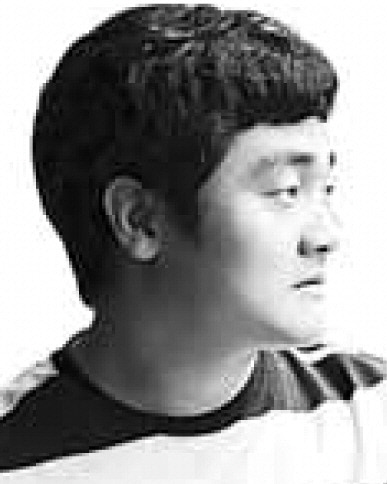 |
손바닥에 ‘王’자를 쓴다고 권력을 쥘 수 있을까. 그럴 수는 없을 것이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생각해보자. 그것이 도사님의 선견지명이었든 같은 동네에 사는 지지자가 덕담 대신 손바닥에 써준 것이든 상관없이 부적이나 사인 같은 것으로 선거에 이길 수는 없다. 그보다는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반대로 토론회에 ‘王’자를 쓴 채 등장해 무속신앙에 깊이 연계된 삶을 살고 있음을 저도 모르게 실토한 사실이 과연 선거에서 불리하게 작용할까. 그 또한 모르겠다. 유권자인 우리는 대체로 미신과 무속의 가르침 및 유사과학과 확증편향의 소용돌이에서 되레 자연스럽게 살고 있으므로, 겨우 그런 일로 실망하여 지지를 철회하거나 선택지를 바꿀 일이 있으랴 싶은 것이다.
아이를 갖기 전에는 용꿈이니 참외꿈이니 하는 태몽을 꾼다고 한다. 아이의 이름을 점성가에게 돈을 주고 받기도 한다. 유도분만이든 제왕절개든 아이는 태어난 일시에 따라 사주팔자를 타고난다. 연초면 사주팔자를 보고 한 해의 운수를 가늠한다. 뭔가 잘 안 풀리면 아홉수에 걸렸다고 생각한다. 작년도, 재작년도 아홉수였으니 아홉수가 지독하게 길긴 길다. 이후 아홉수를 벗어나 취업에 성공해 첫 직장을 다니다 이직을 고민하며, 신점을 보러 간다. 거기서 몇 마디 나누니 어떤 결정을 하든 조금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다.
어쩌다 연애를 하게 되었으니 타로점을 본다. 타로점도 좋았는데, 궁합도 좋았다. 그렇게 상대와 결혼을 하게 되어 집을 구해야 하는데 요즘 돈 들어오는 인테리어는 따로 있다고 한다. 현관에 해바라기 그림을 두고 살 것이다. 운이 좋다면 무병장수해 살다가 풍수지리가 좋은 묫자리에 묻힐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 마지않는 현실적인 삶이다. 결코 과학일 수 없는 유사과학을 과학보다 더 깊게 신뢰하고 일상의 척도 삼는 사회에서 손바닥에 부적이 대수겠는가. 아니, 괴이한 언사를 내뱉는 ‘도사’를 멘토로 생각한다고 하여도 그게 큰 문제는 아닐 것이다.
‘태초에 외계인이 지구를 평평하게 창조하였으니’는 우리 삶에 깊숙이 자리한 유사과학을 모티프로 10명의 SF 작가가 쓴 단편을 모은 앤솔러지 소설집이다. 평소 유사과학에 기반한 모든 것들에 단호히 고개를 저었을 법한 SF 작가가 그린 유사과학의 세상은 어떤 것일까. 평범한 노년을 보내던 윤씨는 어느 날 숯가루를 탄 물이 몸에 좋다는 등산 친구의 말에 지구 평평설을 믿는 모임에 나가 공짜로 숯가루 물을 얻어 마신다. 짧게 요약한 위 문장만으로는 이게 말이 되는가 싶겠지만, 소설 속 윤씨는 나름대로 정보를 선별하고 의심하다 끝내 확신한다. 조상의 음덕을 운운하며 숯가루의 효험을 강조하는 단체의 말은 과학적 사실에는 위배되지만 윤씨의 유사과학에서는 말 그대로 진리로 존재한다. 이와 비슷한 구조로 우리 중 누군가는 창조론을 진지한 과학적 이론으로 받아들인다. 물리치료나 약물치료 대신 우주의 기운을 빌린 기 치료를 받으려고 한다. 운동과 식이요법 대신 출처 불명의 약품을 먹는다. 성격을 혈액형으로 구별하더니, 이제는 MBTI 간이 검사를 맹신하며 말 한마디에 상대방을 ‘I’ 아니면 ‘T’로 무 자르듯 나눠버린다.
이와 같은 이야기는 소설인지 현실인지 분간하기 쉽지 않다. 그 쉽지 않음을 깨닫는 과정이 이 작품을 읽는 재미의 본질일 것이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현대인인 척 우리는 유사과학의 외벽으로 세계를 둘러싸고 그 안에서 안정감을 느껴온 게 아닐까. 일이 풀리면 풀리는 대로, 안 풀리면 안 풀리는 대로 근거와 논리를 찾아 해결하는 게 아닌, 타고난 운명 혹은 운수에 사유를 맡겨버리는 편한 방법을 택해온 게 아닐까.
“더 나은 세상을 고민하지 않고, 무엇을 만들고 어떤 방향으로 변화를 이끌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을 천시하고 조롱하며 배제하는 갇힌 세상을 만들고자”(수록작, 홍지운의 ‘유사과학소설작가연대 탈회의 변’ 중에서) 한 게 아닐까. 그렇게 하여 맞이한 결말이 바로 지금 이 시대인 건 아닐까. 이게 실화냐 싶지만, 부정하기 힘든 오늘날을 우리는 살고 있다. <시인>
‘태초에 외계인이 지구를 평평하게 창조하였으니’는 우리 삶에 깊숙이 자리한 유사과학을 모티프로 10명의 SF 작가가 쓴 단편을 모은 앤솔러지 소설집이다. 평소 유사과학에 기반한 모든 것들에 단호히 고개를 저었을 법한 SF 작가가 그린 유사과학의 세상은 어떤 것일까. 평범한 노년을 보내던 윤씨는 어느 날 숯가루를 탄 물이 몸에 좋다는 등산 친구의 말에 지구 평평설을 믿는 모임에 나가 공짜로 숯가루 물을 얻어 마신다. 짧게 요약한 위 문장만으로는 이게 말이 되는가 싶겠지만, 소설 속 윤씨는 나름대로 정보를 선별하고 의심하다 끝내 확신한다. 조상의 음덕을 운운하며 숯가루의 효험을 강조하는 단체의 말은 과학적 사실에는 위배되지만 윤씨의 유사과학에서는 말 그대로 진리로 존재한다. 이와 비슷한 구조로 우리 중 누군가는 창조론을 진지한 과학적 이론으로 받아들인다. 물리치료나 약물치료 대신 우주의 기운을 빌린 기 치료를 받으려고 한다. 운동과 식이요법 대신 출처 불명의 약품을 먹는다. 성격을 혈액형으로 구별하더니, 이제는 MBTI 간이 검사를 맹신하며 말 한마디에 상대방을 ‘I’ 아니면 ‘T’로 무 자르듯 나눠버린다.
이와 같은 이야기는 소설인지 현실인지 분간하기 쉽지 않다. 그 쉽지 않음을 깨닫는 과정이 이 작품을 읽는 재미의 본질일 것이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현대인인 척 우리는 유사과학의 외벽으로 세계를 둘러싸고 그 안에서 안정감을 느껴온 게 아닐까. 일이 풀리면 풀리는 대로, 안 풀리면 안 풀리는 대로 근거와 논리를 찾아 해결하는 게 아닌, 타고난 운명 혹은 운수에 사유를 맡겨버리는 편한 방법을 택해온 게 아닐까.
“더 나은 세상을 고민하지 않고, 무엇을 만들고 어떤 방향으로 변화를 이끌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을 천시하고 조롱하며 배제하는 갇힌 세상을 만들고자”(수록작, 홍지운의 ‘유사과학소설작가연대 탈회의 변’ 중에서) 한 게 아닐까. 그렇게 하여 맞이한 결말이 바로 지금 이 시대인 건 아닐까. 이게 실화냐 싶지만, 부정하기 힘든 오늘날을 우리는 살고 있다. <시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