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보 신춘문예 출신 이서영 시인 “시는, 부재를 통한 존재 확인 과정”
첫 시집 ‘안녕 안녕 아무 꽃이나 보러 가자’ 출간
시 모임 활동, 심리·직업상담도
시 모임 활동, 심리·직업상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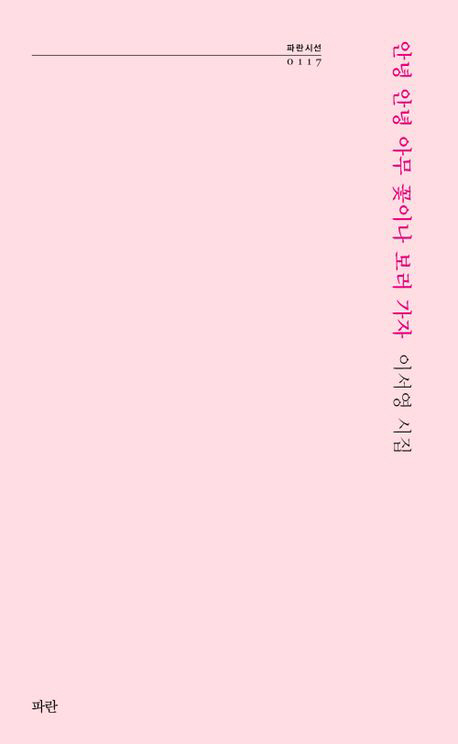 |
“내게 시란 거기 나 혹은 당신이 있는지 더듬어 보는 거예요.”
시인들마다 시를 각기 다르게 정의한다. 시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혹은 어떤 삶의 행로를 걸어왔느냐에 따라 그 규정은 달라진다. 어떤 식으로 정의하든 거기에는 시를 바라보는 시인의 태도가 투영돼 있기 마련이다.
이서영 시인은 ‘더듬어 보는 것’이라고 했다. 부연하자면 나와 타자가 있는지 시를 통해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것일 테다. 존재의 확인이자 존재에 대한 배려일 수도 있겠다. 어쩌면 김춘수 시인의 시 ‘꽃’의 한 구절,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는 것과 같은 맥락일 듯 하다.
광주일보 신춘문예(2021) 출신 이서영 시인이 첫 시집 ‘안녕 안녕 아무 꽃이나 보러 가자’(파란)를 펴냈다.
등단 1년 만에 창작집을 펴낸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시에 대한 열망이 어느 정도인지가 가늠된다. 혹여 등단 이전부터 써온 작품을 그동안 손질하고 퇴고했을 것도 같다. 어떤 식이든 문단에 나온 지 1년 만에 작품집을 출간한다는 것은 부지런하고 시에 대한 ‘진심’이 있다는 사실일 게다.
시집 출간 소식을 전해오는 시인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작년에 등단했는데 무슨 시집을 벌써 냈냐고 의아해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조금 욕심을 냈습니다.”
시인은 그러면서 8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 얘기를 꺼냈다. 그때 너무 후회를 해 많이 울었다는 거였다.
그는 “이제 혼자 남으신 친정엄마와 시어머니께서 또 홀연히 떠나시면 정말로 후회될 것 같다”며 “자식으로서 기쁨을 드리고 싶어 서둘러 시집을 발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썼던 시를 묶어서 빨리 빨리 내버리고 새로운 시를 쓰고 싶다”며 “앞으로는 좀 더 자유로운 시 쓰기를 해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번 시집을 관통하는 주제는 부재를 통한 존재의 확인 과정이다. 유성호 평론가가 “무엇에 잠겨 산다는 것을 생각하는 뭉클의 서정”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다수의 작품의 모티브가 상실이나 부재한 곳에서 포착된다.
“그것이 언제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어 뭉클을 서랍 속에 넣어 두고 부를 기회를 엿보았지 가끔 사람들 앞에서 여기 뭉클이야 자랑하고 싶었으나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았어 뭉클이 아닌 것을 뭉클이라 할 수 없는 노릇이니까 울고 싶기도 하고 웃고 싶기도 한 것 답답하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한 심정을 뭉텅거린 게 바로 뭉클이라네…”
시 ‘뭉클’을 읽다보면 절로 뭉클한 감정에 휩싸이게 된다. 차마 말로는 할 수 없지만 “서랍 속에 넣어 두고”,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아야 했던 시절의 풍경이 스치듯 지나간다. 화자의 내면 풍경일 수도, 그것을 읽는 독자들의 반응일 수도 있겠다.
시인은 시를 쓸 때 이게 시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지 않는다. “일단 쓰고 싶은 순간과 마주할 때 그것이 나에게 건네는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쓴다는 것이다. 얼핏 그의 말에서 워즈워드의 시에 대한 정의, 즉 ‘자연스러운 감정의 발로’라는 표현이 환기된다.
낭만주의 관점일 수도 있지만, 이 시인의 작품 경향은 더 감각적이고 회화적이며 의미적이다.
신춘문예 등단 이후 그는 ‘시산맥’ 등단패와 광주전남작가회의에 가입해 본격적인 시작 활동을 펼쳤다. 개인적으로 함께 시를 쓰는 분들과 시모임을 갖고 조금이라도 시에 가까이 다가가려 했다.
시집이 나오고 얼마 안 돼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시집이 따끈따끈할 때 축하모임을 하자는” 지인들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던 것도 하나의 이유였다.
“문청 시절에 함께 공부했던 분들 30여 명이 조촐하게 모였습니다. 식사하고 차 마시고 시 읽으며 축하와 감사 인사를 전했지요. 그날 아침 눈이 펑펑 내려 길이 불편했지만 분위기는 ‘시집 발간 축하를 아리는 눈꽃’이라고 모두 행복해했습니다.”
시 쓰는 일 외에 그는 상담심리도 하고 있다. 전남대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상담심리를 전공했다. 7년 전부터는 장애인직업능력개발원에서 직업상담을 일주일에 1회 정도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직업 상담 프로그램 내에 시를 접근해” 보는 시도를 하고 있다.
앞으로도 그는 꾸준히 시를 쓸 계획이다. “시들이 모두 새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이 신선하게 다가온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시인들마다 시를 각기 다르게 정의한다. 시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혹은 어떤 삶의 행로를 걸어왔느냐에 따라 그 규정은 달라진다. 어떤 식으로 정의하든 거기에는 시를 바라보는 시인의 태도가 투영돼 있기 마련이다.
광주일보 신춘문예(2021) 출신 이서영 시인이 첫 시집 ‘안녕 안녕 아무 꽃이나 보러 가자’(파란)를 펴냈다.
등단 1년 만에 창작집을 펴낸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시에 대한 열망이 어느 정도인지가 가늠된다. 혹여 등단 이전부터 써온 작품을 그동안 손질하고 퇴고했을 것도 같다. 어떤 식이든 문단에 나온 지 1년 만에 작품집을 출간한다는 것은 부지런하고 시에 대한 ‘진심’이 있다는 사실일 게다.
“작년에 등단했는데 무슨 시집을 벌써 냈냐고 의아해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조금 욕심을 냈습니다.”
시인은 그러면서 8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 얘기를 꺼냈다. 그때 너무 후회를 해 많이 울었다는 거였다.
그는 “이제 혼자 남으신 친정엄마와 시어머니께서 또 홀연히 떠나시면 정말로 후회될 것 같다”며 “자식으로서 기쁨을 드리고 싶어 서둘러 시집을 발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썼던 시를 묶어서 빨리 빨리 내버리고 새로운 시를 쓰고 싶다”며 “앞으로는 좀 더 자유로운 시 쓰기를 해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서영 시인 |
“그것이 언제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어 뭉클을 서랍 속에 넣어 두고 부를 기회를 엿보았지 가끔 사람들 앞에서 여기 뭉클이야 자랑하고 싶었으나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았어 뭉클이 아닌 것을 뭉클이라 할 수 없는 노릇이니까 울고 싶기도 하고 웃고 싶기도 한 것 답답하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한 심정을 뭉텅거린 게 바로 뭉클이라네…”
시 ‘뭉클’을 읽다보면 절로 뭉클한 감정에 휩싸이게 된다. 차마 말로는 할 수 없지만 “서랍 속에 넣어 두고”,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아야 했던 시절의 풍경이 스치듯 지나간다. 화자의 내면 풍경일 수도, 그것을 읽는 독자들의 반응일 수도 있겠다.
시인은 시를 쓸 때 이게 시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지 않는다. “일단 쓰고 싶은 순간과 마주할 때 그것이 나에게 건네는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쓴다는 것이다. 얼핏 그의 말에서 워즈워드의 시에 대한 정의, 즉 ‘자연스러운 감정의 발로’라는 표현이 환기된다.
낭만주의 관점일 수도 있지만, 이 시인의 작품 경향은 더 감각적이고 회화적이며 의미적이다.
신춘문예 등단 이후 그는 ‘시산맥’ 등단패와 광주전남작가회의에 가입해 본격적인 시작 활동을 펼쳤다. 개인적으로 함께 시를 쓰는 분들과 시모임을 갖고 조금이라도 시에 가까이 다가가려 했다.
시집이 나오고 얼마 안 돼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시집이 따끈따끈할 때 축하모임을 하자는” 지인들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던 것도 하나의 이유였다.
“문청 시절에 함께 공부했던 분들 30여 명이 조촐하게 모였습니다. 식사하고 차 마시고 시 읽으며 축하와 감사 인사를 전했지요. 그날 아침 눈이 펑펑 내려 길이 불편했지만 분위기는 ‘시집 발간 축하를 아리는 눈꽃’이라고 모두 행복해했습니다.”
시 쓰는 일 외에 그는 상담심리도 하고 있다. 전남대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상담심리를 전공했다. 7년 전부터는 장애인직업능력개발원에서 직업상담을 일주일에 1회 정도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직업 상담 프로그램 내에 시를 접근해” 보는 시도를 하고 있다.
앞으로도 그는 꾸준히 시를 쓸 계획이다. “시들이 모두 새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이 신선하게 다가온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