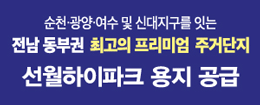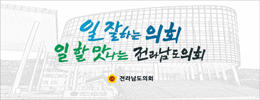북녘 가족 향한 그리움은 늙지 않는다
광주 남구 ‘이산가족 초청 문화행사’ 참가한 이산가족 만나보니
고령에 인지력 떨어져도 헤어진 가족 이름은 생생히 기억
생사 확인 못한 채 무정한 세월만…다시 만날 날 기다려요
고령에 인지력 떨어져도 헤어진 가족 이름은 생생히 기억
생사 확인 못한 채 무정한 세월만…다시 만날 날 기다려요
 광주·전남의 이산가족들이 17일 곡성군 일원에서 열린 ‘남구 이산가족 초청 문화행사’에 참석해 섬진강변에서 화합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왼쪽부터 이동길·김부연 씨, 박순애·김준희 씨, 김찬영 씨, 박덕자·이진영 씨. 이들은 그리운 가족을 북녘에 둔 채 어느덧 나이 아흔을 지나고 있다. |
광주·전남 이산가족들이 세월이 갈수록 흐릿해지기는 커녕, 커져만 가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17일 광주시 남구가 곡성군 국립곡성치유의숲에서 개최한 ‘이산가족 초청 문화행사’에 참석한 광주·전남 지역의 이산가족 김준희(92), 김찬영(91), 이동길(88), 박덕자(여·85)씨도 그랬다.
모두 80~90대 고령에 인지 능력도 저하되고 있지만 지금도 헤어진 가족의 이름을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다시 만날 날을 여전히 기다린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이산가족 어르신들은 가족들과 평화도슨트들의 부축을 받으며 짧은 숲길을 걸은 뒤 강당에 모여 인지 재활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굳어가는 몸과 마음을 서서히 열어갔다.
치매 예방 건강박수 5단계를 배우고 스트레칭으로 몸을 깨운 뒤, 전국 각지의 아리랑 박자에 맞춰 머리·어깨·배를 두드리고 다양한 안무 동작들을 난이도를 높여가며 배워갔다. 북한의 인절미 박수에 맞춰 “오물오물 짝짝 조물조물 짝짝”을 외치고, 노래 ‘동반자’에 따라 팔을 올리고 몸을 흔들며 서로에게 하트를 보내기도 했다.
편백향이 가득한 체험실에서 ‘꿈에 본 내 고향’ 무대가 울려퍼졌다. 노랫 속 가사 “내 부모 내 형제를 그 언제나 만나리” 따라 부르는 이들의 목소리에는 애달픔이 묻어났다.
이들은 저마다 다른 이유로 가족과 생이별해 오랜 세월을 살아 왔지만,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은 그대로였다.
참가자 중 최고령인 김준희 씨는 나주시 성북동에서 8남매의 막내로 태어났다. 큰누님 김봉덕과 셋째 형 김봉희는 해방 전 만주에 머물다 남과 북이 갈린 뒤 돌아오지 못했다. 사진사였던 형은 귀국길에 38선에서 길이 막혔고, 평양에서 은행원이던 누님은 연락이 끊겼다.
김씨는 통일부에 열 차례 넘게 생사확인을 요청했지만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김씨는 “함께 남으로 온 다른 누나 형님들도 다 돌아가셨다. 큰누님이 평양의 모 교수와 결혼해 낳은 조카가 있다는 게 마지막 소식인데 이름이 김광진이다”며 “그 조카라도 반드시 만나고 싶지만 무정한 세월만 가고 있고 나도 벌써 92살이나 먹어서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고 말 끝을 흐렸다.
나주 평산동 화산마을 출신 이동길 씨는 1951년 의용군에 자진 입대한 둘째 형 이동래 씨를 70여 년째 찾고 있다.
형은 거제 포로수용소에 수감된 뒤 흔적이 끊겼다. 어머니는 생전에 매일 새벽 정화수를 떠놓고 아들의 무사를 빌었지만 “내 아들 동래를 못 보고 간다”는 말을 끝내 남기고 눈을 감았다. 이동길 씨는 “봉황천에서 형과 물고기 잡던 여름 풍경이 지금도 생생하다”며 “형이 어디든 살아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다”고 했다.
아버지와 생이별을 하고도 연좌제가 두려워 수십년 동안 그 이야기를 입에도 올리지 못한 이도 있었다.
영암 출신 박덕자씨는 10살 때 6·25를 겪었다. 공산주의 활동을 하던 아버지 박득채 씨가 월북하면서 하루아침에 재산은 몰수됐고 어머니는 나주에서 건어물 장사와 점방 운영으로 생계를 이어갔다. 그럼에도 혹시나 연좌제로 피해를 입을까 감히 다른 사람에게 말도 못 꺼냈다는 것이 박씨 설명이다.
북녘에서 내려왔다가 돌아가지 못한 이에게도 아픔은 매한가지였다.
평안북도 희천군이 고향인 김찬영(본명 김광렴) 씨는 1965년 북한 공작조 안내원으로 남파됐다 체포돼 세 살 딸 김정희와 갓난아기 둘째, 일곱 살 어린 아내 오춘옥 씨와 생이별했다.
김씨는 “정희가 ‘아빠 가지 마’라며 울던 모습이 지금도 그대로다. 그때 막 태어난 아이는 이름도 못 지어줬다”며 “남파 직후 15년간 수감생활을 했고, 이후 목회자의 길을 걸으면서 북에 남겨진 가족의 삶을 생각하면 평생 단잠을 자본 적이 없다”고 했다.
김씨는 이날도 섬진강을 향해 “정희야” 외치며 북녘에 있을 딸을 불렀지만, 돌아오는 답은 없었다.
광주·전남에 남은 생존 이산가족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통일부가 집계한 지난 10월 말 기준 전국 생존 이산가족 중 광주전남에 거주하는 등록자는 840명이며, 이 가운데 광주는 333명, 전남에는 507명이 남아 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지난 2018년 8월 이후 7년째 멈춰 있으며, 아직 북쪽의 가족을 만나보지 못한 이들도 다수다.
김영진 민주평화인권과 남북교류협력팀장은 “2023년엔 8가족, 지난해엔 6가족이 참석할 수 있었는데, 점차 어르신들의 건강상태가 안 좋아지시는 걸 볼때마다 마음이 아프다”며 “대부분 90세가 넘으셨다보니 연락드릴 때마다 걱정도 되고 조심스러워진다”고 말했다.
이어 “기회가 된다면 떨어진 가족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영상기록도 남겨오고 있다”며 “지금도 실오라기 같은 희망으로 하루하루 버티시는 만큼, 남은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돕고 싶다”고 덧붙였다.
/곡성 글·사진=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17일 광주시 남구가 곡성군 국립곡성치유의숲에서 개최한 ‘이산가족 초청 문화행사’에 참석한 광주·전남 지역의 이산가족 김준희(92), 김찬영(91), 이동길(88), 박덕자(여·85)씨도 그랬다.
이날 이산가족 어르신들은 가족들과 평화도슨트들의 부축을 받으며 짧은 숲길을 걸은 뒤 강당에 모여 인지 재활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굳어가는 몸과 마음을 서서히 열어갔다.
치매 예방 건강박수 5단계를 배우고 스트레칭으로 몸을 깨운 뒤, 전국 각지의 아리랑 박자에 맞춰 머리·어깨·배를 두드리고 다양한 안무 동작들을 난이도를 높여가며 배워갔다. 북한의 인절미 박수에 맞춰 “오물오물 짝짝 조물조물 짝짝”을 외치고, 노래 ‘동반자’에 따라 팔을 올리고 몸을 흔들며 서로에게 하트를 보내기도 했다.
이들은 저마다 다른 이유로 가족과 생이별해 오랜 세월을 살아 왔지만,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은 그대로였다.
참가자 중 최고령인 김준희 씨는 나주시 성북동에서 8남매의 막내로 태어났다. 큰누님 김봉덕과 셋째 형 김봉희는 해방 전 만주에 머물다 남과 북이 갈린 뒤 돌아오지 못했다. 사진사였던 형은 귀국길에 38선에서 길이 막혔고, 평양에서 은행원이던 누님은 연락이 끊겼다.
김씨는 통일부에 열 차례 넘게 생사확인을 요청했지만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김씨는 “함께 남으로 온 다른 누나 형님들도 다 돌아가셨다. 큰누님이 평양의 모 교수와 결혼해 낳은 조카가 있다는 게 마지막 소식인데 이름이 김광진이다”며 “그 조카라도 반드시 만나고 싶지만 무정한 세월만 가고 있고 나도 벌써 92살이나 먹어서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고 말 끝을 흐렸다.
나주 평산동 화산마을 출신 이동길 씨는 1951년 의용군에 자진 입대한 둘째 형 이동래 씨를 70여 년째 찾고 있다.
형은 거제 포로수용소에 수감된 뒤 흔적이 끊겼다. 어머니는 생전에 매일 새벽 정화수를 떠놓고 아들의 무사를 빌었지만 “내 아들 동래를 못 보고 간다”는 말을 끝내 남기고 눈을 감았다. 이동길 씨는 “봉황천에서 형과 물고기 잡던 여름 풍경이 지금도 생생하다”며 “형이 어디든 살아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다”고 했다.
아버지와 생이별을 하고도 연좌제가 두려워 수십년 동안 그 이야기를 입에도 올리지 못한 이도 있었다.
영암 출신 박덕자씨는 10살 때 6·25를 겪었다. 공산주의 활동을 하던 아버지 박득채 씨가 월북하면서 하루아침에 재산은 몰수됐고 어머니는 나주에서 건어물 장사와 점방 운영으로 생계를 이어갔다. 그럼에도 혹시나 연좌제로 피해를 입을까 감히 다른 사람에게 말도 못 꺼냈다는 것이 박씨 설명이다.
북녘에서 내려왔다가 돌아가지 못한 이에게도 아픔은 매한가지였다.
평안북도 희천군이 고향인 김찬영(본명 김광렴) 씨는 1965년 북한 공작조 안내원으로 남파됐다 체포돼 세 살 딸 김정희와 갓난아기 둘째, 일곱 살 어린 아내 오춘옥 씨와 생이별했다.
김씨는 “정희가 ‘아빠 가지 마’라며 울던 모습이 지금도 그대로다. 그때 막 태어난 아이는 이름도 못 지어줬다”며 “남파 직후 15년간 수감생활을 했고, 이후 목회자의 길을 걸으면서 북에 남겨진 가족의 삶을 생각하면 평생 단잠을 자본 적이 없다”고 했다.
김씨는 이날도 섬진강을 향해 “정희야” 외치며 북녘에 있을 딸을 불렀지만, 돌아오는 답은 없었다.
광주·전남에 남은 생존 이산가족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통일부가 집계한 지난 10월 말 기준 전국 생존 이산가족 중 광주전남에 거주하는 등록자는 840명이며, 이 가운데 광주는 333명, 전남에는 507명이 남아 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지난 2018년 8월 이후 7년째 멈춰 있으며, 아직 북쪽의 가족을 만나보지 못한 이들도 다수다.
김영진 민주평화인권과 남북교류협력팀장은 “2023년엔 8가족, 지난해엔 6가족이 참석할 수 있었는데, 점차 어르신들의 건강상태가 안 좋아지시는 걸 볼때마다 마음이 아프다”며 “대부분 90세가 넘으셨다보니 연락드릴 때마다 걱정도 되고 조심스러워진다”고 말했다.
이어 “기회가 된다면 떨어진 가족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영상기록도 남겨오고 있다”며 “지금도 실오라기 같은 희망으로 하루하루 버티시는 만큼, 남은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돕고 싶다”고 덧붙였다.
/곡성 글·사진=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