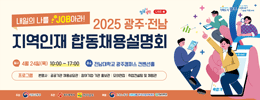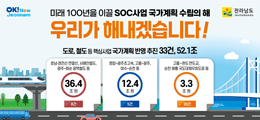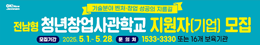[농산물품질관리사 김대성 기자의 ‘농사만사’] 우량종자 생산 어렵고 복잡한 덴 이유가 있다
순도 높고, 균일한 종자 생산 온 힘…보전 방식엔 개선 필요
 /클립아트코리아 |
농사에 있어 좋은 종자란 우선 다른 품종의 종자가 섞여 있지 않은 높은 순도의 것을 말한다. 우량종자 일수록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데, 식량작물의 종자가 여러 단계의 생산 과정을 거쳐 농가에 보급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더욱 순도 높고, 균일한 종자를 생산해야 더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농정 당국은 좋은 품종을 육성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내·외에서 다양한 유전자원을 수집하고, 원하는 특성이 있는 유전자원을 이용해 인위적으로 암술에 수술 꽃가루를 옮기는 교배를 한다. 교배 후 채취한 종자는 심어서 재배적 특성이 우수하고 찾고자 하는 특징을 보이는 개체를 수천, 수만 개 중에서 선발해 몇 년에 걸쳐 검증을 거쳐서 완성된 종자를 국립종자원에 품종등록을 한다.
이렇게 육종기관 또는 육종가가 생산한 소량이면서 아주 순수한 종자를 ‘기본식물’이라고 한다. 또 기본식물 종자를 각도 농업기술원에서 재배해 100배(벼, 작물에 따라 다름)의 종자를 생산한 것을 ‘원원종’이라고 한다. 원원종을 이용해서 지역 원종장에서 90배의 ‘원종’을 생산하고, 이 원종을 이용해 국립종자원에서 110배의 종자를 생산하는데 이를 ‘보급종’이라 한다. 이렇게 생산된 보급종은 각 기초자치단체와 협력해 농가에까지 이르게 된다.
이러한 종자생산 체계는 종자산업법 제15조에 의거 국가 품종등재 대상작물 벼, 보리, 콩, 옥수수, 감자 등 5작목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필요에 따라 추가되기도 한다. 종자산업법 제22조에 품종목록 등재품종의 등의 종자생산에 대해서 법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 중 참깨, 땅콩 등 재배면적이 넓지 않은 종자는 종자생산체계에서 원원종 까지 생산하고 농가에 보급하기도 하고, 농촌진흥청에서 출자해 운영 중인 농업실용화재단에서 생산해 판매하기도 한다. 이러한 국가적인 식량작물의 종자생산체계와 보급 시스템 덕에 우량종자가 농가에 공급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우수한 체계에도 정부와 사회 운동가가 토종종자(씨앗)을 두고 벌이는 논쟁을 보면, 우량종자의 보전 방식 등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견해차가 있는 것 같다.
특히 토종씨앗은 여성농민과 도시농부, 자급농 등 위주로 활용되고 있고 여전히 농민들의 종자권은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인데, 이에 토종씨앗 운동가들은 토종 씨앗을 보전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토종씨앗 운동가들은 ‘종자산업법’과 ‘농업생명자원의 보전·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농업생명자원법)’이 농민의 종자 사용과 보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도적 기반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종자의 생산·판매가 종자업 등록자에게만 허용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농민들이 자가 채종한 종자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인데, 최근 신설된 육묘업 조항은 농민들의 품앗이 식 모종 나눔마저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 단체들은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종자업 및 육묘업 등록기준 완화 ▲농민 간 종자 거래 합법화 ▲현지내 보전 지원 규정 마련 ▲지역 내 종자 공유 시스템 구축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국제연합(UN) 농민권리선언의 농부권 조항을 국내법에 반영하고, 유럽연합(EU)과 아프리카 등의 토종종자 보호 법제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농부는 굶어 죽어도 종자는 베고 잔다’는 말이 있다. 또 농사의 절반은 종자 즉 씨앗이라는 말도 한다. 모두 종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인데, 이는 좋은 종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미도 된다. 본격적인 농사철을 앞두고 국립종자원과 농업기술원은 물론 농촌진흥청까지 일제히 우량종자 보급에 나서고 있다. 종자 공급 시기와 가격이 기관마다 다르므로, 필요한 품목을 확인한 뒤 해당 기관으로 직접 신청하는 게 맞다. /bigkim@kwangju.co.kr
이렇게 육종기관 또는 육종가가 생산한 소량이면서 아주 순수한 종자를 ‘기본식물’이라고 한다. 또 기본식물 종자를 각도 농업기술원에서 재배해 100배(벼, 작물에 따라 다름)의 종자를 생산한 것을 ‘원원종’이라고 한다. 원원종을 이용해서 지역 원종장에서 90배의 ‘원종’을 생산하고, 이 원종을 이용해 국립종자원에서 110배의 종자를 생산하는데 이를 ‘보급종’이라 한다. 이렇게 생산된 보급종은 각 기초자치단체와 협력해 농가에까지 이르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우수한 체계에도 정부와 사회 운동가가 토종종자(씨앗)을 두고 벌이는 논쟁을 보면, 우량종자의 보전 방식 등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견해차가 있는 것 같다.
특히 토종씨앗은 여성농민과 도시농부, 자급농 등 위주로 활용되고 있고 여전히 농민들의 종자권은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인데, 이에 토종씨앗 운동가들은 토종 씨앗을 보전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토종씨앗 운동가들은 ‘종자산업법’과 ‘농업생명자원의 보전·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농업생명자원법)’이 농민의 종자 사용과 보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도적 기반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종자의 생산·판매가 종자업 등록자에게만 허용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농민들이 자가 채종한 종자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인데, 최근 신설된 육묘업 조항은 농민들의 품앗이 식 모종 나눔마저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 단체들은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종자업 및 육묘업 등록기준 완화 ▲농민 간 종자 거래 합법화 ▲현지내 보전 지원 규정 마련 ▲지역 내 종자 공유 시스템 구축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국제연합(UN) 농민권리선언의 농부권 조항을 국내법에 반영하고, 유럽연합(EU)과 아프리카 등의 토종종자 보호 법제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농부는 굶어 죽어도 종자는 베고 잔다’는 말이 있다. 또 농사의 절반은 종자 즉 씨앗이라는 말도 한다. 모두 종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인데, 이는 좋은 종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미도 된다. 본격적인 농사철을 앞두고 국립종자원과 농업기술원은 물론 농촌진흥청까지 일제히 우량종자 보급에 나서고 있다. 종자 공급 시기와 가격이 기관마다 다르므로, 필요한 품목을 확인한 뒤 해당 기관으로 직접 신청하는 게 맞다. /big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