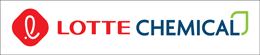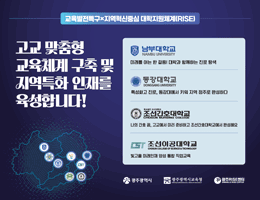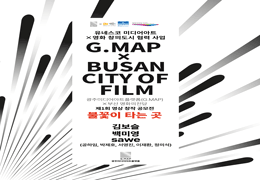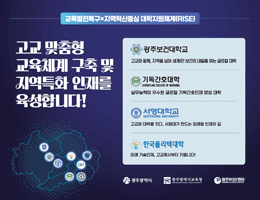나만의 새로운 노래를…임윤찬 광주 리사이틀 ‘전람회의 그림’ 리뷰
이소영 음악평론가
 지난 19일 광주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피아니스트 임윤찬 리사이틀 모습.<광주예술의 전당 제공> |
6월 19일 광주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임윤찬 피아노 리사이틀(Yunchan Lim Piano Recital)’의 프로그램은 1부 멘델스존 ‘무언가’ 2곡과 차이코프스키의 ‘사계’ 12곡, 2부 무소르그스키의 ‘전람회의 그림’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무소르그스키의 ‘전람회의 그림’ 연주가 너무나 파격적이고 이후 음악애호가나 피아노계와 평론계에서 지속적인 논쟁과 관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것이어서 이번 리뷰는 지면의 한계상 ‘전람회의 그림’에 집중하려고 한다.
이번 ‘전람회의 그림’을 들으면서 시종 나를 이끌고 갔던 것은 어디선가 인터뷰를 했을 것같은, 상상되는 임윤찬의 목소리였다. “지금까지 들었던 ‘전람회 그림’의 모든 연주는 다 잊어주세요 이제 나만의 새로운 노래를 부르겠어요”
연주에 앞서 임윤찬이 호로비츠 판으로 연주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문의 결과 소속사 목프로덕션으로부터 호로비츠 버전이 아닌 원곡으로 연주한다는 공식적인 답변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보면 호로비츠 버전이 아닌 오리지날 버전의 연주는 탁월한 선택이었다. 똑같은 악보를 가지고 한 수많은 사람의 연주 중 임윤찬의 연주가 얼마나 파격적이고 도발적인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럼 무엇이 그렇게 도발적이고 파격적이었던가? 무엇이 나를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는 듯한 충격과 전율 속으로 몰아넣었나?
첫째, 악상, 즉 다이나믹의 처리였다. 피아노와 포르테가 정 반대로 뒤집히고 레카토와 마르카토가 뒤바뀌는, 한마디로 예상을 빗나가는 악상 처리로 인한 무수한 예외성으로 인하여 스릴감과 짜릿함까지 느끼게 하는 최초의 연주였다.
둘째, 악보에 새로운 자신만의 음표를 삽입하거나 구성에 변화를 주었다. 임윤찬 본인이 삽입하거나 추가한 트릴과 아르페지오, 앞꾸밈음과 짧은 선율 첨가, 다섯번째 프롬나드의 생략 등 작은 부분의 디테일 처리에서 큰 구성에 이르기까지 임윤찬 버전의 악보가 따로 존재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해주는 파격적이고 경이로운 해석이었다.
셋째, 그의 독특하고 설득력 있는 아티큘레이션과 템포 루바토의 변화무쌍함 등은 해석의 경지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 연주자의 해석에 대한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으며 그 경계는 창작과 해석의 어디쯤에 위치하는지 등 연주에 관하여 음악철학으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넷째, 근대미학의 초석을 다졌던 칸트의 미학, 즉 ‘아름다움(美)이란 무엇인가’의 문제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계기를 주었다. 저음역대에서 배음들이 뒤섞여진, 굉음에 가까운 금속성 소리와 때려부술듯한 타건을 통해 나오는 압도적 음향과 저음역, 고음역, 중음역에서 각각 질적으로 다른 성격의 사운드 및 여러 다른 악기 소리를 상상케 하는 음색의 다변화, 몰아치는 질주 및 숨이 멎을 듯한 멈춤(pause) 등의 과감한 템포 운용 등이 시종일관 우리의 감각을 압도하였다.
이는 마치 자연의 거대한 파도 앞에서 느끼는 역동적 숭고미와 함께 쾌와 불쾌가 혼융된 새로운 미적 쾌감마저 불러일으키고 칸트가 구분했던 이성과 오성, 감성을 하나의 거대한 용광로에 섞어 버리는 듯한 효과를 가져왔다.
임윤찬이 ‘전람회의 그림’을 통해 궁극적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 피아노는 더이상 ‘작은 오케스트라’가 아니라 기존 오케스트라가 할 수 없는, ‘다른 오케스트라’임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아닐까?
나의 감흥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날의 무대는 과거의 노래는 다 잊고 이제 새로운 노래를 부르자는 선포를 통해 피아니스트 계보사에서 신인류의 탄생을 확인하는 역사적 현장이었다. 그러나 새로운 영웅의 탄생을 두고 진보주의자, 혹은 자유주의자들과 보수주의자 혹은 엄격음악 신봉자들 사이에 적잖은 논쟁이 있을 수도 있으리라.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연주에 앞서 임윤찬이 호로비츠 판으로 연주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문의 결과 소속사 목프로덕션으로부터 호로비츠 버전이 아닌 원곡으로 연주한다는 공식적인 답변을 받았다.
그럼 무엇이 그렇게 도발적이고 파격적이었던가? 무엇이 나를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는 듯한 충격과 전율 속으로 몰아넣었나?
첫째, 악상, 즉 다이나믹의 처리였다. 피아노와 포르테가 정 반대로 뒤집히고 레카토와 마르카토가 뒤바뀌는, 한마디로 예상을 빗나가는 악상 처리로 인한 무수한 예외성으로 인하여 스릴감과 짜릿함까지 느끼게 하는 최초의 연주였다.
둘째, 악보에 새로운 자신만의 음표를 삽입하거나 구성에 변화를 주었다. 임윤찬 본인이 삽입하거나 추가한 트릴과 아르페지오, 앞꾸밈음과 짧은 선율 첨가, 다섯번째 프롬나드의 생략 등 작은 부분의 디테일 처리에서 큰 구성에 이르기까지 임윤찬 버전의 악보가 따로 존재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해주는 파격적이고 경이로운 해석이었다.
셋째, 그의 독특하고 설득력 있는 아티큘레이션과 템포 루바토의 변화무쌍함 등은 해석의 경지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 연주자의 해석에 대한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으며 그 경계는 창작과 해석의 어디쯤에 위치하는지 등 연주에 관하여 음악철학으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넷째, 근대미학의 초석을 다졌던 칸트의 미학, 즉 ‘아름다움(美)이란 무엇인가’의 문제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계기를 주었다. 저음역대에서 배음들이 뒤섞여진, 굉음에 가까운 금속성 소리와 때려부술듯한 타건을 통해 나오는 압도적 음향과 저음역, 고음역, 중음역에서 각각 질적으로 다른 성격의 사운드 및 여러 다른 악기 소리를 상상케 하는 음색의 다변화, 몰아치는 질주 및 숨이 멎을 듯한 멈춤(pause) 등의 과감한 템포 운용 등이 시종일관 우리의 감각을 압도하였다.
이는 마치 자연의 거대한 파도 앞에서 느끼는 역동적 숭고미와 함께 쾌와 불쾌가 혼융된 새로운 미적 쾌감마저 불러일으키고 칸트가 구분했던 이성과 오성, 감성을 하나의 거대한 용광로에 섞어 버리는 듯한 효과를 가져왔다.
임윤찬이 ‘전람회의 그림’을 통해 궁극적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 피아노는 더이상 ‘작은 오케스트라’가 아니라 기존 오케스트라가 할 수 없는, ‘다른 오케스트라’임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아닐까?
나의 감흥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날의 무대는 과거의 노래는 다 잊고 이제 새로운 노래를 부르자는 선포를 통해 피아니스트 계보사에서 신인류의 탄생을 확인하는 역사적 현장이었다. 그러나 새로운 영웅의 탄생을 두고 진보주의자, 혹은 자유주의자들과 보수주의자 혹은 엄격음악 신봉자들 사이에 적잖은 논쟁이 있을 수도 있으리라.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이소영 음악평론가.<광주예술의 전당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