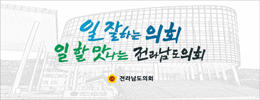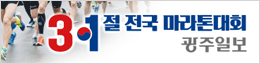[수필의 향기] 채울수 없는 결핍, 할머니- 김향남 수필가
 |
어렸을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할머니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부럽다. 할머니 무릎을 베고 할머니가 해주는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다거나, 할머니의 음식 맛을 잊지 못한다거나, 할머니와 어디를 다녀왔다거나, 할머니로부터 무엇을 배웠다거나…. 그런 얘기를 들을 때면 공연히 샘이 난다. 나에게도 할머니가 있었다면, 그래서 할머니의 옛날이야기를 듣고 자랐더라면 좀 더 풍부한 감성과 상상력을 갖추었을 텐데 싶고, 할머니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느껴보았더라면 더 따스한 사람일 수도 있었을 텐데 싶어지는 것이다.
우리 할머니는 내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작고하셨다.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였다. 하필 나는 9남매의 맨 꼴찌로 태어나는 바람에 그분들의 존재를 전혀 모르고 살았다. 할머니는 엄마에게는 몹시 냉정하고 심술궂은 시어머니였으나 손주들만큼은 끔찍이도 위하는 분이셨고, 할아버지는 비가 와서 곡식이 떠내려가도 그저 글 읽기에 몰두한 백면서생이었다는 정도만 들었을 뿐이다. 그것만으로도 두 분이 어떤 모습이었을지 그려볼 수는 있지만, 상상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무엇이 있다.
외할머니가 계시기는 했다. 그러나 역시 내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 합쳐도 두세 번 뵀을까 말까다. 기억 속의 할머니는 쪼글쪼글 주름진 얼굴에 머리는 하얗게 세었고 비녀를 꽂았으며 체구는 작고 가늘었다. 어느 여름날 아침 할머니를 따라 마을 앞 개울가에서 세수하는 장면과 그때 그 개울물, 그리고 그때쯤 막 떠오르기 시작한 유난히 눈부셨던 햇살이 떠오른다. 앓아누우신 할머니가 머리맡의 지폐 한 장을 꺼내 꼭 쥐여 주시던 것도, 쭈뼛거리는 내 손을 한참이나 붙잡고 계시던 것도 잊히지 않는다. 그런 기억들은 유효기간도 부작용도 없이 다만 포근하고 아름답게 남아 있다. 동굴 속의 벽화처럼 좀체 지워지지도 사라지지도 않는다.
엄마의 엄마인 외할머니가 나를 바라보는 눈빛은 각별했다. 그때는 몰랐지만 생각할수록 그런 느낌이 들곤 한다. 선뜻 다가서지 못하고 엄마 치맛자락이나 붙들고 서 있는 조그만 여자아이를 할머니는 대뜸 안아 들이셨다. 나는 포로가 된 듯 순순히 투항했다. 굳이 밀어내거나 저항할 필요가 없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혹은 할머니와 나 사이에는 이미 서로 충분한 교감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말하지 않고도 그냥, 저절로….
TV를 보다 할머니와 의지해 사는 아이들의 사연을 접한다. 참 딱하고 먹먹한 이야기들이다. 부모의 이혼 후 할머니 손에 자라고 있는 두 형제. 할머니는 부모 없이 자란 티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손주들을 돌본다. 좋은 옷과 신발은 아니어도 언제나 깨끗이 입히려고 애쓰고, 간식비라도 벌기 위해 부업에서 손을 놓지 않는다.
교통사고로 아빠를 잃고 엄마마저 집을 떠나게 된 아홉 살 소녀는 할머니와 함께 산다. 할머니는 양쪽 무릎이 고장 난 데다 혈압에 당뇨를 앓고 허리까지 굽었지만, 손녀를 위하여 힘든 농사일을 그만두지 못한다. 할머니마저 떠나면 어쩌나 겁부터 나는 아이는 서툰 솜씨로 밥상을 차리고 밭일을 거든다. 아이와 할머니는 서로에게 유일한 위안이자 버팀목이다.
할머니는 ‘부모의 어머니’ 혹은 ‘나이가 든 늙은 여성’을 일컫는 말이지만, 사전적인 풀이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할머니가 품고 있는 것은 그보다 훨씬 크고 깊다. 할머니라는 말은 원래 ‘한+어머니’라고 한다. ‘할’은 ‘한’이 변형한 것으로 ‘한’은 ‘큰’을 의미하는 고유어다. 그러니까 할머니는 ‘큰 어머니’, ‘위대한 어머니’, ‘대모(大母, Great Mother)’의 뜻이 크다고 하겠다. 할머니라는 말에 담긴 크고 넉넉한, 포근하고 따스한 이미지는 그로부터 비롯된 것일 테다.
할머니에게는 쪼개지고 깨지고 부딪치면서도 끝까지 살아낸 사람의 체험적 깊이가 녹아 있다. 주름지고 볼품없는 모습일지라도 그 속에는 생명을 낳아 품고 길러온 거인의 혼이 깃들어 있다.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품에 안은 포용의 힘. 어쩌면 신화 속의 ‘마고할미’나 ‘설문대 할망’, ‘삼신 할머니’의 강한 생명력과 지고한 사랑이 우리의 할머니로 이어 온 것이 아닐까.
할머니는 여전히 부러워하고 그리워하는 존재다. 내게는 채울 수 없는 결핍이기도 하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누군가의 할머니가 되어 내가 받고 싶었던 것을 돌려줄 수 있다면, 그래서 그 아이 가슴 속에 오래오래 ‘할머니’를 간직할 수 있게 된다면….
엄마의 엄마인 외할머니가 나를 바라보는 눈빛은 각별했다. 그때는 몰랐지만 생각할수록 그런 느낌이 들곤 한다. 선뜻 다가서지 못하고 엄마 치맛자락이나 붙들고 서 있는 조그만 여자아이를 할머니는 대뜸 안아 들이셨다. 나는 포로가 된 듯 순순히 투항했다. 굳이 밀어내거나 저항할 필요가 없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혹은 할머니와 나 사이에는 이미 서로 충분한 교감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말하지 않고도 그냥, 저절로….
TV를 보다 할머니와 의지해 사는 아이들의 사연을 접한다. 참 딱하고 먹먹한 이야기들이다. 부모의 이혼 후 할머니 손에 자라고 있는 두 형제. 할머니는 부모 없이 자란 티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손주들을 돌본다. 좋은 옷과 신발은 아니어도 언제나 깨끗이 입히려고 애쓰고, 간식비라도 벌기 위해 부업에서 손을 놓지 않는다.
교통사고로 아빠를 잃고 엄마마저 집을 떠나게 된 아홉 살 소녀는 할머니와 함께 산다. 할머니는 양쪽 무릎이 고장 난 데다 혈압에 당뇨를 앓고 허리까지 굽었지만, 손녀를 위하여 힘든 농사일을 그만두지 못한다. 할머니마저 떠나면 어쩌나 겁부터 나는 아이는 서툰 솜씨로 밥상을 차리고 밭일을 거든다. 아이와 할머니는 서로에게 유일한 위안이자 버팀목이다.
할머니는 ‘부모의 어머니’ 혹은 ‘나이가 든 늙은 여성’을 일컫는 말이지만, 사전적인 풀이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할머니가 품고 있는 것은 그보다 훨씬 크고 깊다. 할머니라는 말은 원래 ‘한+어머니’라고 한다. ‘할’은 ‘한’이 변형한 것으로 ‘한’은 ‘큰’을 의미하는 고유어다. 그러니까 할머니는 ‘큰 어머니’, ‘위대한 어머니’, ‘대모(大母, Great Mother)’의 뜻이 크다고 하겠다. 할머니라는 말에 담긴 크고 넉넉한, 포근하고 따스한 이미지는 그로부터 비롯된 것일 테다.
할머니에게는 쪼개지고 깨지고 부딪치면서도 끝까지 살아낸 사람의 체험적 깊이가 녹아 있다. 주름지고 볼품없는 모습일지라도 그 속에는 생명을 낳아 품고 길러온 거인의 혼이 깃들어 있다.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품에 안은 포용의 힘. 어쩌면 신화 속의 ‘마고할미’나 ‘설문대 할망’, ‘삼신 할머니’의 강한 생명력과 지고한 사랑이 우리의 할머니로 이어 온 것이 아닐까.
할머니는 여전히 부러워하고 그리워하는 존재다. 내게는 채울 수 없는 결핍이기도 하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누군가의 할머니가 되어 내가 받고 싶었던 것을 돌려줄 수 있다면, 그래서 그 아이 가슴 속에 오래오래 ‘할머니’를 간직할 수 있게 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