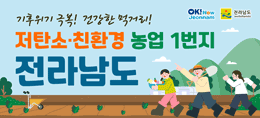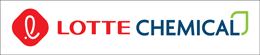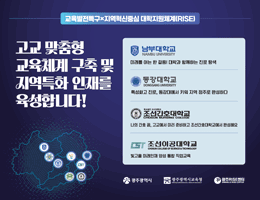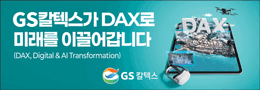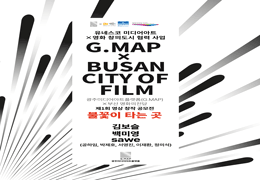트라우마 기억하기-채희종 정치담당 편집국장
 |
살다 보면 누구나 트라우마 하나쯤 갖고 산다. 일상이 힘들 정도인지, 견딜 만한 것인지의 차이일 뿐.
기자들은 대부분 사회부 사건기자 시절에 평생 겪을 충격적인 광경과 처참한 모습들을 접하게 된다. 안전 의식이 뒤떨어졌던 1990년대만 하더라도 사건·사고가 연일 일어나다시피 했다. 사건기자들은 사고 직후 심각하게 손상된 사체와 마주치는 일이 다반사였다.
30년이 다 된 일이지만 처음 접했던 사건이라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장면들이 있다. 1994년 겨울, 광주 충장로의 한 노래방에서 불이 나 미처 피하지 못한 손님 네 명이 숨졌는데, 소방관들이 들것에 실어 나오는 시신을 본 게 사달이 났다. 사체 네 구 중 한 구가 완전히 뼈만 남은 상태였는데, 불에 탄 사체를 처음 본 터라 잊을 만하면 떠오르는 게 여간 성가신 게 아니었다.
“잊지 않겠다”는 약속 지켜야
이 사건 이후 며칠이 지나 광주 서구 광천동의 한 가스충전소에서 폭발이 발생했다. 무너진 건물 잔해에서 찾아낸 사체를 소방관들이 들것에 싣는 데, 숨진 사람의 신체는 형태가 거의 사라지고 옷의 모양으로만 존재했다. 이후 머리 속 영상은 불에 타 뼈만 남은 사체 대신 투명 인간인양 옷으로만 남은 사망자의 그림으로 바뀌었다.
서너 달 뒤, 이 사건들이 지워질 정도의 트라우마를 안겨 준 대형 참사를 만나게 된다. 그때의 충격은 27년이 지난 지금도 동일한 위력을 발휘한다. 유사한 상황을 접하거나, 심지어 떠올리기만 해도 얼마 지나지 않아 눈이 충혈되고, 코가 막히면서 목까지 메는 것이다.
1995년 4월 28일 오전 출근 시간에 대구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폭발 당시 50m 넘는 불기둥이 치솟았으며, 수십 미터 지하 공사장을 지탱하던 철골 구조물과 도로 노면 역할을 하던 복공판(철판)들이 모두 흩어지거나 날아가 버렸다. 문제는 사고 지점을 지나던 버스와 승용차들이 폭발에 휩싸이면서 거의 모든 이들이 사망했다는 점이다. 무려 101명이 숨지고, 200여 명이 크게 다친 공사 현장 사고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참사였다.
사고 발생 소식을 접한 뒤 선배 기자와 함께 대구로 향했다. 이날 점심께 도착한 대구 현장은 마치 폭격을 맞은 전쟁터를 연상케 했다. 정신 없이 현장 취재를 한 뒤 대구에서 숙박하고, 다음날 오전 사고 지점 근처의 영남중학교를 찾았다. 이 학교 학생 42명과 교사 한 명이 탄 버스가 폭발 당시 현장을 지나다 사고를 당해 탑승객 모두가 그 자리에서 숨졌다.
학교에 막 들어서자, 희생자들의 관을 실은 운구차들이 줄지어 운동장을 한 바퀴 돈 뒤 장례식장으로 떠나고 있었다. 그 순간 한 어머니가 운구차를 가로 막더니 쓰러져 정신을 잃었고, 이어 여러 어머니들이 차량을 뒤따르며 울부짖기 시작했다. 울지도 못하고 신음 소리만 내는 이가 있는가 하면 터져 나오는 울음 위로 또다시 울음이 겹치면서 제대로 울지도 못한 채 컥컥거리는 이들도 있었다. 자식 이름을 부르며 운구차를 뒤따르다 쓰러지자 무릎으로 기는 어머니의 모습, 취재 수첩에 한 줄도 적지 못했지만 지금도 또렷이 기억나는 장면이다.
이때 이후로 자식을 잃어 절규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 조건반사인양 대구 폭발 사고 당시 어머니들의 모습이 떠오른다. 지금은 많이 엷어졌지만 아직도 눈이 붉어지고, 목이 메는 것은 여전하다.
안전 시스템 구축이 근본 치유책
사건의 제3자임에도 잊지 못하는 참사를 희생자 가족이나 당사자가 극복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우리 사회는 선진화를 거듭하고 있지만 참사로 인한 수많은 희생과 교훈은 공유하지 못하고 전수되지도 않는다. 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이 트라우마에 빠지고 “잊지 않겠다”는 다짐도 했지만, 이태원 참사로 또다시 부질없는 약속이 되고 말았다.
재난으로 인한 트라우마는 노력과 도움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부와 사회가 안전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같은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을 때만이 피해자들은 심리적 안정과 함께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지만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0여 일이 지난 현재에도, 우리는 여전히 안전 관리 시스템이 부재한 한국 사회를 목도하고 있다. 아직도 안전 관리 시스템의 운영과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스스로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세월호 참사 때 그랬듯이 여전히 우리는 컨트롤타워가 없는 셈이다. 한국 사회에서 재난으로 인한 트라우마 치유가 어려운 이유이다.
/채희종 정치담당 편집국장 chae@kwangju.co.kr
기자들은 대부분 사회부 사건기자 시절에 평생 겪을 충격적인 광경과 처참한 모습들을 접하게 된다. 안전 의식이 뒤떨어졌던 1990년대만 하더라도 사건·사고가 연일 일어나다시피 했다. 사건기자들은 사고 직후 심각하게 손상된 사체와 마주치는 일이 다반사였다.
“잊지 않겠다”는 약속 지켜야
이 사건 이후 며칠이 지나 광주 서구 광천동의 한 가스충전소에서 폭발이 발생했다. 무너진 건물 잔해에서 찾아낸 사체를 소방관들이 들것에 싣는 데, 숨진 사람의 신체는 형태가 거의 사라지고 옷의 모양으로만 존재했다. 이후 머리 속 영상은 불에 타 뼈만 남은 사체 대신 투명 인간인양 옷으로만 남은 사망자의 그림으로 바뀌었다.
1995년 4월 28일 오전 출근 시간에 대구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폭발 당시 50m 넘는 불기둥이 치솟았으며, 수십 미터 지하 공사장을 지탱하던 철골 구조물과 도로 노면 역할을 하던 복공판(철판)들이 모두 흩어지거나 날아가 버렸다. 문제는 사고 지점을 지나던 버스와 승용차들이 폭발에 휩싸이면서 거의 모든 이들이 사망했다는 점이다. 무려 101명이 숨지고, 200여 명이 크게 다친 공사 현장 사고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참사였다.
사고 발생 소식을 접한 뒤 선배 기자와 함께 대구로 향했다. 이날 점심께 도착한 대구 현장은 마치 폭격을 맞은 전쟁터를 연상케 했다. 정신 없이 현장 취재를 한 뒤 대구에서 숙박하고, 다음날 오전 사고 지점 근처의 영남중학교를 찾았다. 이 학교 학생 42명과 교사 한 명이 탄 버스가 폭발 당시 현장을 지나다 사고를 당해 탑승객 모두가 그 자리에서 숨졌다.
학교에 막 들어서자, 희생자들의 관을 실은 운구차들이 줄지어 운동장을 한 바퀴 돈 뒤 장례식장으로 떠나고 있었다. 그 순간 한 어머니가 운구차를 가로 막더니 쓰러져 정신을 잃었고, 이어 여러 어머니들이 차량을 뒤따르며 울부짖기 시작했다. 울지도 못하고 신음 소리만 내는 이가 있는가 하면 터져 나오는 울음 위로 또다시 울음이 겹치면서 제대로 울지도 못한 채 컥컥거리는 이들도 있었다. 자식 이름을 부르며 운구차를 뒤따르다 쓰러지자 무릎으로 기는 어머니의 모습, 취재 수첩에 한 줄도 적지 못했지만 지금도 또렷이 기억나는 장면이다.
이때 이후로 자식을 잃어 절규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 조건반사인양 대구 폭발 사고 당시 어머니들의 모습이 떠오른다. 지금은 많이 엷어졌지만 아직도 눈이 붉어지고, 목이 메는 것은 여전하다.
안전 시스템 구축이 근본 치유책
사건의 제3자임에도 잊지 못하는 참사를 희생자 가족이나 당사자가 극복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우리 사회는 선진화를 거듭하고 있지만 참사로 인한 수많은 희생과 교훈은 공유하지 못하고 전수되지도 않는다. 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이 트라우마에 빠지고 “잊지 않겠다”는 다짐도 했지만, 이태원 참사로 또다시 부질없는 약속이 되고 말았다.
재난으로 인한 트라우마는 노력과 도움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부와 사회가 안전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같은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을 때만이 피해자들은 심리적 안정과 함께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지만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0여 일이 지난 현재에도, 우리는 여전히 안전 관리 시스템이 부재한 한국 사회를 목도하고 있다. 아직도 안전 관리 시스템의 운영과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스스로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세월호 참사 때 그랬듯이 여전히 우리는 컨트롤타워가 없는 셈이다. 한국 사회에서 재난으로 인한 트라우마 치유가 어려운 이유이다.
/채희종 정치담당 편집국장 chae@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