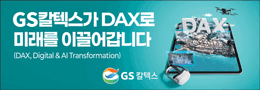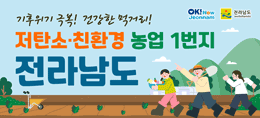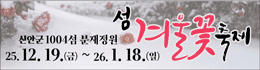광주 첫 문학관, 文·藝·人 교류하는 플랫폼으로
<23> 에필로그
작가의 삶·창작 열정 오롯이
문화·예술·사람 교섭하는 곳
내년말 개관 예정 광주문학관
콘텐츠·힐링의 복합공간으로
작가의 삶·창작 열정 오롯이
문화·예술·사람 교섭하는 곳
내년말 개관 예정 광주문학관
콘텐츠·힐링의 복합공간으로
 문학관은 작가의 생애와 창작에 관한 다양한 자료가 비치된 공간이자 문화와 예술, 사람이 교류되는 복합 문화공간이다. 내년 말께 개관 예정인 광주 첫 문학관은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할 뿐 아니라 힐링, 체험, 교육이 조화를 이룬 플랫폼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진은 곡성 조태일문학관. |
이제는 거론하기조차 식상한 ‘문학은 모든 문화의 기본’이라는 말은 역설적으로 문학의 중요성을 환기한다. 문학관은 작가의 삶과 창작의 여정이 실답게 응집돼 있는 공간이다. 지역문화의 기본 토대를 이루며 문화예술관광의 중요한 축을 담당한다.
특히 생가를 비롯한 작가의 창작 자료가 비치된 문학관은 콘텐츠 생산 기지, 나아가 문화관광 메카 등 주요한 구심점이 된다. 다시 말해 예술적 공간을 넘어 문학과 예술, 사람이 합류되고 교섭되는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문화공간으로 상정된다.
문화적 측면에서 한명의 위대한 작가나 시인은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재한다. 문인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애니메이션, 영화, 연극, 오페라, 뮤지컬, 출판, 테마파크 등 또 다른 주제로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文香이 흐르는 문학관을 찾아서’시리즈에서 다뤘던 문학관은 모두 22곳이다. 타 시도 유명 문학관 사례를 중심으로 향후 건립될 광주문학관 방향, 콘텐츠 구성 요소 등을 다각도로 검토 및 제언하기 위해 초점을 뒀다.
가장 먼저 지난해 초 신동엽문학관을 방문했다. 충남 부여에서 태어난 시인은 1959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장시 ‘이야기하는 쟁기꾼의 대지’로 등단했다. 1964년 시동인지 ‘시단’ 6집에 ‘껍데기는 가라’를 시작으로 1967년 장편 서사시 ‘금강’을 발표한다. 문학관에는 ‘껍데기는 가라’고 외쳤던 시인의 고결한 시혼이 응결돼 있다.
불의한 시대, 시로 맞섰던 ‘국토의 시인’ 조태일을 만나러 가는 길도 기억에 새롭다. 곡성 태안사에서 대처승 7남매 중 넷째로 태어나 문단에 나온 시인은 ‘시인’지를 창간하며 김지하, 양성우 시인 등을 배출했다. 태안사 동리산 자락에 위치한 기념관에는 2000여 점의 유품이 전시돼 있고 집무실이 재현돼 있다.
목가적 서정과 날카로운 저항의식을 읊조렸던 신석정 시인은 전북 부안이 낳은 브랜드다. 그는 일제강점기부터 4·19까지 격동의 현대사를 시로 읊었다. 지난 2011년 개관한 석정문학관은 유품, 원고, 기증 자료 등이 전시돼 있으며 무엇보다 문학관 인근에 자리한 고택 ‘청구원’은 마치 작가가 생존해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청마문학관은 경남 통영에 있다. 청마의 시를 잉태한 푸른 통영의 바다는 박경리, 김춘수, 윤이상, 전혁림 등 다수의 예술가를 배출했다. 한국시인협회 초대회장을 역임한 청마는 교육자로도 활동했다. 그는 ‘청마시집’,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등 주옥 같은 작품집을 펴냈다. 특히 여류시인 이영도는 청마와의 인연을 담은 ‘사랑했으므로 나는 행복하였네라’ 등을 발간하기도 했다.
지리산이 품고 지리산이 기른 작가 이병주는 하동에서 태어났다. 필화사건으로 2년 7개월을 복역하기도 했던 그는 ‘지리산’, ‘산하’ 등 80여 작품을 남겼다. 2008년 하동에 개관한 이병주문학관은 백일장, 강연회 등 의미있는 행사가 열린다. 특히 올해는 그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지난 4월 영호남 공동학술제가 열려 의미를 더했다.
장흥은 산자수명의 자연과 문림이라는 문학이 어우러진 고장이다. 이청준, 한승원, 송기숙, 이승우 등 한국 현대문학사에 내로라하는 작가의 고향이 장흥이다.
또한 기행가사의 효시인 ‘관서별곡’을 쓴 백광홍, 호남실학파의 대가 위백규의 탯자리도 바로 이곳인데, 사람들은 산자수명 풍광이 오늘날 문림(文林)의 터전이 됐다고 본다.
천관산문학관은 문림장흥(文林長興)의 역사를 살뜰히 담아낸 가장 장흥다운 역사성을 지녔다. 2008년 8월에 건립됐으며 고장을 대표하는 문학인들과 작품, 문학에 얽힌 이야기가 살아 숨 쉰다.
광활한 생명의 땅 순천만은 작가 김승옥과 정채봉을 낳았다. 이곳 순천문학관에는 두 작가의 삶과 문학 관련 자료가 비치돼 있으며, 순천만의 아름다운 풍광도 감상할 수 있다. 김승옥의 ‘무진기행’, 정채봉의 ‘오세암’에 담긴 감성과 창작에 얽힌 이야기는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이야기를 선사한다.
김제의 드넓은 평야는 조정래 작가의 대서사시 ‘아리랑’을 품었다. 이곳에는 작가의 취재과정, 창작 관련 자료를 토대로 지난 2003년 개관했으며, 인근에는 아리랑마을과 하얼빈역을 재현한 공간 등이 있어 ‘역사와 문학의 현장’을 오롯이 느낄 수 있다.
차범석, 박화성, 김우진, 김현의 문학혼이 응결된 목포문학관은 ‘목포는 문학이다’는 명제를 증명하는 공간이다. 갓바위 문화의 거리에 건립된 이곳에서는 남동극장, 문예대학, 어린이문학교실, 소설 창작 특강 등을 비롯해 다양한 문학행사가 진행된다.
이밖에 나주 백호문학관, 해남 땅끝순례문학관, 군산 채만식문학관, 공주 풀꽃문학관, 칠곡 구상문학관, 고창 미당시문학관 등은 지역의 대표 문인을 모티브로 건립된 대표 문화공간이다. 각각 특색있는 문학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문화발전을 견인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광주문학관 건립은 그 자체로 지난한 역사다.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인 지난 1996년 ‘문학의 해’ 대규모 문학동산 조성 계획이 문학관 시초였다 할 수 있다. 그동안 적잖은 갈등과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다행히 2018년 12월 문학관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완료됐다. 시는 ‘광주문학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보고회에서 각화동 시화문화마을을 1순위 후보지로 선정했으며 내년 12월께 개관할 예정이다.
특히 광주의 첫 문학관인 ‘광주문학관’ 콘텐츠를 어떻게 채울지는 매우 중요한 과제다. 향후 예술적 공간을 넘어 사유와 사유, 문화와 문화, 사람과 사람이 합류되고 교섭되는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공간으로서의 광주문학관을 기대하는 것은 비단 문학인들만의 바람은 아닐 것이다. <끝>
/글·사진=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특히 생가를 비롯한 작가의 창작 자료가 비치된 문학관은 콘텐츠 생산 기지, 나아가 문화관광 메카 등 주요한 구심점이 된다. 다시 말해 예술적 공간을 넘어 문학과 예술, 사람이 합류되고 교섭되는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문화공간으로 상정된다.
‘文香이 흐르는 문학관을 찾아서’시리즈에서 다뤘던 문학관은 모두 22곳이다. 타 시도 유명 문학관 사례를 중심으로 향후 건립될 광주문학관 방향, 콘텐츠 구성 요소 등을 다각도로 검토 및 제언하기 위해 초점을 뒀다.
불의한 시대, 시로 맞섰던 ‘국토의 시인’ 조태일을 만나러 가는 길도 기억에 새롭다. 곡성 태안사에서 대처승 7남매 중 넷째로 태어나 문단에 나온 시인은 ‘시인’지를 창간하며 김지하, 양성우 시인 등을 배출했다. 태안사 동리산 자락에 위치한 기념관에는 2000여 점의 유품이 전시돼 있고 집무실이 재현돼 있다.
목가적 서정과 날카로운 저항의식을 읊조렸던 신석정 시인은 전북 부안이 낳은 브랜드다. 그는 일제강점기부터 4·19까지 격동의 현대사를 시로 읊었다. 지난 2011년 개관한 석정문학관은 유품, 원고, 기증 자료 등이 전시돼 있으며 무엇보다 문학관 인근에 자리한 고택 ‘청구원’은 마치 작가가 생존해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청마문학관은 경남 통영에 있다. 청마의 시를 잉태한 푸른 통영의 바다는 박경리, 김춘수, 윤이상, 전혁림 등 다수의 예술가를 배출했다. 한국시인협회 초대회장을 역임한 청마는 교육자로도 활동했다. 그는 ‘청마시집’,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등 주옥 같은 작품집을 펴냈다. 특히 여류시인 이영도는 청마와의 인연을 담은 ‘사랑했으므로 나는 행복하였네라’ 등을 발간하기도 했다.
지리산이 품고 지리산이 기른 작가 이병주는 하동에서 태어났다. 필화사건으로 2년 7개월을 복역하기도 했던 그는 ‘지리산’, ‘산하’ 등 80여 작품을 남겼다. 2008년 하동에 개관한 이병주문학관은 백일장, 강연회 등 의미있는 행사가 열린다. 특히 올해는 그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지난 4월 영호남 공동학술제가 열려 의미를 더했다.
 장흥 천관산문학관. |
또한 기행가사의 효시인 ‘관서별곡’을 쓴 백광홍, 호남실학파의 대가 위백규의 탯자리도 바로 이곳인데, 사람들은 산자수명 풍광이 오늘날 문림(文林)의 터전이 됐다고 본다.
 장흥 천관산문학관. |
 순천문학관 |
김제의 드넓은 평야는 조정래 작가의 대서사시 ‘아리랑’을 품었다. 이곳에는 작가의 취재과정, 창작 관련 자료를 토대로 지난 2003년 개관했으며, 인근에는 아리랑마을과 하얼빈역을 재현한 공간 등이 있어 ‘역사와 문학의 현장’을 오롯이 느낄 수 있다.
차범석, 박화성, 김우진, 김현의 문학혼이 응결된 목포문학관은 ‘목포는 문학이다’는 명제를 증명하는 공간이다. 갓바위 문화의 거리에 건립된 이곳에서는 남동극장, 문예대학, 어린이문학교실, 소설 창작 특강 등을 비롯해 다양한 문학행사가 진행된다.
이밖에 나주 백호문학관, 해남 땅끝순례문학관, 군산 채만식문학관, 공주 풀꽃문학관, 칠곡 구상문학관, 고창 미당시문학관 등은 지역의 대표 문인을 모티브로 건립된 대표 문화공간이다. 각각 특색있는 문학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문화발전을 견인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광주문학관 건립은 그 자체로 지난한 역사다.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인 지난 1996년 ‘문학의 해’ 대규모 문학동산 조성 계획이 문학관 시초였다 할 수 있다. 그동안 적잖은 갈등과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다행히 2018년 12월 문학관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완료됐다. 시는 ‘광주문학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보고회에서 각화동 시화문화마을을 1순위 후보지로 선정했으며 내년 12월께 개관할 예정이다.
특히 광주의 첫 문학관인 ‘광주문학관’ 콘텐츠를 어떻게 채울지는 매우 중요한 과제다. 향후 예술적 공간을 넘어 사유와 사유, 문화와 문화, 사람과 사람이 합류되고 교섭되는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공간으로서의 광주문학관을 기대하는 것은 비단 문학인들만의 바람은 아닐 것이다. <끝>
/글·사진=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