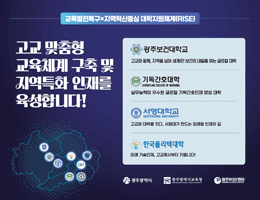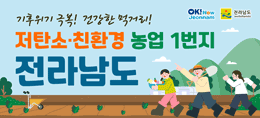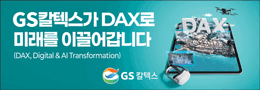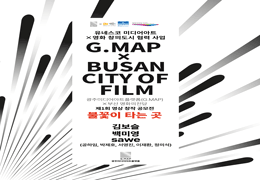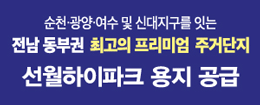10%만을 위한 스카이박스, 고려고
 |
언제부터인가 야구장이나 축구장, 심지어 영화관에도 스카이박스(skybox)라는 VIP좌석이 생겨났다. 기아챔스필드 야구장 스카이박스를 이용한 적이 있다. 뭔가 알 수 없는 우월감을 느끼게 하는 높은 위치의 독립된 공간, 소파와 탁자에 냉장고·TV·에어컨 등이 구비돼 있어 마치 스카이 라운지에서 경기를 내려다보는 느낌이랄까. 특히 소나기가 내리자 우왕좌왕하는 아래쪽 일반석과 달리 스카이박스에서 보는 야구장 풍경은 운치마저 느껴졌다. 스카이박스 요금은 1인당 6만 원으로 일반석의 5배 가량, 비싼 요금이지만 돈값을 한다는 생각에 아깝지는 않았다.
사람들은 부담되는 가격을 지불하되 약간의 호사(?)를 누리며 느끼는 만족감 때문에 스카이박스를 이용한다. 스카이박스 이용은 누군가에겐 사소한 일상이지만 어떤 이에겐 많은 기회를 포기해야 가능한 사치이다.
야구장 좌석 얘기를 취미나 스포츠가 아닌 사회 현상으로 풀어낸 이가 있다. 전 세계에 ‘정의론’ 열풍을 일으킨 ‘마이클 샌델’ 미국 하버드대 정치학 교수는 2012년 출간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에서 야구장 이야기를 했다. 예전에는 돈 있는 사람이든, 돈 없는 사람이든 함께 관람했다.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이 섞였으며, 비가 오면 함께 젖었다. 하지만 부자가 앉는 스카이박스가 생기면서 함께 어울리던 공간이 없어졌다. 서로 부대끼며 소통하는 공간과 경험이 사라진 것은 스카이박스에 앉아 내려다보는 사람이나 그 아래에서 올려다보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손실이라고 꼬집는다. 이런 현상을 샌델 교수는 ‘스카이박스화(skyboxfication)’라고 부른다. 개인이 소유한 돈과 권력, 학벌에 따라 박스가 정해지고 그 박스에 앉으면 다른 박스와는 구분돼 마주치지도 않게 되는 극단적인 단절을 이른다.
우리뿐만 아니라 선진 국가의 복지 정책과 사회 정의는 돈·권력·학벌 격차에 따른 부작용을 줄여 나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보편적 믿음과 바람이 영원히 꿈에 그칠지 모른다는 회의감이 들게 한 사건이 일어났다.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즉 SKY대학 입학률이 높아 광주지역 명문고로 꼽혔던 고려고가 수년간 시험 채점 및 점수 조작을 통해 ‘상위권 내신 몰아주기’ 입시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밝혀졌다.
애초 1학기 시험 문제 유출로 불거진 고려고에 대한 광주시교육청의 감사 결과를 보면 ‘이게 정말 학교인가?’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이 학교는 성적 상위 10%의 학생을 SKY에 보내기 위한 기숙형 학원이었고, 나머지 90%는 상위권 내신 성적을 위한 들러리였을 뿐이었다.
고3의 경우 문과 10명·이과 30명으로 구성된 심화반 학생들의 점수는 교사들의 특별 관리 대상이었다. 일부 학생들은 오답을 써도 정답 처리됐고, 빈칸으로 제출해도 5점을 줬으며, 동일한 답에는 일반 학생은 3점이지만 심화반 학생에겐 7점을 줬다. 더불어 시험 때면 심화반 학생들에게 최고난도 문제를 알려줬다.
이번 감사에 참여한 한 공무원은 “고려고가 지난 3년간 성적을 조작한 것은 수천 건에 이른다. 잘못된 내용이 너무 많아 분석할 수도 없다. 성적 관련 모든 사안을 분석한다면 이건 학교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오답과 빈 답에 점수를 주고, 몰래 시험 문제를 알려주는 것은 단순 비리가 아니다. 정당하게 시험을 치른 90% 학생의 점수와 내신을 빼앗은 범죄이다. 이 같은 행태가 장기간 지속되려면 학교와 교사, 상위권 학생과 학부모들이 공모를 하거나 묵시적인 동의를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학교든 학생이든 학부모든 SKY 입학을 목표로 삼는 것까지야 자유이다. 하지만 SKY 입학률을 높이기 위해 1등급 제자들의 점수를 조작해 올려 준 교사, 부정한 혜택으로 고득점을 받은 학생들, 이 같은 성적 조작의 고리를 쥔 학교와 학교 법인. 우리 사회가 이들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맞을까?
출발부터 반칙과 특혜를 가르치는 학교, 정당한 경쟁보다는 손쉬운 편법으로 성장한 이들이 성공하는 사회를 상상해본다. 이런 리더들이 이끄는 사회에 기본과 원칙이라는 구성원들의 보편적 사고가 통용될까.
고려고의 성적 비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교육계에 파다하게 알려진 일이다. 학교 법인이라고 성적 조작 비리를 몰랐을까. 법인에게 학교 관계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교육청의 요구가 너무나 한가롭기만 하다. 성적 조작은 학내 비리가 아니라 공문서나 사문서 조작이며, 대학 입학 자료라는 점을 감안하면 남의 성적을 떨어뜨린 사기 행위인 만큼 반드시 검·경 수사를 통해 관련자를 엄벌해야 한다.
광주 교육에 먹칠을 한 고려고는 지금까지 사과는커녕 교육청 감사 결과에 반발해 건물에 ‘근조’ 현수막을 내거는 등 후안무치로 일관하고 있다.
/chae@kwangju.co.kr
야구장 좌석 얘기를 취미나 스포츠가 아닌 사회 현상으로 풀어낸 이가 있다. 전 세계에 ‘정의론’ 열풍을 일으킨 ‘마이클 샌델’ 미국 하버드대 정치학 교수는 2012년 출간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에서 야구장 이야기를 했다. 예전에는 돈 있는 사람이든, 돈 없는 사람이든 함께 관람했다.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이 섞였으며, 비가 오면 함께 젖었다. 하지만 부자가 앉는 스카이박스가 생기면서 함께 어울리던 공간이 없어졌다. 서로 부대끼며 소통하는 공간과 경험이 사라진 것은 스카이박스에 앉아 내려다보는 사람이나 그 아래에서 올려다보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손실이라고 꼬집는다. 이런 현상을 샌델 교수는 ‘스카이박스화(skyboxfication)’라고 부른다. 개인이 소유한 돈과 권력, 학벌에 따라 박스가 정해지고 그 박스에 앉으면 다른 박스와는 구분돼 마주치지도 않게 되는 극단적인 단절을 이른다.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즉 SKY대학 입학률이 높아 광주지역 명문고로 꼽혔던 고려고가 수년간 시험 채점 및 점수 조작을 통해 ‘상위권 내신 몰아주기’ 입시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밝혀졌다.
애초 1학기 시험 문제 유출로 불거진 고려고에 대한 광주시교육청의 감사 결과를 보면 ‘이게 정말 학교인가?’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이 학교는 성적 상위 10%의 학생을 SKY에 보내기 위한 기숙형 학원이었고, 나머지 90%는 상위권 내신 성적을 위한 들러리였을 뿐이었다.
고3의 경우 문과 10명·이과 30명으로 구성된 심화반 학생들의 점수는 교사들의 특별 관리 대상이었다. 일부 학생들은 오답을 써도 정답 처리됐고, 빈칸으로 제출해도 5점을 줬으며, 동일한 답에는 일반 학생은 3점이지만 심화반 학생에겐 7점을 줬다. 더불어 시험 때면 심화반 학생들에게 최고난도 문제를 알려줬다.
이번 감사에 참여한 한 공무원은 “고려고가 지난 3년간 성적을 조작한 것은 수천 건에 이른다. 잘못된 내용이 너무 많아 분석할 수도 없다. 성적 관련 모든 사안을 분석한다면 이건 학교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오답과 빈 답에 점수를 주고, 몰래 시험 문제를 알려주는 것은 단순 비리가 아니다. 정당하게 시험을 치른 90% 학생의 점수와 내신을 빼앗은 범죄이다. 이 같은 행태가 장기간 지속되려면 학교와 교사, 상위권 학생과 학부모들이 공모를 하거나 묵시적인 동의를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학교든 학생이든 학부모든 SKY 입학을 목표로 삼는 것까지야 자유이다. 하지만 SKY 입학률을 높이기 위해 1등급 제자들의 점수를 조작해 올려 준 교사, 부정한 혜택으로 고득점을 받은 학생들, 이 같은 성적 조작의 고리를 쥔 학교와 학교 법인. 우리 사회가 이들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맞을까?
출발부터 반칙과 특혜를 가르치는 학교, 정당한 경쟁보다는 손쉬운 편법으로 성장한 이들이 성공하는 사회를 상상해본다. 이런 리더들이 이끄는 사회에 기본과 원칙이라는 구성원들의 보편적 사고가 통용될까.
고려고의 성적 비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교육계에 파다하게 알려진 일이다. 학교 법인이라고 성적 조작 비리를 몰랐을까. 법인에게 학교 관계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교육청의 요구가 너무나 한가롭기만 하다. 성적 조작은 학내 비리가 아니라 공문서나 사문서 조작이며, 대학 입학 자료라는 점을 감안하면 남의 성적을 떨어뜨린 사기 행위인 만큼 반드시 검·경 수사를 통해 관련자를 엄벌해야 한다.
광주 교육에 먹칠을 한 고려고는 지금까지 사과는커녕 교육청 감사 결과에 반발해 건물에 ‘근조’ 현수막을 내거는 등 후안무치로 일관하고 있다.
/chae@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