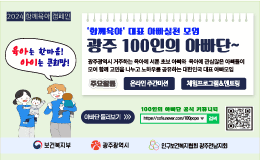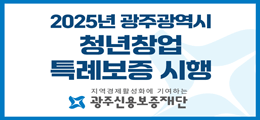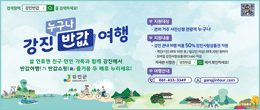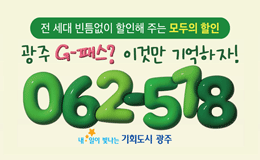“아이 러브 폴리”
 |
영국의 리버풀(Liverpool)은 팔색조 같은 도시다. 축구를 좋아하는 팬들에겐 명문 구단 리버풀 FC의 심장이고 음악을 사랑하는 마니아들에겐 비틀즈의 고향인 것처럼. 하지만 예술을 즐기는 애호가들의 생각은 다르다. 리버풀은 공공조형물 ‘수퍼램바나나’(Superlambanana·초대형 바나나 양)의 메카, 바로 문화도시다.
그도 그럴 것이 리버풀을 돌아다니다 보면 크고 작은 노란색의 ‘수퍼램바나나’를 만날 수 있다. 지난달 초 취재차 리버풀을 방문한 필자도 정체불명의 노랑조형물에 시선을 빼앗겼다. 몸은 바나나 모양인데 머리는 양의 형상을 한 게, 조금 기괴했다. 하지만, 1박2일 동안 길거리에서 자주 마주친 덕분인지 친근하게 느껴졌다. 실제로 조형물이 있는 주변엔 늘 사람들로 북적였다. 관광객들은 인증 샷을 찍느라 바빴고 아이들은 손으로 만져 보며 웃음꽃을 피웠다.
그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작품은 리버풀 시립미술관 야외광장에 폼 잡고 서있었다. ‘맨디 만다라‘(Mandy Mandala)라는 근사한 이름이 붙은 조형물은 5.2m 높이에 무게도 자그마치 8t이나 됐다. 그리고 미술관 구경을 마친 관람객들의 손엔 ‘수퍼램바나나’가 들려 있었다. 아마 미술관 아트숍에서 판매하는 미니어처 기념품을 구입한 듯했다.
‘수퍼램바나나’가 리버풀에 첫선을 보인 건 지난 2008년 유럽문화수도 프로젝트였다. 유럽문화수도로 지정된 리버풀은 1년간 문화로 도시를 재생시키는 프로그램을 전개하면서 상징 조형물 공모를 통해 일본작가 타로 치엔조(Taro Chienzo)의 ‘수퍼램바나나’를 선정했다. 과거 리버풀의 허브인 앨버트 독(Albert Dock)을 통해 거래되던 바나나와 양을 형상화한 작품은 리버풀의 역사와 유전공학의 위험을 함축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수퍼램바나나’는 1년간 거리를 수놓으며 전 세계에 리버풀을 상징하는 아이콘으로 각인됐다. 또한, 리버풀 시와 지역예술가들은 유럽문화수도가 끝난 이후에도 ‘수퍼램바나나’를 활용한 관광투어와 아트상품을 개발, 도시의 브랜드로 키워냈다.
리버풀을 떠나던 날, 기차역 입구의 ‘수퍼램바나나’를 본 순간 ‘광주폴리’가 문득 떠올랐다. 지난 2011년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특별프로젝트로 탄생된 이후 1∼3차에 걸쳐 30개가 광주 도심에 들어섰지만 이렇다할 존재감이 없어서다. 많은 시민은 폴리의 개별명칭은 고사하고 설치된 장소와 작품의미를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최근 광주비엔날레 재단이 주최한 ‘광주폴리, 문화도시 서른 개의 이정표:다시 & 미리보기’ 심포지엄은 매우 뜻깊은 자리였다. 이날 전문가들은 시민들의 일상을 넘어 지역의 문화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들을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특히 기조발제를 맡은 이용우 감독(상하이 예술프로젝트)의 메시지는 깊은 울림을 남겼다. “10년 후에도 폴리가 광주의 명물로 생명력을 갖기 위해서는 시민과의 소통을 고려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폴리의 무용론이 등장할지 모른다.” 이제 광주시와 비엔날레 재단이 답할 차례다.
〈제작국장·문화선임기자〉
그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작품은 리버풀 시립미술관 야외광장에 폼 잡고 서있었다. ‘맨디 만다라‘(Mandy Mandala)라는 근사한 이름이 붙은 조형물은 5.2m 높이에 무게도 자그마치 8t이나 됐다. 그리고 미술관 구경을 마친 관람객들의 손엔 ‘수퍼램바나나’가 들려 있었다. 아마 미술관 아트숍에서 판매하는 미니어처 기념품을 구입한 듯했다.
‘수퍼램바나나’는 1년간 거리를 수놓으며 전 세계에 리버풀을 상징하는 아이콘으로 각인됐다. 또한, 리버풀 시와 지역예술가들은 유럽문화수도가 끝난 이후에도 ‘수퍼램바나나’를 활용한 관광투어와 아트상품을 개발, 도시의 브랜드로 키워냈다.
리버풀을 떠나던 날, 기차역 입구의 ‘수퍼램바나나’를 본 순간 ‘광주폴리’가 문득 떠올랐다. 지난 2011년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특별프로젝트로 탄생된 이후 1∼3차에 걸쳐 30개가 광주 도심에 들어섰지만 이렇다할 존재감이 없어서다. 많은 시민은 폴리의 개별명칭은 고사하고 설치된 장소와 작품의미를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최근 광주비엔날레 재단이 주최한 ‘광주폴리, 문화도시 서른 개의 이정표:다시 & 미리보기’ 심포지엄은 매우 뜻깊은 자리였다. 이날 전문가들은 시민들의 일상을 넘어 지역의 문화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들을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특히 기조발제를 맡은 이용우 감독(상하이 예술프로젝트)의 메시지는 깊은 울림을 남겼다. “10년 후에도 폴리가 광주의 명물로 생명력을 갖기 위해서는 시민과의 소통을 고려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폴리의 무용론이 등장할지 모른다.” 이제 광주시와 비엔날레 재단이 답할 차례다.
〈제작국장·문화선임기자〉